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 2023년 상반기 한-코트디부아르 교역 동향
- 2022년 한-코트디부아르 교역 현황 2022년 한-코트디부아르 간 총 교역액은 1억 8,8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05% 감소하였고, 무역 수지도 9.52%의 하락세를 보였다. 우리나라의 대코트디부아르 수입은 2021년의 1,500만 달러에서 2022년 1,800만 달러로 20% 증가한 가운데, 수출은 1억 8,300만 달러에서 1억 7,000만 달러로 감소했다. <한-코트디부아르 3개년 수출입 실적> (단위: 백만 달러, %) 2020 2021 2022 증감률 (2021-2022) 수출액 113 183 170 -7.10 수입액 5 15 18 20 총교역 118 198 188 -5.05 무역 수지 108 168 152 -9.52 [자료: KITA] 2022년 한국이 코트디부아르로 수출한 상위 5개 품목은 합성수지, 건설장비, 기타 정밀화학원료 승용차 및 기타 어류로 나타났다. 합성수지의 2022년 수출액은 3,400만 달러로 1위를 기록했으나 전년도 대비 23.3% 감소하였으며, 승용차의 수출도 전년 대비 38.5%의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건설장비, 기타 정밀 화학원료, 기타 어류 및 의약품의 수출액은 각각 15.7%, 7.0%, 43.5% 및 41.4% 상승했다. <2022년 한국의 대코트디부아르 10대 수출 품목> (단위: 백만 달러, %) HS 코드 품목명 금액 증감률 (2021-2022) 1 2140 합성수지 34 -23.3 2 7251 건설장비 33 15.7 3 2289 기타 정밀 화학원료 26 7.0 4 7411 승용차 13 -38.5 5 0419 기타어류 10 43.5 6 2262 의약품 8 41.4 7 7412 화물자동차 7 -8.5 8 2190 기타 석유화학제품 4 -34.5 9 7111 원동기 4 10.4 10 8412 변압기 3 15,287.1 [자료: KITA] 2022년 한국이 코트디부아르로부터 수입한 주요 품목은 니켈광(800만 달러)과 동괴 및 스크랩(700만 달러) 등 원자재였다. <2022년 대한민국의 코트디부아르에서 수입된 주요 10개 품목 > (단위: 백만 달러, %) HS 코드 품목명 금액 증감률 (2021-2022) 1 1170 니켈광 8 0.0 2 6221 동괴 및 스크랩 7 -44.8 3 6211 알루미늄괴 및 스크랩 1 38.2 4 0134 식물성 액즙 1 3,253,829.6 5 0149 기타식물성재료 0 -48.8 6 5121 의자 0 0.0 7 7112 펌프 0 10,131.6 8 8151 계측기 0 0.0 9 2262 의약품 0 64.3 10 4411 편직제의류 0 81.3 [자료: KITA] 2023년 상반기 한-코트디부아르 교역 현황 2023년 상반기 한-코트디부아르 충 교역은 1억 1,400만 달러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14% 증가하였다. 수출은 1억 1,000만 달러로 지난해 상반기의 9,400만 달러 대비 17.02% 증가했으며, 수입은 600만 달러에서 400만 달러로, 33.33%의 하락세를 기록했다. <한-코트디부아르 2023년 상반기 수출입 실적> (단위: 백만 달러, %) 수출액 수입액 총교역 수지 2022년 상반기 94 6 100 88 2023년 상반기 110 4 114 106 증감률 17.02 -33.33 14 20.45 [자료: KITA ] 2023년 상반기 중에서는 4월의 수출이 2,300만 달러로 다른 달 대비 제일 많았다. <한-코트디부아르 2023 상반기 월별 수출입 실적> (단위: 백만 달러, %)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수출액 17 18 18 23 16 18 수입액 0 1 1 0 1 1 총교역 17 19 19 23 17 19 무역 수지 17 18 18 23 15 17 [자료: KITA] 2023년 상반기 한국이 코트디부아르에 수출한 주요 품목은 건설장비(28%), 합성수지(24%)이었으며 기타 정밀 화학 원료(11%), 기타 어류(7%) 및 승용차(5%) 등이 뒤를 이었다. 건설장비는 2022년 대비 97.3%의 뚜렷한 증가세를 기록하였으며 주요 품목은 지난해 대비 큰 변화가 없었다. <2023년 상반기 대한민국이 코트디부아르로 수출한 주요 10개 품목> (단위: %) HS 코드 품목명 점유율 증감률 (2022-2023) 1 7251 건설중장비 28 97.3 2 2140 합성수지 24 13.0 3 2289 기타 정밀화학원료 11 -2.2 4 0419 기타 어류 7 41.1 5 7411 승용차 5 -7.5 6 4490 기타 섬유제품 3 153.7 7 2262 의약품 2 18.3 8 5116 위생용품 2 29.5 9 7412 화물자동차 1 0.1 10 2190 기타 석유화학제품 1 -42.4 [자료: KITA ] 2023년 상반기 한국이 코트디부아르에서 수입한 주요 품목은 동괴 및 스그랩(54%), 알루미늄괴 및 스크랩(34%), 기타식물성 재료(6%) 순이었다. 2022년 수입품 1위였던 니켈광은(800만 달러) 올해 상반기에는 수입액이 없었던 부분이 눈에 띈다. <2023년 상반기 한국의 대코트디부아르 10대 수입 품목> (단위: %) HS 코드 품목명 점유율 증감률 (2022-2023 1 6221 동괴 및 스크랩 54 -61.1 2 6211 알루미늄괴 및 스크랩 34 188.3 3 0149 기타식물성 재료 6 -7.7 4 0134 식물성액즙 1 -88.8 5 5113 가방 1 0.0 6 9210 그림 0 0.0 7 7112 펌프 0 0.0 8 7111 원동기 0 0.0 9 5134 타악기 0 0.0 10 0131 식물성유지 0 0.0 [자료: KITA ] 시사점 코트디부아르와 한국의 무역 관계는 조금씩 발전하고 있기는 하지만 교역량은 여전히 미미하며, 코트디부아르는 한국의 교역 상대국 중 88위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코트디부아르는 연간 8%대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고 국가발전 5개년 계획은 물론 인프라 건설 등 다수의 프로젝트가 예정되어 있어 한국기업이 더욱 큰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자료: Global Trade Atlas, KITA, KSPI, 무역관자료 종합 등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아비장무역관 정현철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09.11
-

- 2023년 상반기 한국-중국 중부 6개성 무역 동향
- 한국과 중국 중부 6개성의 교역은 최근 3년간 평균 20% 증가하며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2022년 한국과 중국 중부 6개성(후베이, 후난, 허난, 안후이, 장시, 산시(山西)) 교역량은 역대 최대인 364억 2,00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다만 2023년 상반기는 대중국 전체 교역액이 약 16% 감소하였고, 중부 6개성과의 교역액도 156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 감소하였다. 하지만 어려운 여건에 불구하고 올해 한국-중국 중부 6개성 전체 교역액은 300억 달러 이상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ICT, 신에너지, 원자재 분야에서 양 지역 간 협력 확대로 교역 규모 또한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중부 6개성 경제 동향 및 한국과의 교역량 중국 중부 6개성은 후베이성(湖北省), 후난성(湖南省), 허난성(河南省), 안후이성(安徽省), 장시성(江西省), 산시성(山西省)을 칭하며, 토지면적은 중국 전체의 10.7%, GDP는 전체의 22.2%를 차지하는 인구 3억 6,500만 명의 초대형 경제권이다. <중국 중부 6개성 위치> [자료: 허쉰왕] 중부 6개성은 과거부터 풍부한 광물자원을 기반으로 철강 등 전통 산업 인프라가 발달해 있으며, 2010년 이후 중국 중앙정부의 중부지역 균형 성장정책 및 연안지역 경영환경 악화로 주요 산업 생산시설이 내륙지역으로 이전하면서 현재는 디스플레이, 전기차 등 새로운 IT 생산기지로 각광받고 있다. 2022년 기준 중부지역의 총 GDP 규모는 2조 7,000억 위안에 달하며, 최근 몇 년간 중국 4대 지역(중부, 동부, 동북, 서부) 중 성장률이 가장 빠른 지역이다. <2002~2022년 중국 4대 지역 GDP 비중 변화> image2.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17pixel, 세로 567pixel" src="https://dream.kotra.or.kr/attach/namo/images/000600/20230827151100288_TIJBH402.png" class="" style="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sans-serif !important; font-size: 18px !important; width: 598px;"> [자료: 각 지방 통계국, 웨카이(粤开)증권연구소] 지난 3년간 중국 중부 6개성도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성장률은 기대에 못 미쳤지만, 한국과의 교역액은 매년 약 20%씩 크게 증가하였다. 2023년 상반기 한국-중부 6개성 교역액은 전년 동기 대비 소폭 감소하였지만, 한중 전체 교역액 증감률(△16%)과 비교했을 때 약 9%p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한국-중부 6개성 교역 현황> 연도 무역 규모 (억 달러) 한-중부6개성 교역액 증감률(%) 2020년 242.6 20.3 2021년 310.2 27.9 2022년 364.2 16.3 2023.1~6월 156.0 -7.0 [자료: GTA] 한국의 對중부 6개성 주요 수출 품목 한국에서 중부 6개성으로 수출하는 제품은 IT 및 화학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또한 상위 10개 품목이 對중부 6개성 전체 수출 비중의 82.7%를 차지하고 있다. (1) 휴대폰 부품 중국 허난성에 위치한 세계 최대 애플 휴대폰 OEM 생산기지인 FOXCONN사를 중심으로 중부지역에는 다수의 휴대폰 생산기업이 소재하고 있어 한국산 휴대폰 부품에 대한 수요가 꾸준하게 있으며, 특히 올해 상반기 한국에서 수출한 휴대폰용 카메라 모듈 제품은 전체 중부지역 수출의 30% 이상을 차지하며 수출액 23억 달러 이상을 기록하였다. 그 외에도 기타 휴대폰 부품, 휴대폰 유리패널 등 제품이 상위 10개 품목에 포함되었다. (2) 전자칩(집적회로) 최근 몇 년간 중부지역은 중국의 새로운 IT 생산기지로 떠오르고 있다. 중국 디스플레이 3대 기업인 BOE, CSOT, TIANMA는 중부지역에만 9개 생산라인(우한 6개, 허페이 3개)에 투자했으며, YMTC 등 반도체 기업도 다수 소재하고 있어 IT 부품 및 생산 장비에 대한 수요가 크다. 2023년 상반기 기준 한국은 중국 중부지역으로 21억 달러 이상의 전자칩을 수출하였으며, 디스플레이 패널 생산 설비 등 생산장비는 전년 동기 대비 수출량이 감소했지만 계속해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그 외에도 폴리에틸렌, 화장품 등 제품도 각각 1억 달러 이상 수출되며 상위 10개 품목에 들어있다. <2023년 상반기 한국의 對중부 6개성 수출 품목 TOP 10> 순위 HS 코드 품목 금액 (천 달러) 성장률 (%) 금액 비율(%) 1 8529 (휴대폰) 카메라 모듈 2,320,062 17.9 30.9 2 8542 전자칩 (집적회로) 2,123,026 -31.7 28.3 3 8517 기타 휴대폰 부품 782,121 -19.1 10.4 4 8486 반도체/디스플레이 패널 생산 설비 232,204 -46.1 3.1 5 7003 휴대폰/컴퓨터 유리 패널 166,164 5.5 2.2 6 3901 폴리에틸렌(PE) 163,520 25.3 2.2 7 8524 LCD 패널 모듈 126,792 66.1 1.7 8 3304 기타 화장품 114,689 -16.9 1.5 9 3707 사진용의 화학조제품 88,213 -3.1 1.2 10 8471 하드디스크 86,984 -52.6 1.2 전체 무역 비중 82.7 [자료: GTA] 한국의 對중부 6개성 주요 수입 품목 중국 중부지역으로부터 한국에 수입되는 주요 제품은 수산화리튬 등 원자재 비중이 높으며, 스테인리스 강판 및 IT 부품도 상위 10개 품목 안에 포함되어 있다. 한국에서 수입하는 제품은 상위 10개 품목 외에도 다양한 제품을 수입하고 있어 상위 10개 품목이 對중부 6개성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4.4%에 불과하다. (1) 수산화리튬 등 원자재 ‘세계 리튬의 도시’라고 불리는 장시성은 광물자원이 다양하고 매장량이 풍부하며, 특히 수산화리튬 매장량은 중국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장시성에서 한국으로 수출되는 수산화리튬은 크게 증가하였으며, 올해 상반기도 전년 동기 대비 39% 증가한 약 14억 달러 수출되어 한국에서 수입하는 중국산 수산화리튬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했다. 그 외에도 광물자원이 풍부한 중부 6개성에서는 스테인리스 강판 등 철강제품 3억 달러 이상, 구리 1억 3,000만 달러 등이 한국으로 수출되었다. (2) 삼원계 양극재 최근 한국에서 2차전지 양극재에 대한 수요 증가로 우리기업과 중부지역에 소재한 로컬기업과의 협력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한국으로 수출되는 삼원계 양극재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올해 상반기 기준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90% 이상 증가한 6억 5,40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그 외에도 올해 상반기 천연 석재, 철강 제품 등이 많게는 3억 달러 이상, 적게는 1억 5,000만 달러 이상 한국으로 수출되었으며, 스마트폰 등 IT 기기도 상위 10개 수출 품목에 포함되었다. 최근 중국 중부지역 국제 물류 인프라 개선으로 해외로 직접 수출하는 물류량이 증가함에 따라, 앞으로도 더 다양한 제품이 한국으로 수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3년 상반기 한국의 對중부 6개성 수입 품목 TOP 10> 순위 HS 코드 품목 금액 (천 달러) 성장률 (%) 금액 비율(%) 1 2825 수산화리튬 1,399,614 39.0 17.3 2 2853 삼원 양극재 654,179 91.5 8.1 3 6802 천연 석재 321,263 274.1 4.0 4 8517 스마트폰, 무선 헤드폰 316,938 7.5 3.9 5 7219 스테인리스 강판 204,976 5.6 2.5 6 8471 테블릿 161,292 -58.7 2.0 7 7208 열연강판 152,995 77.0 1.9 8 9401 목재/강재 의자(차량용 포함) 136,546 41.3 1.7 9 7403 구리 및 구리 합금 132,620 -51.6 1.6 10 8534 인쇄회로(PCB) 114,882 -17.4 1.4 전체 무역 비중 44.4 [자료: GTA] 시사점 후베이성을 포함한 중국 중부 6개성은 중앙정부의 내륙지역 균형발전 정책과 안정적인 전통 산업 인프라, 그리고 3억 6,500만 명이 넘는 인구를 기반으로 연안지역에 비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중국에서 차지하는 GDP 규모는 2000년대 초반 10%대에서 2022년에는 22.2%까지 커졌다. 또한, 현재 중부지역 주요 도시의 도시화율은 65%를 넘어 과거와는 다르게 중국 젊은층이 내륙을 떠나지 않으며, 우한, 창사는 최근 2년간 인구 수 증가 1위 도시에 등극하였다. 내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지금, 중부지역 소비 성장률도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중국 상위권을 차지하였다. 최근 중부지역은 한국 입장에서 보면 글로벌 공급망 재편 시기에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이다. 중부지역은 리튬, 희토류, 구리 등 중요한 원자재가 풍부한 곳으로 실제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시작되면서 중국 6개성으로부터의 원자재 수입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2차전지에 중요한 원자재인 수산화리튬 수입이 크게 늘었다. 향후 글로벌 공급망 관리 차원에서 중부 6개성 소재 기업과의 더욱 긴밀한 협력이 필요할 것이다. 중국 중부지역은 내수경제 뿐만 아니라 대외무역도 중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 중 하나이다. 과거 철강 등 전통 산업 외에도 디스플레이, 전기차 등 주요 산업 생산시설이 계속해서 중부지역으로 이전하고 있으며, 우한-부산 강해(江海)직항로, 화후 물류공항 등 국제 물류 인프라 구축으로 비즈니스 환경이 개선되어 한국과의 교역액은 2022년에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대외무역 성장세가 가파르다. 향후 한중 무역에서 중국 중부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 GTA, 웨카이(粤开)증권연구소, 중국 상무부, 각 성(省) 통계국, KOTRA 우한무역관 자체 정리 자료 등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우한무역관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09.0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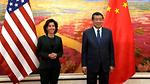
- 미 상무장관 방중, 주요 내용 및 현지 반응
- 지나 레이먼도 미국 상무부 장관은 8월 27~30일 베이징과 상하이를 방문하는 일정을 가졌다. 상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방중 의의는 “미중 상업 관계, 미국 기업이 직면한 과제, 잠재적 협력 분야와 관련해 건설적인 논의“를 진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무부 장관은 이번 일정에서 왕 원타오 중국 상무부장 외 후 허핑 문화관광부장, 국무원 총리 및 부총리, 상하이 당서기 등 고위급 인사와 면담을 진행했다. 상무부 장관의 방중은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6.18~19),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7.6~9), 존 케리 기후특사(7.16~19)에 이은 4번째 고위인사의 방문이었으며, 미국의 우려국 첨단기술 투자심사 행정명령 발표 이후, 주관 부처 장관 중 한명인 상무부 장관의 중국 방문 일정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었다. 회담 주요 내용 레이먼도 장관은 리창 총리와의 회담에서 미국이 지향하는 바는 중국과의 디커플링(De-coupling)이 아니라, 디리스킹(De-risking)이라는 점을 특히 강조했다. 연간 약 7,000억 달러를 기록하는 양국의 무역액을 예시로 언급하며, 미국과 중국의 경제는 상호 보완적이라는 점도 주장했다. 또한, 수출통제는 안보와 관련된 작은 부분에만 해당하며, 상호 이익이 되는 분야에서 무역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중국 측에 전달했다. 또한, 양국 상무장관은 회담을 통해 (1) 수출통제 집행 정보 교환 체결과 (2) 상업 문제 실무 그룹 창설을 통해 양국 간 소통 창구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수출통제 집행 정보 교환을 위한 첫 번째 만남은 베이징에서 차관보급(Assistant Secretary)으로 8월 29일 개최되었다. 상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양국 간 정보 교환은 미국 국가 안보 정책에 대한 오해를 줄이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주장했다. 실무그룹은 무역 및 투자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중국에서 미국의 상업적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미국과 중국 정부 관료 및 민간 부문 대표가 참여하는 협의 메커니즘이 될 전망이다. 실무그룹은 차관급 정기 회의를 매년 2회 가질 것으로 보도되었으며, 첫 번째 회의는 2024년 초 미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레이먼도 장관은 실무그룹이 이번 방중 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결과 중 하나”였으며, 방중 일정 수행 전 “100명 이상의 CEO와 비즈니스 리더의 요청에 대한 응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 기업들이 요청한 주요 사항은 ‘예측할 수 없는 규제 환경에 대해 건의할 수 있는 소통의 창’과 관련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외 주요 인사들과의 회담에서 레이먼도 장관은 2024년 상반기 중국에서 14차 중-미 관광 리더십 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으며, 행정적인 승인 과정에서 기업의 영업 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인 논의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양측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가 안보를 근거로 한 수출통제 정책에 대한 견해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먼저, 레이먼도 장관은 개회연설에서 미국의 국가 안보 문제는 협상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명확히 밝혔다. 반면, 왕 원타오 중국 상무부 장관은 미국이 국가 안보로 해석하는 범위가 중국의 견해보다 넓다고 반박했다. 관련 현지 반응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실무 그룹에 반대하는 서한을 상무부 장관에 전달했다. 하원 외교 위원회 의장 마이클 매콜, 하원 중국 특별 위원회 마이크 갤러거, 영 킴 하원의원, 빌 해거티 상원의원과 같은 공화당 대중 강경파들은 실무 그룹으로 인해 미국 정책의 실효성이 감소할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우려했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는 이에 대해 실무 그룹에서 논의될 사항은 일상적인 경제 활동에 그칠 것이라고 반박하며 우려를 일축했다. 반면 민주당 진 샤힌 상원의원은 성명을 통해 “양국 간 실용적인 접근 방식을 명확히 보여주었으며... 우리의 국가 안보 이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중국과 사업을 하고 미국인들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길을 찾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일부 기관은 레이먼도 장관의 기자 회견 발언인 “첫 번째 만남에서 모든 사안에 극적인 진전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를 인용하며, 상무부 장관의 이번 방중은 기존 기대치였던 미국 기업과 노동자들이 직면한 고충을 대변한 선에서 마무리 되었다고 평가했다. 션 스타인 주중 미상공회의소 회장은 미국 상무 장관의 5년 만에 방중이 미국 기업에 새로운 희망을 제공했다고 언급했다. 특히, 상무 장관이 중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 대표와 만나면서 불투명한 데이터 수집 및 전송 규칙, 많은 기술, 제약, 및 화학 회사가 직면한 장애물과 관련해 직접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긍정적인 기회로 평가했다. 자료: 미 상무부 보도자료, 월스트릿저널, 블룸버그, 폴리티코, 인사이드 트레이드 및 KOTRA 워싱턴무역관 보유자료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워싱턴무역관 이준성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09.07
-

- 프랑스 신재생에너지 정책 및 생산동향
- 프랑스 에너지 정책과 목표 프랑스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보면, 우선 다년도 에너지 계획법(PPE)이 있다. 2050년까지 탄소배출량 제로를 목표로, 프랑스 정부가 10년 동안의 이행 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한 에너지 정책이다. 2015년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 전환법’에 의해 제정됐으며 현재 2019~2028년까지의 생산목표가 설정된 상태로, 2019-2023, 2024-2028까지 5년간의 목표가 담겼다. <다년도 에너지계획(PPE) 생산목표 및 달성 추이(2019-2028)> 에너지원 종류 단위 달성 목표 2019 2020 2021 2023 2028 바이오매스 TWh 113 107 123 145 157~169 열펌프 TWh 32 33 43 39.6 44~52 지열 TWh 2 2 2 2.9 4~5.2 태양열 TWh 1.2 1.22 1.27 1.75 1.85~2.5 회수 열 에너지 TWh 14.6 14.7 N/A 24 31~36 바이오 가스 TWh 1.2 2.2 4.3 6 14~22 수력 GW 25.6 25.7 N/A 25.7 26.4~26.7 지상풍력 GW 16.6 17.7 18.8 24.1 33.2~34.7 태양광 GW 9.5 10.6 13.3 20.1 35.1~44.0 메탄가스 MW 225 250 278 270 340~410 해상풍력 GW 0 0 0 2.4 5.2~6.2 [자료: 프랑스 에너지 전환부(Chiffres Cles des energies renouvelables edition 2022)] 에너지 계획을 통해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는 2019년 개정된 ‘에너지기후법’에서 찾을 수 있는데 2020년까지 최종 에너지 소비 중 신재생에너지 비중 23%,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40% 감축, 2012년 대비 최종에너지 소비 20% 절감, 2012년 대비 1차 화석에너지 소비 40% 저감, 에너지 효율 27% 개선, 최종에너지 소비 중 신재생에너지 비중 33%에 도달한다는 목표다. 하지만, 프랑스의 2020년 최종 에너지 소비 중 신재생 에너지 비중은 19.1%로, 본래 목표였던 23%에 도달하지 못했으며, EU 국가 중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유일한 국가가 됐다. ‘재생 에너지 생산 촉진법’ 발효, ‘생태계획’ 로드맵 발표 예정 마크롱 대통령은 2022년 2월 에너지 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재생에너지 대규모 개발과 신규 원전 개발계획을 발표했다. 2050년까지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용량을 100GW 이상으로 10배 확대하고 해상풍력 발전소 50개를 건설해 40GW에 도달하며, 육상풍력 발전량을 40GW로 두 배 이상 늘리겠다는 목표다. 마크롱 대통령은 또한 2022년 9월 원자력, 풍력, 태양에너지 등 에너지 전환 사업이 보다 빨리 이루어지도록 가속화할 계획을 발표했으며 이후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법안이 국회에서 ‘재생에너지 생산 촉진법(loi relative a l’acceleration de la production d’energies renouvelables)’으로 발전돼 지난 2023년 3월 발효됐다. 재생에너지 개발 가속화 법안은 크게 4가지 방향으로 구성됐다. △지자체장과 협력하여 국토 내 재생에너지 배치 계획을 수립하고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며 △이미 재생에너지 개발이 이루어진 지역을 동원하고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의 가치를 관련 지역과 공유한다는 내용이다. 재생에너지 생산시설 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생산 속도를 높인다는 점이 핵심이고 1500m² 규모 이상의 옥외 주차장과 신축 또는 리노베이션 비거주용 건물의 지붕에 태양광 패널 설치 의무를 확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러-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프랑스 정부는 에너지 주권 회복을 강조하며 재생에너지 생산목표를 높이고 생산을 가속화할 의지를 보이고 있다. 2022년 마크롱 대통령의 재생에너지 개발계획 발표 후, 프랑스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달성을 위한 글로벌 비전인 ‘생태계획(la planification ecologique)’ 구체화 작업을 추진해왔다. 지난 5월 엘리자베스 보른 총리는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 감축 목표를 기존의 1990년 대비 40%에서 50%로 높여 발표했고(2023년 기준 프랑스는 25% 수준, 이를 위해서는 이산화탄소 환산톤(MteCo2)을 2022년 기준 4억8000만 톤에서 2억7000만 톤까지 줄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 30년간 달성한 것보다 향후 8년간 두 배가 많은 감축량이다. 이를 위해서는 2022년에 비해 건물은 53%, 에너지는 42.5%, 제조업에서는 37.5%까지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 이후 지난 6월 12일 프랑스 생태계획사무국(SGPE)은 엘리자베스 보른 총리가 발표한 목표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우선, 태양광의 경우, 2050년까지 발전 속도를 두 배 이상 높여 128~160기가와트(GW) 용량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일간지 르몽드에 따르면, 이를 위해서는 2023년부터 매해 3.7GW~5.5GW를 설치해야 한다. 2022년에는 총 2.4GW가 설치됐다. 해상풍력의 경우, 2050년까지의 목표를 기존의 40GW에서 45GW로 높였다. 현재 프랑스에 완공된 해상풍력단지는 브르타뉴 지역의 생-나제르 단지 한 곳이며, 2050년까지 50기 건설을 목표로 한 바 있다. 원자력의 경우, 현재 운영 중인 원전의 수명을 60년 이상 연장할 것을 검토 중이며, 2050년까지 6~14기의 EPR2 원자로를 시운전 한다는 목표를 재발표했다. 프랑스 정부는 ‘생태계획’실현을 위한 세부 사항을 2023년 9월 중으로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태양광 패널, 해상풍력 발전단지 현황 ① 태양광 프랑스는 유럽에서 일조량이 가장 좋은 나라에 속하지만, 주변 유럽국에 비하면 태양광 전력 생산량은 적은 편이다. 2022년 기준, 태양광에서 비롯된 프랑스 전력생산량은 총 19.1TWh로, 전년대비 30%가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고 한 해 프랑스 전력소비량의 4.2%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참고로, 독일과 이탈리아의 총 전략소비량 대비 태양광 패널 비중은 각각 7%, 8%에 달한다. 2023년 1분기 기준 프랑스의 태양광 전력생산량은 3.6TWh로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했지만 해당 분기의 프랑스 전체 전력생산량에서의 비중은 2.7%에 그쳤다. 프랑스 태양광 발전단지는 주로 프랑스 남부 지역에 설치되고 있으며 누벨-아키텐(Nouvelle-Aquitaine), 옥시타니(Occitanie), 오베르뉴-론-알프스(Auvergne-Rhône-Alpes), 프로방스-알프스- 코트 다쥐르(Provence-Alpes-Côte d’Azur) 지역이 2023년 1분기 신규설치 전력의 63%를 차지했다. <’23년 1분기 프랑스 지역별 태양광 발전단지 패널 현황> (단위: 개, MW, %) 지역 설치된 패널 수 전력량 2023년 신규 설치 전력량 MW 점유율 증가량* Auvergne-Rhône- Alpes 119,560 1,941 11 4 77 Bourgogne-Franche -comte 36,763 668 4 5 32 Bretagne 33,127 443 3 5 22 Centre-Val de Loire 25,367 857 5 7 53 Corse 2,553 220 1 1 2 Grand Est 53,689 1,1874 7 4 47 Hauts-de-France 35,791 454 3 4 18 ile-de-France 25,292 294 2 14 36 Normandie 22,853 278 2 3 9 Nouvelle-Aquitaine 103,291 4,041 24 3 117 Occitanie 118,797 3,269 19 3 84 Pays de la Loire 63,361 986 6 5 44 프랑스 전체 (해외영토 제외) 702,494 16,663 97 4 596 주*: ’22.12.31. 대비 전력량 증가비율 [자료: 프랑스 에너지 전환부] ② 해상풍력 프랑스는 유럽 제 2의 해안규모를 보유하고 있으나 해상풍력단지 건설 현황 및 발전 수준은 영국 등 주변국 대비 미약한 편이다. 2022년 12월 기준, 프랑스 풍력 발전 규모는 육상풍력 20.4GW, 해상풍력 0.5GW를 포함 총 20.9GW 수준을 기록했다. 프랑스는 2028년까지 해상풍력 5.2GW 생산을 목표로 지난 2011년부터 계속적인 경쟁 입찰을 통해 프로젝트를 지원해왔다. 프랑스 자체 대형터빈 제조사는 없는 상황으로, GE 등 해외 기업이 프랑스에 공장을 건설 중인 것으로 조사된다. 현재 프랑스 서부 생-나제르(Saint-Nazaire) 풍력단지가 2022년 완공 후 가동된 상태다. 6MW 터빈 80개가 설립되었고, 향후 25년간 연간 480MW 발전용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프랑스 해상풍력 프로젝트 및 개발 추이> (초록: 가동 중, 노랑: 건설 중, 회색: 프로젝트 단계, 회색F: 부유식) CLP0000910c3e54.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15pixel, 세로 476pixel" src="https://dream.kotra.or.kr/attach/namo/images/000611/20230905171742167_J980GH51.jpg" style="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sans-serif !important; font-size: 18px !important; width: 514px;"> [자료: revolution energetique ] 시사점 프랑스의 탈탄소 에너지 분야 산업이 정부의 적극적인 주도로 가속화될 조짐이다. 프랑스 정부가 주력하고 있는 태양광 패널, 해상풍력의 경우 프랑스 국내 시설 설비가 아직 충분치 않고 향후 지속적인 투자가 예상되므로 관련 분야의 진출 기회도 커질 것으로 판단된다. 프랑스 정부는 특히 공급망 안정성 확보를 위한 리쇼어링, 프렌드쇼어링을 유도하며 기존에 진행하던 생산세 감세 외에도 소득세 감세, 사회 분담금 감면 등 프로젝트별로 맞춤형 인센티브를 확대해 투자를 촉진해왔다. 또한, 최근 친환경 산업을 지렛대 삼아 제조업을 키우려는 녹색산업법을 발표한 바 있다. 기후변화의 위기를 계기로 프랑스 내 산업 환경을 전환한다는 계획으로, 프랑스 국내에 EU 가 지정한 친환경 기술(2차전지, 히트펌프, 풍력터빈, 태양광 패널) 산업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25%~45%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프랑스 정부의 투자지원 제도가 적극화 되고 있는 만큼, 해당 산업 부분의 다각도 진출 방안 검토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자료: 프랑스 에너지 전환부, 재생에너지 전문 정보 사이트 revolution energetique, 일간지 Le monde, Les echos, Le figaro, KOTRA 파리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파리무역관 곽미성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09.06
-

- 브라질, 신용등급 상향 조정 후 외국인 투자자 분위기 달라져
- 지난 6월 14일 신용 평가업체 S&P는 'BB-'인 브라질에 부여하는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변경했다. S&P가 브라질과 관련해 이처럼 긍정적인 평가를 한 것은 2019년 이후 처음이다. 이어 7월 26일에는 신용 평가기관 Fitch가 브라질의 국가 신용 등급을 "BB-"에서 "BB"로 상향 조정하고 전망은 ‘안정적’으로 평가했다. Fitch에 따르면 브라질의 신용등급 상향 조정은 최근 몇 년간 개혁 추구 노력, 이를 지원하는 적극적인 정부 정책 등과 향후 룰라 신 정부가 개선을 위해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는 기대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예상보다 좋은 결과를 보인 2분기 경제 성장률 등도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브라질 국가 신용 등급(2023.8.11. 기준)> [자료: Poder 360] 브라질의 신용 등급은 2018년 정부 재정 위기와 연금 개혁 승인 지연 등으로 인해 강등됐다. 그러나 이번 상향 조정에도 불구하고 브라질의 신용 등급은 아직까지 "투기적 수준"에 위치해있다. 이는 브라질이 단기적으로 위험에 덜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재정 및 경제 상황과 관련해서는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Fitch는 “2018년 신용등급 강등 이후 정치적 긴장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나 브라질 정부가 경제 및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개혁에 진전을 이루었다는 면에서 등급을 올렸다”고 언급했다. Fitch는 "브라질의 새로운 등급은 견고한 내수 시장을 가진 브라질의 크고 다각화된 경제와 충부한 유동성 등에 의해 뒷받침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지 통화 부채 비율이 높은 점(전체 부채의 약 94%)과 국제 파이낸싱에 대한 유연성 등이 환율 변동에 대한 위험과 노출을 완화하는 점 등도 등급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브라질 정부의 경제 활성화 노력 최근 룰라 정부는 연간 600억 헤알(125억 달러) 상당의 재원을 공공 인프라 확충에 투자하는 'Novo PAC(성장 가속화 프로그램)'를 추진 중이라고 발표했다. 새로운 성장 가속화 프로그램을 의미하는 'Novo PAC'는 국방, 교통, 도시 인프라, 위생 수도시설, 디지털 통합 및 연결성(connectivity), 에너지 보안, 사회 인프라 등 7개 카테고리로 구성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운 PAC의 주요 테마는 "개발과 지속 가능성"이며 지우마 정부를 비롯한 과거 정부 때 시작됐으나 재원 부족 등으로 중단된 프로젝트를 우선적으로 진행할 전망이다. 새로운 PAC에서 연방 정부는 PPP(공공-민간 파트너십), 양허 등과 같은 기존의 포맷을 유지할 예정이며 Petrobras 등과 같은 국영 기업들의 활발한 투자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etrobras의 경우 새로운 PAC 프로젝트에 약 3000억(625억 달러) 헤알의 상당의 투자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 개혁, 하원 통과로 가능성 높아져 Fitch는 브라질에서 정치적 갈등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나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공공 재정을 개선하기 위한 필수 조건인 '조세 개혁'이 추진되고 있음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브라질 정부는 등급 상향 조정 관련 논평에서 “조세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서 정부의 재정 건전성 확보 뿐만 아니라 금리 인하와 물가 안정을 보장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정부는 또한 "조세 개혁을 통해 국가 경제 및 사회 발전에 필수적인 요소인 공공 및 민간 투자 확대, 일자리 창출, 소득 증대 및 경제적 효율성 향상을 위한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중한 통화 정책 Fitch는 2023년 6월 물가상승률은 3.2%로 11.9% 기록한 전년 동월 대비 8.7%p 하락한 점을 언급하면서 중앙은행이 채택한 신중한 통화 정책을 유지한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중앙 은행은 수 개월 동안 높은 물가상승률이 지속되는 동안 신중하면서도 적극적인 통화 정책을 유지했으며 재정 불확실성, 고공 물가 행진 속에서도 2022년 8월 이후 13.75%의 기준 금리를 유지해왔다."고 언급했다. 중앙은행은 물가가 안정세를 지속함에 따라 지난 8월 2일 13.75%에서 13.25%로 0.5%p 인하했다. <기준 금리 변화(2022.03.16 ~ 2023.08.02)> [자료: 중앙은행, 2023.8.11.] 무역수지 및 외환보유고 브라질이 견고한 농업 생산과 환율 하락으로 인한 수입 비용 감소에 힘입어 2023년에 기록적인 무역 흑자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경상수지 적자는 2022년 GDP의 3.0%에서 1.8%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룰라 정부의 정치적 방향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면서 브라질 헤알화 가치는 점차 상승하고 있다. 현재 브라질의 외환보유고는 올해 상환해야 하는 부채의 약 8.4개월치에 맞먹는 액수이다 브라질은 현재 'BB' 등급을 보유한 국가 중 외환 보유고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등급 상향 조정 후 달라진 외국인 투자자 태도 지난 5월 Itaú BBA가 뉴욕에서 개최한 브라질 기업들의 주식 공모 행사에서는 브라질에 대한 외국 투자자들의 인식이 변화하기 시작했음이 감지됐다. 그 자리에서 Smartfit과 Oncoclínicas라는 두 개 업체가 계약을 체결했으며 Direcional 및 Localiza와 같은 업체의 주식 관련 대화도 무르익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 행사 이전 Itaú BBA는 국제 투자자들과의 태도에 대해 그다지 낙관적으로 평가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브라질의 신용 등급 상승이후 투자자들의 분위기가 바뀌면서 기 상장 기업 25~35개 업체들의 500억~600억 헤알 상당의 주식 거래가 기대되고 있다. Itaú BBA는 또한 금리 하락의 시작으로 인해 향후 기업간 인수합병(M&A)의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기업공개(IPO)는 올해 연말부터 시작해 2024년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IPO를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은 주로 에너지 및 보건위생 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브라질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분위기 전환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으로 나타났다. 다른 신흥 시장을 살펴보면, 우크라이나는 전쟁 중이고 중국은 지정학적 긴장 속에서 투자자들이 이 두 지역에서 멀어지는 가운데 브라질이 매력 있는 시장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세제 개혁 등 비즈니스 환경 개선도 외국인들의 투자 의지를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 하락이 시작되고 국가신용도가 상승하면서 외국인들이 브라질에 투자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인수합병과 이미 상장된 회사의 주식 공모에서 더 많은 계약이 체결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 하락으로 기업 가치가 향상되면서 상장기업은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하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근 몇 주 동안 브라질 기업의 4건의 인수합병이 있었다. 지난 몇 주 동안에만 Vale, Pismo, Rio Energy 및 Sinqia 등 최소 4개 기업이 인수합병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5월까지 는 4건에 불과했으나 시장 분위기가 전환되면서 5월 중순부터 현재까지 약 100억 헤알(21억 달러) 이상 규모의 M&A 9건이 성사됐다. 시사점 신용등급은 유연한 환율, 충분한 외환보유고 및 순채권국 지위 등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가 어느 정도의 충격 흡수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경제 전문가들은 "브라질이 현재의 등급을 유지 또는 상향 조정을 희망한다면 높은 정부 부채, 재정 경직성, 취약한 경제 성장 잠재력, 상대적으로 낮은 거버넌스 점수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라는 공통된 의견을 보였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전쟁 중이고 중국은 지정학적 긴장 속에서 신용등급 상향조정과 조세 개혁, 금리 인하 등으로 브라질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매력 있는 시장으로 떠올랐다. 우리 기업들은 브라질 기업의 인수합병 등을 통해 브라질 시장에 대한 투자 확대 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자료: UOL, Infomoney, Folha de São Paulo, O Estado de São Paulo, KOTRA 상파울루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상파울루무역관 최선욱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09.06
-

- 베트남 항공산업,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바람을 타고 날아오를 수 있을까?
- 베트남 항공산업 개요 베트남 민간 항공 산업은 1956년 1월 베트남 정부가 민간항공국(Civil Aviation Authority)을 설립하며 시작되었다. 그러나 전시 상황 및 경제 불황으로 인해 이 시기 베트남 민간 항공 산업은 소수 특권층 수요에 최적화된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1993년 베트남 국영 항공사인 베트남항공(Vietnam Airlines)가 설립된 1993년부터 2000년대 초까지는 높은 가격으로 인해 소수의 이용자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 이후 2007년에 베트남 최초의 저비용항공사(LCC) 비엣젯항공(VietJet Air)이 항공산업에 진출하면서 베트남항공의 독점 구조가 깨졌고, 이후 항공산업 전체가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베트남 민간항공국 통계에 따르면 2022년 베트남에서 이륙한 항공편은 총 313,223편으로, 이는 2019년 코로나19 발병 이전 대비 95% 수준이다. 2022년 항공 운송 물동량은 125만 톤으로 2019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추정된다. 현재 베트남 국적 항공사에서 소유한 항공기는 총 227대이다. 이 중 에어버스(Airbus) A321 기종이 대다수를 차지하여 에어버스가 베트남 항공사들의 최대 항공기 공급사로 자리 잡게 되었다. <베트남 국적 항공사별 보유 항공기 수> (단위: 대) 주: 베트남항공 그룹(Vietnam Airlines Group)은 베트남항공, 퍼시픽항공(Pacific Airlines), 바스코항공(VASCO) 포함 [자료: Planespotters] <항공사별 항공기 보유 현황> (단위: 대) 구분 에어버스 (Airbus) 보잉 (Boeing) 엠브라에르 (Embraer) ATR 베트남항공 그룹 (Vietnam Airlines Group) 91 15 - 6 비엣젯항공 (VietJet Air) 82 - - - 뱀부항공 (Bamboo Airways) 22 3 5 - 비엣트래블항공 (Vietravel Airlines) 3 - - - 합계 198 18 5 6 주: 좌측 열 – 베트남 국적 항공사, 상단 행 – 항공기 제조사 [자료: Planespotters] 글로벌 항공산업 공급망에서의 베트남의 활동 영역 <항공산업 공급망 체계> [자료: ICM Industrial, Aerospace Technology & IP Databank, KOTRA 하노이무역관 종합] 베트남은 현재 글로벌 항공우주 공급망에서 3차 부품사(Tier 3), 연구개발, 기술 서비스, 인력 양성 등 총 4개 부문에 주로 참여하고 있다. 부문별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품 공급 베트남에서 항공기 부품을 생산하는 공급 업체는 대부분 프랑스, 일본, 미국 등 해외 기업이 설립한 현지 기업으로, 해외 기업의 제조기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베트남 기업은 베트남 국영기업 비엣텔(Viettel) 그룹의 계열사 2개사가 부품 공급 업체로 확인되고 있다. 1) 에어버스 부품 공급 여행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프랑스 항공기 제조기업 에어버스는 2041년까지 신규 항공기 39,500대를 생산한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이 중 협동체(통로가 1개인 소형 기종)가 80%를 차지하며 나머지 20%가 광동체(통로가 2개인 대형 기종)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에어버스는 전 세계 15,000개 이상 공급업체에서 170만 개 이상의 부품을 공급받고 있으며,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이 에어버스에 부품을 공급하고 있다. 베트남은 2014년부터 항공기 날개 부품 샤크렛(Sharklet) 생산을 통해 에어버스 공급망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베트남에서 운영 중인 기존 에어버스 부품 제조 협력사 중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각각 호치민과 하노이에 위치한 메깃 베트남(Meggitt Vietnam), 니키소 베트남(Nikkiso Vietnam)이 있다. 메깃 베트남의 모회사는 영국 기업으로, 광동체 A330 및 A350 기종뿐만 아니라 협동체 A320 항공기에 사용되는 전기 기계장비를 공급한다. 니키소 베트남의 모회사는 일본 기업으로, 협동체 A320 기종의 샤크렛 구조물, 광동체 A330NEO 및 A350 기종 부품을 생산한다. 올해 3월 호앙 찌 마이(Hoang Tri Mai) 에어버스 베트남 지사장은 “베트남 항공 포럼 2023(Vietnam Aviation Forum 2023)”에서 베트남으로부터 부품 조달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2) 보잉 부품 공급 미국 항공기 제조기업 보잉은 구성품 및 부품, 소프트웨어 등 부문에서 베트남에 총 7개 공급사를 두고 있다. 이 중 일본 미쓰비시 그룹(Mitsubishi)의 자회사인 MHI 에어로스페이스 베트남(MHI Aerospace Vietnam)만이 보잉의 1차 부품사(Tier 1)이고, 나머지는 2·3차 부품사(Tier 2·3)에 해당한다. 베트남 기업으로는 국영 통신기업 비엣텔 그룹의 계열사인 VMC(Viettel Manufacturing Corporation)가 베트남 내 보잉의 3차 부품사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보잉은 지난 2021년 베트남에 상설 사무소를 개설하는 등 베트남의 항공사들과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특히 올 5월에는 스티븐 비건(Stephen Biegun) 보잉 수석부사장이 베트남 산업무역부(MOIT) 장관과의 대담에서 향후 항공 부품·장비 공급망 개발 및 투자와 관련된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향후 베트남 기업이 추가적으로 공급망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3) 기타 베트남 군영 통신기업 비엣텔 그룹의 계열사인 M3커뮤니케이션(M3 Communication Co., Ltd)은 2021년부터 항공기 모터 및 소형 발전기 부품을 메깃(Meggitt)에 공급하고 있다. 메깃은 항공우주, 방위, 에너지 산업에서 R&D, 설계, 제조 및 통합을 전문으로 하는 영국 기업이다. 메깃 생산품의 90%는 에어버스와 보잉에 공급되며, 나머지는 미국 군용기 제조사 록히드 마틴(Lockheed Martin)과 미국 군수업체 레이테온(Raytheon)에 공급된다. 2019년 미국 UAC(Universal Alloy Corporation)는 베트남 중부 다낭시에 항공우주 부품 제조공장 '다낭 선샤인(Da Nang Sunshine)'을 착공했다. 공장은 호아방현(Hoa Vang) 호아리엔(Hoa Lien) 하이테크 산업단지 내에 있으며, 초기 투자 규모는 1억 7,000만 달러에 달했다. 다낭 선샤인은 알루미늄 합금 소재로 된 항공우주 산업 부품, 원자재 및 조립공정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들 제품은 유럽, 북미, 말레이시아 등에 수출되어 보잉 항공기 생산에 투입된다. 한편, 한국 기업인 H사도 2018년 베트남 하노이 호아락(Hoa Lac) 하이테크 산업단지에 베트남 최초의 항공기 엔진 부품 제조 공장을 설립한 뒤, 공장을 점차 증설해나가는 등 현지 생산 거점을 기반으로 베트남 항공산업 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연구개발(R&D) 베트남 최대 ICT 기업 중 하나인 FPT 소프트웨어(FPT Software)는 에어버스가 미국 팔란티어(Palantir)와 협력하여 개발한 데이터 플랫폼인 스카이와이즈(Skywise)를 통해 에어버스와 협력하고 있다. 스카이와이즈는 항공사들을 대상으로 항공기 연료 소비 최적화, 운영 비용 절감, 항공기 유지보수와 같은 기능은 물론 물류, 공급망, 승무원 관리 등 항공사 운영과 관련된 다양한 기능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개방형 데이터 플랫폼이다. FPT 소프트웨어는 이를 다룰 수 있는 항공 전문 데이터 엔지니어 100여 명, 항공기 프로젝트 경험이 있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500여 명 등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역량을 바탕으로 FPT 소프트웨어는 2017년부터 스카이와이즈의 성능 개발에 있어 에어버스와 협력하고 있다. 기술 서비스 제공 베트남항공은 자회사인 VAECO(Vietnam Airlines Engineering Company)를 통해 전 세계 80개 이상의 민간 항공사에 유지보수 및 정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최초의 항공사이다. 이처럼 VAECO는 현재 베트남 국적 항공기 유지보수 및 정비 시장의 최상위권으로 평가받고 있다. VAECO는 미국 연방항공청(FAA)과 EU 항공안전청(EASA)의 항공기 정비 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다. 현재 하노이 노이바이 국제공항(Noi Bai)과 호치민 떤선녓 국제공항(Tan Son Nhat)에 정비 시설 2개 및 격납고 6개를 보유 중이며, 협동체와 광동체 모두 정비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VAECO의 매출액은 2조 650억 동(8,640만 달러)를 기록했다. 2019년, VAECO는 싱가포르의 ST 엔지니어링 에어로스페이스(ST Engineering Aerospace)와 베트남 최초로 항공기 정비 합작회사 VSTEA(Vietnam Singapore Technologies Engineering Aerospace)를 설립했다. VSTEA 출범을 통해 베트남항공 그룹은 항공기 장비 유지보수 및 정비 시장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첨단 기술 이전 및 항공 기술 인력에 대한 전문 교육 기회 또한 창출하고자 하고 있다. 인력 양성 현재 베트남에서 항공공학을 교육하는 학교는 다음과 같다. <베트남 내 항공공학 교육 기관 목록> • 하노이 과학기술대학교(Hanoi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 호치민시 국가대학교 내 과학기술대학교 (Ho Chi Minh City National University -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 군사 기술 교육원(Military Technical Academy) • 베트남 공군사관학교(Vietnam Academy of Air Force - Air Defense Force) • 공군 장교 학교 (Air Force Officer School) • 베트남-프랑스 대학교 내 하노이 과학기술대학교 (Vietnam-France University -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of Hanoi) • 베트남 항공 교육원(Vietnam Aviation Academy) [자료: KOTRA 하노이무역관 종합] 군사 훈련을 전문으로 하는 대학 외에도 하노이 과학기술대학교, 호치민시 국가대학교 내 과학기술대학교는 베트남에서 가장 우수한 항공공학 교육을 제공한다고 알려져 있다.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항공역학, 비행역학 및 제어, 항공 구조, 추진 시스템, 항공 설계 및 유지보수와 같은 내용을 학습할 수 있으며, 관련 학과에서는 매년 학부 이수 이후 프랑스에서 항공공학을 공부할 수 있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전시회 정보 <전시회 기초 정보> 1) 행사명: 에어로엑스포 하노이 & 베트남 항공 포럼 (AeroExpo Hanoi & Vietnam Aviation Forum) 2) 주관: 프랑스 아베(Advanced Business Events, ABE) 3) 협력: 베트남 산업무역부(MOIT) 4) 행사 기간: 2024년 4월 17~19일 5) 행사 내용: 항공산업 내 지속가능한 생산, 공급 및 서비스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6) 웹사이트: https://aeroexpo.com.vn/ 베트남 항공 포럼은 2023년 초에도 개최된 바 있으며, 당시 행사에는 에어버스, 보잉, 사프란(Safran), 탈레스(Thales), 미쓰비시, 파커(Parker), 중국남방항공, 중국동방항공 등 주요 글로벌 항공사와 프랑스, 독일, 미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중국, 일본, 한국 등 50여 개 해외기업이 참가했다. 새로운 공급망을 개발하기 위한 파트너 발굴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면서, 투자자들은 향후 인도, 중국 등에 위치한 생산 공장을 베트남으로 이전하는 것을 목표로 베트남 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이러한 전시회를 참가하고 있다. 시사점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흐름에 따라, 에어버스 및 보잉 등 세계적인 항공기 제조 기업들이 베트남과의 협력을 점차 확대해나가고 있다. 아직은 베트남의 공급 업체들이 3차 부품사에 주로 머물고 있으나, 글로벌 기업의 지원을 받아 1·2차 부품사로 성장하며 공급망 재편의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그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우리 기업 또한 베트남 항공 산업 시장 동향을 면밀히 관찰하며 동반 성장 기회를 모색해 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공동작성: Tang Thanh Lam, 박정호 자료: Planespotters, ICM Industrial, Aerospace Technology & IP Databank, VnEconomy, KOTRA 하노이무역관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하노이무역관 이언정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09.05
-

- 2023년 독일 바이에른주 경제동향
- 바이에른주는 독일 16개 연방 주 중 1개 주에 불과하나 GDP가 EU회원국 27개 중 24개 국가보다도 높다. 1인당 GDP 또한 5만3768유로(5만6456달러)로 독일 전체 4만5993유로(4만8636달러)와 유럽 GDP 평균인 3만2343유로(3만3961달러)보다 높다.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인 BMW, Audi와 인더스트리 4.0의 대표 기업인 지멘스 등 독일의 대표 기업이면서 미래의 혁신을 주도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소재한 바이에른 주의 2023년 경제 동향과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진출 전략을 조망한다. 주*: 27개 EU 회원국(1인당 GDP순):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덴마크, 네덜란드, 스웨덴, 오스트리아, 핀란드, 벨기에,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몰타, 사이프러스, 슬로베니아, 스페인, 에스토니아, 체코, 리투아니아, 포르투갈, 라트비아, 그리스, 슬로바키아, 헝가리, 폴란드, 크로아티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바이에른주 기본 정보 바이에른주는 독일 동남부에 위치하고 동쪽으로는 체코, 남쪽으로는 오스트리아, 스위스와 접경하고 있다. 바이에른주의 총면적(2020년 기준)은 70,541㎢이며, 16개 독일 내 연방 주 가운데 가장 넓다. 인구 수도 2022년 1336만9393명을 기록해 서북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1813만9116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바이에른주의 주도는 뮌헨이며, 2018년 3월 취임한 기사당(CSU) 마르쿠스 죄더(Markus Söder)가 주 총리를 맡고 있다. 바이에른주 주요 경제 지표 바이에른주에는 아디다스, 알리안츠, 아우디, BMW, MTU Aero Eingines, MAN, Siemens, KUKA 등 글로벌 기업뿐만 아니라 제조업, 서비스업 분야에 두루 걸쳐 뛰어난 중견기업들도 소재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 및 자동화 기술 업체들과의 접근성이 좋아 Google, Amazon, Microsoft 등 빅테크가 유럽의 허브로 삼고 있으며 IT 스타트업들도 몰려들고 있다. 바이에른주의 1인당 GDP는 5만3768유로에 달하며 독일 내에서 함부르크를 제외하고 가장 부유한 연방 주이다. <바이에른주와 독일 및 유럽 전체 GDP 비교> 구분 GDP(백만 유로) 1인당 GDP(유로) 바이에른 주 716,784 53,768 독일 3,867,050 45,993 유럽(27개국) 16,613,060 35,500 [자료: 바이에른주 통계청, 2023] Adidas, Audi, BMW, Siemens 등 유명한 글로벌 기업들의 본사가 있는 바이에른주의 2022년 GDP는 코로나 위기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약 8.3% 성장해 7167억 유로를 기록했다. 이는 접경하고 있는 이웃 국가인 오스트리아(약 4469억 유로)와 체코(약 2762억 유로)를 합친 규모이다. 바이에른주는 스위스(약 7625억 유로), 폴란드(약 6569억 유로)와 비슷한 경제 규모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바이에른주의 실업률은 독일 내 최저를 자랑한다.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2022년과 2023년 독일 전체의 실업률이 5.7%, 수도 베를린의 실업률이 9.8%, 9.1%에 육박했으나, 바이에른 주의 실업률은 3.5%와 3.3%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고용 상황을 나타냈다. <2022~2023 독일 연방 주별 실업률> [자료: 독일연방 고용통계청(Statistik der Bundesagentur für Arbeit, Sonderauswertung, Jahresdurchschnittswerte)] 바이에른주 수출입 동향 2020년과 2021년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과 2022년 러-우 사태로 당시 교역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전망했으나 2022년 독일과 바이에른주의 교역량은 오히려 증가했으며 바이에른주의 수출 증가율은 독일 수출 증가율을 상회하기까지 했다. <독일과 바이에른주의 교역동향 변화 추이/비교> (단위: 십억 유로, %) 2021년 2022년 독일 바이에른 독일 증감 바이에른 증감 수출 1,460.1 189.9 1,576.76 7.9 216.4 13.9 수입 1,266.1 221.8 1,494.19 18 250.5 12.9 [자료: 바이에른 경제부, Statista] <한국의 대바이에른주의 교역규모> (단위: 백만 유로, %) 구분 2021년 2022년 대바이에른 수출 1,980 2,401 대바이에른 수입 3,314 4,050 교역 규모 5,294 6,451 [자료: 바이에른주 통계청] 2022년 우리나라의 대바이에른 수입액은 약 40억3000만 유로로 전년 대비 약 22% 증가했으며, 수출액은 약 24억100만 유로로 전년대비 약 21.2% 증가했다. 코로나와 러-우 사태 등 연이은 악재에도 불구하고 2022년 우리나라와 바이에른주 간의 교역량은 전년 대비 약 21% 증가한 64억5000만 유로를 기록했다. 바이에른주의 주요 수입 품목인 기계, 전자 부품은 우리나라의 대독 주요 수입 품목과 유사하며 특히 독일 자동차 산업이 기존 내연기관 차량에서 전기차로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우리나라와 협력이 증가해 교역량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바이에른주의 주요 수입국인 중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대비 우리나라 제품의 수입 점유율은 여전히 3% 미만에 불과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한 점유율 확대가 필요하다. 바이에른주 소재 대표기업 대표적인 스포츠 기업 Adidas, 프리미엄 완성차 BMW, 인더스트리 4.0으로 대변되는 Siemens 등 독일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바이에른 주에 본사를 두고 있다. <바이에른주 소재 주요 독일 기업> 순위 기업명 품목 소재지 2022 매출 (십억 유로) 1 Allianz SE 보험 뮌헨 152.7 2 BMW AG 자동차 뮌헨 142.6 3 Siemens AG 엔지니어링 뮌헨 72 4 Munich RE 재보험 뮌헨 67.1 5 Audi AG 자동차 잉골슈타트 61.8 6 KUKA AG 산업 로봇 아우그스부르크 39 7 Adidas AG 스포츠용품 헤르초게나우라흐 22.5 8 Baywa AG 농업 및 건설자재 무역 뮌헨 27.1 9 Schaeffler AG 자동차 부품 헤르초게나우라흐 15.81 10 MAN 상용차 및 엔진 제조 뮌헨 11.3 11 Infineon AG 반도체 뮌헨 근교 14.2 [자료: KOTRA 뮌헨 무역관 정리] 특히, 바이에른주에는 미래 자동차, 산업 자동화, 반도체 등 하이테크 산업이 집중돼 있다. BMW는 유럽 국가들의 주요 프로젝트인 IPCEI(Important Project of Common European Interest) 배터리 선도기업으로 선정돼 차세대 리튬 이온셀, 배터리 모듈 및 시스템 콘셉트뿐 아니라 프로토타입의 생산시설 개발을 진행 중이다. BMW는 2030년까지는 전체 차량의 50%를 전기차로 판매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미래 차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이를 위해 새로운 동력장치와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다. BMW는 2022년 하반기 뮌헨 근교의 파스도르프에 ‘배터리 셀 제조센터(Cell Manufacturing Competence Center)’를 개소해 새로운 제품군에 탑재될 고체 연료전지 생산을 테스트하고 있으며 삼성 SDI와 밀접히 협력하고 있다. 트럭 등 대형차를 제조하는 MAN 또한 엄격해지는 유럽연합 기후 규제에 발맞추어 수소와 전기차에 집중하며 2024년부터 전기 구동장치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다. Audi도 2026년부터 순수 전기차 전용모델 출시를 목표로 2023년부터 내연기관 모델 생산을 종료할 계획이다. 독일 자동차 산업은 전반적으로 전기차 라인업을 강화하는 등 기후변화 목표 달성을 위해 급격하게 전기차 플랫폼으로 전환하고 있다. 독일 자동차 제조사기업의 미래차 전환은 2035년부터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모든 차량의 판매가 금지되는 등 EU의 강력한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정책이 영향을 미친 결과이다. 바이에른주 한국 진출기업 정보 BMW와 밀접한 협력관계에 있는 Tier1/Tier2가 다수 진출해 있으며 삼성SDI, 삼성전자 반도체 유럽법인 등 대기업을 포함 총 22개의 한국 기업이 바이에른주에 진출해 있다. 특히, 2021년 뮌헨 무역관이 신규 개소한 KOTRA GP센터를 통해 5개사가 추가 진출했다. <바이에른주 소재 한국 기업 리스트> 연번 기업명(가나다 순) 소재지 분야 1 남양넥스모 뮌헨 자동차 조향장치 2 네오팩트 뮌헨 재활 의료기기 3 두산전자 뮌헨 자동차 전장부품(FPCB) 4 디엠티 에르딩 플라스틱 부품 5 뷰런테크놀로지* 뮌헨 라이다 소프트웨어 6 삼성전자 반도체 유럽법인 뮌헨 반도체 7 삼성SDI 유럽법인 이즈마닝 전기차 배터리 8 서울로보틱스 뮌헨 라이다 센서 연계 SW 9 서울반도체 뮌헨 LED 10 성우하이텍(WMU Bavaria) 니더라이히바흐 자동차 프레스 금형 11 센서뷰 뮌헨 케이블, 광통신 안테나 12 유진로봇 뮌헨 산업용 로봇 13 아우토크립트* 뮌헨 자율주행 보안시스템 14 알피니언메디칼시스템 할베르그무스 의료 초음파기기 15 에이디테크놀로지 뮌헨 반도체 소자 설계 및 제조 16 에스엘 뮌헨 자동차 LED 헤드램프 17 인지컨트롤스* 뮌헨 자동차부품 18 일진베어링 슈바인푸르트 자동차 베어링 19 LG전자 뮌헨 전장부품 20 펨트론 펠트키르헨 반도체 검사장비 21 텔레칩스* 운터푀링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22 현대로보틱스 뮌헨 산업용 로봇 주*: 5개 GP 센터 입주기업 [자료: KOTRA 뮌헨 무역관 정리] 바이에른, 독일 DX의 중심지로 발돋움 팬데믹 이후 디지털라이제이션(DX)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독일 연방정부는 DX 투자를 늘리고 있다. 특히 독일의 ‘실리콘밸리’, 즉 ‘이자르밸리’로 불리는 뮌헨을 중심으로 바이에른주가 DX와 인공지능(AI) 분야의 중심지로 거듭나고 있다. 2022년 바이에른주의 DX 지수는 130.6으로, 독일 내에서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2020년 DX지수 100을 기준으로 매년 독일 연방 경제 및 기후 보호부가 발표한 수치로 바이에른주의 DX 성과를 여실히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바이에른주 정부의 노력과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미 2019년부터 바이에른주는 대학과 연구소에 총 20억 유로를 투자해 디지털과 AI 분야의 기업 양성을 지원해 왔는데, 이는 '하이테크 어젠다 바이에른: 현대화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바이에른 디지털부는 '바이에른 디지털 파켓'(DIGITALPAKET) 프로그램을 통해 독일 연방정부로부터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디지털화 분야에 총 60억 유로를 투자를 받아 DX 가속화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 투자로 바이에른주는 기술과 혁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DX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바이에른주 정부는 더 나아가 소관부서인 디지털부를 중심으로 추가적인 개발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바이에른주 내에서는 100개의 연구소와 대학에 디지털과 AI 교수직을 신설하는 등 인력 양성에도 주력하고 있다. 2023년에는 독일 주 정부로부터 5억 유로를 추가로 투자받아 DX 관련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며 항공 우주 전문가들과 위성기술을 활용해 DX 응용이 가능한 분야를 분석할 예정이다. 이처럼 바이에른주는 디지털화와 인공지능 분야에서 엄청난 성과를 거두며 독일 내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노력과 투자가 계속될 경우 바이에른은 국제적으로도 주목받는 디지털화 허브로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韓‧EU 디지털 파트너십 체결과 이후 韓‧바이에른 교역 전망 2022년 한국과 유럽연합(EU) 간의 디지털 파트너십(Digital Partnership) 체결로 인해 한국과 독일 바이에른 간의 디지털 교류 장벽이 크게 낮아지게 됐다. 이러한 파트너십은 한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EU 내수시장집행위원을 수석대표로 하는 양자회담을 통해 구체화됐으며, 2023년부터는 연 1회 개최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한국과 EU 간의 협력이 강화되며, 디지털 분야의 혁신과 발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디지털 파트너십의 첫 협의회에서는 11개의 협력 과제 중 6개 분야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이 중에서도 반도체, 초고성능 컴퓨팅(HPC)과 양자기술, 사이버보안, 5G·6G, 인공지능, 온라인·디지털 플랫폼 등 디지털화(DX) 관련 분야가 포함됐다. 특히 인공지능과 관련된 법‧정책 추진 현황을 주기적으로 공유하고 소통 채널을 구축하며, AI 글로벌 파트너십인 GPAI 내에서의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등 디지털화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이 제시됐다. 이로 인해 한국 기업과 독일 바이에른 소재 기업 간의 교역 가능성이 크게 확대됐다. 특히 IT 산업에서 바이에른이 가지는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며, 한국 기업과 전문 인력이 바이에른 뮌헨으로 진출하는 과정이 더욱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DX와 인공지능 분야에서의 역량 공유와 협력으로 인해 양국의 기술 또한 혁신을 거듭할 것으로 기대된다. 디지털 파트너십 체결 이후 팬데믹으로 급증한 DX 수요가 2022년부터는 다소 주춤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디지털 및 AI 업계 매출은 여전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독일 기업의 DX 관련 주요 카테고리인 프로세스, 제품, 비즈니스 모델, 자격 검증, 연구 활동 등에서도 디지털화 지수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며, 프로세스 자동화(129.5)와 제품(103), 비즈니스 모델(104)과 연구 활동(106) 등에서 특히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하지만 독일 기업의 DX 지수 중 자격 검증 분야는 2년 연속 87점에 머무르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기업의 DX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이에 대한 공급은 부족한 상태인 실정이다. DX 전문인력 부족과 투자 감소 등으로 스타트업 감소 등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한편, 한국과 독일 바이에른 간의 DX 교류가 활성화되는 과정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분석해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협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전략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한 이러한 협력은 양국의 DX 분야에서의 경쟁력 향상과 더불어 글로벌한 혁신과 발전을 끌어낼 수 있다. 시사점 2020년 코로나19 위기와 2022년 러-우 사태에도 불구하고 2022년 독일과 바이에른의 교역량은 약 10% 이상 증가했다. 또한 바이에른주는 코로나 전후 모두 독일 내에서 가장 낮은 실업률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경제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바이에른은 독일 DX와 혁신의 중심지로 부상하는 지역이며, 자동차 산업과 기후변화 위기 대응을 통해 전기차 제조에 주력하면서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다. 바이에른주의 GDP는 독일 내에서 높으며 BMW, Audi, Siemens 등 전통적인 독일 기업들과 미래 기술 분야 기업들이 주로 위치하고 있다. 특히, 전기차와 디지털화 관련 기술 및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추세이다. 또한, 기업들의 디지털화와 혁신을 주도하며 IT 분야에서도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허브이자 미래기업의 중심지이다. DX 성과는 바이에른 주 정부와 기업들의 투자와 노력의 결과로 나타나며, 디지털화 지수 역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한국과 유럽연합(EU) 간의 디지털 파트너십 체결로 한국과 바이에른주 간의 디지털 교류 고속도로가 뚫렸다. 이를 통해 양국 기업 간의 기술 협력이 더욱 강화되고 디지털 분야에서의 혁신이 촉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 statista, 바이에른 경제부, 바이에른 주 통계청, 독일 바이에른 주 디지털부, 독일 연방 경제-기후 보호부, 독일연방 고용통계청, 독일 고용노동부, KOTRA 뮌헨 무역관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뮌헨무역관 신성은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09.04
-

- 쿠바, 국제 고립 속 러시아와의 밀월관계 강화
- 90년대 초반 구공산권이 붕괴하기 전, 쿠바는 소련의 주도 아래 동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경제협력기구인 경제상호원조회의 코메콘(COMECON, Council for Mutual Economic Assistance)의 멤버로 국제경제체제에 참가하고 있었다. 코메콘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이 실시한 유럽 재건 원조 계획인 마셜 플랜에 대항하기 위해 설립됐으며, 1991년 해체까지 자본주의 진영과 대치하던 사회주의 경제공동체를 지향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소련 중심의 공산 국가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에 머물렀던 한계를 가지고 있다. 특히, 1970년대 유가 상승으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에 직면한 코메콘 국가들이 소련으로부터 석유 보조를 받는 규모가 커지면서 소련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게 됐고 90년대 초반 소련의 해체 이후 지원이 끊기게 되자 기존 공산주의에서 자본주의로의 경제체제 전환과정에서 상당한 경제적 고통을 겪기도 했다. 쿠바는 그 상황에서 오히려 "사회주의의 강화"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선회했고 소위 '특별시기(El período especial)'로 불리는 최악의 경제위기를 겪게 된다. 이후 30여 년간 쿠바와 러시아의 관계는 소강국면에 접어들었지만, 최근 미국의 경제제재로 인해 쿠바 경제위기가 심화됐고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의 국제적 고립이 심화되자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구소련-쿠바 관계의 터닝포인트가 됐던 1960년 2월의 아나스타스 미코얀 외무장관의 쿠바 방문> [자료: National Security Archive] 경제위기 해소를 위한 쿠바의 선택은 우-러 전쟁으로 국제적으로 고립된 러시아 2018년 강화된 미국의 경제 제재와 2020년 팬데믹은 쿠바경제의 악화, 국제적 고립을 야기했으며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제재를 받는 국가가 됐다. 두 국가가 현재 겪고 있는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은 오히려 1990년대 소련 붕괴 이후 양국관계가 다시 돈독해지는 효과를 낳았다. 5월 18일 아바나에서 개최된 제20차 러시아-쿠바 정부 간 무역, 경제, 과학 및 기술협력위원회(Russian-Cuban Intergovernmental Commission or Trade, Economic,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Cooperation)에 참가했던 드미트리 체르니셴코 부총리의 발언에 따르면 "2022년 러시아-쿠바 간 무역은 4억52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3배 증가했으며, 2023년 4개월 동안에는 전년 대비 9배 증가한 1억3760만 달러로 급증했다"고 한다. 급증한 무역액의 90%는 쿠바의 러시아 석유 및 대두유 수입액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은 관계 강화는 2022년 11월 미겔 디아스-카넬 대통령이 직접 모스크바를 공식방문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 및 피델 카스트로 기념 동상 제막식에 참가하면서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이후 2023년 5월 드미트리 체르니셴코 러시아 부총리의 쿠바 공식 방문, 6월 마누엘 마레로 총리가 이끄는 쿠바 대표단의 유라시아 경제연합(EEU, Eurasia Economic Union) 정상회의 및 상트페테르부르크 경제포럼(SPIEF) 참석에 이르기까지 최고위급 수준의 교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러시아 기업의 쿠바 시장 진출 가속화, 쿠바 국내민심은 반신반의 양국 경제협력 강화의 주된 내용은 체르니셴코 부총리가 150여 명의 러시아 기업인들과 함께 제11차 경제협력위원회(11th Meeting of the Business Committee) 참석을 위해 쿠바를 공식방문한 5월에 발표됐다. 이때 발표된 주요 계약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쿠바 내 절박한 식량 공급상황 개선을 위해 러시아의 프로딘토그(Prodintorg)가 쿠바 국영 알리포트(Alimport)에 주곡물인 밀을 공급 2. 쿠바 국영기업 CIMEX(Comercio Interior, Mercado External)와 러시아 CGS Group Investments 간 식품류 및 가정잡화류를 포함한 러시아 상품의 쿠바 국내시장 유통을 위한 플랫폼(Rusmarket) 설립 및 직접배송(Direct Shipping) 루트 개설 3. 아바나 동쪽에 위치한 Tarará 지역 재개발 - 한 때 Che Guevara의 별장으로도 유명했던 이 마을은 1986년 체르노빌 원전사고 당시 구소련 피폭피해자들을 위한 요양병원으로도 활용된 바 있어 40여 년만에 다시 소련과의 인연을 재개 4. 우-러 전쟁으로 인해 2022년 3월부터 중단된 러시아-쿠바 간 정기 항공편을 7월 1일부로 재개하는 러시아 대통령령 별도 발표 5. 쿠바산 럼 수출 확대를 위한 러시아-쿠바 국영 Cuba Ron 간 합작투자 설립 6. 건설자재 공급 확대를 위해 쿠바 내 제철소를 재가동하기 위한 자금, 노하우 및 기술 제공 7. 산티 스피리투스 지방에 위치한 노후한 '우루과이' 설탕공장의 재개발을 위한 러시아 Progess Agro와 쿠바 국영 Azcuba 간의 합작투자 2024년 설립. 해당 프로젝트를 통해 연간 15만 톤 수준의 설탕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2022년 쿠바 전체 설탕 생산량의 1/3에 해당하는 분량 <2023년 5월 제11차 러시아-쿠바 경제협력위원회> [자료: Prensa Latina] 위와 같은 여러 계약 외에 가장 큰 주목을 받은 것은 러시아 기업에 대해 30년간 토지를 임대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러시아 스푸트니크와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제11차 경제협력위원회 개막식에서 Boris Titov 러시아-쿠바 비즈니스위원회(Russia-Cuba Business Council) 공동 의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쿠바 정부가 러시아 농업기업에 유휴토지를 3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농기계 수입 면세, 외화로 이익송금 권리 등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중에서도 유휴토지에 대한 사용권은 1959년 피델 카스트로가 집권한 직후 실시한 토지 국유화로 상당수의 토지를 몰수당한 미국 시민과 기업들이 여전히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추후 상당한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해당 소식이 러시아 언론에는 발표된 반면, 쿠바 국영언론에서는 전혀 보도되지 않았다는 점 또한 기존 경제위기가 심화되는 와중에 해외기업에 대한 이러한 특혜조치가 국민들의 불만을 가중시킬 수 있음을 쿠바 정부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의 데탕트가 실패함에 따라 러시아로 급선회 쿠바와 러시아 간의 다양한 경제협력 프로젝트 발표는 쿠바 정부가 경제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옛 정치적 동맹국과 협력을 강화하고 미국과의 관계를 더욱 단절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쿠바 정부는 2021년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중소 민간기업의 설립을 허용하는 등 일련의 경제 개혁을 통해 잠재적인 미국 투자자, 특히 쿠바계 미국인들이 쿠바에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경제개혁이 국민 통제에 위협이 된다고 여기는 강경파의 불만이 쌓이면서 정부 내 파벌이 분열돼 왔다. 일부 전문가들은 쿠바의 오랜, 그리고 상습적인 채무 불이행 역사와 더불어 쿠바 내 재산권에 대한 미국과의 향후 소송 가능성을 고려할 때 러시아 기업들이 약속한대로 쿠바에 투자를 진행할 수 있을지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미국인 중 최초로 쿠바 민간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은 미국-쿠바 무역경제위원회(U.S.-Cuba Trade & Economic Council Inc.)의 존 카불리치(John S. Kavulich) 회장은 쿠바 정부의 러시아에 대한 파격적인 양보가 "쿠바 경제 발전에 대한 자신감이라기보다는 절망적인 상황을 벗어나고자 하는 몸부림에 가깝다"며 "쿠바의 고질적인 채무불이행 역사를 고려할 때 러시아와의 밀월이 오래 지속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그는 덧붙였다. 자료: Prensa Latina, Reuter, Havana Times, Cubanews, Caribbean Council 등 KOTRA 아바나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아바나무역관 윤예찬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09.04
-
- 미국 수소산업 경쟁력과 협력 기회
- 미국 에너지부(DOE)는 2023년 6월 5일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 최초의 ‘국가 청정 수소 전략과 로드맵(U.S. National Clean Hydrogen Strategy and Roadmap)’을 발표했다. 이 로드맵 계획이 실행되면 2030년에 미국이 배출하는 온실가스가 2005년 수준 보다 50% 줄어든다. 이 로드맵은 청정 수소의 생산, 처리, 배송, 저장 및 사용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국가 수준의 프레임워크로 3년마다 업데이트된다. < 미국 연방정부가 발표한 청정 수소 전략과 로드맵 표지 > CLP000100288299.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87pixel, 세로 888pixel" src="https://dream.kotra.or.kr/attach/namo/images/000604/20230830093558904_QVHXNNX9.jpg" style="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sans-serif !important; font-size: 18px !important; width: 250px;"> [자료: 미국 에너지부 홈페이지] 전략 및 로드맵에 의하면, 미국 내 청정 수소 생산 수요가 2030년까지 1000만 미터톤(MMT), 2040년까지 연간 2000만 미터톤, 2050년까지 연간 5000만 미터톤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오늘날 미국의 수소 생산, 운송, 저장 및 사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에너지 운송 회사가 많은 부문에 걸쳐 국가의 탈탄소 목표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에 대한 비전을 설정했다. 초당적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법안(IIJA)을 통해 청정 수소에 대한 95억 달러 투자 내용을 담았다. 청정 수소 관련 95억 달러는 지역 청정 수소 허브 구축에 $80억 달러, 전해(electrolysis) 기술연구·개발 지원에 $10억 달러, 제조 및 재활용 연구·개발 지원에 $5억 달러로 구분된다. 전략 및 로드맵은 청정 수소를 개발하고 효과적인 탈탄소화 도구로 채택하기 위한 세 가지 핵심 전략을 세웠다. 즉, ▲청정 수소에 대한 전략적이고 영향력 있는 사용을 목표로 하고 ▲청정수소 비용 절감 ▲지역 네트워크에 초점을 맞추는 전략이다. 수소 산업 경쟁력 치열 수소연료전지는 수소를 이용해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무공해 에너지다. 수소연료전지는 석유, 가스 등과 같은 연료에서 추출해 낸 수소와 공기 중의 산소와 반응시켜 물과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이는 기존 터빈발전방식이 아닌 산화 환원 반응을 이용해 전기 에너지를 만들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이 더 높다.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실용성이 매우 높다. 수소는 과잉 생산된 전기를 수소로 전환해 저장했다가 날씨 등의 영향으로 발전량이 부족할 때 꺼내 쓸 수 있고, 전기를 수소로 전환하면 장기간 전기를 보관할 수 있으며, 전기를 수소 형태로 변환해서 해외까지 이동시킬 수 있는 매개체로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게다가 수소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면 한 번 충전으로 갈 수 있는 거리가 늘어날 뿐 아니라 더 많은 승객이나 화물을 실을 수 있으므로 지게차·트럭·버스 같은 상용차 수요도 많다. 수소를 연료로 삼아 전기를 만드는 수소 발전 기술도 빠른 속도로 향상되고 있다. 미국의 수소 연료 전지 시스템 개발 회사인 플러그파워(Plug Power)는 수소 생산부터 유통, 활용이 가능한 기술을 갖고 있다. 23년 5월, 전기자동차(EV) 트럭과 상용차 용으로 새로운 유형의 수소발전 충전소를 상용화했다. 이 충전소는 1만 8000갤런(약 6만 8000리터)의 액체수소 탱크와 플러그파워가 제조하는 고정형 연료전지시스템을 조합해 60MW/h 이상의 전력을 발전시킨다. 외부로부터 전기를 끌어들이지 않고, 지하에 매설된 녹색수소 탱크와 발전 시설로 자체 발전해 전기차를 충전하는 것이다. 플러그파워에 따르면 충전기의 자체 발전 용량은 600대 이상의 EV가 충전 가능한 전력이다. 연료전지 기술혁신의 글로벌 선도기업인 퓨얼셀에너지(Fuel Cell Energy)는 연료전지 발전플랜트 솔루션기업이다. 퓨얼셀에너지는 수소 연료전지 분야에서 미국을 대표하는 원천기술 보유 기업으로서 용융탄산염 연료전지(MCFC) 외에도 고체산화물 수전해(SOEC) 및 고체산화물 연료전지(SOFC)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연료전지 및 수전해 수소생산분야 세계적기업 블룸에너지(Bloom Energy)는 최근 고효율 전해조 개발에도 성공하며 수소 생산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고온에서 작동하는 블룸에너지의 수전해는 현재 상용화된 수전해 기술 중 저온에서 작동하는 수전해보다 적은 전기를 사용해 더욱 효율적이다. 수소 생산 시 약 80%를 차지하는 비용이 전기 비용임을 감안할 때, 더욱 적은 비용으로 수소를 생산할 수 있다. 한-미 수소 산업 비즈니스 협력 기회 우리 정부도 ‘수소산업 1등 국가’로의 도약을 천명하며, 국내 수소 산업을 향후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키우기 위해 국내 수소 산업을 적극 육성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정책에 기반하여 한국 수소 시장의 잠재력과 민간 부문 경쟁력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협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우리 기업은 미국의 플러그파워와 함께 수소설비 생산기지 ‘기가팩토리(Giga-factory)’ 건설 등 국내 수소산업에 총 1조원을 투자한다. 동 기업은 22년 4월 25일 미국 워싱턴D.C. 미국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투자신고식’ 행사에서 플러그파워와 이 같은 내용의 합작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이 같은 합작투자는 수소 분야에서 이뤄지는 한·미 기업 간 대표적 비즈니스 협력 모델로 평가받는다. 국내에 수소설비 생산기지 ‘기가팩토리’ 구축하는데, 기가팩토리는 차량용·발전용 수소연료전지와 수전해설비 등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수소 핵심설비 생산기지’로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제품 양산을 본격화해 국내 및 아시아 시장에 공급한다. 이 곳에서 생산되는 수소연료전지와 수전해설비에는 플러그의 핵심기술이 적용돼 수소 분야 첨단기술의 국산화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시사점 미국 정부는 수소 생산·수송·활용 등 수소 산업 생태계 전반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는 수소 생산량 1kg당 3달러의 세액 공제를 해주고, 수소 관련 투자에 대해서는 투자액의 최대 30%를 세액 공제해 준다. 이번에 발표한 전략 및 로드맵은 미국 정부 전반, 산업, 학계, 비영리 부문의 이해관계자 뿐만 아니라 주, 지방 정부의 피드백을 반영했다. 미국 정부는 청정 수소가 미국의 에너지 독립성을 강화하고 미국 제조업 붐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같은 미국 정부의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 간의 강력하고 생산적인 파트너십을 위한 기반 마련이 가속화되면서 우리 기업도 미국 기업과 수소 생산기업 지분 투자, 고압 수소탱크 제조사 인수, 수소충전소 등 수소 인프라 건설 등에서 다양하게 교류하고 있다. 아직까지 수소연료전지를 주요 에너지 공급원으로 사용하지 않았던 이유는 높은 생산 비용 때문이었다. 최근 각국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민간 분야에서 신기술 개발에 역량이 집중되고 있으므로 향후 저비용의 수소 에너지 생산이 가능하게 되면 강력한 성장 모멘텀이 지속될 것이다. 이에 미국과의 투자·기술협력을 통해 수소의 R&D·생산·운송·저장 등에서 경쟁력을 더욱더 강화하고 미국 수소 산업에서 비즈니스 협력 기회를 적극 발굴해야 한다.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시카고무역관 이준섭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09.01
-
-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 1년, 미국 기업 및 지역 경제에 미친 효과는?
- 지금으로부터 1년 전, 미국 연방정부 역사상 가장 중요한 기후변화 조치로 평가받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이 제정됐다. 이 법안의 목적은 청정 기술에 드는 비용을 줄이고 기후 변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를 저감하며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경제 성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청정 에너지 기술 개발 및 배포에 투자할 수 있도록 기업에 다양한 수요 및 공급 측면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혁신을 장려한다. 또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장려함으로써 해당 지역사회, 특히 소외된 지역에서의 경제와 복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일으킬 수 있도록 장소 기반 추가 혜택도 제공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이미 경제에 파장을 일으키기 시작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 파장은 기업들이 미국 내 새로운 제조 시설 설립 계획을 연이어 발표하면서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미 재무부(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또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경제와 기후에 미치는 완전한 영향이 명확해지기 까지는 수십년이 걸리겠지만, 적어도 현재 시점에 관찰된 주요 추세로는 ▲ 연구개발(R&D) 지출을 중심으로 기업 고정 투자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 ▲ 소외된 지역을 중심으로 청정 에너지, 전기차, 배터리 등의 투자가 집중되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하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미국 기업과 지역 경제에 미친 효과를 알아본다. 기업 고정 투자(BFI) 강세, 민간 투자 활발의 신호 기업 고정 투자(Business Fixed Investment, BFI)는 기업이 운영과 성장에 필요한 자산을 구매하거나 내부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지출하는 돈으로, 여기에는 기계, 건물, 장비 및 기술과 같은 항목에 대한 지출이 포함된다. 기업 고정 투자는 국내총생산(GDP)의 핵심 구성 요소이자 민간 기업의 전통적인 투자 척도다. 이는 기업이 미래 경제 환경에 대해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기업 고정 투자는 경기 침체 기간 동안 전체 GDP와 거의 동일한 비율로 하락하지만 회복 과정에서는 다른 구성 요소보다 뒤처진다. 따라서 코로나 19 이후 몇 년 동안은 전체 GDP에서 기업 고정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미 재무부는 코로나 19 이후 회복 과정에서 기업 고정 투자가 일반적인 경우보다 훨씬 빠르게 성장했다고 분석하며 이는 1980년 이후 다른 모든 경기 침체 이후보다 더 나은 결과라고 덧붙였다. <GDP 대비 기업 고정 투자 비중> (단위: %) (주: 경기 침체가 시작되기 전 마지막 분기를 경기 순환 정점이라고 정의하며, 이는 미 경제연구국(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에서 결정한다. 1969년 이후의 모든 경기 침체 정점은 “평균 경기 침체 및 회복”에 포함된다) [자료: 미 경제분석국(Bureau of Economic Analysis), 재무부] 기업 고정 투자의 중요한 구성 요소인 연구개발(R&D)은 특히 이러한 회복세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부문의 실제 연구개발 투자는 코로나 19 사태 시점보다 무려 17%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인 경기 침체 주기로 봤을 때 이 시점에서는 11% 정도만 높고, 대 불황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시점에서 2%정도 밖에 높지 않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민간 부문의 연구개발 투자가 매우 강세를 보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미 재무부는 이에 대해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가 높아졌다는 것은 장기적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신기술 투자가 증가했다는 것을 뒷받침하며, 이는 곧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 제공하고 있는 각종 인센티브가 기업 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비즈니스 주기에 따른 민간 연구개발(R&D) 투자> (단위: %) (주: 실질 연구개발 투자는 국민 소득 및 국민 생산 계정(NIPA)으로 측정한 수십억 달러 단위로 표시되며, 미 경제연구국이 결정한 경기 주기 정점에 따라 색인화된다) [자료: 미 경제분석국(Bureau of Economic Analysis), 재무부] 연구개발 투자 이외에도 다른 많은 부분에서 기업 투자는 강세를 보이고 있다. 2023년 6월까지 실제로 건설된 제조 시설은 2021년 이후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MIT 테크놀로지 리뷰는 에너지 이노베이션의 정책 분석가 잭 코네스(Jack Conness)가 운영하는 트래커 사이트의 분석 결과를 인용하면서 2022년 8월 16일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통과된 이후 기업들이 미국 내 시설에 투자하겠다고 밝힌 금액은 총 760억 달러에 이른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발표된 프로젝트는 태양광 패널, 풍력 터빈, 전력 전송 장비의 부품 공장 건설 등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발표는 전기차 및 배터리 공급망 관련 기업에 집중되어 있다. 발표된 프로젝트 대부분은 아직 계획 단계에 있지만 이미 시작된 프로젝트도 있다. 2022년 10월에 발표된 혼다와 LG에너지솔루션 간의 35억 달러 규모의 합작 투자 프로젝트는 이미 시공에 들어갔다. 에너지 이노베이션의 정책 연구 책임자인 아난드 고팔(Anand Gopal)은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갈 혜택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지역 사회에 고임금 일자리가 제공될 것으로 예상했으며, 제조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초기 신호는 매우 좋다고 평가했다. 공공 정책 싱크탱크 써드웨이(Third Way)의 기후 및 에너지 프로그램 선임 연구원인 엘렌 휴스-크롬윅(Ellen Hughes-Cromwick)도 기업을 위한 세액 공제 혜택이 미국에서의 사업에 이점을 가져다 줄 것이며, 이를 통해 민간 자금 유입이 촉진되고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소외된 지역을 중심으로 투자 집중,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또 다른 중요한 의의는 제조 부문에 대한 투자가 해당 지역 사회 내에서 관련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때, 경제적으로 취약하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사회의 경제적 수익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 있다. 제조 부문 투자는 저임금 지역사회의 임금을 높여 형평성 목표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며, 고용 시장이 어려운 지역에서 시행된 경우 해당 투자 정책이 가장 높은 '가성비'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바, 실제로 이러한 이유로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청정 에너지 발전 투자를 저소득 및 고실업 지역에 배치하는 것을 의도하기 위해 장소에 기반한 추가 혜택을 포함하고 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내에서 장소 기반 인센티브 효과를 연구하기에는 아직 너무 이르지만, 현재까지 나온 분석 자료에 의하면 기업이 투자하기로 선택한 위치와 예상 효과에 대한 초기 단서를 잡을 수 있다. 바이든-해리스 행정부의 Invest.Gov 웹사이트는 대통령 취임 이후 발표된 투자 장소와 특정 산업 분야를 포함한 투자 정보를 제공한다. Invest.Gov 웹사이트는 5,0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발표를 반영하는 250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식별하고 있으며, 특히 2,000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 중 거의 150개가 청정 에너지, 전기 자동차 및 배터리와 같은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이 있는 분야에 속한다. 특히 미국 중서부와 남동부에서 수십억 달러 규모의 배터리 프로젝트들이 다수 발표되면서, 미시간주에서 조지아주로 이어지는 이 지역은 배터리 벨트(Battery Belt)라는 새로운 별명을 얻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발표된 투자 프로젝트의 장소와 산업 분야> [자료: Invest.Gov, 미 백악관] 이러한 데이터를 근거로 미 재무부가 분석한 결과,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 부문에 대한 투자가 발표된 카운티는 평균보다 경제적으로 더 불리한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 투자는 ▲ 대학 졸업률이 평균보다 낮은 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 발표된 투자의 약 65%가 전체 빈곤율이 평균 이상인 카운티에 투자되었으며, ▲ 발표된 투자의 65%는 인구 대비 고용 비율이 정상보다 낮은 카운티에서 이뤄졌고, ▲ 발표된 투자의 거의 90%는 평균 주당 임금이 낮은 카운티에서 이뤄지고 있다. <대졸자 비율:프로젝트 분포(좌) 및 평균 주당 임금:프로젝트 분포(우)> [자료: Invest.Gov, 미 인구 조사국, 재무부] 이와 같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 부문에 대한 투자는 저소득층과 소외된 지역에 집중되고 있고, 이는 투자가 가장 필요한 지역사회에 기회로 작용한다. 어떤 지역에 새로운 공장이 설립되면 고용이 늘어나고 해당 지역 사회의 사람들의 소득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아직까지는 법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영향은 두고 봐야 하겠지만, 미 재무부를 포함해 관련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 투자가 노동 시장이 약하고 기타 여건이 불리한 지역 사회에 집중되고 있는 현재 추세로 볼 때 당초 입법 과정에서 목표하던 ‘불평등 해소’의 첫 단추는 잘 끼워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근본적인 지역 경제 불균형의 문제를 해소하려면 법 제도 자체의 보완이 필요하다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 정책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싱크탱크로 꼽히는 브루킹스 연구소는 인종 차별적 정책으로 인해 특정 지역과 커뮤니티에 취약성이 체계적으로 집중되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분배 중립적인 접근 방식을 유지하는 한 근본적인 불평등을 공고히 할 수 있다며, 광범위한 형평성 요구 사항에 맞춰 보조금 정책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향후 전망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에너지, 교통, 농업 등의 산업을 변화시킬 수천억 달러의 보조금, 대출, 세액공제를 포함한다. 법안에 배정된 자금은 다양한 기술 개발 단계에 투입되어 새로운 연구를 지원하고 확립된 기술의 제조와 확대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2022년 7월 법안의 세부 사항이 처음으로 밝혀졌을 때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총 기후 자금은 3,690억 달러로 추산됐다. 이 후 합동조세위원회(Joint Committee on Taxation)가 2023년 4월에 내놓은 최신 평가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32년까지 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투입할 자금은 총 5,150억 달러로 추산됐다. 다만 여기에는 전기차 구매자 세액공제를 비롯한 프로그램의 일부만 포함되어 있고, 파도 에너지, 소형 모듈식 원자로 또는 핵융합과 같이 현재는 널리 보급되어 있지 않은 기술이라도 향후 개발 속도에 따라 세금 공제를 적용할 수도 있게 되는 유연성이 있기 때문에 향후 10년 동안 미국 정부가 지출해야 하는 잠재적 비용은 훨씬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골드만 삭스는 그 비용이 1조 2천억 달러에 달할 수 있다고 계산했으며, 이는 공식 정부 예측치의 3배에 이른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실제로 미국과 세계 경제가 에너지를 소비하고 생산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고 있다.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는 연구개발에 투자함에 따라 지난 몇 년간 기업 투자는 특히 탄력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청정 기술에 대한 투자를 장려해 전 세계 탄소 배출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고 있으며, 청정 에너지, 전기 자동차 및 배터리에 대한 투자는 노동 시장이 약하고 기타 조건이 열악한 지역 사회에 배치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기후 변화를 해결하고 경제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있어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얼마나 성공적인지를 결정하는 요인은 앞으로도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우리 기업들도 지속적으로 변화의 흐름을 주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 미 재무부, 미 경제분석국, MIT 테크놀로지 리뷰, Invest.Gov, 미 인구 조사국, 미 백악관, 브루킹스 연구소, 골드만 삭스, KOTRA 실리콘밸리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실리콘밸리무역관 이지현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09.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