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 2023년 영국 경제예보: 계속 흐림
- 영국의 2023년은 어두울 전망이다. 이미 팬데믹과 러-우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연쇄 효과로 나타난 인플레이션은 서민 경제를 뒤흔들고 있다. IMF는 2024년 내 세계 경기 침체가 시작될 것이라 예견했고 영국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영란은행이 예측한 영국의 2023년 경제성장률은 -1.5%다. 마이너스 성장세는 2024년에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코로나 이전의 경제 수준을 완전히 회복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이너스 성장 전망은 곧 영국 경제가 팬데믹 이전보다도 나아지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G7 국가 중 팬데믹 이전 경제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국가는 영국뿐이다. <2022~2024년 각종 경제지표 예상치> (단위: %) 2022 2023 2024 GDP 성장률 4.2 -1.4 (영란은행 예측치 -1.5) 1.3 CPI inflation 9.1 7.4 0.6 Bank Rate 3.5 5.2 4.7 실업률 3.6 4.1 4.9 [자료: Statista, BoE, 런던 무역관 자료 종합] 경제 불안요인1. 계속되는 에너지 위기와 물가상승으로 서민 경제 어려움 상승 <영국 인플레이션> (단위: %) [자료: BOE(Bank of England)] 코로나19 및 에너지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생산 차질과 비용 상승은 영국 물가를 살인적인 수준으로 올려놓았다. 2022년 9월 물가상승률은 전년 대비 10.1%를 기록했고 PwC 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에너지 요금이 동결되지 않는 최악의 경우 2023년 물가상승률이 최대 17%까지 이를 수 있다. 영국 예산책임청(OBR)은 물가 상승으로 인해 가계 실질임금이 하락해 가처분소득이 10년 중 최저를 기록할 것이라 내다봤다. 치솟은 물가를 잡기 위해 18년 만에 3%를 넘은 기준 금리도 서민 생활에 영향을 주고 있다. 영국 가정의 1/3이 주택담보대출을 가지고 있는데, 0%에 가깝던 금리가 수십 배 이상 오르면서 갚아야 할 대출이자가 눈처럼 불어났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영국의 실업률 또한 지속적으로 상승할 거란 전망이 나오자 대출 상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영란은행은 서민 채무상환 부담이 금융 안정을 저해할 수준은 아니라고 일축했다. 경제를 되돌리기 위한 정부의 개입도 계속되고 있다. 에너지 가격상한제, 기업 유동성 지원, 생산 규제 완화 등 정부가 내놓은 정책들의 효과가 2023년 중순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제레미 헌트 재무부장관은 인플레이션을 반감시킬 명확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혀 시장 분위기를 안정시켰다. 그러나 불안정한 경제 상황이 지속되어 가계 소비가 현저하게 줄고 경제가 위축됨에 따라 경기침체가 올 수 있다는 우려는 불식되지 않고 있다. 경제 불안요인 2. 재정건전성 건강한 정부 재정 상태는 예상치 못한 위기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나 팬데믹과 에너지 위기 등으로 이미 정부 지출이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난 데 반해 경제활동은 위축되고 세수가 크게 줄면서 영국은 재정적자가 심화된 상태이다. 20/21년 정부 수입은 전체 GDP의 37.1% 수준이었으나 지출은 GDP의 51.9% 수준을 기록했다. 정부가 코로나19 대책으로 사용한 비용은 2290억 파운드(한화 약 347조6197억 원)에 달한다. 게다가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 가격상한제까지 도입되면서 수입, 지출 간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다. <정부 수입 및 지출> (단위: GDP 대비 %) [자료: parliament.uk] 이처럼 들어오는 돈보다 쓰는 돈이 많아 정부의 채무가 늘어난다는 것은 곧 정부가 내야 할 이자 비용이 늘어남을 뜻한다. 이자비용은 이미 정부 지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20/21년 채무 이자 지출은 390억 파운드(한화 약 59조2016억 원)를 기록했다. G7 국가를 기준으로 보면 영국의 재정적자가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경제전문가들은 재정적자 상태가 지속되는 것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2022년 말 탄생한 리시 수낙 내각이 이 사이 간극을 줄이고자 정책 방향을 수정했고 예산책임청은 긴축재정의 시행으로 재정적자가 점차 줄어들 것이라 예견했지만 당장의 서민 경제가 몰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정부 지출은 계속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GDP 대비 정부 재정적자 비율 예상> (단위: %) [자료: parliament.uk] 경제 불안요인 3. 기업 투자심리 위축 <미국, 영국, 유로존 기준 금리> (단위: %) [자료: 블룸버그 파이낸스] 대내외적 경제 상황 악화는 세계 금융 허브인 런던을 흔들고 있다. 글로벌 경제 둔화 및 공급망 병목과 같은 대외적 영향뿐 아니라 금리 상승으로 인한 비용 상승, 법인세 인상 등 긴축재정으로 인한 대내적 요인까지 곁들여지면서 기업활동이 현저하게 더뎌졌다. 더불어 초공제 혜택이 23년 1분기 만료되면서 기업 투자심리가 더욱 위축될 전망이다. 초공제 혜택은 2021년 코로나19로 기업들의 설비 투자가 크게 위축되자 정부에서 임시 도입한 세제 혜택으로, 설비 투자를 진행한 기업에 최대 230%까지 세액을 공제해준다. 특히 금리 인상은 기업의 부채 상환 부담을 크게 가중시켰다. 영란은행은 영국 기업들의 부채 수준이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및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보다 낮고 채무상환 능력이 아직까지 양호한 수준이기 때문에 위험한 수준은 아니라고 밝혔으나 향후 경제 여건의 지속적 악화로 실적이 저조해지고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면 금융안정 리스크로 전이될 수 있다 경고했다. 게다가 기업의 실적 악화는 투자뿐만 아니라 고용에도 큰 영향을 끼쳐 서민 경제에도 타격을 입힐 수 있다. 특히 악재의 연속으로 중소기업의 부채규모가 증가(2.0%→2.4%)했는데, 중소기업은 영국 고용의 60%를 차지하고 있어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하다. 정부 방침: 긴축재정을 통한 경제 회복 <공공부문 부채> (단위: GDP 대비 %) [자료: ONS, OBR] 2022년 11월 리시 수낙 내각은 경제위기에서 탈피하기 위한 중기 재정 전망 보고서(Autumn statement 2022)를 발표했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사임한 리즈 트러스 전 총리의 대규모 감세안을 철폐하고 세수 증가를 통한 재정적자 축소, 공공 서비스 조정 등 영국이 처한 경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대응책으로 구성돼 있다. 긴축재정 시행으로 경제가 다소 안정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나 불안정한 대내외 여건에 경기침체 우려와 시장의 불안은 여전한 상황이다. 계획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긴축재정을 통해 총 550억 파운드를 확보할 예정이며,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한편 채무 이자 지출을 줄여 공공서비스의 질을 개선시킬 예정이다. 금리 상승에 따른 기업 및 가계의 연체 리스크가 존재하기는 하나 동시에 영업수익 개선으로 은행들의 자금 조달 능력이 상승되어 복원력 또한 충분하다고 정부는 밝혔다. 다음은 2022년 11월 정부에서 발표한 재정전망 보고서의 주요 정책 내용이다. 에너지 부문 - 2023년 4월, 연평균 가계 에너지 상한 조정(£2500→£3000)(단, 의료적 목적으로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 등 소외계층 구제 방안 마련 예정) - 2023년, 발전회사 이익의 45%에 달하는 횡재세 임시 부과 및 2028년 3월까지 전기·가스 업체 횡재세 10% 추가 부과 (25%→35%) 생활 부문 - 2023년, 사회취약계층 £900, 연금수령자 £300, 장애인 £150 생활지원금 지급 - 2023년 4월, 사회취약계층 지원금 인플레이션율에 맞춰 조정 예정 기업 부문 - £40b 규모의 에너지 기업 유동성 지원 제도 도입 - 셰일가스 생산을 위한 수압 파쇄 허용, 북해유전 채굴면허를 확대 보급하여 원유 및 가스 생산 추진 등 생산 규제 완화 세금 부문 - 2023년 4월, 최고소득세율(45%) 적용 대상 확대(연 £150,000→£125,000), 과세구간 고정기간 연장(기존 2026년→2028년 4월) -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수당 감소(기존 £2,000→£1,000(’23.4)→£500(’24.4.)) - 양도소득세 비과세액 감소(기존 £12,300→£6,000(’23.4.)→£3,000) - 온라인 판매세(Online Sales Tax, OST) 도입 철폐 의료 부문 - 향후 2년간 NHS 예산 각 £3.3b(한화 약 5조 원) 증액 방위 부문 - GDP의 3%(최소 2%) 방위산업 지출 검토 진흙 속 피어나는 꽃, 2023년 영국 유망시장은? 어려운 경제 속 2023년도 영국의 산업정책 키워드는 ‘그린경제’다. 영국 정부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첨단 산업을 배양하고 특허 보유한 기업의 투자유치를 적극 장려하는 등 그린경제를 위한 아낌없는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특히 중점산업으로 지정한 산업군에 전략적 투자유치 창출을 위하여 2020년 11월 투자청을 신설하고 4500개 이상의 공급망 창출 목표를 세웠다. 영국 정부가 지정한 중점 산업에는 기존에 영국이 강점을 가진 금융 서비스 및 핀테크를 포함해 친환경 선박, 탄소 무배출 차량 등이 포함되어 있다. (1) 전기자동차(EV) 2030년부터 영국 내 가솔린 및 디젤차의 판매는 금지된다. 더불어 2035년부터는 무공해(zero-emission) 제품만이 판매가 가능하다. 그린경제 실현을 위해 영국 정부는 강력한 법안을 내놓았고 전기자동차 산업 육성은 더욱 활성화되고 있다. 이를 방증하듯 앞으로 영국 내 새로 짓는 건물에는 전기차 충전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강제되고 있으며, 2030년까지 영국 내 전기차 충전소는 10배 이상 증설될 예정이다. 런던교통청(TFL)은 영국 전기자동차 전시회인 EV쇼에 참가해 2023년 말까지 런던 시내 초고속 전기차 충전소 건설 공공조달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고 있다 밝혔다. 영국의 정책 변화에 기업들도 기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일본 자동차 제조 전문업체인 닛산(Nissan)은 영국을 유럽 전기차 생산거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중국 에너지 기업 인비전(Envision)의 배터리부문 자회사인 AESC와 협업하여 연 20만 개 규모의 배터리 기가팩토리 신규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공장의 가동시점은 2024년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약 62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은 물론 연간 10만 대 전기차 생산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한국의 포스코케미칼도 영국 배터리기업 브리티시 볼트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브리티시볼트 배터리에 활용될 전기차용 배터리소재 공동개발 협력을 약속했다. (2) 건축분야 건축에서도 그린경제 달성의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영국에서는 저공해, 고효율을 추구하는 디지털 건설 시장이 이전부터 떠오르고 있었다. 특히 영국은 낙후된 인프라와 주거공간 부족 문제로 건설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탄소중립 기조와 맞물려 디지털 건설이 부상하게 된 것이다. 영국 정부는 2018년 건설산업분야 협약을 발표해 디지털 건설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한편 2025년까지 건설 총비용 33% 감축, 소요시간 50% 단축, 온실가스 배출 50% 절감 등의 목표를 세웠다. (3) 에너지저장시스템(ESS) 러-우 사태로 촉발된 유럽의 에너지 위기는 에너지 자립의 필요성을 강하게 일깨웠다. 영국은 에너지 자립을 위해 원전산업을 재개하고 해상풍력, 태양열 에너지 산업에 투자하는 등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에너지 생산이 활성화됨에 따라 생산된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에너지 저장기술이 함께 부상하고 있다. 영국의 에너지 저장 기술은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성장해왔고 2021년에는 저장 가능한 에너지 용량이 크게 상승해 총 27GW를 기록했다. 에너지저장 기술의 성장세와 더불어 영국의 에너지 자립 목표가 더해져 영국은 현재 유럽 내 에너지 저장 시장 규모가 가장 크고 유망하다. 자료: GOV.uk, Statista, BoE, The Guardian, BBC, Statista, KPMG, KOTRA 런던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런던무역관 남현경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01.06
-

- 통계로 보는 카타르 2022 무역 동향
- 카타르 수출입 동향 카타르 전체 수출의 87%를 차지하는 천연가스 및 원유, 석유화학 제품 등 에너지 자원은 무역수지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2020년 초에 발생한 코로나19의 대유행이 야기한 에너지 자원의 수요 감소 및 유가 하락으로 2019년 대비 수출과 수입 규모 모두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카타르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며 위축되었던 경제 회복, 건설 프로젝트 재개, 월드컵 개최 준비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무엇보다 2022년 2월 발생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연료 가격 급등으로 인해 수출 규모 1110억 달성하며 높은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2019-2022 카타르 수출입 동향>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9 2020 2021 2022 수출 72,935 51,504 87,203 110,236 수입 31,354 25,835 27,985 27,716 무역수지 41,581 (△18%) 25,669 (△38.26) 59,218 (130.69%) 82,520 (39.34) 주: 2022년의 경우 1-3분기 자료 [자료: Planning and Statistics Authority] 카타르의 에너지 자원은 무역수지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세계적인 에너지 자원 공급난 속에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경제를 유지할 수 있었으며, 지난 4년 중 역대 최고의 무역수지를 경험하며 전년 동기 대비 약 40%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이 수치는 2022년도 1-3분기 통계 수치로 4분기까지 포함된다면 2022년 무역수지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조업이 크게 발달하지 않은 카타르는 대부분의 물품 수요를 여전히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각종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산업 기자재, 자동차, 소비재 등의 수입과 함께 전체 수입 규모는 약 277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이 수치는 매년 비슷한 것으로 나타난다. 국가별 수출입 동향 2022년 기준 카타르의 주요 수입 국가는 중국, 미국, 인도로 해당 상위 3개 국가가 전체 수입의 약 37%를 차지한다. 한국의 경우 전체 수입의 1.5%를 점유하고 있다. 2017년 6월 발생한 주변국(사우디, UAE, 바레인, 이집트)과의 단교사태로 해당 국가들과의 육상, 영공, 영해를 통한 출입국 및 수출입이 금지되면서 GCC국가로부터의 수입은 단교사태 정상화 이후에도 점유율을 회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단교국이 아닌 오만으로부터의 수입은 단교사태 중 우회노선 및 신규거래선 구축에 따른 영향을 받아 2022년 기준 약 3%의 점유율을 차지한다. 카타르의 전체 수출 중 11%가 한국으로 향하고 있으며 상위 4개국인 중국, 인도, 한국, 일본으로의 수출량은 카타르 전체 수출의 약 48%를 점유하고 있다. <2022 국가별 교역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수입 수출 연번 국가 금액 점유율 연번 국가 금액 점유율 1 중국 4,565 16.6 1 중국 16,419 15 2 미국 3,772 13.7 2 인도 12,690 12 3 인도 1,734 6.3 3 한국 11,985 11 4 이탈리아 1,486 5.4 4 일본 10,930 10 5 독일 1,297 4.7 5 영국 7,696 7 6 터키 1,231 4.5 6 싱가포르 5,627 5 7 영국 1,154 4.2 7 이탈리아 5,019 4.6 8 스위스 882 3.2 8 벨기에 4,964 4.55 9 오만 866 3.15 9 아랍에미리트 4,836 4.43 10 비분류 751 2.7 10 파키스탄 3,228 3 16 한국 408 1.5 11 프랑스 3,161 2.9 [자료: Planning and Statistics Authority] 품목별 동향 카타르의 주요 수입품목은 인프라 프로젝트의 진행 및 오일·가스시설 유지보수 등을 위한 산업 기자재로 구성돼 있으며 주요 수입 품목은 매년 큰 변동이 없는 편이다. 2022년 1-3분기 1위 수입품목은 석유 화학 시설에서 사용되는 가스터빈과 항공기 및 선박용 터보제트(HS 84111200)로, 해당 품목은 11억3000만 달러 규모로 수입돼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했다. 2022년도 수입 제품 줌 특이한 점은 ‘지정되지 않은 항목’(HS 93990000)으로, 전년대비 596% 수입량 증가를 보였으며 전체 수입의 2위를 차지한다. HS코드 93으로 시작되는 경우 무기 및 탄약-부품 및 액세서리로 분류되고 있으나 카타르 관세청은 구체적인 품목명을 공개하지 않았으며 해당 품목은 미국, 노르웨이, 터키로부터 대부분의 수입이 이루어졌다. 카타르의 경우 최대 항공사 중 하나인 카타르 항공의 꾸준한 성장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와 함께 항공기 부품군(HS 88033000)이 전체 수입의 2.4%를 점유하고 있다. Fitch Solution은 2022년 카타르의 가계 지출이 3.6% 증가할 것, 귀금속을 포함하는 개인 용품 지출은 6.25%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었다. 이런 예상에 맞게 귀금속 제품의 수입은 전년대비 약 56% 로 크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는 위축되었던 소비시장 및 경제의 회복을 의미하기도 한다. 주목할 만한 주요 수입 품목으로 기타 의약품(HS 30049010)이 있다. 코로나19 이후 카타르의 의료산업은 빠르게 성장해왔을 뿐 아니라 현재 준 종합병원 수준의 사립 병원 개원 등으로 인해 앞으로 지속해서 관련 품목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2022년 카타르의 천연가스 및 원유 수출은 약 800억 달러로 전체 수출의 79%를 차지했다. 유가 폭등 및 에너지 자원의 공급망 위기로 인해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석유화학제품인 나프타, 에틸렌, 질소비료 등도 전반적으로 증가세를 기록했다. 최근 독일을 비롯 중국과 맺은 중장기적 천연가스 공급계약은 앞으로 카타르의 수출량이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1-3분기 카타르 10대 수입품목> (단위: 백만 달러, %) 연번 HS코드 품목명 금액 점유율 증감률 1 84111200 가스터빈, 항공기 및 선박용 터보제트 (Turbo Jets Of A Thrust Exceeding 25 Kn) 1,132 4.7 25.4 2 93990000 지정되지 않은 항목 – 미분류 (Non Specified Items) 813 3.7 596 3 88033000 항공기 부품 (Other Parts Of Aeroplanes Or Helicopters) 584 2.4 22.8 4 71131910 귀금속으로 만든 것 (Jewelry Of Gold) 509 2.1 56.4 5 85171200 전화기 (Telephone Sets , Mobile) 405 1.7 22.7 6 74081100 구리선 (Copper Wire Of Which The Maximum Cross-Sectional Dimension Exceeds 6 Mm) 360 1.5 22.2 7 28182000 인조 커런덤, 산화 및 수산화 알루미늄 (Other Aluminum Oxide) 313 1.3 33.7 8 71081210 금 (Gold Ingots) 286 1.2 -9.5 9 87032111 1,000cc 이하 자동차 (Motor Vehicle The Year Clearing Or Subsequent Of The Year) 251 1 8.6 10 30049010 기타 의약품 (Medical Solutions) 234 1 26.7 기타 19,283 80 - 합계 24,168 100 22 [자료: PSA(Planning and Statistics Authority), 관세법령정보포털(HS코드 해설서)] <2022년 1-3분기 카타르10대 수출품목> (단위: 백만 달러, %) 연번 HS코드 품목명 금액 점유율 증감률 1 2711 천연가스 (Petroleum Gases And Other Gaseous Hydrocarbons) 65,849 65 74.3 2 2709 석유와 역청유(원유) (Petroleum Oils & Oils From Bituminous Minerals Etc. (Crude)) 14,435 14.3 58.4 3 2710 석유와 역청유(원유 제외) Petroleum Oils & Oils From Bituminous Minerals Etc. (Not Crude) 8,182 8.1 38.7 4 2909 에테르와 과산화알코올류 (Ethers, Ether-Alcohols, Ether-Phenols, Ether-Alcohol-Phenols) 2,874 2.8 99 5 3102 질소비료 (Mineral Or Chemical Fertilizers, Nitrogenous) 2,740 2.7 83.5 6 3901 에틸렌의 중합체 (Polymers Of Ethylene, In Primary Forms) 2,200 2.2 5.7 7 7601 알루미늄 괴 (Unwrought Aluminum) 1,542 1.5 35.8 8 2503 황(콜로이드황 제외) (Sulfur Of All Kinds, Other Than Sublimed, Precipitated Or Colloidal Sulfur) 727 0.7 210 9 2903 탄화수소 할로겐화 유도체 (Halogenated Derivatives Of Hydrocarbons) 498 0.5 99 10 2804 수소 및 희가스, 비금속 원소 (Hydrogen, Rare Gases And Other Non-metals) 430 0.4 48 기타 1,748 1.7 - 합계 101,224 100 61.6 [자료: PSA(Planning and Statistics Authority), 관세법령정보포털(HS코드 해설서)] 한국과의 수출입 동향 한국은 2022년 기준 카타르의 3위 수출국이자 16위 수입국이다. 2022년 기준 한국의 카타르향 수출은 약 4억4600만 달러로 전년대비 21% 가량 증가했다. 한국은 주로 자동차, 전자제품, 산업 기자재 등을 수출하고 있으며 천연가스 및 원유와 같은 고부가가치의 에너지 자원을 카타르로부터 수입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무역수지 적자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2019-2022 한국의 대카타르 수출입 동향> (단위: 천 달러, %) 구분 2019 2020 2021 2022 수출 357,290 (△32.1) 339,097 (△5.1) 420,152 (23.9) 446,190 (21.5) 수입 13,036,553 (△20) 7,562,141 (△42) 11,611,066 (53.5) 14,913,892 (46.2) 무역수지 -12,679,263 (19.58) -7,223,044 (43) -11,190,914 (△55) -14,467,702 (△29.3) 주: 괄호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자료: KITA] 품목별 동향 2022년 1-11월 MTI 3단위 기준 카타르로 가장 많이 수출된 우리나라 제품은 철강관 및 철강선(MTI 614)으로, 전년대비 681% 증가한 7억7658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카타르의 천연가스 생산 증대 뿐 아니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글로벌 에너지 원료 수급난이 심화되면서 천연가스 수출 확대와 함께 철강관 수입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진행 중인 북부 가스전 증산 개발로 2027년까지 세계 최대 천연가스 생산국을 목표로 한 만큼 해당 품목의 수입은 앞으로도 상승세를 보일 전망이다. 자동차(MTI 741)는 한국이 매년 카타르로 수출하는 주요 상위 품목이며 6억1264만 달러로 수출돼 전년대비 약 49% 증가했다. Market Research Qatar에 따르면, 2021년 신차 등록은 전년대비 24%가량 증가했으며 2022년도에도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카타르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10월 기준 신차 등록은 전년 동기 대비 1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제적 불안정으로 인해 신차 수요가 감소했다가 경제가 회복되면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년대비 무려 6,214% 수출 증가를 기록한 선박해양 구조물 및 부품(MTI 746)의 경우 LNG 운반선의 발주가 2020년 협약 체결 2년 만에 시작된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파악된다. 100척 이상의 운반선의 발주를 고려한다면 동 품목 수출은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다. 수출 금액에서 50% 감소세를 보인 전력용 기기(MTI 841)는 한국 기업의 카타르 대규모 전선 공급 프로젝트 진행이 시작된 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스레 감소세가 나타나고 있다. 건설광산기계(MTI 725)의 경우도 카타르 월드컵 이전까지 빠르게 진행해오던 건설 프로젝트 종료 및 발주 감소로 지속해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카타르는 한국의 1위 LNG 공급국으로, 2022년 기준 천연가스(MTI 134) 수입은 약 74억 달러로 37% 증가했으며 원유(MTI 131) 또한 45억 달러로 약 45% 증가하여 에너지 자원 수입을 카타르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나프타 및 윤활유를 포함한 석유제품(MTI 133)의 경우 98% 증가한 23억 달러를 기록했다. <2022년1-11월 한국 대 카타르 품목별 수출입 > (단위: 천 달러, %) 수출 수입 연번 MTI 품목명 금액 점유율 증감률 연번 MTI 품목명 금액 점유율 증감률 1 614 철강관 및 철강선 77,658 17.4 681.5 1 134 천연가스 7,383,630 49.5 37.5 2 741 자동차 61,263 13.7 48.9 2 131 원유 4,599,202 30.8 44.9 3 133 석유제품 28,396 6.4 47.8 3 133 석유제품 2,318,184 16 97.6 4 841 전력용기기 25,534 5.7 -50.6 4 621 알루미늄 259,666 1.7 31.9 5 746 선박해양 구조물 및 부품 23,096 5.2 6,214.4 5 231 질소비료 147,715 1 575.2 6 617 주단조품 15,619 3.5 133.8 6 228 정밀화학원료 136,496 1 44.7 7 725 건설광산기계 14,892 3.3 -71.4 7 214 합성수지 30,858 0.2 1.8 8 711 원동기 및 펌프 12,264 2.7 -14.6 8 211 기초유분 22,888 0.15 -11.3 9 214 합성수지 12,149 2.7 -38.2 9 135 LPG 3,970 0.02 -92.1 10 835 건전지 및 축전지 11,023 2.5 -13.6 10 226 농약 및 의약품 3,423 0.02 11,433.7 기타 164,296 37 - 기타 7,860 0.05 - 합계 446,190 100 21.5 합계 14,913,892 100 46.2 [자료: KITA] 시사점 2022 카타르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카타르 정부는 대부분의 인프라 프로젝트를 이미 완료한 상태이다. 이에따라 2023년 신규 프로젝트 예산으로 2022년 대비13.6% 감소한 176억 달러를 편성함에 따라 각종 물품 및 기자재의 수입은 점차 감소할 수도 있다. 하지만, 북부 가스전(North Field) 증산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관련 화학시설에 사용되는 품목의 지속적인 수요를 예상할 수 있다. 무엇보다 2023년 신규 프로젝트 예산의 경우 전체 예산의 28%를 차지하기 때문에 중대형 신규 프로젝트 발주로 인한 관련 산업기자재 수입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코로나19를 경험하며 수입된 한국산 의료용품, 의약품, 의료기기에 대한 현지 시장의 반응이 긍정적인 편이기 때문에 2022년 카타르 10대 수입품목에 포함된 기타 의약품(HS 30049010)과 관련된 제품으로 시장 진출을 고려해볼 수도 있다. 다만 체내에 흡수되는 의약품의 경우 정부에 등록을 해야하기 때문에 등록 절차 및 구비서류 관련하여 현지 에이전트나 무역관에 미리 연락해서 관련 내용을 알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한편, 카타르는 2017년 단교사태와 2020년 코로나19 대혼란을 겪으며 취약한 제조업 분야를 발전시키고 정부차원의 지원을 하고자 노력해왔다. 대부분의 제품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지화 전략을 앞세워 복잡한 제조시설을 요구하지 않는 산업 기자재 및 의료 소비재와 같은 단순 제조업 설비 관련 기회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 카타르 통계청 Planning and Statistics Authority, 한국무역협회KITA, 관세법령정보포털, Market Research Qatar, Fitch Solution, 주요 일간지(Gulf Times, Peninsula, Qatar Tribune), KOTRA 도하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도하무역관 문수아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01.0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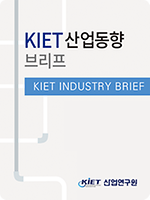
- KIET 산업동향 브리프 2022년 12월
- Ⅰ. 해외 경제 동향 • 미국은 10월 생산 감소와 소비 확대 등 실물지표들의 혼조 속에 체감지표들과 선행지수의 동반 하락세 등이 이어지면서 경기 둔화 우려감이 고조 -연준은 11월 FOMC 의사록을 통해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가능성을 시사한 데 이어, 파월의장도 긴축 완화 시점의 도래 가능성에 대한 의사를 표명 • 일본은 9월 중 실물지표들의 혼조세 속에 경기선행지수가 급락세를 보이고, 유로존도 역내 실물지표들의 혼조세 속에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사상 최고치 -일본은 3분기 실질GDP가 내수 둔화와 무역적자 확대 등의 영향으로 2분기 만에 마이너스 성장률(전기비 -0.2%)을 기록하고, 유로존은 독일과 프랑스 등 주요국들의 소폭 성장으로 인해 전기비 성장률이 0.3%로 하락 • 중국은 10월 생산과 투자 등 기업활동 지표들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소비가 5개월 만에 감소세를 보인 데 이어 수출도 2020년 5월 이후 처음으로 감소 -중국 인민은행이 7개월 만에 지급준비율 인하(-25bp)를 결정(11월 25일)한 가운데 중국 내 주요 대도시 지역에서 코로나19 관련 새로운 방역 완화 조치들을 공표 Ⅱ. 국내 실물 경제 • 10월 전 산업 생산은 서비스업이 2개월 연속 감소(-0.8%)하고, 광공업이 4개월 연속 감소하면서 전월비 감소폭 확대(-0.4% → -1.5%) -광공업 생산이 기계장비(-7.9%) 등 다수 업종에서 감소함에 따라 전월비 감소폭(-1.9% →-3.5%)이 확대되고, 서비스업 생산은 금융ㆍ보험(-1.4%), 정보통신(-2.2%) 등이 감소하면서 0.8% 감소 -소매판매는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전월비 3.1%) 판매가 전월비 증가세를 보인 반면에, 승용차 등 내구재(-4.3%)와 의복 등 준내구재(-2.5%) 판매가 동반 감소세를 보인 여파로 인해 2개월 연속 감소세(-0.2%) -설비투자는 선박 등 기계류(전월비 1.9%)는 증가한 반면 운송장비(-5.0%)가 3개월 만에 감소하면서 보합을 보이고, 건설기성액(불변)은 건축(3.9%) 과 토목(3.3%) 공사 실적이 증가하면서 3.8% 증가 -동행종합지수는 광공업생산지수, 내수출하지수는 감소했으나, 수입액, 건설기성액 등이 증가해 전월비 0.2% 증가하고, 선행종합지수는 건설수주액, 코스피 등은 감소했으나, 기계류내수출하지수, 재고순환지표가 증가해 전월비 0.2% 증가 Ⅲ. 주요 산업별 동향 •제조업 생산은 자동차(22.8%)와 기타운송장비(16.0%), 기계장비(5.7%) 등이 증가세를 유지한 반면, 전자부품(-26.3%), 1차 금속(-18.5%), 화학제품 (-13.2%) 등이 감소세를 이어간 영향으로 전년동월비 1.1% 감소 -공업구조별로는 제조업ICT에서 감소세(-6.1%)가 이어지고, 중공업(-1.0%)과 경공업(-1.9%)에서 모두 감소세로 전환 -전월비 기준으로도 기타운송장비(5.5%), 통신ㆍ방송장비(1.9%), 반도체(0.9%)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의약품(-10.1%), 기계장비(-7.9%), 자동차 (-7.3%) 등 다수 업종에서 감소함에 따라 4개월 연속 감소하며 감소세 확대(-3.6%) •제조업 생산능력은 반도체와 자동차, 통신ㆍ방송장비 등의 업종에서 상승한 반면, 전자부품과 기계장비, 식료품 등의 업종에서 상당폭의 감소세를 보이면서 전년동월비 0.8% 감소, 전월비 기준으로는 0.2% 감소 -제조업의 재고/출하 비율(재고율)은 122.1%로 전월에 이어 0.7%포인트 상승하고, 재고-출하 순환도는 재고 증가폭이 축소(9.2% → 4.6%, 계절조정치 전년동월비)되고, 출하 증가폭 역시 축소(2.8% → 0.4%)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2.4%로 전월에 이어 전월 대비 2.7%포인트 하락 Ⅳ. 지역별 동향 • 10월 전국 산업생산은 전년동월비 1.1% 감소 -부산(22.6%), 대구(9.0%), 경남(8.8%) 등에서 상대적으로 생산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서울(-11.3%), 전남(-9.8%), 충북(-4.6%) 등이 감소 Ⅴ. 산업 포커스 • 2023년 13대 주력산업 수출은 주요 수출국 물가 상승 및 통화긴축 기조 유지, 세계경제 성장률 둔화 여파로 자동차(2.5%), 조선(42.4%), 이차전지 (17.3%), 바이오헬스(6.5%)를 제외한 대다수 산업에서 부진하여 2022년(7.7%)보다 4.0% 감소한 5,179억 달러 전망⋅13대 주력산업 수출액: (2021년) 5,012억 달러 → (2022년) 5,397억 달러 → (2023년) 5,179억 달러⋅13대 주력산업 수출 비중: (2021년) 77.8% → (2022년) 77.8% → (2023년) 77.1% • (기계산업군) 일반기계 감소(-2.3%)에도 불구하고 자동차(2.5%)와 조선(42.4%)이 수출 호조를 보이면서 기계산업군 전체로는 5.7% 증가 전망 -자동차 수출은 공급 차질이 일부 해소되는 반면 수요도 위축되는 상황이지만 국내 업체들은 경쟁업체 대비 공급능력이나 가격경쟁력에서 우위를 보이면서 올해 대비 2.5% 증가한 783억 달러(자동차부품 포함)를 기록할 전망 -조선 수출은 2020년 4분기 이후 대량으로 수주 받은 컨테이너선, LNG운반선, LPG운반선의 수출이 대폭 증가하면서 올해 대비 42.4% 증가한 257억 달러 규모로 전망
- [ 경제자료 ] [ 국내경제 ] KIET | KIET 산업연구원 | 2023.01.02
-

- 2023년 칠레 경제 전망
- IMF는 고인플레이션과 시장 불확실성, 글로벌 경기 침체가 2023년에도 지속되면서 2023년 칠레 경제성장률을 -1.0%로 발표했다. 아래에서는 칠레 경제에 영향을 미칠 주요 요인에 대해 살펴본다. <2018~2023년 주요 경제지표 추이> (단위: US$ 십억, %)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명목 GDP 295.15 278.35 252.35 316.77 310.87 347.57 실질 GDP 성장률 4.0 0.8 -6.1 11.7 2.0 -1.0 소비자물가상승률 2.3 2.3 3.0 4.5 11.6 8.7 실업률 7.4 7.2 10.8 8.9 7.9 8.3 총수출 75.40 69.15 67.56 89.84 - - 총수입 67.71 64.12 55.32 86.12 - - 주: 2022년은 추정치, 2023년은 전망치 기입 [자료: IMF 및 GTA] 고인플레이션, 가계 구매력을 악화시켜 2022년 칠레는 코로나19 경기부양책 등으로 과열된 경제가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높은 인플레이션에 직면했다. 시중에 유동성이 확대되면서 연간 인플레이션은 두 자릿수에 진입했는데, 2022년 8월 연간 물가 상승률은 1992년 이래 역대 최고치인 14.1%를 기록했다. 따라서 칠레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2022년 10월 초부터 기준금리를 연초 4%보다 7.25%p가 높은 11.25%로 상향 조정하며 긴축 통화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칠레의 한 연구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1~8월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가계 구매력이 약 5억 2,400만 달러가 떨어졌다. 하지만 2023년에도 이러한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칠레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 목표를 3%로 설정했는데, 3%대 수준으로 물가가 안정되려면 2024년 하반기는 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헌법을 둘러싼 혼란, 시장 불확실성을 증폭 2022년 3월 사회주의 성향의 신정부가 집권하고 진보적인 가치를 담은 신헌법을 둘러싼 정국 혼란이 지속되면서 시장 불확실성이 가중되었다. 신정부는 취임 후 4월 경기부양책인 ‘포괄적 회복 계획(Chile Apoya: Plan de Recuperación Inclusiva)’를 발표했는데, 최저임금 인상, 대중교통 요금 동결, 소외계층 지원 등 21개의 단기 세부 정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불확실성으로 인한 투자 심리 악화에 큰 영향을 미친 이슈는 신헌법이다. 2019년 전국적인 사회적 소요(Estallido Social) 이후 사회적 불평등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신헌법 제정 절차가 약 2년간 진행되었다. 하지만 신헌법 개정안은 지방분권, 다민족, 양성평등, 환경보호 등 진보적이나 다소 급진적인 가치를 담고 있다는 평가를 받으며 2022년 9월 4일 국민투표에서 큰 차이로 부결되었다. (찬성 38.14%, 반대 61.86%) 신헌법 제정이 부결되면서 아우구스토 피노체트(Augusto Pinochet) 군사 정권 시 제정된 현행 헌법이 유지되나, 여야 협의로 2023년 신헌법 제정 절차를 다시 시작하면서 이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향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칠레 정부는 신헌법 찬반 국민투표는 2023년 11월로 예정되어 있다.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동 가격 하락세, 수출에 타격 고인플레이션과 시장 불확실성으로 소비와 투자 심리가 악화된 상황에서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글로벌 경기 침체와 주요 교역대상국인 중국과 미국의 경제성장 둔화로 동 가격 하락세가 심화되었다. 칠레는 동 중심의 수출 구조로 인해 동 가격이 하락하면 수출 또한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칠레 총 수출액은 동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한 2022년 5월 107억 달러를 기록한 후 매월 감소 중이다. <2022년 칠레 월별 수출액 추이> (단위: US$ 백만) [자료: GTA] 2023년에도 동 가격 하락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칠레 동 위원회는 2023년 동 가격을 기존에 파운드당 3.94달러에서 3.70달러로 하향 조정했다. La Tercera 등 주요 언론은 중국과 유럽의 경제성장 둔화와 고인플레이션과 고금리 지속으로 동 수요가 감소하면서 당분간 동 가격 하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사점 2023년 칠레 경제는 -1.0% 내외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 칠레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 높은 인플레이션과 시장 불확실성, 글로벌 경기 침체가 2023년에도 지속되면서 마이너스 성장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2022년 칠레 경제가 하락 국면에서도 2.0% 소폭 성장이 예상되는 것에 비추어볼 때, 2023년 칠레 경제가 실제로 마이너스 성장을 할지에 대해서는 향후 주요 경제지표 추이와 정치∙경제 환경 등을 주시해야 한다. 칠레 시장 진출에 관심이 있는 우리 기업은 변화하는 시장 환경을 수시로 파악하고 신규 사업진출을 위한 시장조사와 구체적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작성자: 산티아고 무역관 이동희 과장, Catalina Salinas Specialist 자료: IMF, GTA 등 산티아고 무역관 보유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산티아고무역관 이동희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01.02
-

- 인도경제 내수시장 기반 고성장세 지속
- 인도는 러-우 사태, 원자재 가격 폭등, 글로벌 고금리, 공급망 위기, 물가 상승 등 각종 글로벌 경제의 악재에도 불구하고 거대한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견고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인도는 2022년에 영국을 제치고 세계 5위의 경제대국 반열에 올랐다. 인도경제 고성장 지속 The World Bank는 12월 6일 인도의 2022-2023년 경제성장율을 6.5%에서 6.9%로 상향 조정하였는데 이는 지난 10월 당초 예상치였던 7.5%에서 6.5%로 낮추었다가 다시 상향 조정을 한 것이다. 그 이유는 인도경제가 대외경제변수에 대한 회복력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투자은행인 Morgan Stanley는 지난 10월 보고서를 통해 인도경제는 향후 약 10년간 세계 5위권의 고성장을 이루고 2032년까지 세계 3위권 경제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인도의 경제성장율 전망 및 소득분포 변화 예상치> 자료: CEIC, Haver, Morgan Stanley Research S&P는 지난 11월말 인도의 올해 경제성장율을 기존 7.3%에서 7.0%로 낮추었지만 인도의 내수 주도 경제는 글로벌 경제 충격에 영향을 덜 받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S&P는 2023년 및 2024년 인도의 경제성장율을 각각 6.0%, 6.9%로 전망하였다. 인도 경제성장의 원동력 글로벌 고금리 기조, 물가상승 등으로 인해 2022-2023년 인도 경제성장율은 둔화될 것으로 보이나 견고한 내수시장의 고성장에 따라 성장세가 유지될 전망이다. 인도는 특히, 2022년 10월부터 민간소비 및 투자가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승용차 판매도 호조를 보이는 등 내수시장이 활기를 되찾고 있다. 또한, 중국의 코로나 정책으로 인한 중국내 생산감소에 따라 외국기업들의 제품소싱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영향으로 2022년 상반기에는 미국의 대 인도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의 비즈니스 환경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의 2022년 12월 자료에 따르면 인도의 비즈니스 환경은 이제 중국 및 동아시아 국가들과 경쟁할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고, 이로 인해 더 많은 외국인 투자가 이뤄질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인도의 비즈니스 환경 순위는 5년전 62위에서 올해 52위까지 상승하면서 중국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호주 및 영국 등과의 양자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산업 발전을 위한 인도정부의 PLI(Production Linked Incentive) 제도 역시 내수시장 및 수출의 증가에 기여를 하고 있다. 대만의 Foxconn사는 중국생산이 어려워짐에 따라 PLI 제도를 활용하여 인도내에서 생산을 큰 폭으로 확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EIU 인도의 Dasgupta Senior Analyst에 따르면 인도는 풍부한 저가 노동력, 제조업 가격경쟁력, 투자의 개방성, 우호적인 비즈니스 환경(정부정책), 소비성향을 가진 젊은 연령층 등의 강점을 기반으로 2030년까지 제조업 생산지로서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한면, 영국계 투자은행 Barclays는 인도의 고성장 기조에도 위기요인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글로벌 경기침체, 고금리 정책, 물가상승 등은 경상수지 적자 요인이 될수 있고, 이로 인한 외환보유고 감소는 루피와의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고성장 기조하에서도 외환 등 신중한 대외경제 정책 추진이 필요해 보인다. 시사점 인도 경제는 내수기반 경제로서 우리나라와 같이 수출비중이 높은 국가에 비해 대외 변수에 따른 경제적 충격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최근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하에서도 인구 14억명의 거대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인도 경제는 견고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향후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는 과거 IT BPO(Business Process Outsourcing) 산업으로 명성을 날렸지만 최근 들어서는 제조업 발전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인도 정부는 PLI(Production Linked Incentive) 제도를 도입하여 인도내 제조업 생산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제조업 분야의 외국인 투자유치에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글로벌 기업들이 CHINA+1 정책을 추진하면서 인도가 중국을 대체하는 제조업 생산기지로서의 가치가 부각되고 있다. 아직까지 인도는 각종 인프라가 열악하고 외국인 생활환경도 우수한 편은 아니지만 잠재력을 보유한 내수시장, 정부의 제조업 육성정책, 제조업 진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조업 진출도 검토해볼수 있는 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평가된다. 자료 : Morgan Stanley, Economic times, Financial Express, EIU, Outlook India, 무역관 정보종합 등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콜카타무역관 박병국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01.02
-

- 2023년 중국 경제 전망
- 최근 중국의 ‘위드코로나’가 가시화되고 중국 중앙·지방정부가 고강도 경기부양 기조를 유지해 내년 경기회복을 이뤄낼 것이라는 신호를 보내면서 내년 중국 경제가 5% 이상의 성장률을 실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중국 관영 싱크탱크인 사회과학원은 내년 중국 경제성장률이 5.1%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디지털 경제, 스마트 제조, 탄소중립 전환, 바이오의약 등 산업 발전에 가속도가 붙으며 중국 경제 성장 모멘텀이 회복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모건스탠리, 골드만삭스 등 해외 기관들도 최근 2023년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중국 본토 코로나19 확산세가 내년 1월 춘절(=설)을 전후해 정점에 달하고 2분기부터 중국 경제가 반등할 것으로 보고 있다. * 모건스탠리 5% → 5.4%, 골드만삭스 4.5% → 5.2%, 노무라 4% → 4.8% <중국 경제성장률(%) 추이> [자료: 국가통계국, wind 등] 전망 1. 서비스 소비 중심으로 전체 소매판매 회복에 속력 중국의 코로나19 방역 완화 기조가 현실화되면서 중국 소비, 특히 서비스업 소비 회복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다. 중국 국가건강위(방역당국), 교통운수부 등 부처는 최근 국내외 이동제한 취소 조치를 쏟아내고 있다. 12월 초 중국내 이동제한을 철폐한 데 이어 2023년 1월 8일을 기점으로 입국 후 PCR 검사를 없애는 등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검역 조치를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다수 지역에서 실내시설 진입 전 PCR 음성 결과 제출 의무를 취소하고 있다. 그간 고강도 방역통제 조치로 갇혀 있던 여행 등 서비스 소비 수요가 분출되면서 ‘제로코로나’시대 미진한 양상을 보였던 중국의 소비 회복세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단,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불안감으로 중국의 소비 증가율은 코로나 이전과는 일정한 차이를 보일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코로나 이전 중국의 소비는 8% 이상의 성장세를 이어왔다. 그러나 감염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종의 중국 내 확산으로 올해 중국 소비 증가율은 코로나 이전의 절반 수준에도 못미치는 2.7%를 유지하고 있다. 코로나 기간 중국의 경기 회복세 지연으로 소득 성장률**이 크게 꺾인 상황에서 중국 소비의 급격한 반등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 2023년 중국 소비 증가율 전망치: 궈타이쥔안 증권 4% 수준, wind 6.3% ** 중국 도시주민 가처분소득 증가율: (‘19) 7.9% → (‘20) 3.5% → (‘21) 8.2% → (‘22.1~9.) 4.3% <중국 소매판매 증감률 추이> [자료: wind, 궈타이쥔안 증권] 전망 2. 고강도 경기부양책 지속 시행으로 인프라·제조업 투자 증가율은 현 수준 유지 11월 누계 기준 인프라와 제조업 투자는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1.7%, 9.3% 증가하며 전체 투자, 중국 경기하강을 방어했다. 2023년 중국 경제운용 방향을 확정하는 2022년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내년 ‘안정 최우선·안정 속 성장(穩字當頭, 穩中求進)’의 경제기조로 운용함에 있어 기존의 적극적인 재정·통화정책을 유지하고 재정정책의 효율성을 증진하는데 전력하겠다고 밝혔다. 현지 전문가들은 2023년 양회에서 재정적자율 목표치는 올해(2.8%) 대비 상향 조정한 ‘3.0% 안팎’, 지방정부 특별채권 신규 발행 한도는 올해와 동일한 수준인 ‘4조 위안’으로 잡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또한 최근 중국 국무원이 발표한 내수확대 중장기 전략인 ‘내수확대 전략 계획 요강(2022~2035년)’에는 ▲제조업 투자 확대, ▲신SOC 투자 가속화, ▲신형 도시화 가속화, ▲현대화 유통체계 건설, ▲탄소중립 전환 가속화 등 인프라·제조업 투자 확대 관련 내용이 대거 담겨져 있다. 고강도 경기부양책, 중국의 안정적 자립형 공급망 구축 수요에 따라 디지털 경제, 스마트 제조, 탄소중립 전환, 첨단 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에 가속도가 붙으며 중국의 인프라와 제조업 투자는 현재의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점쳐진다. 전망 3. 부동산 투자는 내년 1분기 저점 찍은 후 감소폭 지속 축소 올해 중국의 부동산 투자는 연초부터 역성장을 거듭하며 중국 경기하방 압력을 증대시키는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했다. 11월엔 전년 동월 대비 19.9% 대폭 감소하며 사상 최대 낙폭을 기록하기도 했다. 중국 정부는 내년 정부·민간 자금 투입을 확대하고 지방정부·금융기관의 보장성 주택 투자 확대를 장려하는 등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내년 1분기까지 중국 본토 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 반등은 이뤄내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바 악화일로를 걸어온 중국의 부동산 투자는 내년 2분기부터 반등세로 돌아설 전망이다. 신당증권(信達證券)은 2023년 4분기 중국 부동산 투자 감소폭이 △5% 수준으로 축소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궈타이쥔안 증권은 부동산 투자 안정화 대책 및 기저효과로 내년 3분기 중국 부동산 투자가 플러스 전환을 실현할 수 있다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중국 분야별 투자 증감률(당월, %)> [자료: wind, 중신증권] 전망 4. 수출의 저조한 흐름은 내년에도 지속 코로나 기간 중국 경제회복의 견인력 역할을 해온 수출은 올해 10월 전년 동월 대비 0.3% 소폭 감소하며 역성장하기 시작했다. 11월엔 감소폭이 8.7%로 확대됐는데 이는 2020년 2월 이후 최대 낙폭이다. 2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하며 11월 누계 중국 수출 증가율은 한자릿수로 둔화했다. * 중국 수출 증가율(%): (‘20) 3.6 → (‘21) 29.6 → (‘22.1~11.) 9.0 <중국 수출입 (당월)증감률> [자료: 해관총서] 중국의 對선진국 수출 둔화세가 심화되고 있으며 그간 견조세를 보이던 아세안향 수출도 11월 대폭 둔화되었다. 중국의 미국, EU향 수출은 10월부터 두달째 역성장 중이며 對일본 수출도 11월 마이너스 국면에 진입했다. 10월까지 20% 이상의 고성장세를 유지하던 중국의 對아세안 수출 증가율이 11월 15%p 대폭 둔화되면서 중국 수출 업계의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중국 주요 수출대상국(지역)별 수출 증감률(당월, %)> 수출대상국 미국 EU 일본 아세안 한국 9월 △11.6 5.6 5.9 29.5 6.8 10월 △12.6 △9.0 3.8 20.3 7.0 11월 △25.4 △10.6 △5.6 5.2 △11.9 둔화폭(11-10월) △12.9 △1.7 △9.4 △15.1 △18.9 [자료: 해관총서] 외수부진으로 중국의 전통 수출품목, 코로나 기간 수출효자 역할을 담당했던 마스크 수출도 빠르게 둔화하고 있다. 11월 중국의 기계전자류 수출 감소폭은 11.4%에 달했다. 이중 집적회로와 휴대폰 수출 감소폭은 30%에 육박하거나 돌파했으며 가전 수출도 2개월 연속 20% 이상 감소했다. 의류 수출은 4분기 들어 두자릿수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고 플라스틱 수출도 11월 마이너스 전환했으며 마스크 수출 감소폭은 11월 두자릿수로 확대됐다. <중국 주력 수출품목별 수출 증감률(당월, %)> 품목 집적회로 휴대폰 가전 가방 의류 플라스틱제품 방직품 (마스크 등) 9월 △1.7 23.2 △19.8 28.0 △4.4 5.6 △2.7 10월 △1.6 7.0 △25.0 20.4 △16.8 3.1 △9.0 11월 △29.0 △33.3 △22.9 12.7 △14.4 △3.8 △14.8 둔화폭 (11~10월) △27.4 △40.3 2.1 △7.7 2.4 △6.9 △5.8 [자료: 해관총서] 글로벌 경기침체로 주요 수출대상국(지역)에 대한 수출 둔화세가 심화하고 있으며 기계전자와 노동집약형 품목 등 중국의 주력 품목의 수출실적이 일제히 악화하면서 2023년에도 저조한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는데 무게가 실린다. wind(△1.6%), 궈타이쥔안 증권(△7.3%) 등 현지 연구기관들은 내년 중국 수출이 마이너스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망 5. 중국 내 물가 안정세는 지속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속에서 중국의 물가는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코로나 재확산에 의한 소비심리 위축으로 11월 당월 중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폭은 2%를 하회했으며 11월 누적 기준도 2%에 그쳤다. 중국의 생산자물가지수(PPI)는 작년 9월 13.5%에서 고점을 찍은 후 올해 11월까지 둔화세를 이어왔다. 올 10월부터는 2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 중이다. 11월 누적 PPI 상승폭은 4.6%이다. <중국 CPI·PPI 증감률(당월, %)> [자료: 국가통계국] 2023년 중국 소비의 급격한 반등이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당국이 경기안정을 위해 물가 안정세를 유지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2023년 중국의 CPI 상승폭은 2%대에 그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또한 글로벌 경기침체로 중국의 수출 둔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PPI의 급격한 반등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데 무게가 실린다. 일각에서는 내년 중국의 PPI 상승폭은 마이너스 국면에 머물러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사점 방역 중심에서 경제 회복 모드로 전환한 중국은 2023년부터 내수를 중심으로 경제회생을 실현할 방침이다. 내년 중국은 신에너지차 소비진작, 관련 인프라 확충, 첨단설비 투자 장려 등 내수진작 정책, 조치를 쏟아낼 것으로 예상되는 바 우리 기업들은 중국 내수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전략을 검토, 수립해야 한다. 한편, 영국 투자은행 바클리스 등 금융기관은 중국의 2023년 성장률이 4%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하는 등 엇갈린 관측도 나오고 있다. 우리 기업들은 중국 본토 코로나19 확산 동향, 글로벌 경기침체 등 중국 경기회복세를 지연시키는 불확실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중간재 위주의 對中 수출 구조로 외수부진 및 이에 따른 중국의 수출 저조는 우리 기업의 대중 수출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바 對中 소비재 수출을 늘리는 수출구조 개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자료: 국가통계국, 해관총서, wind, 궈타이쥔안 증권(國泰君安證券), 궈위안 증권(國元證券), 중신증권(中信證券), 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 등 KOTRA 베이징 무역관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베이징무역관 김성애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01.02
-
- 필리핀 경제부흥을 위한 크리에이티브 산업법 추진
- 필리핀 산업 통상부(DTI)는 12월 7일 필리핀 크리에이티브 산업 법안의 시행을 위한 최종 세칙을 발표했다. 해당 법안은 2022년 7월 28일에 발표한 법안으로 산업통상부(DTI) 장관이 의장을 맡은 필리핀 창조 산업개발 위원회에서 관리할 예정이다. 위원회 구성으로는 교육부, 과학기술부, 관광부, 내무부 및 지방정부의 비서관과 국가경제개발청(NEDA)의 수장이 포함돼 있으며 인프라, R&D, 기술, 디지털화, 자금, 투자, 교육 등 구체적인 현안에 대한 지원 제도를 실현하기 위함이다. 크리에이티브 산업법 <필리핀 크리에이티브 산업법> [자료: 필리핀 관보] (http://legacy.senate.gov.ph/republic_acts/ra%2011904.pdf) 법안 주요 내용 크리에이티브 기업, 예술가, 기술자, 건축가, 근로자, 토착 문화 공동체, 콘텐츠 제공자 및 창작 분야 이해관계자의 권리와 역량을 보호하고 강화함으로써 필리핀 창조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필리핀은 고용 창출, 인적 자원 육성, 재정적 지원 보장을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필리핀 크리에이티브 산업의 개발 및 진흥을 위한 장기 계획을 이행하도록 위임된 크리에이티브 산업 개발 위원회 설립하며, 크리에이티브 산업에서 필리핀의 우수성을 장려하고 유지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가치 창출, GDP에 대한 기여, 고용 창출, 시장 확장, 국내 또는 해외 투자 대상을 포함해 크리에이티브 산업에 대한 경제 목표 및 핵심 성과 지표를 정의하는 필리핀 크리에이티브 산업 개발 계획을 수립과 더불어 정부의 기존 관련 정책, 계획,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를 검토하고 정부 기관, 비정부 조직, 기업 협회 및 크리에이티브 근로자 협회와 협력해 크리에이티브 산업을 지원하는 국가 정책, 계획 및 프로그램을 수립한다. 크리에이티브 산업 발전 지원 1) 인프라 지원 크리에이티브 기업은 필리핀 혁신법(RA 11293)에 따른 산업통상부(DTI)의 공유 서비스 시설과 인프라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위원회는 스튜디오 및 공연장 임대를 위한 보조금 계획을 수립하고 공동 작업 공간 및 기타 유사한 시설과 장비를 제공하여 여러 산업 이해 관계자가 제품 또는 서비스의 제작과 개발 및 홍보를 위해 사용할 수 있다. 2) 연구 개발(R&D) 및 지원 크리에이티브 산업체는 DOST의 연구 개발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 프로그램은 과학 및 기술 지원을 통해 산업 요구를 해결하고 생성된 기술의 이전 및 상용화를 가속하며 연구 프로젝트에 재정 지원을 제공한다. 연구 개발을 수행할 자원과 기관으로 연구 보조금은 평가 및 승인 여부에 따라 학술 기관, 지역 기업 및 신생 기업에서 사용할 수 있다. 3) 디지털화 전용 고속 인프라와 대역폭은 DICT와 국가통신위원회가 제공하여 이러한 서비스, 플랫폼 및 프로그램이 크리에이티브 산업 기업에 효율적으로 전달 지원한다. 4) 크리에이티브 바우처 시스템 중소기업을 우선으로 크리에이티브 산업 주체에 대한 지원, 원조 및 기타 인센티브 부여를 체계화하기 위해 크리에이티브 바우처 제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크리에이티브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지원단체 및 크리에이티브 근로자 협회 등 이해관계자에게 크리에이티브 바우처를 발급하여 각종 정부 기관의 지원과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5) 크리에이티브 산업 투자 우선 계획 시의회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크리에이티브 산업의 특정 활동 목록을 포함하는 창조 산업 투자 우선 계획(CIIPP)을 수립해야 한다. 6) 재정 지원 정부가 관리 또는 지원하는 금융 기관은 관련 금융 기관의 규칙 및 규정에 따라 신용 지원 및 보증 제도를 제공할 때 크리에이티브 산업에 우선권을 부여한다. 7) 인재 양성 민간 부문 및 학계와 협력해 국가의 크리에이티브 산업에서 인적 자원 개발, 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한 크리에이티브 교육 계획 및 기타 정책, 프로그램 및 전략을 수립한다. 크리에이티브 산업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지원 및 개발하고 크리에이티브 산업과 관련된 프로그램이나 전공 과정을 이수 중인 대학생 및 대학원생에게 각각 장학금을 지원한다. 크리에이티브 산업의 기업가, 근로자, 실습생 및 이해관계자를 위해 장학금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적인 교육, 기술 훈련, 역량 강화를 제공한다. 8) 크리에이티브 산업 개발 기금 크리에이티브 산업발전기금(이하 기금)으로 불리는 특별 재단이 설립된다. 기금의 목적은 연구 개발, 무역 진흥, 인적 자원 개발, 기업 지원 조직 및 크리에이티브 근로자 협회를 통한 예술가, 근로자 및 기타 이해 관계자의 복지를 위한 것으로 기금은 기존 정부 예산 편성, 회계 및 감사 규칙 및 규정에 따라 이사회에서 관리한다. 9) 공공-민간 파트너십 민관 협력은 필리핀 BOT(Build-Operate-Transfer) 법(RA 6957)의 조항에 따라 창조 산업을 위한 인프라 개발 촉진을 지원한다. 시사점 필리핀은 높은 생산 비용, 분열된 교육 시스템, 불법 복제 문제, 데이터 및 통계 부족, 낙후된 브랜딩 및 인프라, 기술 격차와 같은 제약에 직면한 필리핀의 크리에이티브 산업에 적절한 지원 조치를 제공하며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성장시킬 계획으로 창조성과 문화를 중심에 두고 허브 및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필리핀에 더 많은 유네스코 지정 도시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할 전망이다. 필리핀 정부는 크리에이티브 산업의 막대한 잠재력을 인정하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최전선에서 확장된 필리핀의 크리에이티브 산업을 통해 창조 경제를 구축하고 국가 발전을 주도하며 지역 문화를 더욱 풍요롭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산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역할이 중요하며 실제로 크리에이티브 산업은 국가 경제에 8% 정도에 기여하며 500만 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국가 전체 수출의 12%를 차지하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자료: 필리핀 관보, 필리핀 산업통상부(DTI), Philippine News Agency, Philstar, ManilaBulletin, BusisnessMirror 및 KOTRA 마닐라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마닐라무역관 김진형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12.2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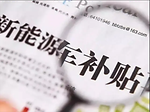
- 중국, 2023년부터 전기차 구매보조금 전면 폐지
- 中 전기차 보조금 내년부터 전면 폐지 중국은 오는 2023년부터 신에너지차 구매보조금을 완전히 폐지하기로 했다. 중국 재정부, 공업정보화부, 과학기술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4개 부처는 '2022년 신에너지차 보급을 위한 보조금 정책에 관한 통지'를 발표, 신에너지차 구매 보조금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만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년부터는 신에너지차 구매 시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중국은 지난 2009년에 전기차 보급 정책을 시행하면서 보조금을 지급해왔다. 보조금은 우리나라처럼 전기차 구매 소비자에게 직접 주는 게 아니라 전기차 생산업체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전기차 생산업체가 자사 전기차 판매량을 지방정부에 보고해 보조금을 신청하면 정부가 전문가 심사를 거쳐 보조금을 집행한다. 기업들이 보조금을 반영해 가격을 책정하니 판매가가 낮아지고 결국 소비자들은 저렴한 가격에 전기차를 구매할 수 있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2년간 중국 전기차 업체가 받은 보조금 액수는 총 1600억 위안(약 29조5280억 원) 정도다. 중국 1위 전기차 제조기업 비야디가 70억 위안(약 1조2933억 원) 가까운 보조금을 지원받았고, 미국 전기차 브랜드 테슬라는 약 35억 위안(약 6466억 원) 규모의 보조금을 받았다. 그 외에 둥펑, 광치, 치루이, 창청 등 주요 자동차 기업들도 10억~20억 위안(약 1847억~3695억 원) 이상씩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 기업별로 전기차 보조금 수령 현황> (단위: 만 위안) [자료: 후슈자동차(虎嗅汽车)] 중국 정부의 보조금 폐지에 따라 전기차 판매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야디는 지난달 말 왕차오(王朝), 하이양(海洋), 텅스(腾势) 등 전기차 모델 판매가를 2000~6000위안(약 37만~111만원)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저우자동차 산하 전기차 메이커인 아이안(埃安)도 최근 일부 모델의 공식 판매가를 3000~8000위안(약 55만~148만 원)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경쟁력을 키운 중국 전기차 산업이 보조금에 의존하지 않고도 앞으로 발전할 수 있을지 시장은 예의 주시하고 있다. 사실은 중국 정부는 과도한 보조금 의존도를 낮추고 전기차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그 동안 전기차 보조금 액수를 계속 줄여왔다. 보조금 정책 시행 초기에는 대당 최대 6만 위안(약 1126만 원)까지 지급했었지만 2017년에는 보조금 한도를 2016년 대비 20% 삭감하기로 했고 2019년에는 전년 대비 40%, 올해는 작년 대비 30% 줄였다. 이와 동시에 보조금 지급 기준은 꾸준히 높였다. 2018년에는 항속거리 150km인 차량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지급하다가 2019년 250km로 기준을 높였고 최근에는 300km 이상 차량만 보조금 지급 대상이었다. 그 결과 전기차 판매수입 중 보조금 비중은 해마다 축소되며 지난해 기준 5~1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이보다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전기차 구매보조금 현황> (단위: 만 위안) [자료: 재정부, 화촹증권(华创证券)] 중국 승용차시장정보연석회 추이둥수(崔東樹) 의장은 "중국 전기차 소비는 정책 중심에서 시장 중심으로 전환 중"이라며 "보조금 폐지로 단기적 영향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계속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거대해지는 中 전기차시장 중국 전기차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중국 자동차산업협회(中國汽車工業協會)에 따르면, 2009년 500대에 불과했던 전기차 연간 판매량은 지난해 352만 대로 늘어났다. 전 세계 전기차 절반이 중국에서 팔린 정도다. 올해 1~11월 전기차 판매대수는 607만 대로 작년 대비 약 2배에 달한다. 신차 판매 중 전기차 비중은 25%다. 중국 자동차공업협회는 올해 전체 중국 전기차 판매가 90% 증가한 670만 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전기차 판매 추이> (단위: 만 대) [자료: 중국자동차공업협회] 또한 중국 자동차공업협회는 내년 중국 전기차 판매 규모를 올해에 비해 35% 증가한 900만 대로 예상하고 있다. 이 경우 신차 판매 중 전기차의 비중이 32.6%에 달하게 된다. 중국 정부는 2020년 11월 ‘신에너지차 산업 발전계획(2021~2035)’을 발표해 2025년까지 전체 자동차 판매에서 전기차 비중을 20%까지 끌어올리고 2030년에는 30%, 2035년에는 50%로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중국의 전기차 시장은 당초 계획보다 빠르게 성장하며, 2023년 목표치는 내년에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시사점 2009년부터 시행, 올해로 13년차를 맞은 중국 신에너지차 보조금 정책이 2023년을 기점으로 전면 폐지된다. 보조금 폐지가 전기차 업계에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겠지만 장기적인 충격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전망하고 있다. 내년에는 중국 전기차 시장은 성장세를 이어가 900만 대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보조금 폐지로 중국 로컬기업들이 가격을 인상하면서 경쟁력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동안 보조금 문제로 중국 시장 진출이 막혔던 국내 자동차 메이커나 전기차 배터리 업체들에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기업들은 전기차 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과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자료: 경제관찰보(经济观察报), 21세게경제보도(21世纪经济报道), KOTRA 선양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선양무역관 동흔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12.29
-

- KIET 경제 · 산업동향 2022년 12월 2호
- □ 해외경제 : 주요국 실물지표 부진 속에 중앙은행 금리 인상 지속 시사 □ 국내경기 : 10월 전산업생산 전월비 -1.5%, 소비 감소·투자 보합 □ 금 융 : 11월 기업대출 증가세 지속·가계대출 감소폭 확대, 12월 중순(12.13~12.26일) 금리 보합세 및 원/달러 환율 하락 □ 산업별 동향 : 10월 제조업생산 전년동월비 -1.1%, 서비스업생산 +5.0% □ 고 용 : 11월 전산업 취업자 기준 전년동월비 2.3% 증가 □ 수출입 : 11월 수출 -14.0%, 수입 +2.7%, 무역적자 약 70억 달러 <부록> 슬로우플레이션(Slowflation) 진행 중인 국내 경제 (현대경제연구원)
- [ 산업자료 ] [ 산업/기술일반 ] KIET | KIET 산업연구원 | 2022.12.28
-

- 일본 2023년도 예산안, 114조3812억 엔으로 역대 최대
- 일본 정부는 12월 23일 114조3812억 엔의 2023년 예산안을 결정하였다. 2022년도 본예산 대비 6조7848억 엔이 증가해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110조 엔을 넘은 것은 처음이다. 고령화로 사회보장비가 증가하였고 방위비가 1조4192억 엔 증가한 6조7880억 엔을 기록하면서 총 예산 규모가 급증하였다. 견조한 기업 실적과 고용자 수 증가로 인해 세수도 69조4400억 엔으로 사상 최고치가 될 전망이다. 하지만 세수가 세출(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 내 모든 지출)을 충당하지 못한 결과 35조 6230억 엔의 신규 국채를 발행해 세입 부족을 메운다. 전체의 31.1%를 빚에 의존하는 셈이다. 일본 정부는 향후 5년간 방위비를 이전의 1.5배 규모인 43조 엔을 책정할 방침이다. 2023년도는 전년도보다 1조4192억 엔 확대됐는데 이는 최근의 증가 규모(500억~600억 엔 정도)를 크게 상승한 것이다. 일반 회계의 30%를 차지하는 사회 보장비는 36조8889억 엔으로 책정되었다. 고령화로 인한 의료 및 간병 비용의 증가로 전년도보다 6154억 엔 상승했다.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지방교부세 예산 규모는 5166억 엔이 증가한 16조3992억 엔을 기록하였다. 또한 국채의 원리금 상환에 충당되는 국채비는 9111억 엔 증가한 25조2503억 엔이다.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거액의 예비비도 책정되었다. 코로나19와 물가상승 대책으로 4조 엔, 우크라이나 위기대응으로 1조 엔이 포함되었다. 예비비는 정부가 각의결정에서 구체적인 사용 방도를 정한다. 국회 감시가 미치기 힘들다는 비판이 있다. 고물가 대비 예산, 석유 및 천연가스 권익 획득 추진 우크라이나 사태 및 엔저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으로 가계·기업이 안고 있는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정책이 지속될 예정이다. 경제산업성은 2023년도 예산안에 중소기업이나 소규모사업자의 생산성 향상 및 가격 전가 원활화를 위해 877억 엔을 책정하였다. 매입 가격에서 발생하는 상승분을 적절하게 판매 가격으로 전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에너지 안전보장이나 자원확보를 위해 2022년도 본 예산 대비 5.8% 증가한 5549억 엔을 배정한다. 일본 정부는 일본 기업의 석유 및 천연가스 권익 획득 또는 유지에 필요한 리스크 머니 공급이나 기술개발에 지원하고 원자력 생산 인재, 기술, 공급망 유지 및 강화나 고온가스로 고속도로 개발을 위해서도 노력할 계획이다. 액화천연가스(LNG)나 석탄의 가격상승으로 인해 도호쿠전력, 호쿠리쿠전력, 주고쿠전력, 시코쿠전력, 오키나와전력 5개사는 경제산업성을 대상으로 2023년 4월부터 규제요금 상승을 신청하고 있다. 해당 사안이 인가된다면 큰 폭의 부담증가가 예상된다. 2022년도 제2차 추경 예산에서는 전기, 가스비 상승 대책으로 3조1074억 엔, 석유제품 대책으로 3조272억 엔의 지원정책이 마련되었다. 전기·가스요금은 2023년 8월까지 일반 가정의 표준전기세를 월 2800엔, 도시가스 비용을 900엔으로 책정해 그 이상 가격이 상승하지 않도록 제한할 방침이다. 또한, 가솔린 보조금은 1리터당 35엔을 상한으로 보조해 가솔린 전국 평균 가격을 170엔 정도대로 형성하는 것이 목표다. 2023년도 1월부터 5월에 걸쳐 보조상한을 25엔까지 월 2엔씩 축소할 방침이다. 식료품 가격 상승도 대응할 방침이다. 우크라이나 사태 후 가축용 사료 및 비료 등의 공급이 불안정해지며 가격이 상승하였다. 농림수산성은 수입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자급률 향상 및 대체품 활용을 추진하는 사업 등에 총 1925억 엔을 투자한다. 비료원료는 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해 안정적 조달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비료 제조업자의 비축분 지원에 1억 엔을 계상하였다. 퇴비 등 화학비료를 대체할 국내 자원 이용확대도 도모할 예정이다. 생활보호지급액 개정은 특례조치로 인하를 2년 미뤘다. 2019년 시점 조사를 바탕으로 인하를 검토하고 있었지만 그 후 물가상승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고려하였다. 월 1000엔을 일률적으로 가산하고 그럼에도 감액되는 세대의 경우에는 현행 지원액을 유지한다. 2025년도 이후에는 사회경제 동향을 확인하고 판단할 예정이다. 방위비, 26% 증가한 6조8000억 엔, 처음으로 공공사업비를 넘어 2023년 예산안에서 방위 관련 비용은 역대 최대인 6조8219억 엔이 되었다. 2022년도 본 예산과 비교해보면 26% 증가한 수치다. 거의 변동이 없는 공공사업관계비용(6조600억 엔)을 최초로 상회하여 일반 세출로 보면 사회보장관계 비용 다음 순위를 차지한다. 방위관계비의 경우 미군 재편 경비 및 디지털청이 소관하는 방위성 시스템 경비를 포함한다. 일본 정부는 예산안을 결정하기에 앞서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안보 관련 3문서를 결정하였다. 5년간 43조 엔 정도를 할당할 계획으로 2023년 처음으로 시행한다. 방위관계비는 2023년 GDP 대비 1.19%를 차지할 전망인데, 이는 11년 연속 증가하며 지금까지 GDP 대비 1%였던 기준을 넘어서는 수치다. 장거리 미사일이나 함정 등 새로운 군 장비 구입비는 1조3622억 엔으로 약 70% 증가하였다. 장비 유지정비비인 ‘유지비’ 등도 1조8731억 엔으로 50% 가까이 증액하였다. 이제까지 자위대 시설 등은 유사시에 파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건설국채 대상경비가 아니었지만, 이번에는 방위비 중 자위대 시설정비나 선박 건조비 등 합계 4343억 엔을 건설국채에서 재원을 조달할 예정이다. 2024년도 이후에는 세출을 넘는 분의 부담은 미군재편경비 등을 포함해 7조6049억 엔이 된다. 2022년도와 비교해 2.6배가 되는 수준으로, 23년도 예산안 단년 세출액을 넘는다. 어린이 가정청, 정원 430명으로 발족, 2023년도 예산은 4조8000억 엔 일본 정부는 2023년도 예산안에서 23년도 4월에 발족하는 어린이 가정청의 예산으로 4조8104억 엔을 계상하였다. 정원은 430명이 된다. 예산액은 기존 업무를 담당하던 후생노동성이나 내각부 관계부처 등의 22년도 예산 합계에서 1233억 엔 증가한다. 임산부 및 아이 양육 세대를 위한 보조나 보육사를 증원하는 보육소 조성 등에 할당한다. 영재 지원, 실증연구에 8000만 엔을 산정한 문부성 예산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어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문부과학성은 2023년도 예산안에서 관련예산을 8000만 엔을 포함하였다. 대학이나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지도 프로그램 실증연구를 진행한다. 문부과학성 전문가 회의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특별한 재능을 가진 아동들에게서 ‘수업 분위기를 깨뜨리지 않도록 모르는 척하는 것이 고통’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유식자회의는 9월 제언에서 ‘학습 레벨에 맞게 자유도를 높인 학습을 도입하는 교육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하며 지원을 요구하였다. 향후 지원이 필요한 아동학생의 특성을 확인하고 효과적인 지도법을 전파할 수 있는지가 과제이다. 문부과학성은 2023년도부터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수집 및 교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연수교재 개발에 착수한다. 지도방법 등에 관련된 실증연구도 시작한다. 전문가 회의 제언은 별도의 교실에서 온라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환경정비도 요구하고 있으며, 문부과학성은 실증연구의 결과 등을 토대로 지원책 확충을 검토할 계획이다. 시사점 일본 예산안을 확인해보면 물가 안정화 및 물가 상승 억제, 고령화·저출산에 대비한 사회보장비용 및 아이 양육 예산 증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인재 확보 및 성장 지원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공급망 및 교육, 의료 분야에서의 국가 지원 확대가 기대되며 해당 분야와 관련된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진출을 희망하는 관련 기업들은 향후 정책 움직임 및 지원 규모를 확인하여 효과적인 진출 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료: 일본 정부 발표, 경제산업성, 내각부, 문부과학성, 디지털청, 후생노동성, 닛케이, KOTRA 나고야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나고야무역관 민현정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1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