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 루마니아 쉥겐 조약 가입 무산과 시사점
- - 루마니아 및 불가리아의 쉥겐 조약 가입 실패 루마니아는 2007년 유럽연합 회원국이 되었으며 이후 EU 회원국으로서 권리이자 의무인 쉥겐 조약(Schengen Agreement)과 유로존(Euro Zone) 가입을 추진해왔다. 쉥겐 조약과 유로존 가입을 위한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루마니아의 경우 유럽연합에 가입한 지 1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가입을 완료하지 못한 상태이다. 2022년 12월 8일 루마니아,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3개국의 쉥겐 조약 가입 결정을 위한 EU 사법·내무위원회(Justice and Home Affairs, JHA)의 투표가 진행되었다. 오스트리아, 네덜란드의 반대로 루마니아, 불가리아의 쉥겐 조약 가입은 다시 한 번 무산되었고 EU 가입국의 만장일치 찬성을 받은 크로아티아만이 2023년 1월 기준 새로운 쉥겐 국가로서 추가될 예정이다. 이번 기사는 쉥겐 조약 가입을 위한 루마니아의 노력과 투표 결과에 따른 대내외 반응을 소개한다. 루마니아는 쉥겐 조약 가입을 위해 다시 도전할 예정이지만, 기술적인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가입되는 것이 아니고, 이번 투표처럼 기존 가입국 모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정치적 과정이 필요하기에 가입이 언제 이루어질 지는 미지수이다. 쉥겐 조약 쉥겐 조약은 EU회원국 간 국경에서의 검문·검색 폐지 및 여권 검사 면제 등 인적 교류를 위해 국경 철폐를 선언한 국경 개방 조약으로, 새로운 회원국의 쉥겐 조약 가입은 기존 가입 국가와 신규 회원국 사이 내부 국경 통제 해제를 의미한다. 루마니아는 유럽 연합에서 두 번째로 긴 외부 국경 2,070km을 관리하고 있으며, 그중 1,877km가 육지 국경에 해당한다. 쉥겐 지역의 외부 국경에 대한 통제는 비자, 이주, 망명, 경찰, 사법권 및 세관 협력에 관한 고유한 규칙에 따라 이뤄진다. 쉥겐 조약 가입을 위해서는 우선 EU의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는 EU집행위의 평가 계획 설정 → 후보국의 설문지(Schengen Evaluation Questionnaire) 제출 → EU집행위의 후보국가 방문 조사 → EU집행위의 평가 보고서 및 권고 사항 제시의 순서로 이뤄진다. 평가 항목은 경찰 협력, 데이터 보호, 영사 업무, 외부 국경 관리(해양, 항공, 육로), 쉥겐 정보시스템(SIS) 등이 있다. 쉥겐 조약 가입 시 주요 변경 사항 현재 쉥겐 가입 후 국경 통제 - 대상: 승객 및 상품 - 해양, 항공, 육로 국경 쉥겐 국가 간 국경 통제 해제 - 대상: 승객 및 상품 쉥겐 정보시스템 접근 불가 쉥겐 정보시스템 접근 가능 경찰 간 협력 쉥겐 국가간 경찰 협력 용이 [자료: 무역관 자체 정리] 루마니아 쉥겐 가입 시도 루마니아는 유럽연합의 새로운 회원국으로서 가입일 이후 의무적인 쉥겐 조항 이행을 약속하였으며, 첫 번째 단계로서 2008년 1월 불가리아와 함께 2011년 3월 30일 쉥겐 조약 가입에 관한 공동 선언에 서명하였다. 루마니아와 불가리아의 쉥겐 가입을 지원하기 위하여 EU 가입일로부터 2009년 말까지 새로운 EU국경 관리 등의 자금 조달을 위한 기구가 운영되기도 했다. 그러나 2011년 6월 9일 EU 사법·내무 위원회는 루마니아와 불가리아의 쉥겐 조약 가입 승인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한다. 이 결과는 압도적으로 찬성표를 던진 유럽 의회의 의견과는 다른 의견이었다. 당시 EU 의회와 집행위원회는 루마니아의 쉥겐 가입 실패는 협력·검증 장치(Cooperation and Verification Mechanism, CVM) 보고서 결과와는 무관하다고 밝히며, 개별 국가의 정치적 고려가 법적 근거를 뒤엎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주*: 협력·검증 장치(CVM): EU 신규 회원국 또는 가입국이 자유·안보·정의 영역 또는 내수 시장 정책 분야에서 EU 가입 협상 과정에서 약속한 내용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EU집행위원회가 취할 수 있는 조치로 현재 상황에 대한 평가와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 등을 제안함. 반대 국가는 프랑스, 독일, 핀란드, 스웨덴, 네덜란드, 벨기에로 성명을 통하여 루마니아와 불가리아의 쉥겐 가입 반대는 부패 및 조직 범죄 퇴치와 관련이 있으며 사법부 개혁과 조직 범죄 부패 단속을 위한 더 많은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하였다. 루마니아는 2022년 다시 한 번 쉥겐 조약 가입을 위한 EU 평가를 진행하였으며, 2022년 11월 발표한 협력 및 검증 메커니즘 보고서는 루마니아가 불가리아 및 크로아티아와 함께 쉥겐 가입에 필요한 기준을 충족하는데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고 밝혔다. EU의회는 이번에도 2022년 10월 투표에서 루마니아의 쉥겐 가입 지지 의사를 보여주었으나 12월 8일 27개 EU회원국 장관들로 구성된 EU 사법·내무 위원회에서 만장일치 찬성을 받지 못해 쉥겐 가입이 무산되었다. 처음 루마니아를 반대했던 네덜란드는 찬성으로 돌아섰으나 오스트리아가 반대하였으며, 오스트리아 내무장관은 불법 이민과 같은 보안 문제 등으로 현 시점에서 쉥겐 확장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가입 무산에 대한 반응 올라프 숄츠(Olaf Scholz) 독일 총리는 독일의 루마니아와 불가리아의 쉥겐 가입에 대한 분명한 지지 입장을 갖고 있으며 이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랄드 다르마냉(Gerald Darmanin) 프랑스 내무부 장관 역시 프랑스의 크로아티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3개국의 쉥겐 가입을 지지한다고 언급했다. 루마니아 요하니스(Johannis) 대통령은 이번 투표 결과에 대해 유럽 사법재판소에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을 것이며, 오스트리와의 문제는 외교적으로 해결할 것이라 밝혔다. 루마니아 치우커(Ciuca) 총리는 EU 사법·내무 위원회의 가입 반대 결과를 비판하며, 루마니아의 매우 명확하고 적절한 쉥겐 가입 시도는 내부 정치적 이유로 완전히 정당하지 않은 방식으로 거부되었다고 말했다. 루마니아 외교부는 “EU 사법·내무 위원회의 결과가 완전히 불공정하고 객관적인 동기가 결여된 것”이라며 “특히 유럽연합을 파괴하려는 러시아의 끈질긴 시도와 복잡한 지정학적 맥락 속에서 오스트리아의 반대표가 유럽의 통합과 결속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시사점 루마니아가 쉥겐 조약에 가입하는 경우, 경제적으로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특히 루마니아에 공장을 두고 있는 한국 기업들은 다른 EU국가로부터의 원자재 운송에 걸리는 시간이나 루마니아에서 생산한 제품을 다른 서유럽 국가로 운송하는 시간의 단축을 예상할 수 있었다. 하지만 루마니아는 기술적인 평가 기준을 충족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오스트리아의 반대로 인하여 만장일치를 얻지 못해 쉥겐 지역에 들어가지 못했으며 다음 합류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2023년 1월부터 EU 의장국을 맡게 될 스웨덴이 EU 의장국 자격으로 쉥겐 조약 가입을 위한 투표 개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다음 투표가 언제 개최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자료 : 루마니아 정부 보고서, 현지 언론 기사 등 KOTRA 부쿠레슈티 무역관 보유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부쿠레슈티무역관 정보영 | 루마니아 | 2022.12.23
-

- 2023년 중국 경제 운용방향 미리보기
- -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안정 최우선·안정 속 성장’을 경제기조로 확정 - ‘성장’에 중점을 두고 경기부양책 지속 추진 예상 - 소비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지정해 다양한 소비진작책, 소득 확대 정책을 펼칠 전망 2023년도 중국 경제기조와 정책방향을 확정하는 중앙경제공작회의가 12월 15~16일 이틀간 베이징서 개최됐다. 경제공작회의는 중국 당·정 최고 지도층(중앙정치국 상무위원·국무위원·중앙정치국위원 등)과 성·시·자치구 대표, 국가기관 및 중앙직속 국유기업 주요 책임자 등이 대거 참석하는 연례 회의로서 올해의 경제성과를 평가하고 대내외 경제환경을 분석하며 차년도 경제운용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이번 회의에는 시진핑 주석, 리커창 총리, 리창, 자오러지, 왕후닝, 한정, 차이치, 딩쉐샹, 리시 등 신·구 정치국 상무위원이 참석했다. 중국 지도부는 올해를 “역사상 극히 중요한 한 해”라고 평가했다. 다양한 대내외 불확실 요인 속에서 방역과 경제사회발전을 동시 보장했고 개혁개방 심화·취업과 물가의 기본적 안정·식량 및 에너지 안보·민생을 보장했다고 자평했다. 또 한편 중국 경제는 여전히 대내적으로 수요 위축·공급 충격·기대 약화의 3중 압력에 직면해 있고 경기회복 기반이 견고하지 않으며 대외환경의 복잡성 및 불확실성은 증대하고 있다고 대내외 환경을 진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의 탄력성·잠재력·역동성 및 정책효과에 힘입어 2023년 경기회복을 실현할 수 있다는데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현지 전문가들은 당국의 환경진단에서 주목할 만한 대목은 ‘경기회복’을 언급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중국 당·정 최고 지도층이 2023년을 ‘중국 경제회복의 해’로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2023년 중국 경제정책 전망 중국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안정 최우선·안정 속 성장(穩字當頭, 穩中求進)’을 경제기조로 확정했다. <시진핑 지도부 중앙경제공작회의 개최시기 및 차년도 정책기조> 연도 회의기간 차년도 경제정책 기조 2012년 12.15.~16. 개혁심화, 거시경제조정 강화 2013년 12.10.~13. 국가식량안전보장, 대외개방 제고 2014년 12.9.~11. 신창타이 시대 중국의 경제발전전략 2015년 12.18.~21. 공급측 개혁 통해 산업구조 고도화 실현 2016년 12.14.~16. 2017년 12.18.~20. 시진핑 신시대 사회주의경제사상 확립 2018년 12.19.~21. 온중구진(안정 속 성장), 시장신뢰 강화 2019년 12.10.~12. 온중구진, 시장신뢰도 강화, 안정적인 레버리지 2020년 12.16.~18. 발전과 안전을 위한 ‘연속성∙안정성∙지속가능성’ 강조 2021년 12.8.~10. 안정 우선·안정 속 성장(穩字當頭, 穩中求進) 2022년 12.15.~16. [자료: 중국 정부 발표자료 의거해 KOTRA 베이징 무역관 종합] 코로나19 재확산 및 이에 따른 경기하방과 마주하며 내년 중국 정부는 ‘성장’에 중심을 둔 경제정책을 펼칠 것을 예고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올해 3월 양회에서 설정한 중국 경제성장률 목표치인 ‘5.5% 안팎’ 달성이 어려워진 가운데 코로나19 재확산 속에서 내년 경제전망도 낙관할 수 없게된 상황에서 중국 지도부는 ‘안정적 성장’을 보장하는 데 전력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경제성장률 추이> (단위: %) [자료: 국가통계국, wind 등] 회의에서 내년 경제를 안정적 성장 최우선 기조로 운용함에 있어 기존의 적극적인 재정·통화정책을 유지하되 재정정책의 효율성은 증진하겠다고 밝혔다. ▲적정 수준의 재정 지출 유지, ▲적자·특별채권·이자할인 등 정책 조합 최적화,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의 이전 지급 확대, ▲풍부한 유동성 유지, ▲금융기관의 중소기업·기술혁신·녹색개발에 대한 지원 강화, ▲위안화 환율 안정 유지 등 구체적 조치를 언급했다. 중국 지도부는 2023년의 중국 산업정책의 키워드는 ‘발전’과 ‘안보’라고 강조했다. 회의에서 ▲공급망 자립, ▲에너지·식량 안보 강화, ▲첨단산업 및 디지털 경제 육성 가속화 등을 제시했다. 과학기술 정책방면에서는 기술과 인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핵심 기술력 강화에 주력할 것을 지시했다. 미중 디커플링 및 서방국가의 대중 기술 견제 심화에 따라 기술 자립과 완전한 공급망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하면서 핵심 과학기술 프로젝트, 첨단 산업, 완전한 산업망·공급망 구축에 대한 정부지원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점쳐진다. 대외적 환경의 지속 악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 지도부는 내수 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 의지를 재천명했다. 이번 회의에서 ‘소비진작’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소득 확대 및 신에너지차·양로서비스 등 분야 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중국의 11월 소매 판매는 지난해 같은 달과 견줘 5.9% 감소하며 지난 4∼5월 상하이 봉쇄 이후 최악을 기록했다. 국제통화기금(IMF) 부총재를 지낸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 주민(周民) 부이사장은 최근 2023 ‘재경’연회에서 2022년 중국 민간소비가 코로나19 첫 발발한 2020년과 비슷한 수준이라며 ‘2021년 대비 약 2조 위안 감소했다’고 진단했다. 이번 회의에서 제시한 ▲소득확대, ▲주택개선·신에너지차·양로 서비스 등 분야 소비 지원이 어떠한 구체적 정책, 조치로 시행될지에 시장은 주목하고 있다. 또한 정부·민간 자금 투입을 확대하고 지방정부·금융기관의 보장성 주택 투자 확대를 장려하는 등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 중국의 부동산 투자는 연초부터 역성장을 거듭하며 중국 경기하방 압력을 증대시키는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했다. 11월엔 전년 동월 대비 19.9% 대폭 감소하며 사상 최대 하락폭을 기록하기도 했다. 중국 국민경제의 ‘기둥산업’인 부동산 안정성을 보장하여 시장의 기대심리를 회복시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중국 분야별 투자 증감률> (단위: %) [자료: wind, CITIC SECURITIES] 이번 회의에서 ‘민간 투자 확대’, ‘민영경제와 민영기업 발전 지원 및 장려’, ‘국유기업과 민영기업 동등 처우’ 등을 명시하면서 민간기업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시장은 내년 중국 경제회복을 위해 민간경제 활성화,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속속 제정, 시행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3년간 지속되어 온 ‘제로코로나’ 정책은 점진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당국은 노인·기저질환자 관리와 중증 예방에 방점을 둔 최적화 방역정책을 추진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했다. 하지만 완전한 위드코로나 실현, 입국자에 대한 방역통제 완화 여부는 중국 내 코로나 확산세가 언제쯤 잡히느냐에 달렸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올 4분기부터 그간 중국 경제성장을 이끌었던 중국 수출입 증가율이 마이너스 국면에 진입한 가운데 중국 지도부는 내년에도 ▲수출확대, ▲선진기술·중요장비·에너지자원 수입 확대 등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한 눈에 보는 2023년 중국 경제정책> 경제 기조 - ‘안정 최우선·안정 속 성장(穩字當頭, 穩中求進)’ 재정· 통화 재정 - 적정 지출 유지 - 적자·특별채권·이자할인 등 정책 조합 최적화 -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의 이전 지급 확대 통화 - 풍부한 유동성 유지 - 중소기업·기술혁신·녹색개발에 대한 금융 지원 강화 - 위안화 환율 안정 유지 산업 - 중점산업 핵심기술·부품 확보로 자주적인 공급망 형성 - 에너지·광물 생산·저장능력 강화, 곡물 생산능력 향상 - 신에너지, 인공지능, 바이오, 저탄소, 양자컴퓨팅 연구·응용 강화 - 플랫폼 기업의 발전 견인 역할 강화, 고용 창출, 글로벌 경쟁력 강화 과학·기술 - 범국가적 차원에서 핵심 과학 및 기술 프로젝트 추진 내수 소비 - 소비진작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 - 소득 제고, 소득확대 및 소득분배체계 개선 - 주택개선·신에너지 자동차·양로 서비스 등 분야 소비 지원 투자 - 14.5계획 주요 프로젝트 집중 시행 - 정부·민간 자금 투입 확대 리스크 예방 부동산 - 재고리스크 해소 - 우량기업 리스크 방지 - 업계 구조조정 촉진 금융 - 지역적·시스템적 금융리스크 형성 예방 - 지방정부 부채 억제·해소 민생 방역 - 방역 최적화, 노인·기저질환자 관리, 중증예방 중점 추진 고용 - 청년실업률 개선을 위한 청년층(특히 대학졸업자) 고용 촉진 물가 - 식료품 가격 상승 등 구조적 물가상승의 취약계층 영향 최소화 인구 - 법정 정년연장 추진, 출산지원 시스템 개선 고수준 개방 - 외자유치 및 무역투자 협력 확대, 국제협정 적극 참여 - 외자기업 합법적 권익 보호, 현대서비스업 개방 - 일대일로 지속,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 추진 [자료: 중국 정부 발표자료 의거해 KOTRA 베이징 무역관 종합] 시사점 중국 정부는 대내외 환경이 악화되었지만 내년 내수 확대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안정적 성장·취업·물가를 실현하겠다며 2023년 중국 경제 회복에 강한 자신감을 어필했다. 최근 중국 관영 싱크탱크인 사회과학원은 내년 중국이 5% 이상(5.1%)의 경제성장률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이에 따라 내년 우리 기업들은 중국 내수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중국이 질적성장을 위한 산업구조조정, 전략산업·디지털 경제 육성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우리 기업은 기술우위 분야 중심으로 협력 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 한편, 중국의 공급망 자립화 및 에너지·식량 안보 정책 등이 초래할 수 있는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자료: 국무원, 신화사, 둥베이(東北)증권, 궈롄(國聯)증권, 중타이(中泰)증권 등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베이징무역관 김성애 | 중국 | 2022.12.2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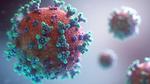
- 영국 코로나19 톺아보기
- 한 때 세계에서 가장 많은 감염자 수를 기록하며 록다운까지 시행했던 영국은 이제 마스크 없는 삶으로 완전히 돌아왔다. 보리스 존슨 전 총리는 코로나19 제한 조치가 경제, 사회, 정신적 행복 및 아이들의 삶의 기회에 큰 타격을 주었고 개인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2022년 2월 24일부로 코로나19 관련 모든 규제를 철폐했다. 병원에서 환자와 의사들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며 코로나19에 확진되더라도 자가격리가 권고될 뿐, 강제되지 않는다. 이렇듯 내국인에 대한 규제는 모두 철폐되었지만 해외 입국자에 대한 규제는 일부 남아있었는데, 이마저도 2022년 3월 모두 사라졌다. 3월 18일 새벽 4시부터 모든 입국자들은 본래 입국시 제출해야 했던 승객 위치 확인서(passenger locator form)와 백신 미접종자의 사전검사 및 2일차 우편 송부 검사 없이 영국에서 체류가 가능해졌다. 영국의 코로나19 현황 <코로나19로 인한 영국 사망자 수> (단위: 명) [자료: GOV.uk] 2022년 11월 기준 영국의 코로나19 누적확진자 수는 2400만 명에 이른다.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정도가 코로나19에 걸렸던 셈이다. 코로나19 사망자를 추산하는 방법은 나라마다 다르지만, 영국 정부에서 발표하는 코로나 양성반응 이후 28일 내 사망한 사람의 수는 19만 6000명이다. 이마저도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가 코로나19 사망자 수 집계를 중단*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알 수 없어 지금까지 영국에서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의 수는 총 20만 명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주*: 스코틀랜드는 22년 6월 2일, 북아일랜드는 20년 5월 이후 사망자 수 집계를 중단함. <영국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추이(11.18.)> (단위: 백만 명) [자료: ONS] 코로나19 감염자는 증가세와 감소세를 번갈아 나타내는데, 그 폭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2022년 12월 13일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 또한 지속적으로 줄어들었고 11.25. -12.2. 한 주간 사망자는 전 달 대비 28명 줄어든 372명이었다. 전체 사망자 대비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 비율 또한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또한 1세 이하, 15세 이상 24세 이하 그룹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단 한 건도 나타나지 않았으며 1세 이상 14세 이하, 25세 이상 54세 이하 그룹에서 코로나19 사망자도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코로나19 백신접종현황 영국의 백신 접종률은 매우 높은 편에 속한다. 12세 이상 국민의 94%인 5300만 명 가량이 1차 접종을 완료했으며, 88%인 5000만 명이 2차 접종까지 완료했다. 3차 접종률은 70%이고 현재 진행 중인 4차 백신의 접종률은 58%이다. 영국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2월 영국 코로나 확진자 수가 다시 100만 명을 돌파했으며, 바이러스가 다시 영국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어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2년간 즐기지 못한 연말 파티가 시작되면서 다시 확산됐다거나 백신 효과가 오래 지속되지 않는 상황에서 4차 접종률이 60%를 밑돌기 때문이라는 등 확산세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영국 병원들도 다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입장할 수 없도록 방침을 바꾸는 등 바이러스 재확산 방지책을 마련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야기된 영국 간호사 총파업 12월 15일 영국 전역의 간호사들은 임금상승을 두고 대규모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는 106년만의 일어난 최대 규모의 파업으로 연말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파업의 배경을 살펴보면, 먼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간호업계의 근무환경은 크게 악화되었다. 수많은 환자가 단시간에 몰리면서 과도한 업무량을 버티지 못한 간호인력들이 대거 직장을 떠났고 그로 인해 남은 간호사들의 업무량과 스트레스가 배가 되었다. 게다가 올해 물가상승률이 10%가 넘어 민간부문은 임금이 6.9% 오른데 비해 공공부문은 2.7% 상승에 그치자 이에 대한 불만으로 대규모 파업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간호사 총파업에 영향을 받은 여러 공공부문 노조가 연이어 파업에 돌입하고 있다. 철도와 우편 부문은 이미 파업이 진행 중이며 더 많은 공공부문이 파업에 합류하여 의료 뿐 아니라 여러 공공부문이 마비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야기된 간호사 총파업을 시작으로, 영국의 공공부문의 불만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성탄절을 앞둔 영국의 관광업계 및 일반 시민의 생활여건이 크게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로 가장 크게 타격받았으나 빠르게 회복중인 소비시장 영국은 관광 대국이다. 비유럽인이 유럽 여행 시 꼭 들리는 나라 중 하나가 영국이고 유럽인들도 가고싶은 관광지로 꼽는 곳이 바로 영국이다. 이를 방증하듯 영국의 수도 런던에는 한 시간 내 접근이 가능한 공항이 5개나 있다. 코로나19의 영향이 거의 미미했던 2019년 영국의 관광 수입이 GDP에 일조한 금액이 무려 2340억 파운드(한화 약 378조6800억원)로 약 10%에 달했다. 이는 다시 말해 코로나19가 영국 경제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쳤음을 의미한다. <영국을 찾은 관광객 수 추이> (단위: 백만 명) 주1) 2021년은 추정치, 2022년은 현재 집계 중 [자료: Statista] 2019년 영국을 찾은 관광객 수는 약 4090만 명이었으나 코로나19 타격이 가장 컸던 2020년 그 수는 1110만 명으로 2019년의 1/4 수준에 그쳤다. 관광수입 역시 크게 줄어 2020년 관광수입은 전년 대비 40%를 밑돌았다. 코로나19가 지속되던 2021년도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으며 이 시기 관광객을 주 고객으로 하던 많은 상점들이 월세를 버티지 못하고 장사를 포기했다. 관광객뿐만 아니라 유학생들이 쓰는 학비와 생활비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영국 유학생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중국인으로, 중국인 유학생이 영국 대학에 납입하는 학비가 연간 17억 파운드가 넘는다. 실제 영국 몇몇 대학은 중국 유학생을 받지 않으면 재정난이 생길 정도로 중국인 유학생 의존도가 높다. 코로나19로 중국이 봉쇄령을 내리자 유학생 수가 급격하게 줄었고 유학생으로부터 벌어들이는 수입 또한 크게 영향받았다. 2022년 규제가 하나, 둘 해제되면서 많은 부분 정상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19년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시사점 팬데믹으로 영국을 비롯한 세계 국가들의 경제는 크게 위축되었다. 영국은 코로나19 규제를 철폐하고 여행객에 대한 규제까지 모두 없애면서 경제가 다시 원상복구 되는가 싶었지만, 전례없는 에너지 위기와 세계 경제 불안 등으로 아직 2년 전 수준으로도 회복하지 못한 상태이다. 현재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100만 명을 돌파하며 우려를 낳고 있으나 이전보다 국가적 관심도가 크게 떨어졌고 감기처럼 여기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일상 생활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 완벽한 치료제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므로 앞으로의 추세를 신중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자료: GOV.uk, ONS, Statista, BBC, the Guardian, KOTRA 런던 무역관 자료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런던무역관 남현경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12.22
-

- 변화하고 있는 독일의 대외무역 기조
- EU, 무역정책 재편의 필요성 대두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한 공급망 차질 및 에너지 위기를 바탕으로 EU는 무역정책을 재편하고 있다. 독일 경제일간지 한델스블라트(Handelsblatt)는 EU의 무역 흐름을 다변화하고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의 지속적인 구축을 지지하는 EU 집행위 부집행위원장 돔브로우스키스(Valdis Dombrovskis)의 입장을 보도하였다. EU의 경우, 특히 희토류, 리튬과 같은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광물을 주로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는데 중국은 2022년 1~9월 집계 기준, EU의 주요 수입국 1위 및 주요 수출국 3위를 차지하였다. <EU의 주요 교역국> (단위: 백만 유로) 주요 수입국 주요 수출국 순위 국가명 수입액 순위 국가명 수출액 1 중국 470,699 1 미국 375,463 2 미국 262,262 2 영국 243,593 3 러시아 167,868 3 중국 170,540 4 영국 167,275 4 스위스 137,244 5 노르웨이 120,114 5 튀르키예 72,121 8 한국 52,224 8 한국 43,785 주: 2022년 1~9월 집계 및 2022년 11월 15일 발표 기준 [자료: Eurostat] EU 집행위는 2022년 9월 연례 정책연설에서 주요 원자재에 대한 역외 의존도를 줄이고 역내 공급망 구축을 목표로 핵심원자재법(CRMA, Critical Raw Material Act) 입법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추가적으로 EU 원자재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KOTRA 해외시장뉴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 KOTRA 해외시장뉴스(EU의 핵심 원자재법 미리보기) 바로가기 독일과 중국의 무역관계 중국은 현재 독일의 가장 중요한 무역 파트너 중 하나로, 독일 연방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독일의 대중국 수출입 규모는 약 2460억 유로에 달한다. 20여 년 전만 해도 독일과 중국 간 무역은 독일 전체 무역 규모의 약 1%에 그쳤었다. 그러나 2021년 기준, 중국은 독일의 대외무역에서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독일의 1위 수입국이자 2위 수출국이다. 주요 수출입 품목의 경우, 독일은 일반적으로 자동차, 기계와 같은 품목군을 중국에 수출하고 있으며 의류, 소비재와 같은 품목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독일과 중국의 무역 규모 추이> (단위: %) [자료: ZDF, 독일 연방통계청] 독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무역 의존도에 대한 우려 커져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하여 에너지 위기가 고조된 독일은 대중국 무역 의존도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독일의 대중국 수입의 경우, 희토류·리튬과 같은 원자재 의존도가 큰 편이기 때문이다. 일례로 ZDF는 독일의 전자 및 화학 산업의 많은 생산 공정에서 중국에서 수입되는 원자재·중간재 없이는 진행이 되지 않는다고 보도한 바 있다. 또한 독일산업협회(BDI) 바흐터(Matthias Wachter)는 많은 광물 원자재의 경우, 특히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독일의 러시아 가스 의존도보다 훨씬 크다고 경고한 바 있다. 독일 연방경제∙기후보호부의 장관 하베크(Robert Habeck)도 n-TV와의 인터뷰에서 주요 원자재와 같은 특정 분야의 경우, 대중국 의존도는 거의 100%에 달한다며 독일의 경제 의존도가 너무 크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독일 연방정부, 새로운 대중국 전략 모색 경제계와 산업계에서 독일의 대중국 무역 의존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독일 연방정부 또한 새로운 대중국 전략을 모색 중이다. 이와 관련, 현재 독일 각 부처는 중국 전략 보고서를 작성 중이다. 독일 현지 언론이 중국 전략 보고서 초안을 공개한 바에 따르면, 해당 보고서는 대중국 무역 의존도를 감축하기 위한 일환으로 아시아-태평양·라틴 아메리카·아프리카와 같은 대체 미래 시장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독일 연방정부, EU 집행위에 글로벌 게이트웨이(Global Gateway) 추진 촉구 한델스블라트는 독일 연방정부가 중국의 글로벌 영향력에 대응하기 위해 EU 집행위에 글로벌 게이트웨이(Global Gateway)* 이니셔티브의 추진을 촉구하는 제안서를 보낸 사실을 보도했다. 독일은 지금까지 EU 국가 중에서 EU 집행위에 글로벌 게이트웨이에 관한 내부적으로 합의된 제안서를 보낸 첫 국가이며, 독일 정부는 이를 위해 기업의 의견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 각 부처 장관들은 공동으로 “글로벌 게이트웨이는 특히 시스템의 글로벌 경쟁 측면에서 EU의 전략적 및 글로벌 영향력을 강화하는데 매우 중요한 지정학적 도구”라고 강조하였으며 독일은 글로벌 게이트웨이를 위해 총 20개의 등대 프로젝트(투자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이와 관련, 독일 외무부는 남유럽과 동유럽 이외에도 라틴 아메리카를 중점 전략 지역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주: 글로벌 게이트웨이는 2021년 12월 EU 집행위가 중국의 ‘신 실크로드(일대일로)’ 전략에 대응하고자 발표하였으나, 그 이후 별다른 진전이 없었음. 독일 자동차 산업계, 교역 다각화 추진 그렇다면, 독일의 제1의 산업인 자동차 산업의 대중국 무역 의존도는 어떨까? 자동차 연구센터 CAR(Center Automotive Research)의 비스베르트(Helena Sophie Wisbert)는 중국 제조업체의 경우, 전기차의 가장 큰 비용 요인인 배터리와 원자재 채굴, 가공, 배터리 셀, 모듈의 생산 등 공급망에서 높은 수준의 통합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반면 독일 제조업체는 이러한 부분에서 중국을 포함하여 기타 자원이 풍부한 국가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고 하며 CAR 통계에 따르면 전체 배터리셀과 모듈의 약 66%가 중국산이라고 한다. 추가적으로 독일 완성차 기업의 전기차 배터리 원자재에 관한 대응 현황은 KOTRA 해외시장뉴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KOTRA 해외시장뉴스(부족한 전기차 배터리 원자재, 독일 완성차 업체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바로가기 비스베르트에 따르면, 독일 자동차 산업은 이러한 종속 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해 미래 기술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고 하며 폴크스바겐(VW)의 자체 기가팩토리를 한 예로 들었다. VW의 경쟁기업인 스텔란티스(Stellantis) 또한 자체적인 기가팩토리에 투자하고 있으며 VW와 스텔란티스는 리튬과 같은 중요한 배터리 원재료를 채굴하는 광산 업체와도 협상하고 있다. VW, BMW, 메르세데스-벤츠에 있어 중국은 여전히 보급로이며 독일 자동차 산업의 대중국 의존도는 주요 고려사항이 되고 있다. 그러나 독일 경제연구소(Ifo)의 플라흐(Lisandra Flach)는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원자재를 조달하는 것에 관하여 아직 개척되지 않은 다각화 잠재력이 있다고 하며 특히 자동차 산업계는 이러한 부분에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글로벌 경영 및 테크놀로지 컨설팅 기업인 BearingPoint의 펜틴(Stefan Penthin)은 자동차 산업의 중요한 원자재 및 부품에 대한 코로나 관련 공급 병목 현상으로 인해 공급망에 있어서 자동차 산업의 우선 순위가 변경되었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더불어 현재는 공급망 관리의 전환점이며, 이제 비용 대신 가용성이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덧붙였다. 독일의 정치, 경제 및 산업계에서 교역 다각화가 추진되고 있는 만큼, 국내기업은 독일의 교역 다각화 추진 방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자료: Handelsblatt, Tagesschau, ZDF, 독일 연방통계청, Wirtschaftswoche, Eurostat, Statista, n-tv.de, wirtschaftundschule.de 및 KOTRA 프랑크푸르트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프랑크푸르트무역관 조정윤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12.22
-

- 美 애플의 공급망 이동과 반도체 공급망 변화
-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시간주에 위치한 SK실트론 CSS 공장을 방문한데 이어 2022년 12월 6일 애리조나주의 TSMC 공장에 방문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내 반도체 공급망 강화를 언급하였고 TSMC는 바이든 대통령 방문에 맞춰 400억 달러를 추가 투자하기로 발표하였다. 이날 TSMC공장 방문에는 애플 팀쿡 CEO가 동행하며 애플이 미국에서 생산된 반도체 사용을 공식화했다. 애플의 공급망 변화 현황 애플은 전 세계 최대 IT기기 판매 기업이지만 생산을 전량 외주에 맡기고 있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특히 중국이 애플 제품 생산의 중심 역학을 맡고 있으며 Foxxonn은 중국 중부에 세계 최대 iPhone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있다. Reuters에 따르면 애플 제품 생산에서 중국 공급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44%에서 47%를 차지하였지만 2021년 36%로 감소하였다. 반면 미국은 2019년 7.2%에서 2021년 10.7%로 가장 많이 상승했으며 대만, 한국, 베트남도 모두 상승하였다. JPMorgan은 2022년 말부터 iPhone 14 생산량의 약 5%를 인도로 이전하고 2025년까지 iPhone 전체 생산량의 25%를 생산할 예정이라고 언급하였다. 그리고 iPhone 이외의 Mac, iPad 등의 제품은 2025년이후 중국 이외 지역에서 생산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애플의 국가별 공급망 비중> (단위: %) [자료: Reuters] 애플의 미국 생산 계획 애플은 iPhone 생산 원가의 약 33%를 차지하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미국 내 생산을 계획하고 있다. Bloomberg에 따르면 애플의 팀쿡 CEO는 내부회의에서 2024년부터 애리조나주 공장에서 반도체를 구매할 것이라 언급하였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과 애리조나주의 TSMC 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해당 발언을 다시 한 번 공식화했다. 반도체 뿐만 아니라 다른 부품들도 중국 중심의 아시아 의존도를 낮추고 있다. 2021년 9월 기준으로 애플이 발표한 180개 공급업체 중 48개가 미국으로 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25개와 비교하면 두 배에 가깝게 증가하였다. 반도체 생산지 이동의 영향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웠던 트럼프 대통령 때부터 미국 기업의 생산지 이동은 시작되었다. 중국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한 Dell, HP는 노트북 생산량의 30%를 중국에서 동남아 등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켰다. 바이든 정부에서도 여러 법안을 발표하며 생산지 이동을 강력하게 유도 하고 있다. 특히 현대 산업의 필수품인 반도체를 생산하는 TSMC, 삼성전자, 인텔 등의 대표 기업들이 미국에 생산공장 투자를 발표하며 생산을 가속화하고 있다. 제품 생산에 필요한 부품 중 가장 부가가치가 높고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반도체의 생산을 미국 내에서 하게 되며 새로운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전 세계 파운드리 산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TSMC의 주요 고객의 대부분이 미국 기업이기 때문에 미국 기업이 필요한 반도체 생산량의 상당부분이 향후 미국에서 생산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2021년 TSMC 고객별 매출 비중> [자료: Statista] 반도체 분야 전통 강자인 인텔은 TSMC의 새로운 공장이 설립되고 있는 애리조나주에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인텔도 향후 미국에서 생산되는 애플의 반도체 생산 수주를 희망하고 있다고 언급하여 미국 내 반도체 생산 증가에 대한 전망을 내놓았다. 미국의 강력한 의지와 전망 2022년 8월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 생산시설 보조금 지급을 중심으로 하는 “CHIPS and Science Act”를 발표하였다. 10월에는 반도체 생산 장비의 중국 수출을 사실상 금지하는 조치를 발표하였다. 그리고 11월 미시간주에 위치한 SK실트론 CSS 방문과 12월 TSMC를 애플 팀 쿡 CEO와 함께 방문하며 미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 구축 의지를 강하게 표명하였다. 12월 15일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 메모리 반도체 제조업체인 YMTC와 AI반도체 21개 기업을 추가로 블랙리스트에 추가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에도 일부 전문가들은 아직 미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 구축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SemiAnalysis의 수석분석가 Dylan Patel은 “TSMC의 새 공장이 미국의 반도체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언급하며 “추가적인 공장도 중요하지만 미국이 자급자족하지 못하는 원자재는 여전히 대외 의존하고 해야 한다”라고 추가 언급하였다. 시사점 애플의 공급망 변화는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이러한 공급망 변화의 중심에는 미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 구축이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많은 기업들도 반도체 공급망 재편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전히 반도체 공급망 구축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Centre for a New American Security의 보안 및 기술전문가 Martijin Rasser는 “공급망 탄력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생산량을 더 늘려야 하지만 원자재에서 공급망에 이르기까지 칩 공급망의 모든 영역에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언급하였다. 반도체 공급망은 산업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향후 유심히 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료: Reuters, Bloomberg, INSIDER, Statista, Yahoo Finance, JPMorgan, Wallstreet Journal, KOTRA 디트로이트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디트로이트무역관 정연진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12.21
-

- 2023년 1월 실시되는 체코 대통령 선거 전망
- 체코 대선 개요 및 대통령의 역할 2023년 1월 13~14일(2차 27~28일)에 실시되는 체코 대통령 선거가 한달도 남지 않았다. 체코는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어 총리의 실권이 상대적으로 강하지만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서 대외적으로 체코를 대표하고 총리 및 각부처 장관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한다는 면에서 중요한 자리다.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며 한번의 연임이 가능해 최대 10년의 임기를 가질 수 있다. 현 밀로쉬 제만(Miloš Zeman) 대통령도 2013년에 처음 도입된 직선제를 통해 당선된 이후, 2018년 재선에 성공함으로써 현재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다. 2013년 전에는 하원에서 간접선거 방식으로 대통령을 선출한 바 있다. 대통령 선출 방식은 1, 2차로 나뉜다. 1차 선거에서 특정 후보가 절반 이상을 득표하면 바로 확정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1차 선거 최다 득표 후보 2명이 2차 결선투표를 거쳐 대통령을 선출하는 방식이다. 체코는 헌법에 의거해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어 행정부의 수장은 총리이며, 총리가 총괄하는 정부(연립내각)가 대∙내외 정책 결정 및 집행을 책임진다. 국가원수인 대통령은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며, 총리*와 각 부처 장관을 임명하고, 의회(하원, 상원)를 통과한 법안에 대한 최종 승인 역할을 갖고 있다. * 대통령이 총리를 임명하고 총리는 30일 내에 하원 신임투표를 통과해야 취임 가능 <체코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주요 권한> ㅇ 총리 및 내각 구성원(부처 장관)의 임명, 소환(Recall), 사임에 대한 승인 ㅇ 하원 회의 소집 및 해산 ㅇ 일시적으로 정부 대표 역할 수행 위임(정부가 사임/철회한 경우 새 정부 임명 시 까지) ㅇ 법안의 제(개)정 안에 대한 최종 승인(서명) 또는 거부(의회에 반려) ㅇ 그 외 주요 인사에 대한 임명권 - 헌법재판소장 및 부소장 - 대법원장과 부원장 - 국가감사원(Supreme Audit Office)의 원장 및 부원장 - 체코 중앙은행(ČNB) 은행위원회 구성원 [자료: 체코 대통령실 홈페이지(Hrad.cz)] 법안의 제개정과 관련해서는 의회 발의 또는 각료회의를 통해 승인 후 하원-상원-대통령의 승인 절차를 거치게 되지만 내각과 의회가 각각 행정, 입법 기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대통령의 서명은 관례상 절차로 여겨지고 총리 임명도 대부분 의회의 의견을 따라왔다. 다만 첫 직선제로 선출된 제만 대통령의 경우 총리, 장관 임명에서 정당간 이해에 중립적이지 않거나 법안 승인에 거부권을 행사한 경우가 있는 등 과거 대통령들에 비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주요 대선 후보 및 정치 성향 2023 대선후보는 총 9명이 등록했으며, 현재 안드레이 바비쉬, 페트르 파벨, 다누셰 네루도바가 여론조사에서 근소한 차이를 보이며 유력 후보로 꼽히고 있다. 1) 안드레이 바비쉬(Andrej Babiš), ANO당 안드레이 바비쉬는 2014~2017년 경제부총리 겸 재무장관, 2017~2021년에 총리를 지낸 인물로 현재는 하원의원으로 야당인 ANO당 대표를 맡고 있다. 동시에 체코 최대 식품∙화학∙농업 대기업인 Agrofert 그룹을 경영한 기업가이기도 하다.* * 바비쉬는 2013년 연립정부에 합류하면서 회사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고, 2017년 2월 이해상충방지법 개정(정부 구성원은 기업에 대한 보조금 신청 및 언론사 운영 금지)에 따라 회사 주식을 신탁펀드에 이전한 상태지만 기금의 유일한 수혜자가 바비쉬로 되어있어 일부 논란도 있음. 2011년 바비쉬가 창당한 ANO당은 2014~2021년 중 여당(연립)이었으나 2021년 총선에서 중도우익정당간 연합인 SPOLU(ODS, KDU-ČSL, TOP09)에 패하면서 지금은 제1 야당 역할을 하고 있다. ANO당은 기존 정치세력에 대한 반대, 부패척결, 세금감면, 연금인상 등 대중 친화적 정책(일부는 포퓰리즘 정책으로 비판)을 내세우며 지지층을 확대해 왔다. 그러나 반부패를 주장하던 바비쉬가 EU보조금 부정 수령 혐의*를 받으면서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동 부패혐의는 바비쉬를 반대하는 정당들이 ‘反바비쉬’를 내세우며 ANO당과 연정을 거부하는 명분 중 하나로 ANO당은 2021년 총선에서 상당한 득표율**을 기록했음에도 연립정부 합류에 실패한 바 있다. * 실질적으로 대기업인 Agrofert에 속한 회사(Čapí hnízdo)가 중소기업만 지원 대상이 되는 EU보조금을 수령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으며 현재도 수사 진행 중 ** 2021년 총선에서 ANO당 29.64%로 SPOLU 다음의 높은 득표율을 기록해 하원 78석 확보 그러나 현재 연정을 제외하면 단일당으로는 ANO당의 지지율이 가장 높고, 바비쉬의 지지층이 견고한 편이어서 유력 후보로 꼽힌다. 바비쉬는 예상보다 늦은 ’22년 10월 30일에 대선출마를 선언했으며, 출마 이유를 현 정부가 국민을 제대로 돕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하는 등 현정부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안드레이 바비쉬> Andrej Babiš 정치 성향 - (외교) EU 회원국 유지에는 찬성하나 일부 EU정책에는 반대 (내연 기관차 금지, 체코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수준의 그린정책, 난민 수용 정책 등) - (러-우사태) 러시아를 비판하면서도 현 체코 정부의 우크라이나 지원 수준은 과도하다며 이에 동의하지 않음, (우선순위는 체코 국민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과도한 지원은 피해야 한다는 입장 - (인플레이션 및 에너지) 연료 및 식품 가격상한제 도입, 에너지(가스 및 난방) 및 기본 식료품에 대한 VAT 폐지 등 제안 강점 - 견고한 지지층 보유 - 총리, 장관, 의원 등 행정, 정치 경험 풍부 약점 - EU 보조금 불법 수령에 대한 수사 진행 중 - 언론사 소유, 대기업 소유권 등에 대한 논란 [자료: ANO당 홈페이지, E15, Novinky, ceskatelevize, idnes 등 인터뷰 종합] 2) 페트르 파벨(Petr Pavel), 무소속 페트르 파벨은 전 체코 육군 참모총장(2012~2015년) 및 2015~2018년에는 NATO 군사위원장 직을 역임했다. 2021년 9월부터 대선 출마 의사를 밝힌 상태로 후보 중 가장 오랜 기간 유력 후보로 거론되어 왔다. 특히 러-우 전쟁 발발과 관련해 전문지식을 내세우며, 국가안보와 외교가 중시되는 시점에서 그의 체코 군 및 NATO 에서의 경험이 강점으로 부각된다. 정치적으로는 라이벌인 바비쉬 정책을 포퓰리즘적이라고, 제만 대통령은 친러 성향을 보인다면서 비판해 왔다. <페트르 파벨> Petr Pavel 정치 성향 - (선거 캠페인) ∆적극적 외교정책, ∆고부가가치 혁신경제, ∆자립적∙효율적 에너지, ∆평생 교육, ∆건강한 환경을 강조 - (경제) 유로화 도입 찬성,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의 경쟁력 향상 지원 - (에너지) 에너지원 다변화, 천연가스 운송 인프라 협력 강화 및 확장, LNG 터미널 건설에서 체코 비중 논의, 소형 모듈 원자로 개발 추진(소형 모듈 원자로 부지 선정 및 준비, 해외 공급사와 논의), 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프로젝트 촉진 - (환경 및 기후보호) 석탄없이 산업 및 가정의 에너지 수요 충족 가능할 경우 2033년 석탄발전 중단 찬성, 그린딜 및 탄소중립 추구 - (외교노선) NATO 및 EU와 협력 증진 - (러-우사태) 러시아 석유 수입금지 조치, 우크라이나 지원∙재건 지지 - (사회) 동성결혼, 안락사 도입 찬성, 사형제 도입 반대 강점 - 안보, 외교 관련 체코 군 및 NATO 경험 약점 - 정치 경력 無 - 체코슬로바키아 시절 공산당 가입 활동에 대한 논란 [자료: 후보자 홈페이지, E15, Novinky, ceskatelevize, idnes 등 인터뷰 종합] 3) 다누셰 네루도바(Danuše Nerudová), 무소속 다누셰 네루도바는 경제학자이자 교수로 브르노 Mendel 대학의 총장(체코 최연소 여성 총장)을 역임했다. 네루도바가 당선되면 체코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되며, 이런 관점에서 여타 후보와 차별화되는 여성 특유의 리더십도 강조하고 있다. 기업가인 바비쉬, 군인 출신인 파벨과 차별화 하며 ”우리나라가 기업이나 군대처럼 운영되면 안되고 가족과 같이 운영되어야 한다.” 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취약, 소외 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의사도 밝히고 있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 성소수자 인권 보호 등도 강조하면서 젊은 층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으며, 경제위기 상황에서 경제전문가인 자신의 전문성을 강조하면서 지지율이 오르는 추세다. < 다누셰 네루도바 > Danuše Nerudov 정치 성향 - (경제) 소득세 기본 할인폭 인상, 연금개혁 조속 추진, 유로화 채택은 지지하지만 경제 여건상 현재 도입은 부적절, 세금 인상은 지출 효율성 확인 후 판단 - (에너지) 현 정부의 에너지 절약 관련 조치 지지, 원자력을 포함한 체코의 녹색 에너지 전환 지원 - (외교노선) NATO와 EU 협력 추구, 미국과 외교관계 구축 중시, 중국과의 관계는 신중 (체코에서 중국의 영향력 면밀히 검토) - (러-우사태) 우크라이나 지속 지원 - (사회) 동성결혼 및 자녀입양 찬성 강점 - 경제전문가 약점 - 정치 경력 無 [자료: 후보자 홈페이지, E15, Novinky, ceskatelevize, idnes 등 인터뷰 종합] 대선 지지율 현황 3명 유력 후보의 지지율이 모두 20% 중반대로 각축을 보이면서 여론조사 결과도 조사기관, 시기에 따라 순위가 달라지고 있어 현재로서는 당선자 예측이 쉽지 않은 상태다. 이중 네루도바의 경우 젊은 층에서 가장 많은 지지(34세 미만의 절반 이상)를 받고 있고, 초반에 비해 지지율이 크게 상승하고 있다. 반면, 바비쉬의 경우 65세 이상 장년층에서 지지율이 높은 편이다. 가장 최근 (12월 9일 발표) Median에서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네루도바가 28.0%로 지지율이 가장 높고 이어서 바비쉬가 26.5%, 파벨 23.5%를 기록했다. 한편 체코의 유력 경제지인 Hospodarske noviny가 실시한 여론조사 종합자료(12월 1일 기준)에서는 바비쉬 지지율이 27.5%로 가장 높게 나타나는 등 각축 양상이다. 1차 선거 득표율에 따른 2차 선거 실시 여부, 군소 후보들의 후보 단일화 여부 등에 따라 당선자 윤곽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2022년 11월 Median 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 (단위: %) 주: 조사기간 2022. 11. 09 ~ 12. 07., 체코 유권자 1,010명 대상 [자료: 체코 국영방송(Ceska televise)] <Hospodardske noviny가 산출한 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 동향> (단위: %) 주: Median, Ipsos, STEM/MARK, Kantar의 여론조사를 종합(최근 순으로 가중평균 적용)하여 Hospodarske noviny에서 선호도 산출 [자료: hospodarske noviny] 시사점 이처럼 지지율이 박빙을 보이고 단일화 여부 등 변수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 분석이며, 네루도바와 파벨은 지지층이 겹치는 반면 바비쉬 쪽은 상대적으로 성격이 다른 견고한 지지층을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 현 집권당인 SPOLU은 자체 후보를 내지 않았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도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여론조사를 통해 파악해 봤을 때 파벨과 네루도바, 피셰르(Pavel Fischer) 후보가 SPOLU 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성향과 가깝다고 밝힌 바 있다. 체코는 의원내각제로 총리 권한이 센편이지만 주요 정책이 의회 및 대통령의 최종 승인을 거치게 되고, 체코가 내년에는 V4 의장국을 맡게 되고 내부적으로도 에너지 위기 등 현안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서 총리와 내각 임명권을 가진 새 대통령이 피알라 총리 내각과 얼마나 협력적 관계를 가지면서 국정을 운영해 나가게 될지 주목되는 시점이다. 자료: Hrad.cz, 각 후보자 홈페이지, E15, Novinky, ceskatelevize, Hospodarske noviny 및 KOTRA 프라하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프라하무역관 정지연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12.21
-

- 2023년 폴란드 경제전망
- 2023년 경제성장률 연평균 약 0.9%대로 경기 악화 두드러질 전망 연초에 IMF 등 주요 기관에서는 2022년 연간 폴란드 GDP 성장률이 전년도에 이어 약 5%대의 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하였다. 하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에너지 가격 상승, 원자재 수급 문제, 인플레이션 증가, 환율 불안, 소비자 구매력 감소 등의 여러 악재 요인이 폴란드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되어 폴란드 경제계 및 국제기구는 2022년 폴란드 경제성장 전망을 연초 전망치인 평균 5%대에서 4%대로 하향 조정하였다. 2023년에는 인플레이션의 지속 심화로 인한 소비심리 악화와 폴란드의 최대 교역국인 유로존, 특히 독일의 마이너스 경제성장이 예상되어 주요 기관들이 평균 약 0.9%대의 낮은 경제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다. EU 위원회는 폴란드의 경제성장이 2023년과 2024년에 크게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특히 2023년 1분기 경에는 마이너스 성장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U 위원회는 폴란드 GDP 성장률을 2022년에는 약 4%, 2023년 약 0.7%, 2024년에는 약 2.6%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주요 기관별 2023년 폴란드 GDP 성장률 전망> [자료: 각 기관 자료 종합, ‘22.10월 기준] <2023년 주요 EU 회원국 GDP 성장률 전망> [자료: EU 위원회, 2022년 11월 자료] 증가하는 인플레이션으로 기업과 가계에 모두 부담 2022년 10월 기준 인플레이션이 전년동월대비 17.9%로 25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물가가 대폭 상승하였다. 폴란드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은 금년 가을 혹은 2023년 초에 정점을 기록하여 2024년에야 비로소 한자리 수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폴란드 통화정책위원회(RPP)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원자재 및 에너지 가격 급등, 공급망 문제 등으로 야기된 인플레이션 해결을 위해 ’22년 9월 기준금리를 0.25% 인상한 6.75%로 인상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2023년에는 폴란드 기업들이 경기침체 및 가격 인상에 직면하고 높은 금리로 인해 추가 자금 조달이 어려워져 투자를 감축할 것으로 보이며 가계부담이 커짐에 따라 개인의 소비둔화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력 부족, 임금인상 등으로 기업들의 비용부담 커질 것으로 예상 ‘22년 11월 기준 폴란드 국내 실업률은 5.1%대로 폴란드 고용시장은 경제침체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인력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인력 부족 및 지속적인 임금인상 압력이 나타나고 있다. 가장 노동력이 부족한 산업분야는 제조업, 건설업, 물류·운송업, 요식업, 서비스업, 농업, 의료, IT 등으로 2023년에도 인력부족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3년 법정 최저임금은 상하반기 총 2번으로 나누어져 인상될 예정이다. 상반기인 ’2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법정 최저임금은 세전 월 3,490 PLN(약 104 만원) 이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세전 월 3,600 PLN(약 108만원) 으로 인상된다. 이는 ‘22년 법정 최저임금인 3,010 PLN(약 93만원) 대비 총 19.6% 인상되는 것으로 기업들에 고용 비용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비 예산 증가, 인플레이션에 따른 재정완화 정책 등으로 국가재정 적자 증가 전망 폴란드 경제계는 2023년도 높은 인플레이션 및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로부터 가계와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의 재정완화 정책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VAT 및 소비세 인하를 포함하는 인플레이션 방패와 같은 기존 재정 지원 조치와 에너지 및 식품가격에 대한 지원은 2022년 연말까지 연장되었다. 유사한 지원책이 2023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여 폴란드의 재정적자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8월, 폴란드 모라비에츠키 총리는 2023년 재정적자를 GDP의 4.2~4.4% 수준으로 높게 책정할 계획이며 이는 무엇보다도 국방비와 국민건강에 대한 국가지출이 대폭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언급하였다. <폴란드 국가재정 적자 현황 및 전망> (단위: 10억 즈워티) [자료: 폴란드 재정부, Rzeczpospolita] *전망치 2023년 10월경 폴란드 총선실시 예정 2023년 10월경 폴란드 총선이 있을 예정이며, '22년 12월 초 정당지지 조사에서 현 정권인 법과정의당(PiS)이 약 33.6%로 1위, 야당인 시민엽합당(KO)가 26.9% 등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상황으로 PiS가 큰 변화 없이 안정적으로 1위를 고수하고 있다. 현 정세는 이러하나 2023년 봄에 실시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실질적 총선국면의 정당 지지도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시사점 폴란드는 최근 몇 년간 4%대 이상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였으나,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폴란드 경제가 큰 타격을 입어 ‘20년 경제성장률은 약 마이너스 3%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폴란드 거시경제의 안정적인 성장과 내수경기 회복으로 2021년 상반기부터 점차 경기 회복기에 들어가 2022년에는 약 4%대의 플러스 성장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에는 인플레이션 지속 심화로 인한 소비심리 악화, 임금상승 압력, 폴란드의 최대 교역국인 유로존, 특히 독일의 마이너스 경제성장이 예상되어 평균 약 0.9%대의 낮은 경제 성장률이 전망된다. 따라서 폴란드 현지 투자진출을 고려하거나 이미 진출해 있는 투자기업들은 투자처로서 매력적이었던 낮은 임금 수준, 견조한 경제성장률 등 만을 고려하여 투자를 결정하기 보다는 폴란드 및 EU회원국 거시경제 현황 및 폴란드 노동시장 현황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자료: EU위원회, IMF, OECD, PKO BP, Rzeczpospolita, PIE, BNP Paribas, NBP, Gazeta Prawna, Business Insider, Shutterstock, 인터뷰 및 바르샤바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바르샤바무역관 남호선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12.21
-

- 2022 중국 500대 민영기업 발표
- <2022 중국 500대 민영기업 조사 연구 분석 보고서(2022中國民營企業500強調研分析報告)>*에 따르면 2021년 중국 500대 민영기업의 영업이익은 263억 6,700만 위안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12.20% 증가했다. 영업이익 1,000억 위안 이상인 곳이 87개, 500~1,000억 위안인 곳이 118개, 100~ 500억 위안인 곳이 295개로 분포됐다. <2017~2021년 500대 민영기업 진입 기준> (단위: 억 위안) 주) 조사용 데이터 기간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자료: 중국 전국 공상업 연합회(全國工商聯)] 500대 민영기업 중 상위 20개 기업은 주로 베이징시, 저장성, 장쑤성, 광둥성에 소재한다. 상위 20개 기업에는 각종 제조업 13개, 인터넷 3개(JD, Alibaba, Tencent), 부동산 2개(Country Garden, Vanke), 보험 1개(Taikang), 소매 1개(GOME)가 포함됐다. 2021년 JD는 9,515억 9,200만 위안으로 HUAWEI를 제치고 중국 민영기업 1위가 됐다. Alibaba는 8,364억 500만 위안으로 2위에 올랐다. 인터넷 및 관련 서비스 산업의 이 두 민영기업의 2021년 총 영업이익 증가량은 각각 1,829억 6,800만 위안 및 1,921억 6,900만 위안에 달했다. 2020년 민영기업 1위였던 HUAWEI는 2021년에 5위로 떨어졌고 2021년 총 영업 소득은 6,368억 700만 위안으로 2020년 대비 2,545억 6,100만 위안 감소했다. <2021년 500대 민영기업 TOP20> (단위: 억 위안) 2021년 순위 2020년 순위 기업 업종 지역 2021년 영업이익 2020년 영업이익 1 2 JD (京東) 인터넷 및 관련 서비스 베이징시 9,515.92 7,686.24 2 5 Alibaba (阿裏巴巴) 인터넷 및 관련 서비스 저장성 8,364.05 6,442.08 3 3 HENGLI (恒力) 석유, 석탄 및 기타 연료 가공업 장쑤성 7,323.45 6,953.36 4 4 AMER (正威國際) 비철금속 제련 및 압연 가공업 광둥성 7,227.54 6,919.37 5 1 HUAWEI (華為) 컴퓨터, 통신 및기타 전자기기 제조업 광둥성 6,368.07 8,913.68 6 6 Tencent (騰訊) 인터넷 및 관련 서비스 광둥성 5,601.18 4,820.64 7 7 Country Garden (碧桂園) 부동산업 광둥성 5,230.64 4,628.56 8 9 Lenovo (聯想) 컴퓨터, 통신 및기타 전자기기 제조업 베이징시 4,898.72 4,175.67 9 8 Vanke (萬科) 부동산업 광둥성 4,527.98 4,191.12 10 13 RongSheng (榮盛) 화학원료 및 화학제품 제조업 저장성 4,483.18 3,086.09 11 15 WEIQIAO (魏橋) 비철금속 제련 및 압연 가공업 산둥성 4,111.35 2,889.65 12 11 GEELY (吉利) 자동차제조업 저장성 3,603.16 3,269.40 13 14 TSINGSHAN (青山) 흑색금속 제련 및 압연 가공업 저장성 3,520.18 2,928.92 14 12 GOME (國美) 소매업 베이징시 3,500.54 3,104.77 15 19 SHENGHONG (盛虹) 화학원료 및 화학제품 제조업 장쑤성 3,479.79 2,652.37 16 16 Midea (美的) 전기 기계 및 기자재 제조업 광둥성 3,433.61 2,857.10 17 18 HENGYI (恒逸) 화학섬유제조업 저장성 3,288.00 2,660.76 18 22 Xiaomi (小米) 컴퓨터, 통신 및기타 전자기기 제조업 베이징시 3,283.09 2,458.66 19 17 SHAGANG (沙鋼) 흑색금속 제련 및 압연 가공업 장쑤성 3,027.56 2,667.86 20 23 Taikang (泰康) 보험업 베이징시 2,619.33 2,447.82 [자료: 중국 전국 공상업 연합회(全國工商聯)] 중국 500대 민영기업 산업구조 분포를 보면 2차 산업이 주를 이룬다. 2021년에는 2차 산업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이 중 제조업은 여전히 500대 민영기업의 선도 산업이며 흑색금속 제련 및 압연 가공업은 몇 년 동안 지속 업계 1위를 차지했다. 2021년 500대 진입한 1차 산업 기업 수는 4개로 전년도와 같았고, 2차 산업 기업 수는 342개로 전년 대비 23개 증가했으며, 3차 산업 진출 기업 수는 154개로 전년 대비 23개 감소했다. <2017-2021년 500대 민영기업 산업구조> (단위: 개사) [자료: 중국 전국 공상업 연합회(全國工商聯)] 2021년 500대 민영기업 상위 10대 업종에는 총 307개 기업이 포함되고 전년 대비 8개 기업이 감소했다. 기업 수로 볼 때 흑색금속 제련 및 압연 가공업은 지속 1위를 차지했으며 2021년 500대 민영기업 중 65개가 철강 산업에 종사한다. 건축업은 전년의 4위에서 3위로, 전기기계 및 기자재 제조업은 6위에서 7위로, 컴퓨터, 통신 및 기타 전자기기 제조업은 5위에서 6위로 각각 상승했다. 흑색금속 제련 및 압연 가공업, 전기기계 및 기자재 제조업, 컴퓨터, 통신 및 기타 전자기기 제조업, 석유, 석탄 및 기타 연료 가공업, 화학원료 및 화학제품 제조업, 비철금속 제련 및 압연 가공업 등 6개 업종의 500대 민영기업 진입한 기업 수는 전년 대비 상승했고, 종합, 건설업, 도매업, 부동산업 등 4개 업종은 전년 대비 하락했다. <2017-2021년 500대 민영기업 업종 TOP10> (단위: 개 사) 업종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1 흑색금속 제련 및 압연 가공업 65 59 61 55 45 2 종합 36 41 36 43 41 3 건축업 34 37 38 37 39 4 도매업 29 29 27 22 26 5 전기 기계 및 기자재 제조업 28 26 24 24 22 6 컴퓨터, 통신 및 기타 전자기기 제조업 27 23 23 24 23 7 석유, 석탄 및 기타 연료 가공업 25 22 27 26 21 8 부동산업 25 44 45 39 36 9 비철금속 제련 및 압연 가공업 20 18 19 21 24 10 화학원료 및 화학제품 제조업 18 16 15 21 23 합계 307 315 315 312 300 [자료: 중국 전국 공상업 연합회(全國工商聯)] 2021년 중국 500대 민영기업의 총 취업자 수는 1,094만 1,500명으로 전년 대비 1.35% 감소하고 전국 취업자 중 1.47%를 차지해 전년 대비 0.01% 감소했다. JD(京東)의 취업자 수는 38만 5400명으로 1위를 차지고, BYD(比亞迪)(중국 500대 민영기업 중 26위)는 2위를 차지해 취업자 수가 28만 8,200명에 달했다. <2017-2021년 500대 민영기업 취업자 수> (단위: 만 명) [자료: 중국 전국 공상업 연합회(全國工商聯)] 2021년 500대 민영기업 취업자 상위 5개 업종은 컴퓨터, 통신 및 기타 전자장비 제조업, 건축업, 인터넷 및 관련 서비스, 전기기계 및 기자재 제조업, 흑색금속 제련 및 압연 가공업으로 총 취업자 수는 480만 9,000명으로 전체 500대 취업자 수의 43.95%를 차지했다. 이 중 컴퓨터, 통신 및 기타 전자기기 제조업이 129만 5,100명으로 전년보다 22만 5,500명 증가해 전체 500대 취업자의 11.84%를 차지했다. <2021년 500대 민영기업 취업자 수TOP5업종> 업종 2021년 취업 인원수(만 명) 기업 수 (개 사) 평균 취업 인원수 (만 명) TOP500 취업 인원수 비중 1 컴퓨터, 통신 및 기타 전자기기 제조업 129.51 27 4.80 11.84% 2 건축업 103.56 29 3.57 9.46% 3 인터넷 및 관련 서비스 94.79 15 6.32 8.66% 4 전기 기계 및 기자재 제조업 78.73 28 2.81 7.20% 5 흑색금속 제련 및 압연 가공업 74.31 65 1.14 6.79% 합계 480.90 164 2.93 43.95% [자료: 중국 전국 공상업 연합회(全國工商聯)] 2021년 중국 500대 민영기업이 27개 성, 자치구, 직할시, 신장 생산건설단에 분포해 전년 대비 1개 성이 감소했다. 500대 민영기업의 60%는 저장성, 장쑤성, 광둥성, 산동성에 위치한다. 저장성과 장쑤성에 가장 많은 민영기업이 500대에 진입했으며 저장성은 107개 기업으로 전년 대비 11개(11.46%) 증가했으며 장쑤성은 92개 기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다. 기업 수가 많이 증가한 기타 성은 후베이성, 산시성(山西省)으로 각각 3개로 각각 18.75%, 60.00% 증가했으며, 기업 수가 많이 감소한 성은 광둥성, 산둥성, 허베이성, 상하이시로 각각 10개, 3개, 3개, 3개로 각각 16.39%, 5.66%, 9.09%, 14.29% 감소했다. <2021년 지역별 500대 민영기업 수> (단위: 개사) [자료: 중국 전국 공상업 연합회(全國工商聯)] 500대 민영기업 수량으로는 저장성, 장쑤성, 광둥성이 1~3위, 영업이익 기준 광둥성이 장쑤성을 제치고 6조 5,128억 8,600만 위안으로2위를 차지했으며 500대 기업 총 영업이익의 17%를 차지했다. <2021년 500대 민영기업 수 TOP10 지역> 지역 기업 수 (개 사) 500대 민영기업 점유율 영업이익 (억 위안) 500대 민영기업 점유율 1 저장성 107 21.40% 78,762.85 20.55% 2 장쑤성 92 18.40% 60,495.98 15.79% 3 광동성 51 10.20% 65,128.86 17.00% 4 산둥성 50 10.00% 30,257.78 7.9% 5 허베이성 30 6.00% 21,813.51 5.69% 6 베이징시 23 4.60% 35,980.73 9.39% 7 후베이성 19 3.80% 9,175.13 2.39% 8 상하이시 18 3.60% 14,725.76 3.84% 9 푸젠성 15 3.00% 8,399.82 2.19% 10 허난성 14 2.80% 7,545.88 1.97% 합계 419 83.80% 332,286.3 86.71% [자료: 중국 전국 공상업 연합회(全國工商聯)] 성시별로 보면 2021년 500대 민영기업 중 제조업 기업은 여전히 저장성, 장쑤성, 산둥성에 집중돼 있으며, 3개 성은 총 237개 제조업 기업으로 전년 대비 20개 감소해 500대 민영기업 중 제조업 기업의 47.40%를 차지해 전년 대비 4% 감소했다. 저장성, 장쑤성, 산둥성은 각각 94개, 82개, 61개 기업으로 전년 대비 각각 3개, 2개, 15개 감소해 각각 3.09%, 2.38%, 19.74% 감소했다. <2021년 500대 민영기업 중 제조업 기업 수 TOP10 지역> 지역 2021년(개 사) 2020년(개 사) 占制造业500强比例 1 저장성 94 97 18.80% 2 장쑤성 82 84 16.40% 3 산둥성 61 76 12.20% 4 광동성 49 45 9.80% 5 허베이성 40 38 8.00% 6 푸젠성 19 16 3.80% 7 허난성 17 16 3.40% 8 안후이성 16 16 3.20% 9 쓰촨성 15 10 3.00% 10 산시성 (山西省) 13 13 2.60% 합계 406 411 81.20% [자료: 중국 전국 공상업 연합회(全國工商聯)] 시사점 중국 500대 민영기업에 장쑤성은 92개 기업이 선정돼 전국 2위를 차지했다. 92개 장쑤성 민영기업의 총 영업 소득은 6조 495억 9,800만 위안에 달했으며 이 중 13개 기업이 1,000억 위안을 초과했다. 92개 장쑤성 민영기업 중 제조업 기업은 62개로 67.39%, 서비스업 기업은 18개로 19.57%를 차지했다. 92개 장쑤성 민영기업은 10개의 구(區)와 시(市)에 분포돼 있으며 우시시가 14개로 가장 많고 이어서 쑤저우시는 9개, 난퉁시 8개, 난징시 7개가 각각 2, 3, 4위를 차지했다. <2021년 500대 민영기업 중 장쑤성 기업 TOP20> (단위: 억 위안) 500대 순위 기업 지역 업종 총 영업 소득 1 3 HENGLI (恒力) 쑤저우시 석유, 석탄 및 기타 연료 가공업 7323.45 2 15 SHENGHONG (盛虹) 쑤저우시 화학원료 및 화학제품 제조업 3479.80 3 19 SHAGANG (沙鋼) 쑤저우시 흑색금속 제련 및 압연 가공업 3027.56 4 21 ZOINA (中南控股) 난퉁시 부동산업 2602.58 5 33 ZENITH (中天鋼鐵) 창저우시 흑색금속 제련 및 압연 가공업 1903.82 6 36 NISCO (南京鋼鐵) 난징시 흑색금속 제련 및 압연 가공업 1874.95 7 53 Suning (蘇寧易購) 난징시 소매업 1389.04 8 56 Delong Nickel (德龍鎳業) 옌청시 흑색금속 제련 및 압연 가공업 1353.82 9 60 HTGO (亨通集團) 쑤저우시 컴퓨터, 통신 및기타 전자기기 제조업 1310.03 10 62 GCL (協鑫集團) 쑤저우시 전기 기계 및 기자재 제조업 1300.05 11 70 Yonggang (永鋼) 쑤저우시 흑색금속 제련 및 압연 가공업 1205.61 12 73 Heilan (海瀾集團) 우시시 방직 의류업 1168.50 13 81 XCJ (新長江實業) 우시시 흑색금속 제련 및 압연 가공업 1070.02 14 93 RSUN (弘陽集團) 난징시 종합 880.91 15 103 ZTT (中天科技) 난퉁시 전기 기계 및 기자재하는제조업 815.47 16 104 N2CE (南通二建) 난퉁시 건축업 809.47 17 116 Yangzijiang (楊子江藥業) 타이저우시 의약 제조업 785.53 18 117 NTSJ (南通四建) 난퉁시 건축업 783.05 19 119 Hodo (紅豆集團) 우시시 방직 의류업 769.51 20 139 Sanfanme (三房巷) 우시시 화학섬유 제조업 687.53 [자료: 중국 전국 공상업 연합회(全國工商聯)] 2022년 7월 말 기준 장쑤성에는 47,154개의 규모 이상(공업기업은 연간 생산가치 2,000만 위안 이상, 상업기업은 연간 영업액 200만 위안 이상을 뜻함)의 민영 공업 기업이 있으며 이는 전년 대비 6,122개 증가한 것이다. 500대 민영기업 중 장쑤성 소재 기업은 대부분 선진제조, 고급방직, 스마트장비, 현대비즈니스 등 분야에 집중돼 있으며 신에너지, 컴퓨터, 사무기기 등 신흥산업 기업도 순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2022년 12월 장쑤성 공상업 연합회(全國工商聯) 서기 구완펑(顧萬峰)는 '장쑤성 소재 민영기업은 양적 증가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발전을 계속할 것이며, 기업 문화 방면에서의 글로벌 스탠다드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언급한바 있다. 향후 민영기업의 질적발전 촉진을 위한 현지정부의 다양한 지원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힌 바, 우리 진출기업들은 지속적인 정책 모니터링, 정보 수집을 통해 경영활동에 미치는 영향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자료: 장쑤성인민정부(江蘇省人民政府), 전국공상련(全國工商聯), IFENG(鳳凰網), KOTRA 난징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난징무역관 진몽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12.20
-

- 과테말라 2023년 인플레이션 전망
- 과테말라정부는 전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추세에 따라 올해 두 자릿수 인플레이션을 마감할 예정으로 상품 및 서비스 재화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2022년 상반기 2021년 1월대비 유가가 50%이상 상승했으며 이러한 현상은 과테말라의 운송비용 상승으로 이어졌다. 과테말라 통계청(National Institute of Statistics, INE) 관리자인 아벨 크루즈 칼데론(Abel Cruz Calderón)은 441개의 인플레이션 항목들은 운송비용의 상승이 원인이라고 언급했다. 과테말라 내부에서 2023년 전망은 긍정적으로 8월 인플레이션율은 3.62%로 국제 가격의 반등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1월의 5.24%에 비해 크게 못미치는 수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11월 소비자물가지수(CPI)에 따르면 물가상승률은 9.17%로 10월 9.7%보다 낮아졌으며 누적 물가상승률은 8.98%를 기록했다. 경제당국은 연간 물가상승률은 약 9.75%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2023년 3월부터는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했다. <2022년 과테말라 소비재 가격 변동 추이> [자료: 과테말라 신문 Prensa Libre] 2022년 세계 경제는 코로나 사태와 우크라이나-러시아 분쟁으로 연료가격과 경제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과테말라의 경우 국제 분쟁으로 인해 비료와 생산 투입이 증가했으며 80%는 외부요인, 20%가 내부적 요인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생성으로 외부요인에 절대적 영향을 받고 있다. 연료, 비료의 가격 상승은 해외에서 오는 컨테이너 비용의 상승에 기인한다. 전반적인 물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과테말라 행정부와 입법부는 파운드당 Q0.80의 액화 프로판 가스(LPG)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승인했다. 2018년 인구 주택 총 조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가구의 약 54.4%가 장작을 취사 에너지원으로, 43.7%가 액화 프로판 가스를 사용하고 있어 이러한 보조금 지원은 2023년 물가상승을 막기위한 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부가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해 연료 수입에 일시적 부가세(VAT) 면제 등의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물가 안정을 위해 전 경제부 장관이자 통화위원회 위원인 귀도 로다스(Guido Rodas)는 지역 농업 생산량 상승을 위해 비료 보조금 지원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마로킨대학(Francisco Marroquín University) 대학의 경제학부 학부장인 클린턴 로베르토 로페즈(Clunton Roberto López)는 2022년 인플레이션 원인 중 하나가 과테말라 은행의 조치에서 파생된 과테말라 화폐인 케찰의 강세라고 언급했다. 코로나 비상사태에 정부에 부과된 대출과 국채 시장 축소 등을 언급하며 통화정책의 선행금리 인상과 환율 절상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금융통화위원회(JM)는 지난 5월부터 인플레이션을 상쇄하기 위해 기준금리 조정에 착수했다. 올해 통화정책의 주요 금리 8개 섹션 중 5개 분야에서 조정이 있었고 지표는 연초 1.75%에서 11월 3.75%로 2%가 증가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2023년 말까지 인플레이션이 5%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 과테말라 건설회의소(CGC)의 통계위원회 이사인 페르난도 에스트라드 도밍게즈(Fernando Estrada Dominguea)는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이 하락세를 보이며 통제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중국발 운임비는 하락했으며, 송금으로 인한 외화수입은 견고하게 증가하고 있어 일반적인 인플레이션은 떨어지기 시작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시사점 과테말라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의 장기화와 글로벌 공급망의 느린 정상화 등 높은 해외수입 가격이 지속될 경우 연료와 식품의 인플레이션 심화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미국발 대 과테말라 해외 가계 송금 증가로 인해 외화 수입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어 환율이 안정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는 민간 소비의 큰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을 기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미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정점을 찍었다고 기대하고 있다. 과테말라 중앙은행 대표 알바로 곤잘레스 리치(Alvaro Gonzalez Ricci)는 과테말라 대표 일간지 프렌사 리브레(Prensa Libre)의 포럼에서 과테말라는 2023년 경기 불황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처럼 과테말라 주요기관에서는 2023년 경기전망을 긍정적으로 예측하고 있으나, 연준에서 금리를 계속 올리게 되면 경기침체 가능성도 존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 : 과테말라 일간지 Prensa libre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과테말라무역관 장보람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12.15
-
- 한국-캄보디아 FTA 발효 ② ; 유망품목 교역분석
- 주요 유망 품목 [차량] 캄보디아는 청소차, 탱크 트럭 등 일부 화물차(HS 코드 8704)에 대해 기존 15% 관세율을 부과하지만, 한-캄보디아 FTA 발효에 따라 관세가 즉시 철폐되거나 10~15년에 걸쳐 균등 철폐한다. 일부 중형 승용차(HS 코드 8702~8703) 기본 관세율이 15~35%이지만, 10~15년 또는 HSL로 관세가 철폐된다. * HSL: 10년간 기준세율을 유지하다가 11년 차부터 10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기준 세율의 50% 인하, 이행 20년 차 1월 1일부터 기준 세율의 50% 유지(캄보디아 관세 양허표만 해당) 한국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자동차는 한국의 대캄보디아 주요 수출품으로 2022년 10월 기준 수출액(HS 코드 8702~8704)은 7160만 달러이다. 승용차(HS 코드 8703)와 10인 이상 자동차(HS 코드 8702)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02%, 168% 증가했으나, 화물 자동차(HS 코드 8704)는 전년 동기 대비 61% 수출액이 감소했다. 한국-캄보디아 FTA 발효에 따라 가격 경쟁력이 증가하고, 캄보디아 건설 경기와 경제가 회복되면서 한국의 대캄보디아 자동차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차량 대캄보디아 수출규모> (단위: US$ 천, %) 순위 품목(HS 코드) 2020 2021 2022.1~10. 증감률 3 승용차와 그 밖의 차량 (8703) 19,587 28,860 44,322 101.6 9 화물자동차 (8704) 54,539 50,087 16,824 -60.5 16 10인 이상 수송용 자동차 (8702) 7,495 4,669 10,458 167.6 합계 81,621 83,616 71,604 -14.4 [자료: 한국무역협회] ITC Trade Map에 따르면, 캄보디아는 주로 한국, 일본, 태국, 미국 등에서 차량을 수입한다. 한국산 차량은 10인 이상 자동차(8702)와 화물차(8704)에서 각각 88%와 21%의 높은 수입 점유율을 차지한다. 캄보디아 차량 바이어에 따르면, 한국 차량은 태국, 중국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품질이 우수하고 가격이 높다고 평가된다. 향후 자동차 부문에서 청소차, 탱크 트럭, 덤프트럭, 트럭, 중형 승용차 등 일부 품목에서 관세가 철폐되므로 가격 경쟁력 증가에 따라 수입 점유율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캄보디아의 차량 수입 동향> (단위: 천 달러) 품목(HS 코드)/국가 2020 2021 2022.1~4. 10인 이상 수송용 자동차(8702) 34,316 16,882 10,034 대한민국 22,331 14,984 8,865 일본 1,598 1,110 716 독일 405 356 217 승용차와 그밖의 차량(8703) 501,843 509,100 229,425 일본 287,683 258,567 94,791 중국 16,266 43,764 25,228 인도네시아 10,519 11,958 23,231 태국 37,613 39,805 20,217 미국 22,997 35,841 16,658 대한민국 20,721 21,845 10,592 화물자동차(8704) 395,094 456,463 114,557 태국 186,224 265,066 61,572 대한민국 108,514 110,323 23,804 미국 44,750 40,132 15,479 차량 총합 931,253 982,445 354,016 [자료: ITC Trade map] [식품류] 간장 등 소스류(HS 코드 2103)는 기본 관세율이 7~15%이지만, 한국-아세안 FTA를 통해 토마토 소스류는 0% 관세율이 적용됐다. 한국-캄보디아 FTA에서는 간장, 칠리소스, 어간장, 기타 소스의 관세율이 10년간 균등 철폐된다. 한국산 소스류의 대캄보디아 수출 규모는 2020년 143만 달러, 2021년 224만 달러, 2022년 10월까지는 전년 동기 대비 11.8% 증가한 186만 달러이다. 캄보디아의 소스류 주요 수입국은 태국, 중국, 베트남 순이며, 한국은 2022년 4월 기준 6위로, 캄보디아는 약 11만 달러 상당을 수입했다. 2022년 기준 캄보디아 소스류 시장 규모는 약 1억2400만 달러 이상으로 최근 몇 년간 시장이 계속 성장하고 있으며, 유통채널 확대와 식습관 변화로 소스류 수요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캄보디아에서는 주로 간장, 피시 소스, MSG가 사용되고 있고, 한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한국 식품점 외에서도 한국산 고추장, 쌈장 등 소스류를 볼 수 있다. 한국-캄보디아 FTA로 인한 관세 인하와 한식에 대한 관심 증가로 한국산 소스류에 대한 현지 수요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캄보디아의 소스류(HS 2103) 수입동향> (단위: US$ 천) 순위 국가 2020 2021 2022.1~4. 1 태국 21,664 24,105 9,773 2 중국 2,815 2,202 1,177 3 베트남 2,705 2,560 802 4 말레이시아 491 783 475 5 일본 224 266 164 6 한국 167 358 106 총합 29,732 32,075 12,956 [자료: ITC Trade map] 소주(HS 코드 2208.90)는 기본 관세율이 35%이지만, 한-아세안 FTA와 RCEP을 통해 15% 관세율을 적용받는다. 한-캄 FTA에서는 알코올 도수 40도 이하의 소주는 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매년 10년간 관세가 균등하게 철폐된다. 한국산 소주의 대캄보디아 수출 규모는 2020년 143만 달러, 2021년 369만 달러, 2022년 10월까지는 전년 동기 대비 29.2% 증가한 389만 달러이다. HS 코드 2208.90 품목에 대한 캄보디아의 주요 수입국은 태국, 한국, 중국 등이다. 캄보디아 유통망에서 한국산 소주는 일반적으로 1.7~2달러 내외로 가격이 형성돼 있으며, 캄보디아 일반 식당에서도 한국산 소주를 판매하거나 과일맛 소주를 활용한 칵테일을 판매하고 있다. 한국산 소주에 대한 캄보디아 청년층의 관심 증가 및 가격경쟁력 향상으로 향후 한국산 대캄보디아 수출 확대가 예상된다. <캄보디아의 기타 주류(HS 2208.90) 수입동향> (단위: 천 달러) 순위 국가 2020 2021 2022.1~4. 1 태국 55 186 42 2 중국 43 49 23 3 영국 0 0 8 4 일본 10 14 3 5 프랑스 8 1 2 6 대한민국 65 104 0 총합 254 366 79 [자료: ITC Trade map] 한국-캄보디아 FTA 활용법 FTA 활용을 위해서는 먼저 HS 코드를 확인하고 그에 맞는 관세 양허 유형과 관세를 확인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품목별 원산지 결정 기준을 확인하고, 제품이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다면 소요 부품 명세서 등과 같은 원산지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세관이나 상공회의소에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거나 인증 수출자 원산지 신고서를 통해 수입 통관 시 FTA 관세 혜택을 신청해 적용받는다. 수입 통관 후 1년 이내 FTA 특혜 관세 환급이 가능하지만, 캄보디아 절차 진행상 어려움이 있어 수입 통관 시 FTA 특혜 관세를 적용받는 것이 안전하다. 마지막으로는 관련 서류는 최소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HS 코드 및 관세율 확인] 먼저 수출입 품목의 HS 코드 확인은 한국으로 제품 수입(한국의 수입 관세율 확인 필요) 시, 한국 관세청 관세 법령 정보포털(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캄보디아로 수출을 위한 관세율 확인은 통합무역정보서비스 TrdaeNAVI(http://www.tradenavi.or.kr/)와 캄보디아 관세청(https://customs.gov.kh/en)에서 가능하다. 다만, 캄보디아는 HS 코드 8자리, 한국은 10자리를 사용하고, HS 코드는 품명 외에도 용도, 기능, 성분, 재질 등에 따라 분류하므로, 정확한 HS 코드는 관세사 등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하다. TradeNAVI에서는 대상국을 캄보디아로 지정하고, HS 코드를 입력하는 경우, 기본 관세율, 한국-아세안 FTA(AKFTA), RCEP 세율과 함께 캄보디아 특별세와 부가세가 함께 확인이 가능하다. 한국-캄보디아 FTA는 한국-캄보디아 FTA 협정문 부속서 2-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https://fta.go.kr/main/situation/kfta/lov3/kh/2/) * 부속서는 한국 양허표, 캄보디아 양허표 순임. <대캄보디아 수출 HS Code 및 관세 확인 방법> <TradeNAVI 확인> <캄보디아 관세청 확인> [자료: TradeNAVI, 캄보디아 관세청] 관세 양허 유형에 따라 0(즉시 철폐), 5, 7, 10, 15, 20(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5, 7, 10, 15, 20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 철폐), EX(기준 세율 유지), HSL(이행 10년 차까지 기준 세율 유지 후, 11년 차부터 10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기준세율의 50퍼센트 인하 후, 기준 세율의 50% 유지. 캄보디아 관세 양허표만 해당)로 나눠진다. 무역 협정별로 시기에 따라 관세율이 상이하므로, 무역 협정별 관세율 비교가 필요하다. <협정별 관세율 비교 예시> [자료: KOTRA 프놈펜 무역관] [원산지 결정 기준 확인 방법] 양국 간 무역협정이 있더라도 양국 간 수출입 품목 모두가 FTA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협정에서 규정하는 원산지 기준 등 모든 조건을 충족한 물품에 대해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수출 전에 원산지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원산지 결정 기준은 ① 완전생산기준, ② 원산지 재료 생산기준, ③ 실질변형기준(세번 변경기준, 부가가치 기준, 조합기준, 선택기준 등)으로 나뉜다. 한국-캄보디아 FTA 품목별 원산지 결정 기준은 https://www.fta.go.kr/main/situation/kfta/lov3/kh/2/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한국-캄보디아 FTA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확인방법> [자료: FTA, KOREA 홈페이지] [FTA 원산지 증명서] FTA원산지 증명서는 FTA 적용을 위한 특정 물품의 원산지를 나타내는 서류로, 비특혜 원산지 증명서(Non-preferential C/O)와는 상이하다. FTA 원산지 증명서는 영어로 작성되며, 발급 또는 작성된 날부터 1년의 유효기간을 가진다. (선적 전~선적 후 7일 이내 신청 가능) FTA 원산지 증명서는 ① 원산지 증명서와 ② 원산지 신고서 두 가지 양식이 있다. 원산지 신고서의 경우, 캄보디아 세관 실무자가 해당 제도에 대해 인식이 부족한 경우 원산지 증명서 통관이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현지 세관의 이해도가 높아지기 전까지는 세관을 통해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이 안전하며, 한국 관세청에서는 주말에도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 원산지 증명서 사본 등 관련 서류는 최소 5년 간 보관해야 한다. 원산지 증명서 원산지 신고서 발급방식 기관 발급 인증수출자에 의한 작성 작성주체 수출자, 생산자 또는 권한받은 대리인 신청 인증수출자 양식 협정문 3장 부속서 3-라 협정문 3장 부속서 3-다, 마 * 양식은 협정문 3장 ‘원산지 규정’파일에 첨부(https://www.fta.go.kr/main/situation/kfta/lov3/kh/2/) 자료: Phnom Penh Post, Khmer Times, TradeNAVI, 한국무역협회 수출통계, ITC Trade Map, FTA 실무활용 가이드, KOTRA 프놈펜 무역관 자료 등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프놈펜무역관 이주영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1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