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 '전자' 담배 권하는 영국 정부
- <2011-2019년 영국의 18세 이상 인구 흡연 비율> (단위: %) [자료 : ONS] 영국은 누구보다 담배를 사랑하는 나라였다. 1970년대까지 인구 절반이 담배를 피울 정도로 영국인들의 담배사랑은 유별났는데, 담배에 대한 진실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그 사랑이 식기 시작했다. 2019년 영국에서 담배로 인해 사망한 사람은 6만 4천명에 이르며 2020년 담배로 인해 입원한 사람의 수는 50만 6천 1백명에 달한다. 담배가 국민 건강을 위협하자 정부는 미성년자 담배 구입 금지조치(2007년), 표준담뱃갑 제도(2017년)*를 시행하는 등 흡연인구를 줄이기 위한 여러 조치를 취했고, 이에 따라 흡연인구 비율이 눈에 띄게 낮아졌다. 흡연자가 코로나19 감염에 더 취약하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면서 그 비율은 더욱 빠르게 줄어들었다. 그러나 담배와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영국 정부는 2017년 담배 관리 계획(Tabacco control plan)을 발표하며 2022년까지 성인 흡연률을 12%까지 줄이겠다 다짐했으나,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했으며 여전히 14.7%의 영국인이 주기적으로 흡연을 하고 있다. *주1) 담배갑의 규격 등을 통일하고, 경고 문구를 삽입하는 등의 규제 <2014-2019년 영국 내 전자담배 사용률> (단위: %) [자료: ONS] 한가지 주목할만한 것은, 흡연률을 줄이려는 영국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자담배 사용률이 2014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영국은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전자담배 이용률이 높으며, 영국의 전자담배 시장 규모는 매년 커져 현재 유럽 내 가장 큰 전자담배 시장으로 자리잡았다. 2021년 영국 전자담배 시장의 총 매출액은 34억 달러(한화 약 4조 9천억 원)를 기록했고, 2027년에는 42억 달러(한화 약 6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기조에 빗대어 봤을 때 이러한 추세는 얼핏 모순적으로 보인다. 더 놀라운 것은 영국 정부가 전자담배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4-2027년 영국 내 전자담배 시장 총 매출액 추이> (단위: 십억 달러) [자료: Statista] 담배 권하는 사회: 전자담배를 권하는 영국 정부 금연정책을 펴는 정부가 전자담배를 권장하는 것은 모순적으로 보이지만, 사실 ‘이열치열(열을 열로 다스린다)’이라는 말처럼 흡연률을 잡기 위해 영국 정부는 전자담배를 꺼내들었다. 그 이유인 즉, 전자담배는 니코틴이 들어있어 담배와 비슷한 효과를 주면서도 타르, 일산화탄소와 같은 유독성 발암물질은 내뿜지 않아 건강에 덜 해롭기 때문이다. 영국 공중보건국(Public Health England, PHE)은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95% 가량 덜 해롭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 있다. 담배는 중독성이 강해 끊는다고 해도 금단 증상으로 인해 다시 흡연하게 될 확률이 높은데, 금연으로 가는 과도기에 몸에는 덜 해롭고, 효과는 비슷한 대체재로 전자담배를 권고하는 것이다. 영국 보건부에서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지역 금연 센터에서 치료를 받으며 담배를 끊을 목적으로 전자담배를 피우는 경우 68%의 사람들이 금연에 성공했다. 수치로만 보면 금연껌, 금연패치보다 더 높은 금연 성공률을 보이고 있어, 담배를 담배로 끊는 것이 효과가 있는 셈이다. 심지어 2021년 영국 의약품규제청(The Medicines and Healthcare Product Reulation Agency)에서 전자담배 생산자들이 처방허가를 받도록 권고했는데, 허가를 받으면 국가 보건 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NHS)에서 전자담배를 처방할 수 있다. 어쩌면 곧 영국은 세계 최초로 병원에서 전자담배를 담배를 끊는 ‘약’으로 처방하는 국가가 될지도 모른다. 날로 인기가 높아지는 전자담배 시장 금연 목적이 아니라 전자담배가 좋아서 피우는 사람들도 많다. 전자담배를 선호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먼저, 전자담배는 향을 첨가하여 피울 수 있어 다양한 취향을 만족시킨다. 텁텁한 담배의 냄새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는데, 과일이나 커피 향이 가미된 전자담배는 불쾌감을 덜 일으키는 효과도 있다. 더불어, 담배를 끊었음에도 흡연하는 습관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니코틴 함량이 없는 전자담배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향뿐만 아니라 니코틴 함량도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 전자담배의 장점이다. 또한 전자담배는 일반담배와는 다른 법에 의해 규제되기 때문에 일반 담배보다 제약이 덜하다. 일례로 2007년부터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도록 규정되었지만, 전자담배는 해당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정부에서 발표한 것처럼 전자담배는 일반 담배보다 독성 물질을 덜 함유하고 있어 몸뿐만 아니라 환경에도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어 담배를 피우지만 건강이 걱정되는 사람들에게 좋은 대안이기도 하다. <2021년 편의점 및 식료품점에서 가장 많이 팔린 전자담배 브랜드> (단위: 백만 파운드) [자료: Statista] 영국 정부에서 조사한 결과, 전자담배를 피우는 사람의 75%는 탱크형 전자담배를 피우며, 전자담배 사용자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향은 과일향(31.6%), 담배향(25.2%), 멘솔향(20%)이다. 결과를 토대로 분석해보면,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거부감 없는 과일이나 멘솔 향이 큰 인기를 얻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시중에는 400여개가 넘는 전자담배 브랜드가 있는데, 그 중 상위 6개 브랜드가 시장을 크게 선도하고 있다. 영국 내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브랜드는 2021년 영국에서 가장 많은 매출액을 올린 Edge로, 2021년에만 1800만 파운드(한화 약 289억 7,568만 원)의 수익을 냈다. 이 브랜드는 의약제품 연구소에 준하는 영국 내 생산시설에서 전자담배를 생산하고, 적당한 가격에 높은 품질의 담배를 만들어 소비자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 전자담배가 가진 여러 장단점이 있지만, 영국 정부가 국민들을 금연으로 이끄는 수단으로 전자담배를 선택한 것은 자명하다. 정부는 곧 2030년까지 금연국가로 거듭나기 위한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연국가로 거듭나든 아니든 전자담배 시장은 계속해서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시사점 및 수출입 유의사항 영국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전자담배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2.2%만을 차지하던 전자담배 시장점유율이 2021년 12.4%까지 오르며 빠르게 담배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2025년 전자담배 시장 매출액은 2조 4667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그에 맞춰 전자담배 생산 기술도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영국 전자담배 시장의 크기가 커지고 있는 만큼 우리기업의 영국 진출기회도 늘어날 것으로 사료된다. 2016년 발표된 담배 및 관련제품 규제(Tobacco and Related Products Regulations 2016, TRPR)에 따르면, 영국 시장에 전자담배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이 충족되어야 한다. - 전자담배 탱크 용량은 2ml 미만 제한 - 리필 컨테이너 니코틴 함유 용액은 10ml 이하 제한 - 니코틴 함량 20mg/ml 제한 - 니코틴 함유 제품의 어린이 접근 제한 및 개조 금지 - 인공향료, 카페인, 타우린 등의 재료 첨가 금지. - 라벨링 요구조건 및 경고문구 포함 - 판매 전 MHRA(Medicines and Healthcare products Regulatory Agency)에 고지 단, 북아일랜드는 영국령이지만, EU 단일시장에 속하기 때문에 북아일랜드 시장으로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경우 EU-CEG 시스템에 고지해야 하며, 영국으로 납품하는 경우 영국 자국 시스템에 판매를 고지해야 한다. MHRA 고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Guidance on the submission and content of notifications for Great Britain - GOV.UK (www.gov.uk) 앞서 밝혔듯 영국은 전자담배를 의학적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니코틴 함유 제품들의 의료용 제품 등록을 권장하고 있다. 의료용 전자담배 시장이 커지게 되면 전자담배의 수익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담배를 의약용품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는 아래 링크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Guidance for licensing electronic cigarettes and other inhaled nicotine-containing products as medicines - GOV.UK (www.gov.uk) 자료: GOV.UK, ASH, Statista, ONS, KOTRA 런던무역관 자료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런던무역관 남현경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10.28
-

- 중국 3분기 경제성장률 3.9%...‘나이키형’ 더딘 회복세
- 3분기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3.9%를 기록했다. 코로나 여파로 ‘0%’대의 성장률을 기록한 올 2분기(0.4%) 대비 크게 개선되었고 블룸버그(3.3%)와 로이터(3.4%) 예상치를 상회했다. <중국 분기별 경제성장률> [자료: 국가통계국] 9월 누계 중국 GDP는 87조269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3% 증가했다. 상반기(2.5%)보다 0.5%p 소폭 상승하며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국가통계국은 코로나19 방역과 경제안정화 정책 패키지 가동으로 3분기 경제회복 속도가 개선됐다고 자평했다. <중국 연도별 경제성장률> [자료: 국가통계국] 주요 경제지표 2분기 코로나19 재확산 및 도시봉쇄로 주요 경제지표들이 크게 악화했다. 3분기 코로나 사태가 진정세에 접어들고 공급난·물류난이 해소되면서 시장은 ‘V자형’ 반등을 기대했으나 개선세가 뚜렷하지 않다. 전문가들은 완만한 속도의 경제 반등을 의미하는 ‘나이키형 회복’을 나타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주요 경제지표(증감률) 비교> 지표 ‘21년 ‘22년 1~2월 ‘22년 1~6월 ‘22년 1~9월 지표 ‘21년 ‘22년 1~2월 ‘22년 1~6월 ‘22년 1~9월 산업생산 6.1% (2년 복합) 7.5% 3.4% 3.9% 수출입 30% 15.9% 10.3% 8.7% 소매판매 3.9% (2년 복합) 6.7% △0.7% 0.7% 수출 29.9% 16.3% 14.2% 12.5% 고정자산투자 3.9% (2년 복합) 12.2% 6.1% 5.9% 수입 30.1% 15.5% 5.7% 4.1% CPI 0.9% 0.9% 1.7% 2% PPI 8.1% 8.9% 7.7% 5.9% [자료: 국가통계국] 1) 산업생산 9월 중국 산업생산 증가율은 6%대로 회복됐다. 코로나 재확산 및 이에 따른 봉쇄조치로 공급망 불안정·물류난이 심화되면서 산업생산 증가율은 2022년 4월 -2.9%에서 저점을 찍었다. 그러나 당국의 강력한 조업재개 지원, 물류난 해소 조치로 5월 플러스 전환했으며 6월 3.9%까지 회복됐다. 7~8월엔 쓰촨성 등 일부 지역에서 전력 부족으로 역내 생산시설을 전면·부분 가동 중단하는 사태까지 발생했지만 3~4% 수준의 성장세를 유지했으며 9월엔 6.3%의 신장세를 실현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사태 진정세에 따른 공급망 불안정 완화가 중국 산업생산 안정적 증가세의 주 요인이라고 입을 모은다. 자동차 제조업을 예로 들면, 2분기 중국 주요 자동차 생산기지인 지린과 상하이 봉쇄로 공급망이 크게 흔들리면서 중국 자동차 생산량은 전년 동기 대비 8.5% 감소했다. 3분기 코로나 충격이 해소되면서 중국 자동차 생산 증가율은 31.4%로 반등했다. <월별 규모 이상 기업의 산업생산 증가치 증감률> [자료: 국가통계국] 9월 누적 증가율은 3.9%로 집계됐다. 채광업, 하이테크 제조업, 설비 제조업이 전체 산업생산 증가세를 견인하는 양상이다. 품목별로는 신에너지차와 태양광 전지 등 탄소중립 관련 제품 생산 증가세가 가장 눈에 띈다. 생산량 기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12.5%, 33.7% 증가했다. 주*: 1~9월 산업생산 증감률: 채광업 8.5%, 제조업 3.2%(이 중 하이테크 제조업 8.5%, 설비제조업 6.3%), 전력·에너지·가스·물 공급 5.6% 2) 소비(소매판매) 중국 경제 성장을 이끄는 핵심 축인 소비의 회복세는 미진한 모습이다. 1~9월 중국 소매판매(사회 소비품 소매 판매 총액)은 전년 동기 대비 0.7% 소폭 증가한 32조305억 위안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소매판매를 제외한 증가율도 0.7%이다. 상품 소비 증가율(+1.3%)이 저조하고 외식소비(△4.6%)의 마이너스 행진이 지속되는 등 중국 소비 성장세를 이끌어온 온라인 소비(상품+서비스) 증가율도 4%에 그쳤다. <소매판매 증감률> (단위: %) [자료: 국가통계국] 1~9월 식품(+9.1%), 약품(+9.4%), 석유제품(+14%) 등 필수형 소비는 견조한 신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의류(△4%), 화장품(△2.7%), 가구(△8.4%), 인테리어 용품(△4.9%) 등 선택형 소비품목과 부동산 관련 품목의 소매판매는 여전히 마이너스 행진 중이다. 코로나 사태로 급격하게 악화된 중국의 소비심리가 되살아나지 않고 있음을 반영한다. 3) 투자 투자 증가율은 2분기 대비 소폭 둔화했다. 1~9월 중국 고정자산투자액은 42조1412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5.9% 증가했다. 이는 6월 누적 대비 0.2%p 하락한 수치이다. 분야별로 부동산 투자 감소폭(9월 누계 △8%)이 확대되는 가운데 인프라(+8.6%)와 제조업(+10.1%) 투자가 견조세를 유지하며 투자 둔화세를 방어하고 있는 양상이다. 부문별로는 민간 투자 증가율이 2%로 급위축됐다. 민간기업의 체감경기가 지속 악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2분기 9%대(누계)로 소폭 하락했던 국유 부문 투자 증가율은 3분기 다시 두 자릿수로 확대되면서 전반 투자 성장세를 견인하고 있다. <분야별·부문별 투자 증감률> [자료: 국가통계국] 4) 수출입 올들어 중국 수출입 증가율은 꾸준히 둔화하고 있다. 1~9월 중국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2.5% 증가한 2조6986억 달러,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4.1% 증가한 2조534억 달러로 집계됐다. <중국 수출입 증감률> [자료: 해관총서] 9월 당월 수출 증가율은 5.7%에 그쳤다. 외수 감소로 8월보다 더 부진했다. 특히 중국의 최대 수출대상국인 對美 수출이 2개월 연속 역성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감소폭이 두자릿수(8월 △3.8% → 9월 △11.6%)로 대폭 확대됐다. 중국의 주력 수출품목인 기계전자제품 수출이 8월부터 5%대의 저조한 실적을 유지하고 있으며 의료기기와 하이테크 제품의 수출은 두달째, 집적회로 수출은 석달째 마이너스 성장 중이다. 시장은 글로벌 경기 침체에 의한 수출 부진 및 이에 따른 중국 경기하방 압력 증대를 우려하고 있다. 외수부진에 따른 생산수요 감소, 중국내 소비심리 위축으로 수입은 두달째 ‘0%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기계전자제품, 집적회로, 하이테크 제품 수입은 3월부터 역성장 중이며 철광석 수입은 7월부터 3개월째 30~40% 수준의 감소폭을 이어가고 있다. 내외수 부진으로 중국의 수출입은 연말까지 저조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월별 수출입 증감률> [자료: 해관총서] 전망 및 시사점 전문가들은 중국 경제가 2분기 코로나 재확산 및 도시봉쇄의 영향, 부동산 경기침체, 외수부진 등 리스크 요인으로 당국이 올해 목표로 설정한 ‘5.5% 내외 성장률’은 실현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입을 모은다. 3분기 경제성장률이 시장예상치를 상회했지만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중국의 경기회복세가 지연되고 있다는 게 중론이다. 연말까지 ‘나이키형’ 완만한 회복세를 유지할 것이라는데 무게가 실린다. IMF 등 국제기구는 중국 경제성장률은 3%대, 중국내 연구기관들은 3.5% 수준으로 점치고 있다. <주요 기관의 2022년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기관 2022년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IMF 3.2% 세계은행 2.8% 피치(Fitch) 2.8% CHINA SECURITIES(中信建投) 3.4% 내외 WIND 3.6% [자료: 각 기관 발표자료] 소비심리 위축 지속, 외수부진에 의한 수출의 경제성장 견인력 약화, 민간·중소기업 체감경기 회복세 미진, 부동산 규제 완화에도 부동산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겹악재 속에서 당국은 연말까지 인프라와 국유대기업의 제조업 투자 확대를 통해 경기하방을 방어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하반기 들어 중국의 정책성 금융기관들이 인프라·부동산에 대한 융자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9월 기업·공공기관의 설비투자에 쓰이는 중장기 대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94% 급증한 1조3488억 위안으로 집계됐다. 국가개발은행, 수출입은행, 농업발전은행 등 정책성 금융기관은 7월 이후 총 6700억 위안 규모의 인프라 투자기금을 설립해 인프라 투자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 주민·기업향 중장기대출 증감폭> [자료: 중국인민은행(中國人民銀行)] 중국 경기회복세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은 정부의 정책동향, ‘제로코로나’ 정책에 의한 공급망 불안정 등 불확실 요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맞춤형 진출진략을 제정해야 한다. 중국 내수시장을 분석하고 제품 경쟁력에 더해 디지털 플랫폼 등을 활용해 한국산 제품의 수출 동력을 지속 창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자료: 국가통계국, 해관총서 등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베이징무역관 김성애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10.28
-

- 중국의 망간 산업 현황
- 망간은 철강을 제조할 때 강에 유해한 산소나 황 등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탈산ᆞ탈황제로서 사용되는 외에도 인성이나 강도를 높이기 위한 첨가제로도 사용된다. 철강용 외에 알루미늄합금에의 첨가제나 망간건전지ᆞ망간페라이트 혹은 사료ᆞ비료용 첨가제로 사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원료로서도 주목받고 있다. 망간광석 매장 및 생산 현황 망간광석은 망간계 합금철의 주원료로 사용되는 한편, 전해망간 원료로 사용되고 있다. 미국지질조사국 (USGS: United States Geological Survey)에 따르면 전세계의 망간 매장량은 약 15억 톤으로 추정되며, 그 중 고품위 망간광석(망간함량 44% 이상)은 남아프리카, 브라질, 호주 등 국가에 편재하고 있다. <국가별 망간광석 매장량 비중> [자료: USGS, 중신증권연구소(中信证券研究部)] 중국의 망간 매장량은 5,400만 톤으로 세계 6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망간함량 30% 이하의 저품위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고품위 망간광석은 수입의 의존하고 있다. 2021년 중국의 망간광석 생산량은 130만 톤인 반면 망간광석 수입량은 2,996만 8,000톤이었다. 망간광석의 수입 의존도는 95.7%에 이른다. 망간제품 생산 동향 망간계 합금철의 주된 제품은 실리콘 망간과 페로망간이다. 중국은 망간계 합금철의 최대 생산국으로 2020년 기준 실리콘 망간과 페로망간의 연간 생산량은 각각 1,177만 1,000톤, 189만 톤에 달했다. <중국의 망간계 합금철 생산 현황> (단위: 만톤) 지역 실리콘 망간 페로망간 망간 슬래그 금속망간 네이멍구(内蒙古) 452.9 57.3 139.9 0 닝샤(宁夏) 215.8 3.7 0 57.9 광시(广西) 168.4 20.8 0 27.0 구이저우(贵州) 93.7 7.6 0 21.5 허난(河南) 58.2 14.7 0 0 충칭(重庆) 52.1 0 0 9.4 산시(山西) 32.7 52.2 58.7 0 윈난(云南) 30.6 4.9 0 4.1 간쑤(甘肃) 28.7 0 0 0 후난(湖南) 16.6 4.6 25.4 14.6 신장(新疆) 15.4 0 0 7.0 쓰촨(四川) 12.1 4.8 0 2.3 랴오닝(辽宁) 0 8.0 22.5 0 후베이(湖北) 0 0 0 6.4 기타 0 10.4 0 0 합계 1,177.1 189.0 246.3 150.2 [자료: 중신증권연구소(中信证券研究部)] 전해망간은 불순물을 꺼려하는 알루미늄ᆞ화학용으로 사용되는데다 철강용에서도 인(P)ᆞ 질소(N)ᆞ탄소(C) 등의 불순물을 껴려하는 특수강에 사용되고 있다. 지난해 중국의 전해망간 생산량은 130만 4,000톤으로 전년대비 13.2% 감소했다. 생산량 감소의 배경은 전력 소비량이 높고 오염물질 배출도 작지 않은 전해망간 산업이 중국 내 전력난과 정부의 환경 규제 정책 영향 속에 업그레이드 또는 구조조정의 대상이 된 데 있다. <중국 전해망간 생산 현황> [자료: 중신증권연구소(中信证券研究部)] 전해이산화망간은 아연-탄소 배터리 및 알칼리 배터리에서 양극(전자 수용체) 물질로 사용된다. 2020년 중국의 전해이산화망간 생산량은 351만 1,000톤이고, 2019년 30만 7,000톤과 비교하여 14.3% 증가했다. 이유는 1차전지 및 리튬이온 배터리의 생산량 증가에 의한 수요증가 때문이다. <중국 전해이산화망간 생산 현황> [자료: 중신증권연구소(中信证券研究部)] 황산망간은 합성 지방산 촉매, 비료, 망간화합물 제조, 배터리, 염료, 제지, 세라믹, 제약 등 다양한 산업에 적용되고 있다. 중국의 연간 황산망간 생산량은 2020년 기준 47만 9,000톤이었다. 이 중 배터리 등급 황산망간은 약 15만 2,000톤으로 약 1/3를 차지했다. 고순도 황산망간은 중대형 배터리에 가장 많이 쓰이는 삼원계 NCM (니켈ᆞ코발트ᆞ망간) 배터리의 양극재로 사용되어 배터리의 안정성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한다. 전기차 산업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배터리 등급 황산망간의 수요도 계속 증가하여 2017년 이후 고순도 황산망간의 생산량은 연평균 20% 이상 확대해 왔다. <중국 고순도 황산망간 생산 현황> (단위: 만 톤) [자료: 상하이비철금속망(上海有色网), 중신증권연구소(中信证券研究部)] 망간 제품 가격 동향 2021년 정부의 환경대책 강화로 중국 내 전해망간의 생산량이 줄어들어 가격이 급등하였다. '21년 상반기 톤당 17,000위안(약 2,368달러) 안팎이던 전해망간 값은 11월에 44,000위안 (약 6,129달러)수준으로 뛰어올랐다. 올해 들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조강생산량 감소 및 봉쇄조치로 인한 물류 차질로 중국 내 전해망간 가격은 다시 예년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중국 내 전해망간 가격 변동 추이> (단위: 위안/톤) [자료: 아시아금속망(亚洲金属网), 중신증권연구소(中信证券研究部)] 한편, 전해망간을 제외한 기타 망간제품의 가격 상승은 제한적이었다. 페로망간, 실리콘 망간, 이산화망간, 황산망간의 작년 가격 인상폭이 각각 85%, 60%, 90%, 70%에 그쳤다. 올해 들어 망간제품 중 철강 생산 공정에 많이 이용되는 페로망간과 실리콘 망간의 가격이 하락한 반편, 배터리 소재로 쓰이는 이산화망간과 황산망간의 가격은 상승세를 보였다. <중국 내 망간제품 가격 변동 추이> [자료: 아시아금속망(亚洲金属网), 중신증권연구소(中信证券研究部)] 망간 시장 장악한 중국 중국은 세계 최대의 망간제품 생산국이다. 강철 첨가제에서 배터리 등급 화학물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망간제품의 90% 이상을 생산하고 있다. 특히 철강생산 공정의 필수품인 전해망간의 경우, 중국은 전세계 생산량의 98% 이상을 독점하고 있다. 그러나 생산 과정에서 전력 소비량이 높고 다수의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전해망간이 친환경 정책을 펴고 있는 중국 정부의 구조조정 대상으로 지목되었다. 중국은 낙후 생산시설 철거, 오염 물질 배출기준 강화, 과잉 생산 규제 등 조치를 통해 전해망간 산업의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올해 중국 내 전해망간의 생산 정기 기간은 평년의 4개월에서 6.5개월로 늘어날 계획이며, 공급량 감소가 불가피할 것이다. 한국은 전해망간의 대부분 물량을 중국에서 도입하고 있다. 중국 ‘철합금 온라인(铁合金在线)”에 따르면 중국의 지난해 전해망간 수출 대상국 중 한국이 네덜란드에 이어 2위에 자리했다. 이 기간 한국은 중국으로부터 82,299톤의 전해망간을 수입했는데, 이는 이 품목 중국 수출 물량의 22.5%에 해당된다. 전망 및 시사점 2021년의 세계 조강생산량은 19억 5,200만 톤으로서 과거 최고를 기록하였다. 2022년에도 전년대비 소폭 증가한 19억 6,400만 톤, 2025년에는 20억 2,700만 톤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조강생산량 증가에 따라 망간의 수요도 비례 증가하여 2025년에는 2,230만 톤에 이를 전망이다. <세계 조강생산량 현황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자료: 세계철강협회, 중신증권연구소(中信证券研究部)] <세계 조강생산용 만강 수요량 현황 및 전망> (단위: 만 톤) [자료: 중신증권연구소(中信证券研究部)] 한편, 1차전지 및 리튬이온 배터리 소재로 활용되는 망간의 수요량도 향후 성장을 지속해 2025년에는 각각 45만 5,000톤, 30만 8,000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1차전지 소재용 망간 수요량 전망> (단위: 만 톤) [자료: Fortune business insights, 중신증권연구소(中信证券研究部)] <세계 리튬이온 배터리 소재용 망간 수요량 전망> (단위: 만 톤) [자료: GGII(高工锂电), 중신증권연구소(中信证券研究部)] 그러나 망간제품 생산은 전력소비 원단위가 높고, 중금속을 함유한 슬래그(Slag) 처리 등 환경문제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환경대책 강화에 의해 산업 구조조정이 진행되어 전체 생산량은 감소하는 추세다. 한국이 망간제품의 대부분을 중국에서 수입하는 상황에서 중국의 상황변화 등에 따라 수급불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업계 차원에서는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준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자료: 중신증권연구소(中信证券研究部), Wind, 신화매일전신(新华每日电讯), 철합금 온라인(铁合金在线), KOTRA 선양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선양무역관 동흔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10.2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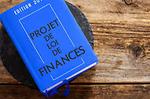
- 2023년 프랑스 정부 예산안 주요 쟁점
- 최근 프랑스 정부와 국회는 9월 26일 발표된 2023년도 프랑스 정부 예산안에 대한 검토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러-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에너지 대란과 전세계적인 인플레이션 등 내년 국가 경제에 빨간 불이 켜진 이 때, 프랑스 하원에서 검토를 끝낸 2023년 1차 예산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알아보자. <2023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토론하는 프랑스 하원> [자료: Les Echos] 2023년도 예산안 구성 배경 및 프랑스 경제 전망 지난 9월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경제부 장관은 “에너지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러-우크라이나 사태, 중국과 미국 등 파트너 국가들의 경제적 취약성, 높아진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거대한 경제적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것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짜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배경이 됐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프랑스 경제가 마주할 위와 같은 위기에 대응해 가계를 보호하고,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 위기에 빠진 기업을 지원하며, 공적 지출 규모를 관리하는 것이 이번 예산안의 주요 골자라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르메르 장관은 계속되는 인플레이션과 관련, “향후 몇 개월간 물가상승률이 6%까지 올라갈 것이나, 내년도에는 4% 대로 내려올 것”이라고 내다봤으며, 2022년 프랑스의 경제성장률은 2.7%로 마감, 2023년도에는 1%의 성장률을 유지할 것이라며 프랑스 경제가 이 위기를 잘 버텨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서 르메르 장관은 지난 코로나 팬데믹 기간 마크롱 정부에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Quoi qu’il en coûte)”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했던 각종 지원을 종료한다고 발표하면서도, 내년도 프랑스 경제 안정을 위해 재정지출을 늘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프랑스 정부의 2023년 재정지출은 전년 대비 217억 유로(2022년 대비 6.6%)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 프랑스 재경부, Le Monde] 2023년도 예산안의 주요 쟁점 프랑스 공공정보서비스 사이트(vie-publique.fr)에서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가계의 구매력 보호책 이번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에도 프랑스의 에너지 요금 인상률은 15%로 동결될 예정이다. 치솟는 에너지 가격으로 인해 상승률 상한제가 없다면 가정용 에너지 가격이 100% 이상 급등한 것으로 예상되는 바, 프랑스 정부는 내년에 450억 유로를 투입해 올해처럼 에너지 요금 상승률을 위와 같이 규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가스 요금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전기요금은 2023년 2월 1일부터 15%씩 인상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가계의 구매력 보호 조치의 일환으로,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도입해 가계의 실질 소득을 보호할 예정이다. 또한 2023년부터 상위 20% 가구를 제외한 모든 가구의 주거세를 폐지되며, 부동산세 인상분도 최대 3.5% 선이 될 전망이다. ② 일자리와 기업 보호책 프랑스 정부는 이번 예산안에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여러 조치를 반영했다. ‘견습생 고용 지원(L’aide à l’embauche d’alternants: 학생들이 취업 후에도 학업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에 35억 유로를 배정해 2027년까지 총 100만 명이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장려할 예정이다. 또한 ‘국가고용기금(FNE)’과 ‘단체직업전환(Transitions collectives: 달라지는 경제 현실에 대비해 노동자와 고용주의 직업 전환을 돕는 제도)’에 3억2500만 유로를 투입할 예정이다. 기업을 위해서 프랑스 정부는 ‘기업의 부가가치분담금(CVAE: 일정 정도 이상의 수익을 올린 기업이 내야하는 지역경제기여세)’을 2년에 걸쳐 없애기로 결정했다. 또한 30억 유로 규모의 지원금이 기업들의 에너지 비용 지출 부담을 줄이는데 투입될 예정이다. ③ 환경생태전환 지원책 일반 가정집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리노베이션 지원금 제도(MaPrimeRénov’)’는 2023년에도 계속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서 25억 유로를 여기에 배정해 난방, 단열 등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데 효과적인 리노베이션을 계속해서 적극 장려해나가기로 했다. 또한 친환경 자동차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내년도에 13억 유로를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여기에는 2023년 중반부터 도입될 ‘소셜 리스(Leasing social: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월 100유로에 전기자동차를 대여해주는 제도)’가 포함된다. 올 9월 정부가 자전거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발표했던 ‘자전거 플랜 기금(Fonds du Plan Vélo: 자전거 인프라 확충 및 안전한 자전거 코스 개발을 위한 플랜 지원금)’에도 2억5000만 유로가 투입될 예정이다. ④ 지방자치단체 지원책 주거세 폐지 및 생산세 감면 등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부족이 예상되는 바, 이를 위해 마련된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국가 재정 원조(Concours financiers de l’État aux collectivités territoriales)에 전년 대비 2.15% 늘린 534억 유로를 투입할 예정이다. 또한 ‘기업의 부가가치분담금’ 폐지의 결과로 인한 지자체 재원 감소를 보상하기 위해서 부가가치세 수입의 일부를 ‘지방의 신경제활동 유치를 위한 국가 기금(Fonds national d’attractivité économique des territoires)’에 투입할 예정이다. 이밖에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인해 위기에 처한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5억 유로의 예산을 별도로 마련하기로 했다. ⑤ 정부 부처 및 공공인력 예산 관리 내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정부 부처 예산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에너지생태전환부의 예산이 전년보다 15% 증가했으며, 일자리 관련 부처 예산 역시 67억 유로가 늘어날 예정이다. 교육부 예산 역시 37억 유로 늘어날 예정이며, 보건 분야 예산 역시 21억 유로가 늘어날 예정이다. 또한 국방, 외교, 사법부 예산 역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방 분야에만 30억 유로가 전년보다 더 투입될 예정이며, 사법부 예산 역시 전년 대비 8% 증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2023년에는 총 1만1000개의 공공기관 일자리를 더 확보하기로 프랑스 정부는 결정했다. 이중 3069개의 자리는 내무부 관할 부처에, 2253개의 일자리는 사법부 관할 부처에, 1547개의 일자리는 국방부 관할 부처에 배정될 예정이다. 교육 관련 인력의 경우 교사 정원은 2000명을 줄이되 장애학생 보조인력은 4000명을 늘릴 계획이다. 프랑스 하원의 첫 검토 결과 및 수정 사항 프랑스 하원은 곧바로 예산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으며, 프랑스 정부는 10월 19일 117개의 수정사항이 반영된 예산안을 헌법 특별조항 49조 3항에 따라 하원 표결 없이 통과시켰다. 이번에 결정된 예산안은 하원에서 내각 불신임안이 부결됨에 따라 자동으로 통과됐다. 이번 수정안에서 눈여겨볼만한 변화로는 ‘에너지 기업에 대한 임시 연대분담금’ 부과 등이 있다. 프랑스 정부는 석유, 석탄, 석유정제, 가스 분야 기업 중 2018년부터 벌어들인 수입보다 20% 많은 기업에 대해 33%의 ‘임시 연대분담금(Contribution temporaire de solidarité)’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뿐만 아니라, 원자력 에너지, 화석에너지, 재생에너지 등을 포함하는 모든 전기 생산기업 중 MW/h당 180유로 이상의 가격으로 판매한 기업에 대해 특별 과세하는 방안 역시 담겨있다. 이번 수정안에는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방안 역시 포함됐다. 그동안 프랑스에서는 3만8100유로 이하의 영업이익을 벌어들이는 중소기업의 경우 15%의 법인세만 납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상한 액수가 2000년대 초반에 결정된 이래로 지금까지 수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일부 의원들은 6만 유로까지 그 상한선을 끌어올릴 것을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주요 일간지 레제코(Les Echos)가 전한 바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일부 의원들의 제안을 일부 수용해 4만2000유로 이하의 영업 이익을 기록한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율을 15%로 감면해주는 내용을 이번 수정 예산안에 반영했다. 반면 민주운동당(Modem) 등에서 주장했던 기업 이익 배당금에 대한 세금을 올리는 방안에 대해서 프랑스 정부는 분명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다. Modem 측에서는 최근 5년간 평균 이익 배당금보다 높은 액수의 배당금을 받을 경우 이에 대한 세금을 30%에서 35%로 인상하는 방안을 주장해왔다. 레제코(Les Echos)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Modem 측의 주장이 오히려 더 큰 부정의를 가져온다며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Modem 측에서 주장하는 대로라면 주식을 보유한 근로자와 같은 자연인은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지만 법인, 회사, 홀딩스 등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당 법안은 프랑스 기업에만 적용되므로 프랑스 기업에 대한 투자는 줄고 외국계 기업에 대한 투자를 독려하는 꼴이 된다는 것이다. 그밖에 이번 수정 예산안에는 마스크 등 Covid와 관련된 물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5.5%로 줄이던 조치를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원에서 야당의 내년도 예산안 관련 질의에 답하는 브뤼노 르메르 경제부 장관> [자료: Les Echos] 시사점 9월 26일 발표된 2023년도 프랑스 정부 예산안은 10월 10일부터 70일간 국회의 토론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번에 하원에서 채택된 첫 번째 예산안은 상원의 검토를 거친 후 하원에서 2차 검토를 거쳐야 하는데, 이때 프랑스 정부는 또 다시 헌법 특별조항 49조 3항에 따라 하원의 표결 없이 통과시킬 수 있다. 예산안의 두 번째 부분에 대한 검토는 오는 10월 27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1차 예산안에 대해 좌파연합 뉘프(NUPES)와 국민연합(Rassemblement National)이 발의한 내각불신임안은 부결됐으나, 예산안이 하원의 표결없이, 헌법 특별조항에 따라 통과되고 있음은 현재 프랑스 내 정치적 불협화음이 얼마나 큰지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마크롱 대통령의 재임 이후 치러진 총선(’22.6.19.) 결과 집권여당이 과반 확보에 실패해 정치적 기반이 약화된 상황에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정책이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는 앞으로 계속해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자료: 프랑스 공공정보서비스 사이트(vie-publique.fr), 프랑스 상원 홈페이지(publicsenat.fr), 레제코(Les Echos), 르몽드(Le Monde), KOTRA 파리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파리무역관 곽미성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10.27
-

- 소비자 권한 강화하는 EU의 제조물 책임지침 개정, 우리 기업 대비는?
- EU 제조물책임지침(PLD) 개정 발표 EU 집행위는 2022년 9월 28일 새로운 제조물 책임지침(Product Liability Directive) 및 인공지능 (AI, Artificial Intelligence) 책임지침 법안을 제안했다. 기존 EU의 제조물 책임지침(85/374/EEC)은 1985년에 채택된 이후 제품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대한 제조사 배상 책임을 규정하며 역내 단일시장을 보호하던 법이다. 하지만 4차 산업시대에 들어서며 제품이 생산·유통되는 방식이 변하고 기존 법안으로 규제할 수 없는 데이터, 소프트웨어, AI, 제약 등 지식 기반 상품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EU는 디지털· 순환 경제 전환에 맞춰 새로운 시장에서의 소비자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신규 제조물 책임 지침과 AI 책임 지침을 제안했다. 제조물 책임법이란? 제조물 책임법은 제조사가 제조하고 시장에 유통한 상품의 결함으로 이용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제품의 생산, 판매 과정에 관여한 이들이 피해를 보상하도록 배상 책임을 규정하는 법이다. 국제적으로 많은 국가가 제조물 책임법을 도입했으며, 한국에서는 2002년 7월부터 시행 중이다. 제조물 책임법은 나라마다 제조물의 정의와 결함의 범위, 책임의 엄격성 등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며 EU에서도 회원국 별도의 입법이 필요한 지침의 성격상 나라마다 법안에 일부 차이가 존재한다. 무엇이 변하는가? 제조물의 정의와 손해 범위의 확장 개정된 EU 제조물 책임지침은 제조물의 범위로 무형과 유형의 모든 상품 및 서비스를 망라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전기, 디지털 파일(디지털 버전의 문서 또는 템플릿 등), 제품 운용 및 기타 목적의 소프트웨어, AI 시스템 등이 포함된다. 즉 역내 유통되는 모든 유무형의 제품과 서비스, 제품 사용을 위한 소프트웨어 등이 제조물 책임지침의 대상이다. 따라서 비상업적으로 이용되는 무료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등에는 책임이 면제되지만, 만약 해당 소프트웨어가 상업 활동에 사용 되는 경우에는 지침의 대상이 된다. 한편 신규 지침은 피해자가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손해의 종류도 확대하고 있다. 기존 지침의 손해 범위인 재산 손해 및 물리적 상해에 더해 신규지침은 의학적으로 인정된 심리적 피해나 데이터의 손실까지도 손해로 인정한다. 또한 소비자가 더 쉽게 자신의 손해를 주장할 수 있도록 재산 손해 인정 범위의 500유로 하한선과 일부 회원국 법으로 규정된 사망 혹은 상해 시 최고 보상금 7000만 유로의 상한선도 없앨 계획이다. 결함 제품에 대한 제조사의 책임기한으로는 기존 제품 출시 이후 10년이 유지됐지만 즉각적이지 않은 신체적 상해를 유발할 수 있는 화학물질과 음식 등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책임기한이 15년까지 연장된다. 피해 사실을 주장할 수 있는 기한은 피해 사실을 인지한 날부터 3년으로 유지됐다. 소비자의 권한 강화 제조물 책임 법안은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제조물에 의한 피해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따라서 4차산업시대에 들어서며 늘어난 지식 기반 상품으로 인해 제조사와 소비자 간 정보의 격차가 커지면서 소비자의 입증 부담도 증가하게 됐다. 이에 신규 지침은 소비자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의약품과 AI 등 특정 제품에 한해 피해자가 증거에 접근할 수 있도록 법원이 업체에 증거 공개를 요구하는 등의 장치를 도입하고 이 외에도 인과관계 추정 등을 적용하고 있다. <인과관계 추정(Presumption of causality)> EU의 신규 제조물 책임지침은 책임업체가 피해 예방에 필요한 의무 사항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법원의 증거 공개 요구를 거부할 경우, 제품에 대한 EU 안전 규정 미 준수 시 혹은 명백한 오작동 발견 시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고 추정할 것을 제안함으로 피해자가 제품의 결함을 직접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완화 단, 업체는 피해 방지를 위한 의무를 준수했음을 증명하거나 다른 피해 원인을 규명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를 반박할 수 있음. 단, 증거 공개 요구의 경우 증거 공개 과정에서 제조사의 영업 비밀이 노출 되지 않도록 청문회 및 녹취록에 대한 접근권 제한 등의 보호하는 조치도 마련할 예정이다. 하지만 피해 예방을 위해 제조사는 예방에 필요한 의무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디지털 서비스의 경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보안 취약점 등에 대한 조치 등이 의무화되며 제조사 책임이 강화된다. 또한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역내외 구분 없이 제조·수입 업체에 보상 요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별도 수입업체가 없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직접 EU에 제품을 판매한 경우에도 피해 배상 의무가 발생한다. 따라서 역내 진출한 한국 기업 및 온라인을 통한 직접 유통망을 거쳐 제품을 판매하는 제조업체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AI 책임 지침 AI 책임지침은 기존 EU에서 추진 중인 AI법을 보안하기 위해 제안됐다. AI법이 AI로 인한 위험을 줄이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는 반면, AI 책임 지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이용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안전망으로 작용한다. 제조물 책임지침도 AI에 대한 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지만 AI 책임지침은 제조물 책임지침이 보장하지 않는 손해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보상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즉 제조물 책임지침이 적용되지 않는 기본권 침해나 직접적인 거래관계 없이 AI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비계약적 과실기반 손해 배상 청구)에 적용된다. 또한 AI 제조사가 아닌 AI 사용자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해당 지침을 적용할 수 있다. AI 책임지침 역시 피해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기 위해 피해자에 증거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인과관계 추정 원칙 등 제조물 책임지침과 함께 피해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있다. 향후 일정 제조물 책임 지침과 AI 책임지침은 EU 이사회와 유럽 의회의 승인을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신규 지침이 발효 되면 기존 지침은 발효일로부터 1년 뒤 폐지되며 각 회원국은 1년간의 전환기간 동안 신규 지침의 입법을 완료해야 한다. 신규 지침은 기존 지침의 폐지와 함께 시행되며 신규 지침 시행 이전에 출시된 제품에 대해서는 기존 지침이 계속 적용될 계획이다. 시사점 EU의 제조물 책임 지침 개정에서 우리는 4차산업 시대, 그린·디지털 전환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EU의 전략을 엿볼 수 있다. 이 법안은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함과 동시에 제조사의 책임을 강조 하며 시장에서 보다 지속 가능하고 안전한 제품이 유통되도록 유도해 EU의 순환경제 가속화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EU가 계획하는 디지털 , 데이터, 인공 지능 등 기술 집중적인 산업 육성에 앞서 해당 시장의 이용자를 위한 안전망을 미리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관련해 집행위는 2021년 4월에 세계 최초로 AI법을 제안했으며, 해당 법안이 채택되면 EU에서 AI에 대한 규제가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신규 지침의 대상 및 범위 확대에 따라 우리 기업의 대응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이 지침으로 제조사의 배상 책임 확대가 전망됨에 따라 역내 진출 기업은 제품 안전을 위한 기술 향상뿐 아니라 제품 설명서 및 경고 표시 등 피해 방지에도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신규 지침이 디지털 제품의 하드웨어 뿐 아니라 소프트웨어 제공 업체에도 배상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으므로 관련 업체들의 대비도 필요하다. 특히 책임 기한 동안 진화하는 사이버 보안 위험에 대응해 제품의 취약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업데이트 등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한편 만약의 사고를 대비하는 제조물 배상 책임 보험에 대해서도 법 개정에 맞춘 규정 개정 여부 확인 등 관련 기업의 유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브뤼셀무역관 윤웅희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10.27
-

- KIET 경제 · 산업동향 2022년 10월 2호
- □ 해외경제 : 3분기 中 경제성장률 3.9%로 전분기 대비 반등 □ 국내경기 : 8월 전산업생산 전월비 -0.3%, 소비·투자 동반 증가 □ 금 융 : 9월 기업대출 증가세 확대·가계대출 감소 전환, 10월 중순(10.17~10.25일) 금리 및 원/달러 약보합 □ 산업별 동향 : 8월 제조업생산 전년동월비 +0.8%, 서비스업생산 +7.1% □ 고 용 : 9월 전산업 취업자 기준 전년동월비 2.6% 증가 □ 수출입 : 9월 수출 +2.7%, 수입 +18.6%, 무역적자 약 38억 달러 <부록> 미국 수입시장에서의 주요국 수출경합관계 분석 (국제무역통상연구원)
- [ 산업자료 ] [ 산업/기술일반 ] KIET | KIET 산업연구원 | 2022.10.26
-

- 일본 주요 글로벌기업의 공급망 ESG 관리 방침
- 최근 세계적으로 코로나19를 비롯해 기후위기,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대응 등이 기업의 중대한 과제로 떠오르면서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체계 및 리스크 관리 등에 대한 고객과 투자자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ESG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기업의 생존을 위한 핵심 과제로 대두되면서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이 앞다퉈 지속가능경영 방침을 내놓고 있다. 특히 과거와 달리 글로벌기업 뿐만 아니라 글로벌기업과 거래하는 협력사에까지 ESG 경영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다. KOTRA 도쿄 무역관은 글로벌기업과 거래 중이거나 향후 거래를 희망하는 우리 기업에게 ESG 리스크 대응에 도움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일본의 주요 글로벌기업 4개사(혼다, 닛산, 소니, 캐논)의 공급망 ESG 관리 방침을 살펴보았다. 일본 주요 글로벌기업 4개사의 공급망 ESG 관리 방침 1. 닛산(NISSAN) <닛산(NISSAN)> [자료: 닛산 글로벌 홈페이지] 1) 지속가능경영 추진 방향 글로벌 완성차 기업 닛산은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자사의 장기 경영 비전의 핵심을 ‘전동화’로 삼고 친환경 전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전기차(EV)를 중심으로 전동차 라인업을 확충해 2030년까지 전동차 비중을 50%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닛산의 지속가능경영에 글로벌 협력사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CSR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환경부하 저감, 법령 준수, 인권 노동 존중 등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2) 공급망 내 협력사 ESG 관리 방침 닛산은 르노·미쓰비시자동차와 설립한 공동구매조직(APO)을 통해 협력사 선정 단계부터 소싱, 설계, 양산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에 걸쳐 윤리·사회·환경을 배려한 비즈니스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닛산의 모든 글로벌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서플라이체인 운영 방침을 담은 CSR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준수를 권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협력업체의 기업활동을 CSR 관점에서 재검토하고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5개 분야·26개 항목*(주1)에 대한 대처를 요구한다. ESG 관리 기준은 국가, 지역 관계 없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세부 내용은 ‘르노·닛산 서플라이어 CSR 가이드라인*(주2)’에서 확인 가능하다. 또한 ‘22년 5월 개정한 '닛산 그린 조달 가이드라인*’에 근거해 글로벌 협력사를 대상으로 환경부하 저감을 위한 구체적 대응(온실가스·폐기물 배출량 삭감, 화학물질 관리 등)을 요구하고 있다.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해 협력사에게 탄소 배출량 현황 파악, 탄소 배출 삭감 목표 설립 및 실천 등 자주적인 탄소 배출 저감 활동의 계획적인 추진을 요청하고 있다. *주: 1) 5개 분야: ① 컴플라이언스(법령 준수 및 부패 방지), ② 안전·품질(제품·서비스의 안전·품질 확보), ③ 인권·노동(아동노동·강제노동 금지, 노동시간·임금법령 준수 등), ④ 환경(환경관리 구축·운용, 온실가스·폐기물 배출량 삭감, 화학물질 관리 등), ⑤ 정보 공개(이해 관계자와의 개방적이고 공정한 커뮤니케이션 등) 2) Renault-Nissan CSR Guidelines for Suppliers: https://www.nissan-global.com/EN/SUSTAINABILITY/LIBRARY/SUPPLIERS_SH/ 3) Nissan Green Purchasing Guideline: https://www.nissan-global.com/EN/SUSTAINABILITY/LIBRARY/GREEN_PURCHASING/ 3) 협력사 ESG 평가·관리 방식 닛산은 자사의 지속가능경영 방침을 글로벌 공급망 전체에 침투시키기 위해 ’16년부터 제3기관에 의한 공급업체의 CSR활동 평가 활동을 개시했다. 환경부하 저감, 법령 준수, 인권 존중 등 협력사의 EGS경영 현황에 대해 정기적인 평가를 시행한다. 평가 결과가 닛산이 요구하는 ESG 경영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협력사에게 CSR 개선계획 수립을 요구하고, 개선상황에 대한 팔로우업를 실시하고 있다. ESG 경영에 대한 협력사의 이해와 대응을 돕기 위해 ESG 관련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CSR 평가 항목에 응답하는 노하우나 ESG 개선 계획 책정 방법에 대한 강의를 제공한다. 2. 혼다(HONDA) <혼다(HONDA)> [자료: 혼다 홈페이지] 1) 지속가능경영 추진 방향 글로벌 완성차 기업 혼다그룹은 전 세계에 존재하는 혼다 거래처와 함께 각각의 개발·제조 현장에서의 지속가능경영 추진을 통해 지역 사회와 공존·공영하는 글로벌 공급망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혼다의 지속가능경영 가이드라인을 전 세계 협력사에 배포하고 있으며 특히 구매 영역과 물류 영역에 초점을 두고 있다. 2) 공급망 내 협력사 ESG 관리 방침 혼다는 혼다와 거래하는 전 세계 협력사의 환경 부하 저감을 촉진하고 컴플라이언스 위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서플라이어 지속가능성(Supplier Sustainability) 가이드라인*(주4)’ 및 ‘그린 구매 가이드 라인*(주5)’을 배포해 준수를 권고하고 있다. 혼다는 신규 부품·원자재 조달처 선정 시에도 해당 가이드라인에 따라 QCDE*(주6), 인권, 노동, 안전,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정보보호 등에 대한 대응을 확인 후 최적의 공급업체를 결정하고 있다. *주: 4) Honda Supplier Sustainability Guidelines: https://global.honda/sustainability/cq_img/report/pdf/supply-chain/supplier-sustainability-guidelines.pdf 5) Honda Green Purchasing Guidelines: https://www.honda.co.jp/environment/report/pdf/report/green-purchasing-guidelines-2018-en.pdf 6) QCDE: Quality(품질), Cost(비용), Delivery(조달), Development(개발), Environment(환경)의 약어. 혼다는 탄소 배출 삭감, 컴플라이언스 대응, 리스크 관리 등 다양한 구매(조달)·물류상의 현안에 대응하기 세계 6개 지역(일본, 북미, 남미, 유럽, 아시아·대양주, 중국) 생산거점의 현지 조달 기능을 강화하고, 구매/물류 관리 체제 일원화를 추진한다. 구매/물류 프로세스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삭감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현지 생산·현지 소비를 촉진하는 한편, 물류 오퍼레이션에 관한 국제 조약이나 법규 정보를 일원화해 관리한다. 2014년부터는 글로벌 협력사의 탄소 배출 데이터를 일원화해 관리하는 CO2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탄소 저감 목표(월 1% 삭감)를 부여하고 달성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2021년 기준 혼다의 글로벌 조달규모 전체의 80%를 차지하는 약 1800개사가 해당 시스템을 도입 중이다. 이외에도 혼다는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해 수출 부품의 포장자재 경량화와 리사이클, 저탄소 운송수단(철도, 선박 등)의 이용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3) 협력사 ESG 평가·관리 방식 혼다의 글로벌 조달액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협력사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ESG 조사를 서면*(주7)으로 실시한다. 조사 결과 ESG관련 문제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문제 발생 시 자사에 미칠 영향이 큰 고위험 공급업체를 선정해 청문회를 시행한다. 청문회에서는 고위험 공급업체의 'EGS 관련 장표·생산공정·시설의 확인', '개선계획·실적보고서에 의한 진척 확인', '팔로우업 조사(필요시 현지 실사 추진)' 등을 수행한다. 글로벌 협력사가 혼다에서 요구하는 ESG 경영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협력사로부터 해당 내용을 즉시 보고받아 기준 미달의 원인 분석하고, 개선 계획 제출을 요청해 재발 방지를 도모한다. 협력사가 제출한 개선 계획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향후 해당 협력사와의 거래 지속 여부에 대해 다시 검토한다. *주: 7) 서면조사항목: 국제표준에 근거한 체크시트(인권, 노동, 환경, 법령 등) 평가, 혼다의 지속가능경영 가이드라인 준수 현황, ESG 개선 추진 현황 파악 3. 소니(SONY) <소니(SONY)> [자료: 소니 홈페이지] 1) 지속가능경영 추진 방향 기후위기 대응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RBA(책임 있는 비즈니스 연합)*(주8)의 설립 멤버이기도 한 소니그룹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책임’과 ‘공헌’ 두 가지 측면에서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우선 지난 ’22년 5월, 사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환경 부하 제로 달성 목표 연도를 기존의 2050년에서 2040년으로 10년 앞당겼다. 또한 소니그룹이 사용하는 전력을 재생 에너지 100%로 하는 달성 목표도 기존의 2040년에서 2030년으로 10년 앞당겼다. 소니의 지속가능경영 방침에 협력사가 동참할 수 있도록 서플라이어 행동규범을 제정해 협력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주: 8) RBA(Responsible Business Alliance·책임있는 비즈니스연합): 글로벌 공급망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전담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산업 연합체로, 현재 180여 개 글로벌 기업이 회원사로 활동 중 2) 공급망 내 협력사 ESG 관리 방침 소니그룹은 자사와 거래하는 협력사를 대상으로 ① 노동, ② 안전·위생, ③ 환경, ④ 윤리, ⑤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총 5가지 행동 규범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협력사와의 거래 계약서에도 포함시키고 있다. 신규 공급업체 선정 시에서도 소니의 서플라이 체인 행동 규범*(주9)을 준수하는지 평가해 최적의 협력사를 결정한다. 또한 협력사들이 적극적으로 ESG 경영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해 협력사와의 커뮤니케이션 강화에도 주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2021년 작년부터 협력사의 지속가능경영활동('소니의 서플라이 체인 행동 규범' 준수, 환경부하 저감 노력 등)을 가시화하고 일원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소니와 거래하는 모든 협력사를 대상으로 서플라이 체인 행동 규범의 주요 내용이 담긴 동영상을 일본어·영어·중국어로 발신하고 있다. 이 동영상은 SONY 사내 조달 관계자에게도 공유해 협력사와의 커뮤니케이션에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다. *주: 9) Sony Supply Chain Code of Conduct: https://www.sony.com/en/SonyInfo/csr_report/sourcing/Sony_Supply_Chain_CoC_E.pdf?j-short=en_SonyInfo_csr_report_sourcing_Sony_Supply_Chain_CoC_3.0_E.pdf <소니 서플라이 체인 행동 규범 5가지 항목> ① [노동] 고용 자유선택, 노동시간·임금법령 준수, 복리후생, 인도적 대우, 차별 폭력 배제 등 ② [안전·위생] 직무 상 안전 확보, 긴급 시 대비, 노동재해 방지, 산업 위생, 기계 안전대책 등 ③ [환경] 환경허가 및 보고, 오염방지 및 자원 절약, 유해물질관리, 온실가스 배출 저감 등 ④ [윤리] 기업 청렴도, 부당 이익 배제, 정보공개, 지적재산 보호, 신분보호 및 사생활 보호 등 ⑤ [매니지먼트 시스템] 기업 책무 이행, 법적요건 및 고객 요구사항 충족, 리스크 평가 및 관리 등 [자료: SONY ‘Sustainability Report 2022'] 3) 협력사 ESG 평가·관리 방식 소니그룹은 협력사의 서플라이 체인 행동 규범 준수 현황 파악을 위해 정기적으로 규범 준수 승낙서를 취득하고 평가·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소니그룹의 국내외 제조 사업소를 대상으로 ESG 경영 현황에 대한 셀프 체크를 연 1회 실시한다. 또, 소니 서플라이 체인 행동 규범에 명시된 5가지 항목(노동, 안전·위생, 환경, 윤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협력사의 소재 지역·국가나 규모, 업종 등의 요소에 따라 리스크 레벨을 구분해서 평가한다. 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제조 사업소(협력사)에 대해서는 개선책의 검토·실시를 요청하고 있다. 소니그룹의 ‘서플라이 체인 행동 규범’에 대한 중대한 위반사항(강제 노동, 아동 노동, 비인도적인 처우, 부당 차별, 긴급 재해 발생에 대한 대응계획 미비, 노동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인신사고를 즉시 일으킬 위험성의 존재, 심각한 환경오염 등)이 확인된 경우나 ESG 평가·감사 실시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협력사와의 거래 관계를 재검토하는 것을 기본방침으로 하고 있다. 4. 캐논(Canon) <캐논(Canon)> [자료: 캐논 글로벌 홈페이지] 1) 지속가능경영 추진 방향 전자제품·산업기기 제조 대기업 캐논은 뛰어난 ‘기술’과 ‘혁신’의 힘으로 ① 안심, ② 안전, ③ 쾌적, ④ 풍부한 생활과 지구 환경의 양립의 4가지 목표 달성을 위해 2021년 5월 캐논 서스테이너빌리티 추진 본부를 설립해 그룹 전체의 지속가능경영활동을 통괄·추진하고 있다. 2) 공급망 내 협력사 ESG 관리 방침 캐논은 기업 윤리 준수, 환경 보전 배려, 공정·공평한 거래 등을 자사 경영의 기본 방침으로 책정하고, 협력사에게도 지구환경·인권·사회를 배려하는 사업 활동을 권고하고 있다. 노동, 안전·위생, 환경, 윤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등에 대한 규범(캐논그룹 행동규범)*(주10)을 제정해 협력사에게 준수를 요청하고 있다. 이 행동규범에 따라 협력사와 신규 거래 시 사전에 ESG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거래기본계약서에 법령과 기업 윤리에 따라 상호간 공정하고 성실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명시하고 있다. *주: 10) Canon Supplier Code of Conduct: https://global.canon/en/procurement/pdf/coc-e.pdf 탄소중립 대책의 일환으로 캐논 협력사의 사업활동에 따른 환경오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리스크 관리도 한층 강화하고 있다. 우선 협력사에 대한 환경 관련 요구사항을 정리한 ‘그린 조달 기준서*(주11)’의 준수를 거래 필수조건으로 한다. 그린 조달 기준서에 근거해 유해화학물질 제거 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협력사에서 제품의 화학물질 관리체제가 적절하게 운용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만일 협력사가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즉시 시정 조치를 요구해 개선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또한 환경오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캐논의 1차 거래처뿐만 아니라 2차 거래처까지 리스크 관리 대상 범위를 확대해서 관리한다. *주: 11) Canon Green Procurement Standards: https://global.canon/ja/procurement/gp-docs/green-v14-en.pdf <그린 조달서에 근거한 거래 체결 필수조건> ① 사업 활동 환경관리시스템: 사업 활동 시 발생하는 환경부하를 저감하기 위한 구조 구축·운용 여부 ② 사업 활동 퍼포먼스: 환경관리시스템 구축·운용한 결과 법규제의 준수, 사용금지물질 미사용, 감소대상물질의 사용 감소 및 토양·지하수 오염방지 대책 실시 여부 ③ 물품의 환경관리시스템: 캐논에 납품하는 물품에 함유되는 화학물질을 파악·관리하기 위한 구조 구축·운용 여부 ④ 물품 퍼포먼스: 캐논에 납품하는 물품에 대한 사용금지물질 함유 여부 및 사용제한 물질의 유효기한 이후 함유 여부 [자료: 'CANON Sustainability Report 2022’] 3) 협력사 ESG 평가·관리 방식 캐논은 거래중인 글로벌 협력사에 대해 연 1회 ESG 추진 관련 정기 평가를 시행하고, 평가 결과가 좋은 공급업체와 우선적으로 거래를 진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캐논 서플라이어 행동 규범’에 근거해 ① 기업윤리(법령 준수, 제품 안전, 기밀 정보 관리, 인권, 노동, 안전 위생, 지적 재산권 보호 등), ② 지구 환경 보전(화학물질 관리, 대기오염이나 수질 오염의 방지, 폐기물의 적정 처리, 자원 절약 활동, 온실 가스의 삭감, 생물 다양성 보전), ③ 재무, ④ 생산 체질(품질, 비용, 납기, 제조 능력, 관리)등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지를 심사한다. 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협력사에 대해서는 개선책의 검토·실행를 요청한다. 캐논이 요구하는 ESG 관련 개선사항에 협조하지 않고 인권, 노동, 환경 등의 법령 등에 관한 규범을 준수하지 않는 협력사에 대해서는 거래 중단을 검토할 가능성도 있다. 시사점 최근 세계적으로 기업에 요구되는 사회적 책임의 범위가 점점 확대됨에 따라 ESG 경영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기업의 생존을 위한 필수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과거에는 사회적 영향력이 큰 글로벌 기업이나 대기업을 중심을 지속가능경영이 요구돼 왔으나 최근에는 글로벌기업과 거래하는 중소·중견기업에까지 ESG 대응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세계 각국의 글로벌기업은 자사 공급망 내 협력사의 ESG 경영 관리에 적극 나서고 있다. 협력사에 대해 ESG 경영을 거래 필수 조건으로 내거는 기업도 늘어나고 있으며, ESG 관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협력사와는 거래 중단을 검토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글로벌기업이나 대기업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중소·중견기업에 있어서도 ESG 리스크 대응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글로벌기업과 거래 중이거나 향후 거래를 희망하는 기업이라면 해당 기업의 협력사 ESG 관리 방침이나 공급망 이슈를 지속적으로 주시하며 동향 파악과 함께 자체적인 ESG 리스크 관리에 돌입할 필요가 있다. KOTRA는 국내 수출기업의 ESG 리스크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ESG 정보 활용지원센터’를 설치해 전방위적인 지원에 주력하고 있다. 글로벌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이라면 KOTRA의 'ESG 정보 활용지원센터'를 적극 활용해 ESG 리스크 대응은 물론, ESG를 신규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자료: NISSAN, HONDA, SONY, CANON 각 사의 지속가능경영 보고서(Sustainability Report 2022), 각 사 홈페이지 및 KOTRA 도쿄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도쿄무역관 김소정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10.25
-

-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위해 생산 거점 이동하는 일본기업
- 중국은 풍부한 노동력과 천연자원, 저렴한 인건비, 거대시장 등 생산자와 판매자 모두에게 매력적인 대상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중국에 집중된 글로벌 서플라이체인 리스크가 발생하면서 일본기업은 중국 내 생산 거점을 이동시키는 ‘탈중국’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있다. 중국 진출 일본 기업의 현황 <중국 진출 일본기업수> (단위: 개사) CLP0000564c3a10.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19pixel, 세로 275pixel" src="https://dream.kotra.or.kr/attach/namo/images/000306/20221018163325432_HGEKFI3E.jpg" style="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sans-serif !important; font-size: 18px !important; width: 518px;"> [자료: 제국데이터뱅크] 제국데이터뱅크 자료에 따르면, 중국(홍콩, 마카오 특별행정구 제외)에 진출한 일본기업은 2022년 6월 기준 1만2706사로 과거 10년간 중국 진출 일본기업 수가 가장 적게 나타났으며, 2020년의 1만3646사 대비 940사가 감소했다. 2020~22년 거점의 철수·소재 불명은 2176개 사, 도산 및 폐업이 116개 사로 누계 2292개 사가 중국에서 철수했다. (신규 진출은 1352개 사)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일본기업의 대중 진출 의욕은 높았으나, 코로나19를 계기로 중국 진출 일본기업 수 추이는 감소세이다. 중국 록다운으로 ‘부정적 영향이 있다’라고 답한 기업은 전체의 48.4% <기업 활동에 중국 정부가 제로코로나를 위해 시행한 록다운의 영향이 있었나요?> CLP00004b54000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96pixel, 세로 262pixel" src="https://dream.kotra.or.kr/attach/namo/images/000306/20221018163325603_00QLZ6S6.jpg" style="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sans-serif !important; font-size: 18px !important; width: 396px;"> [자료: 제국데이터뱅크] ‘기업 활동에 있어 중국 정부가 제로 코로나를 위해 시행한 록다운의 영향이 있었나요?’에 대한 앙케트 조사에서(제국데이터뱅크가 중국 진출 일본기업 1653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 ‘영향 없다’로 답한 기업은 33.8%, ‘부정적 영향이 있다’(‘ 이미 부정적 영향을 받았다(35.5%)’, 향후 부정적 영향을 받을 전망이 있다(12.9%)’ 포함) 라고 답한 기업은 전체의 48.4%였다. 중국의 록다운으로 이미 부정적 영향을 받거나 향후 받을 전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기업이 절반에 가까운 48.4%라는 점을 통해 중국 정부가 전면적으로 록다운을 해제하지 않는다면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의 정체와 혼란은 계속될 수도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생산 거점을 이동하는 일본기업 사례 코로나19 사태 이전까지 다수의 일본기업은 비용 경쟁력이 높은 중국에 생산 거점이나 부품 조달처를 집중시켜 왔다. 그러나 코로나19 발생 이후 중국에 진출했던 일본기업은 공급망 단절, 경제 안전보장 의식의 고조, 엔저를 통한 브랜드 가치 어필 등의 이유로 최근 중국에 있는 공장을 일본 및 다른 해외로 이전하며 국내 생산도 늘리고 있다. 1) 파나소닉 홀딩스(이하 파나소닉): 생산 거점 이관(중국⟶ 일본, 베트남) 파나소닉은 중국 상하이시의 도시 봉쇄로 인한 반도체 부족으로 일본 국내 가전 공급이 어려워지면서 2022년 4~6월 분기 영업이익이 약 200억 엔 감소했다. 이후 파나소닉은 중국에 집중된 생산공 장을 일본 및 아시아에 분산시키기로 결정했으며, 스틱 청소기 생산을 시가현의 공장으로 이관하고, 세탁기도 일본내에서 생산할 예정이다. 파나소닉은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생산 거점으로 일본과 베트남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발표했다. 2) 마츠다: 일본 생산 안정화 마츠다는 상하이 봉쇄와 반도체 부족으로 2022년 4~6월 분기 판매량이 전년동기 대비 34% 감소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마츠다는 일본 내 부품 생산을 확대해 일본 공장에서의 생산을 안정화할 계획이다. 부품 조달의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중국에서 부품을 조달하는 거래처 약 200사에 대해 일본 내 재고를 보유하도록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3) 야스카와 전기: 일본에 새로운 공장 건설 야스카와 전기는 2027년까지 가전 부품을 생산하는 신공장을 일본(후쿠오카)에 마련할 예정이다. 투자액은 500억~600억 엔으로, 일본 내 생산을 늘려 중국 의존도를 줄일 계획이다. 야스카와 전기는 일본 내에서 만드는 인버터용 주요 부품의 자체 생산 비율을 2027년까지 50%로 높이고, 산업용 로봇 부품의 자체 생산 비율도 2024년까지 2022년 기준 40%에서 70%까지 높일 예정이다. 4) 다이킨 공업 <다이킨 공업 시가현 생산 거점 모습> CLP00004b54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12pixel, 세로 392pixel" src="https://dream.kotra.or.kr/attach/namo/images/000306/20221018163325830_Y4WELFR3.jpg" style="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sans-serif !important; font-size: 18px !important; width: 409px;"> [자료: 닛케이신문] 다이킨 공업도 2010년 중반부터 부품 조달에 있어 중국 의존도가 높았으나, 상하이 봉쇄 영향으로 일부 제품의 생산이 감소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를 계기로 제품 공급 안정화를 위해 평상시에는 중국에서 부품을 조달하지만, 비상시에는 다른 지역에서도 조달할 수 있는 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다이킨 공업은 에어컨 부품의 국내 생산 확대뿐만 아니라 중국 이외의 나라에서 부품을 생산할 계획이다. ‘23년까지 유사시에도 중국산 부품 없이 에어컨을 생산할 수 있는 공급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미·중 대립, 경제안전보장에 의한 움직임 미국과 중국의 대립, 경제안전보장 차원에서도 생산거점을 옮기는 사례도 있다. 중국의 반도체 공급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키오시아 홀딩스(반도체, 메모리 제조)는 1조 엔 규모의 투자를 통해 일본 기타카미 공장에 새로운 제조 설비를 짓고 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 역시 경제안전보장 및 공급망 재편 측면에서 보조금으로 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일본 정부는 2022년 6월에 TSMC와 소니 그룹, 덴소가 일본 구마모토현에 건설하는 반도체 공장에 최대 4760억 엔을 보조하겠다고 발표했다. <건설 중인 일본 구마모토현 반도체 공장> CLP00004b54034b.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14pixel, 세로 345pixel" src="https://dream.kotra.or.kr/attach/namo/images/000306/20221018163325992_H0ED2ZRD.jpg" style="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sans-serif !important; font-size: 18px !important; width: 412px;"> [자료: 아사히신문] <일본 기업의 생산거점 이관 사례> 회사명 제품 이관 전 국가 이관 후 국가 비고 도시바기계 사출성형기 중국 일본, 태국 중국제품에 대해 미국 추가 관세가 적용됨에 따라 2018년 이관 미츠비시전기 공작 기계 중국 일본 제재 대상이 된 미국 수출용 공작기계의 생산을 중국에서 일본으로 이관 리코 복합기 중국 태국 미국이 관세 상향 대상을 모든 중국제품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미국용 주요 복합기 생산을 중국에서 태국으로 이관 계획 발표(‘19.5) 아이리스오야마 서큘레이터 일부 중국 한국 중국에서 미국으로의 수출이 어려워져 중국 국내 2공장에서 생산하는 송풍기를 2020년 일부 한국 생산으로 바꿔 리스크 분산 계획 발표 교세라 복합기 중국 베트남 미국의 대중국 제재 관세 발동 방침에 따라 미국 수출용 복합기 생산을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이관 계획 표명 샤프 차량용 액정디스플레이 중국 베트남 미국 수출용 차량용 액정디스플레이 베트남에서 생산 계획 변경 표명 [자료: 총무성] 일본 정부, 일본기업의 국내 생산 거점 마련에 대해 보조금 지급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일본 공급망의 취약성이 드러나면서 일본 정부는 생산 거점의 집중도가 높고 공급망이 단절될 리스크가 큰 제품(소재), 국민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중요한 제품(소재)을 취급하는 기업 중 국내에 생산 거점을 정비·마련하는 기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했다. <서플라이 체인 대책을 위한 국내 투자 촉진 사업비 보조금 안내> CLP00004b540004.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04pixel, 세로 475pixel" src="https://dream.kotra.or.kr/attach/namo/images/000306/20221018163326149_IYI3KWMO.jpg" style="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sans-serif !important; font-size: 18px !important; width: 404px;"> [자료: 경제산업성] 일본 정부의 사업비 보조금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3차에 걸쳐서 이루어졌는데, 자세한 모집 시기 및 보조금 지급 내역은 아래의 표와 같다. <서플라이 체인 대책: 국내 투자 촉진 사업비 보조금 모집시기 및 결과> 차수 시기 결과 1차 2020년 3월 22일~6월 5일 57건 채택, 약 996억 엔의 보조금 지급 결정 2차 2021년 3월 12일~5월 7일 151건 채택, 약 2,095억 엔의 보조금 지급 결정 3차 2022년 3월 1일~5월 6일, 2022년 5월 2~20일 (우크라이나 사태로 원재료 등의 안정공급대책 일환) 85건 채택, 약 974억 원 보조금 지급 결정 [자료: 경제산업성, KOTRA 오사카 무역관 자체 정리] 시사점 중국의 공급망 리스크를 줄이고,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해 자국으로 복귀하거나 중국 이외의 국가로 생산 거점을 이관하는 일본기업의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해외 진출한 일본기업이 일본으로 복귀하거나 일본 국내에 신규 공장을 건설하는 경우 기계, 철강 등 수요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우리 기업은 수요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또한, 일본기업이 일본 국내로 생산 거점을 이동할 경우 우리 기업과 거래하던 기존 일본업체의 제품 단가가 인상될 가능성에 대해 우리 기업은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자료원: 제국데이터뱅크, 총무성, 경제산업성, 닛케이신문, 아사히 신문, KOTRA 오사카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오사카무역관 고다연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10.25
-

- 미 재화수요 둔화를 반영한 해상운임의 하락
- 팬데믹 기간 중 치솟았던 해상운임 급락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급등했던 해상운임이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아직 팬데믹 이전보다 높은 수준이나 업계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우려, 엔데믹에 따른 소비 수요 전환 등의 요인으로 당분간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해상운임의 주요 벤치마크인 드류리 세계 컨테이너 운임지수(Drewry World Container Index, WCI)는 지난 9월 말 기준 3689달러로 32주 연속 떨어져 전년 동기 대비 64% 하락했다. 팬데믹이 한창인 시기 WCI가 1만 달러를 넘어섰던 것에 비하면 큰 폭의 하락이나 팬데믹 직전인 1420달러에 비해 여전히 160% 정도 높은 수준이다. 프레이토스 발틱 해상 운임지수(Freightos Baltic Index, FBX) 역시 크게 떨어졌다. 10월 14일 기준 아시아발 미 서부향 평균 운임은 2720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해 9월 대비 86.8% 하락했다. <2017~2022년 프레이토스 발틱 해상 운임지수> 주: 10월 14일 기준 [자료: fbx.freightos.com] 재화 수요 급감에 따른 물동량 감소 이처럼 해상운임이 크게 하락한 것은 재화 수요 위축에 따른 물동량 감소가 그 요인으로 지목된다. 미 소매연맹(NRF)이 최근 발간한 글로벌 포트 트래커(Global Port Tracker) 보고서의 저자이자 국제 무역 컨설팅 기업의 해켓 어소시에이트의 설립자인 벤 해켓은 지난 10월 22일 월스트릿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아시아를 중심으로한 미국의 수입 시장 성장이 그 동력을 점차 잃어가는 모습”이라며 “주요 운송업체들이 선적 처리 수용량을 축소시키는 것은 위축된 수요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NRF 보고서는 소매업체들이 연말 쇼핑 시즌을 준비하는 지난 8~9월에도 미국향 물동량이 큰 폭으로 줄었다고 지적하며 이 같은 사실은 공급망을 통해 수요가 감소하고 있음을 반영한 경고 신호라고 분석했다. 이 보고서는 올 하반기 미 주요 항만으로 들어오는 수입물량이 전년 동기 대비 4%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 상반기 5.5% 증가했던 것과 대조적이다. 공급망 소프트웨어 기업인 데카르트 시스템 그룹의 모기업인 데카르트 데이터마인 역시 10월 초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국향 물동량이 크게 줄었다고 명시한 바 있다. 9월 미국으로 수입된 컨테이너(20피트 기준) 물동량은 전년 동기 대비 11% 감소했으며, 전월과 비교해서는 12.4% 줄었다. 장난감, 가구, 전자제품 등을 포함한 중국발 화물은 8월 대비 18.3% 급감했다. 11월 연말 쇼핑 시즌을 앞두고 수입 컨테이너 물동량이 이처럼 급감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것이 업계 측의 설명이다. 미국 내륙 운송량 역시 감소했다. 미국철도협회(AAR)가 발표한 지난 9월 주간 평균 화물철도 운송량은 전년 동기 대비 4.8%, 전월 대비 5.4% 각각 줄었다. 트럭킹 산업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화물 운송 시장 컨설팅 기업인 FTR 트랜스포테이션 인텔리전스가 트럭커-화물 매칭 서비스를 제공하는 트럭스톱닷컴을 통해 지난 10월 17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서부지역 현물시장 거래가 2020년 5월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으며, 같은 시기 남동부 지역도 강세를 이어오던 거래량이 큰 폭으로 줄었다. 트럭 운임도 떨어졌다. 또 다른 트럭커-화물 매칭 서비스 기업인 DAT 솔루션은 지난 8~9월 사이 화물용 밴의 평균 요금이 지난 2015년 이후 처음으로 하락했다고 전했다. 미 경기 둔화와 소비 수요 전환 컨설팅 기업 A사의 미 소매시장 애널리스트는 “지난해 연말 쇼핑 시즌 공급망 제약으로 물량 공급에 차질을 빚었던 소매업체들이 올 상반기부터 연말 쇼핑 시즌을 준비하며 전체적인 주문이 분산된 경향이 있다”며 “그 사이 소비자들의 구매 수요가 재화에서 외식, 여행 등 서비스로 전환되면서 재화 소비 수요가 전년에 비해 크게 둔화됐다”고 설명했다. 많은 유통기업이 재고 적체와 이에 따른 비용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최근 미국의 경기침체 우려 확산을 비롯한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주문을 미루거나 기존의 주문을 취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2022년 항목별 개인 소비 지출 증감률> (단위: %, 전월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개인소비 지출 1.2 0.7 1.2 0.4 0.7 1.2 -0.2 0.4 재화 3.3 0.0 1.6 0.0 0.4 1.9 -0.7 -0.5 - 내구재 6.9 -1.3 -0.6 1.2 -1.3 1.1 0.3 0.1 - 비내구재 1.3 0.8 2.9 -0.7 1.3 2.3 -1.3 -0.8 서비스 0.1 1.1 1.1 0.6 0.8 0.9 0.1 0.8 [자료: Bureau of Economic Analysis]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공격적인 긴축 통화정책과 기록적인 물가상승률,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의 영향으로 이미 미국 경제 성장이 크게 둔화됐으며 미 경제가 내년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지난 10월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2023년 미국의 경기침체를 예고하며,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0.5%로 하향 조정했다. 지난 6월 피치가 전망한 내년 미국 GDP 성장률은 1.5%였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지난 10월 경제학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1년 내 미국의 경기침체를 예상한다고 답한 비중이 전체의 63%를 기록해 2020년 7월 이후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전망 및 시사점 수출기업에 큰 부담이 됐던 물류비는 운임 하락 등으로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고 항만 적체 문제도 상반기에 비해 완화됐다. 업계 관계자들은 당분간 운임은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연말 전자상거래 증가, 최근 수요 감소에 따른 운송 처리량 축소, 트럭 기사 부족현상 등으로 트럭킹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또 유통기업의 재고 적체에 따른 창고 부족 현상과 높은 창고 비용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수출기업들은 물류비 하락 요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경제 재개 이후 빠른 회복세를 보여온 미국 경제가 올들어 성장세가 크게 둔화됐다.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바이어들도 상황을 지켜보고 신중하게 구매를 결정하는 분위기다.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재량 소비가 크게 줄었고, 엔데믹 선언 이후 소비 수요도 서비스로 이동한 것 역시 상품의 대미 수출에 부정적 요인이다. 우리 기업은 미국 경제상황과 소비자 동향을 면밀하게 살피고, 적절한 전략 수립을 해야할 때다. 자료: Wall Street Journal, Washington Post, CNBC, Bureau of Economic Analysis, National Retail Federation, Freightos, Drewry 및 KOTRA 뉴욕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뉴욕무역관 김동그라미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10.24
-

- 미 재무부, 주류 라벨 정보 표기 강화 추진 중
- 미국에 시판되는 주류의 라벨링을 관리∙감독하는 미 재무부가 와인, 맥주, 증류주에 새로운 라벨링 규정 적용 방안을 고려 중이며 조만간 새로운 개정안이 발표될 것이라고 월스트릿저널(WSJ)이 지난 10월 6일 보도했다. 미국 내에서 소비자 건강 보호와 건강 증진을 위해 주류 라벨링 규정 개정 필요성은 지난 20년 가까이 제기되어 왔다. 미 소비자 단체들 “주류 칼로리와 성분 공개 의무화하라” 정부 압박 미 연방 재무부 산하 주류담배세금무역국(Alcohol and Tobacco Tax and Trade Bureau, TTB)은 지난 6월 알코올 라벨링 규정 변경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맥주, 와인, 증류주를 대상으로 기존 라벨링 규제에서 요구하는 정보 외에 주조 성분, 칼로리 등 더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표기하도록 규정을 강화할 방침이다. WSJ은 주류 산업 관계자를 인용, 새로운 개정안이 이르면 올해 말 또는 늦어도 2023년 초에는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주류의 라벨링 규정 강화는 미 소비자 단체들이 지난 수십 년간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내용이다. 최근 미 소비자연맹(Consumer Federation of America)을 포함한 소비자 단체 연합은 재무부를 상대로 지난 2003년 제출한 주류 라벨링 규정 개정에 대한 청원서에 응답할 것을 요구하며 워싱턴DC 연방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전문가들은 주류의 1회 제공량당 칼로리와 알코올 함유량 등을 명기하는 것이 소비자가 음주량을 조절하고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있다. 지난 2월 재무부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TTB가 요구하고 있는 주류 라벨링 규정은 지난 1935년 이후 큰 개정이 없었다. 알코올 섭취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 문구 삽입과 대법원 판결에 따라 맥주 제조사가 원할 경우 알코올 함량을 추가 기재하도록 한 정도다. <소비자 단체에서 제시한 맥주, 와인, 증류주 영양 성분표 라벨 예시> 라벨 예시 포함 내용 - 성분표 기준 1회 제공량 - 1회 제공량 당 칼로리와 알코올 함량 비율 - 미 식생활 지침에 따른 성별 적정 음주량 제안 - 주조 성분 [자료: Center For Science In The Public Interest] 현재 와인과 증류주는 브랜드 이름, 알코올 함량, 숙성기간, 원산지(수입산만 표기), 색소(함유 여부에 따른 정보 공개) 등을 라벨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맥주는 주정부의 방침에 따라 알코올 함량 여부를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1회 제공량당 칼로리나 알코올 함량 비율, 성분 등은 표기 의무가 없다. 다만, 알코올 함량이 14% 이상인 주류와 7% 이상인 증류주와 와인은 의무적으로 라벨에 도수(alcohol by volume, ABV)를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수입산 와인 라벨 샘플> [자료: ttb.gov] <증류주 라벨 샘플> [자료: ttb.gov] 현지 기업 반응 맥주와 와인, 증류주 기업들은 제품 라벨을 통해 자발적으로 필요한 정보들을 공개하고 있다며 재무부의 라벨링 규정 개정 추진에 우려를 표했다. 미국 맥주 산업 협회인 더 비어 인스티튜트(The Beer Institute)는 몰슨 쿠어스 비버리지(Molson Coors Beverage Co.), 하이네켄(Heineken) USA 등 회원사 맥주의 95%가 지난 2016년부터 칼로리, 맥주 구성성분과 영양정보 등을 라벨에 표기하고 있다. 와인 제조사들은 소비자에게 추가적인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하면서도 라벨링 규정 변경에 난색을 표했다. 미국 와인 산업 협회인 와인아메리카(WineAmerica)의 마이클 카이저 부회장은 소규모 와이너리의 비용 문제나 와인병 라벨의 심미적인 부분을 해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나타냈다. 또 각 와인의 새로운 빈티지마다 정확한 칼로리를 측정하는 것 역시 업계의 새로운 과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 증류주 협의회는 주요 증류제 제조업체들이 자발적으로 1회 제공량과 칼로리, 영양정보 등을 라벨에 직접 표기하거나 추가 정보를 라벨 바코드를 통해 제공하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다. 또 증류주의 주조 성분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업계에 가이던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미 증류주 협의회의 아만다 버거 과학∙건강 분야 부회장은 증류주 제조 특성상 증류 과정에서 첨가되는 성분이 달라질 수 있어 원활한 정보 공개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들어 무알코올∙저알코올과 저칼로리 술이 크게 유행하면서 실제로 많은 주류 제조 업체들이 제품 용기에 별도로 칼로리와 알코올 함량을 표기하고 있는 추세다. 저칼로리 맥주의 경우 저칼로리 입증을 위해 영양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하는 규정이 적용된다.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무알코올∙저알코올과 저칼로리 주류 제품> 제품명 사진 제품 설명 Heineken Non-Alcoholic 0.0 - 하이네켄 맥주맛을 구현한 무알코올 맥주 - 하이네켄의 고유한 Heineken A-yeast®로 제조 - 한 병당 79칼로리, 설탕 함량은 1.3g Ritual Zero Proof - 무알콜, 저칼로리 증류주 대체제 - 데킬라, 진, 위스키, 럼 대체제를 판매하며, 칵테일 레시피를 함께 제공 - 1회 제공량과 그에 따른 영양성분과 칼로리 정보를 라벨로 제작해 공개 Bev - 저칼로리 캔 와인으로 종류에 따라 한 캔당 72~112칼로리 - 알코올 도수는 5~12.9% ABV - 무설탕, 저탄수화물(탄수화물 함량 1~3g) [자료: 각 사 홈페이지] 전망 및 시사점 주류 업계를 대상으로 소비자의 알 권리를 요구하는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직접 소비하는 주류 제품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기 원하는 소비자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맥주, 와인, 증류주를 대상으로 한 규제 강화 압박도 지속되고 있어 조만간 재무부가 제품에 대해 좀 더 상세한 정보를 요구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한류 콘텐츠가 미국에서 큰 인기를 끌면서 소주, 막걸리 등 한국 술에 대한 미국 소비자들의 관심도도 매우 높아졌고 미국 내 한국 술 수요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우리 기업들은 미 당국의 주류 제품 라벨링 규정 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추가적인 제품 정보 공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다. 또 이와 별도로 최근 건강한 음주 문화 확산 변화를 감지하고 무알코올∙저알코올, 저칼로리 제품 개발에도 주력해 미국 시장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자료: Wall Street Journal, Center For Science In The Public Interest, Alcohol and Tobacco Tax and Trade Bureau, Sial America 및 KOTRA 뉴욕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뉴욕무역관 김동그라미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1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