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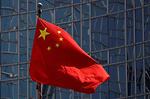
- 2022년 하반기 중국 경제 전망
- - 하반기 중국 경제의 최대 변수는 ‘코로나19 재확산’ - 부동산 경기침체 지속, 소비회복세 미진으로 경기하방 압력 가중 - 중국 정부, 인프라 투자 확대·수출 경쟁력 강화 통해 경기하방 방어 예상 7월 경제지표 2022년 2분기 중국 경제는 코로나 여파로 ‘0%’대의 성장률(0.4%)을 보였지만 6월 주요 경제지표가 본격적으로 회복되면서 하반기 반등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다. 그러나 7월 경제지표가 예상보다 부진한 수준에 머물며 중국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봉쇄 완화로 생산 정상화에 가속도가 붙고 있지만 7월 산업생산 증가율은 6월 대비 0.1%p 하락했다. 제조업 경기 동향을 가늠하는 지표인 구매관리자지수(PMI)는 한 달 만에 기준선 50을 밑돌며 위축 국면에 진입했다. 자동차 소매판매가 한 자릿수(6월 13.9%→7월 7.9%)로 줄어들면서 전반 소매판매 증가율이 6월 대비 소폭 둔화한 가운데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식품·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7월 중국 부동산 투자 감소폭이 두 자릿수*로 확대되면서 전반 투자 (누계) 증가율은 5%대로 가라앉았다. 주*: 7월 분야별 투자 증가율(%): 인프라 11.5, 제조업 7.5, 부동산 △12.3 <2021~2022년 중국 주요 경제지표> (단위: %) 구분 2021년 2022년 연간 (*전망) 10월 11월 12월 연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GDP 증가율(분기별) 4.0 8.1 4.8 0.4 4.2 생산 산업생산증가율 3.5 3.8 4.3 9.6 7.5 5.0 △2.9 0.7 3.9 3.8 4.3 구매관리자지수(PMI) 49.2 50.1 50.3 - 50.1 50.2 49.5 47.4 49.6 50.2 49.0 - 생산자물가지수(PPI) 13.5 12.9 10.3 8.1 9.1 8.8 8.3 8.0 6.4 6.1 4.2 5.2 소비 소매판매 증가율 4.9 3.9 1.7 12.5 6.7 △3.5 △11.1 △6.7 3.1 2.7 3.9 소비자물가지수(CPI) 1.5 2.3 1.5 0.9 0.9 0.9 1.5 2.1 2.1 2.5 2.7 2.3 투자 고정자산투(누계) 6.1 5.2 4.9 4.9 12.2 9.3 6.8 6.2 6.1 5.7 5.3 고용 실업률 4.9 5.0 5.1 5.1 5.3 5.5 5.8 6.1 5.9 5.5 5.4 5.5 무역 수출 증가율 26.8 21.7 20.8 29.9 24.0 6.1 14.4 3.6 16.4 17.7 18.0 10.4 수입 증가율 20.1 31.4 19.7 30.1 20.9 11.5 0.5 0.1 4.0 1.0 2.3 5.1 [자료: 국가통계국, 해관총서, wind, CITIC SECURITIES, 웨이카이(粤開)증권연구원 등] 하반기 전망 전망 1. 코로나 사태가 통제될 경우 연간 4%대 성상 실현 전망 올 3월 양회에서 중국 정부가 설정한 연간 ‘5.5% 내외’의 목표치는 실현하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2022년 상반기 중국 경제 성장률은 2.5%로 목표치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고용 및 소비회복이 지연되고 있으나 중국 정부가 경기부양 강도를 높이고 있으며 외수 회복세로 수출이 견조하기 때문에 3분기 ‘5%’, 4분기 ‘6%’로, 연간 4%대의 경제성장률을 실현할 수는 있다는 데 무게가 실린다. 단, ‘코로나 사태가 통제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올 2분기와 같은 코로나19 대규모 재확산 및 동시다발적인 셧다운이 재연된다면 경기둔화는 한층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중국 경제성장률 추이> [자료: 국가통계국, wind, 신다(信達)증권연구센터] 전망2. 경기하방 압력을 가중시키는 마이너스 요인:부동산과 소비 <중국 경제를 견인하는 삼두마차> 경제성장률 소비 투자 부동산 제조업 인프라 수출 2019 6.0% 8.0% 5.4% 9.9% 3.1% 3.3% 0.5% 2020 2.2% △3.9% 2.9% 7.0% △2.2% 3.4% 3.6% 2021(2년 복합) 5.1% 4.0% 3.9% 5.7% 5.4% 1.8% 16.0% 2022.1~7. 2.5%(1~6월) △0.2% 5.7% △5.2% 9.9% 9.6% 14.6% [자료: wind, 웨이카이(粤開)증권연구원] 부동산 경기침체와 소비회복세 미진은 중국 경기하방 압력을 가중시키는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소비는 중국 경제를 견인하는 삼두마차 중 경제성장 기여도가 가장 높은 지표*이다. 그러나 7월까지 중국 소비(소매판매)는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경기둔화 및 고용에 대한 불안감으로 소비심리가 약화되며 위축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주*: 2021년 중국 경제성장 기여도: 최종소비지출 65.4%, 자본형성(투자) 13.7%, 순수출 20.9% 2022년 상반기 코로나19 대규모 재확산, 주요 도시 봉쇄로 중국경제 전반이 충격을 받으며 고용이 크게 악화했다. 2022년 2분기 중국인민은행이 도시 예금자 대상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45.6%의 응답자가 ‘취업 어렵다’ 또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데 반해 ‘취업환경이 좋다’고 응답한 비중은 10.1%에 그쳤다. 2분기 중국 취업체감지수는 1분기 대비 6.9%p 하락한 35.6%로 나타났다. 5월 중국 31개 대도시 조사실업률은 6.9%로 2018년 1월 해당 지표 발표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7월 5.6%로 낮아졌지만 전년 동기보다 높은 수준이다. 코로나19 여파로 기업들의 신규 고용 여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졸업시즌을 맞아 대졸·고졸 인력이 대거 쏟아져 나오며 7월 중국 16~24세 청년 실업률은 6월 대비 0.6%p 상승한 19.9%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중국 31개 대도시 조사실업률> [자료: 국가통계국] 고용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중국인들은 소비와 개인투자를 줄이는 대신 저축을 늘리고 있다. 중국인민은행의 설문조사에 참여한 베이징지역 도시 예금자 중 57.6%가 ‘저축을 늘릴 예정’이라고 답했다. 코로나19 첫 발발로 중국경제가 사상 최초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2020년 1분기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치이다. ‘소비’를 선택한 응답자 비중은 26.8%로 작년 동 기간 30%를 웃돌던 상황과 대조적이다.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면서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고용악화, 소비심리 위축으로 개선세는 완만할 것으로 전망된다. <베이징 도시 예금자 대상 자산운용 계획 설문조사 결과> [자료: 중국인민은행] 중국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면서 작년 하반기부터 부동산 투자 둔화세가 뚜렷해졌다. 2022년 4월부터 중국 부동산 투자 증가율은 마이너스 구간으로 들어섰으며 7월까지 감소폭은 확대되는 양상이다. 중국이 부동산 경기 안정화 조치를 선언하며 부동산 할인 판매, 대출 규제 완화 등의 정책을 연이어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도 부동산 시장 냉각 분위기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중국 부동산 투자(누계) 증감률> [자료: 국가통계국] 전망3. 제조업·인프라 투자와 수출이 중국 경기하방을 방어 하반기 제조업 투자, 인프라 투자와 수출이 중국 경기하방을 방어할 것으로 점쳐진다. 주요국의 경기 후퇴 우려 속에서도 중국 수출은 코로나 봉쇄가 완화된 5월부터 석달째 플러스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7월 누계 중국 수출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14.6% 증가했다.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상하이 봉쇄 완화에 따른 수출 반등 효과가 종료되면서 하반기 수출은 점차 둔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러-우 사태로 유럽의 알루미늄 등 품목의 수입선이 중국으로 전환, △중국 리튬이온배터리, 자동차 등 품목의 수출 호조, △미국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대중 추가관세 인하 가능성 등이 중국 수출증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중국 품목별 당월 수출 증감률> [자료: 해관총서] 산업고도화, 탄소중립화, 중국정부의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하반기 제조업과 인프라 투자가 견조세를 유지하며 중국 부동산 경기침체에 의한 투자 둔화를 방어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내 코로나19 대규모 재확산이 시작되던 3월부터 제조업과 인프라 투자 증가율은 중국 전반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을 웃돌고 있다. 특히 둔화세를 보이는 제조업 투자와 달리 인프라 투자는 완만한 상승세를 타고 있다. <중국 고정자산투자 (누계)증감률> [자료: 국가통계국] 7월 28일 시진핑 주석이 주최한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회의에서 ‘지방정부 전문채권 등 정책적 도구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것’을 지시했다. 시장은 정부 주도의 인프라 투자가 하반기 본격화되면서 중국 경제 회복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한다. 지방정부 전문채권 발행은 올 2분기부터 본격화됐다. 시진핑 주석이 4월 중앙재경위 회의에서 ‘인프라 건설을 강화하기 위한 전면적 노력’을 촉구하면서 5월 신규 발행액은 급증했다. 5월 말 채권 신규 발행량은 한도액 (3조6500억 위안)의 절반을 초과했다. 코로나 첫 발발로 직격타를 맞았던 2020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6월 코로나 봉쇄 완화로 생산경영 활동이 정상화되면서 누계 발행액은 3조4000억 위안을 넘어섰다. 7월 말 기준 발행규모는 한도액의 95%에 달했다. <지방정부 전문채권 신규 발행 진도> [자료: 중국 재정부] 전문가들은 정부의 추가 특별채권 발행 여력을 주목하고 있다. 2022년 중국의 지방정부 전문채권 발행한도는 21조8000억 위안, 사용한 규모는 20조2600억 위안으로 아직 1조5000억 위안을 추가 발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은 당국이 1조5000억 위안 전액을 추가 발행하지 않더라도 재정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에서 재정 확장책을 통해 투자 증가율을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한다. 중국 하반기 경제 운용 방향 및 시사점 올가을로 예정된 중국 20차 당대회를 앞두고 중국 정부는 ‘안정’에 사활을 걸고 있다. 중국 경기하방 압력이 가중되면서 당국은 경기부양을 위해 실물경제의 지원 강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적극적으로 운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을 확정하는 7월 말 당 정치국회의에서 “거시경제정책을 통해 내수를 확대하고 사회적 수요 부족은 재정·통화정책으로 메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정부 전문채권의 발행 한도 도달 등으로 인해 상반기에 비해 정책여력이 다소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인프라·제조업 투자를 늘리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 도구를 총동원할 것으로 점쳐진다. 실제로 8월 22일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1년 만기 대출우대금리(LPR)를 기존의 3.7%에서 3.65%로 0.05%p 인하하고 5년 만기 LPR은 4.45%에서 4.3%로 0.15%p 낮췄다. 1년 만기 LPR 인하는 올해 1월 이후 7개월만, 5년 만기 LPR 인하는 5월 이후 석 달 만이다. 중국 부동산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코로나 여파로 경기둔화가 심화되면서 중국 정부가 경기부양 강도를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중앙정치국회의(2022년 7월) 주요 내용> 분야 주요 내용 현황 - 경기둔화 심화, ‘5.5% 내외’의 목표 달성 난망 정책 기조 - ‘안정 속 성장’(온중구진)의 경제정책 기조는 변함 없음. - 경기둔화 최대한 방어 방역 - 강도 높은 방역 통제(제로코로나) 견지 재정·통화정책 - 실물경제에 대한 지원 강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적극 운용 내수진작 - 거시경제정책을 통해 내수 확대 탄소중립 - 에너지 자원의 공급력을 확보하면서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투자 확대 산업정책 - 산업망·공급망의 안정성, 원활한 물류운송을 보장 수출입 - 수출입 확대하고 기술 수입과 외자 유치를 안정적으로 촉진 [자료: KOTRA 베이징 무역관] 시장은 이번 중앙정치국회의에서 ‘소비진작’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을 주목한다. 산발적 코로나 확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제로코로나’ 정책을 견지하기로 한 상황에서 소비쿠폰 발행 등 기존의 소비진작책으로는 소비를 끌어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중국사회과학원의 연구원 A씨는 KOTRA 베이징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소매판매 증가율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자동차 소비진작책, 예컨대 차량 구매세 혜택 연장 등 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 기업들은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책과 내수 회복세를 예의주시해야 한다. 6월 봉쇄 완화 이후 생산·경제활동 정상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지만 회복세에는 분화가 생기고 있다. 한중 산업망 연결이 긴밀한 전기전자와 자동차 산업을 예로 들면, 중국 전기차 시장 호황에 중국 정부의 소비진작책까지 더해져 중국의 신에너지차 및 관련 품목의 시장수요는 계속하여 가파른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소비심리 위축으로 스마트폰 시장은 저조한 실적을 이어가고 있다. · 신에너지차 당월 판매 증감률: 4월 44.9% → 5월 105.7% → 6월 133.2% · 스마트폰 당월 출하 증감률: 4월 △40.4% → 5월 △9.1% → 6월 9.1% 한편 중국 서남부 지역 전력난 및 이에 따른 관련 품목 가격 급등·공급망 불안정 등 불안 요소가 산재해 있는바 우리 기업들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 자료: 자오상(招商)증권, CITIC SECURITIES(中信證券), 웨이카이(粤開)증권연구원 등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베이징무역관 김성애 | 중국 | 2022.08.29
-

- 통계수치로 보는 홍콩 물류 산업 동향
- 홍콩 물류 산업 규모 홍콩의 무역 및 물류 산업은 4대 핵심산업(금융, 무역·물류, 관광, 전문서비스) 중 하나로써 2020년 무역·물류산업의 부가가치는 5,082억 홍콩달러(약 658억 2,900만 미 달러)를 기록했으며, 전체 GDP의 19.8%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물류산업은 2020년 기준 828억 홍콩달러(약 107억 2,500만 미 달러)의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GDP의 3.2%를 기록했으며, 총 175,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홍콩 항구 개황 홍콩 항구는 세계에서 가장 바쁘고 효율적인 국제 컨테이너 항구 중 한 곳으로 전 세계 600여 개 목적지와 연결되어 있다. 2021년 기준, 홍콩은 세계 10대 항만 중 9위를 차지했으며, 컨테이너 물동량은 약 1,800만 TEU로 집계됐다. <2021년 세계 10대 항만 순위> (단위: 천 TEU) 2021년 순위 (2020년 순위) 항만 물동량 1(1) 상하이 47,033 2(2) 싱가포르 37,468 3(3) 닝보-저우산 31,079 4(4) 선전 28,768 5(5) 광저우 24,467 6(6) 칭다오 23,714 7(7) 부산 22,706 8(8) 톈진 20,269 9(9) 홍콩 17,798 10(10) 로테르담 15,300 [자료: 홍콩 해운항구국(Hong Kong Maritime and Port Board)] 홍콩 항구는 작업 구역별로 콰이칭 컨테이너 터미널(Kwai Tsing Container Terminals), 미드 스트림 사이트(Mid-Stream Sites), 툰문 리버 트레이드 터미널(Tuen Mun River-Trade Terminals)로 구분된다. 콰이충과 칭이섬(Kwai Chung-Tsing Yi)사이에 위치해 있는 콰이칭 컨테이너 터미널은 5개의 민간 기업(Asia Container Terminals, COSCO-HIT, Goodman DP World, HIT, Modern Terminals)이 운영하는 9개의 터미널로 구성된다. 면적은 279헥타르로 총 24개의 정박지가 있다. 홍콩의 미드 스트림 사이트들은 총 면적이 33헥타르로 바지선과 컨테이너 트럭·화물차 사이의 화물 하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툰문(Tuen Mun)에 위치해 있는 툰문 리버 트레이드 터미널은 홍콩과 주강 삼각주*(Pearl River Delta)를 오가는 컨테이너와 벌크 화물을 재편하고 통합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면적은 65헥타르로 비교적으로 작다. *주: 중국 남부(광저우시, 선전시, 홍콩, 마카오)를 흐르는 강 홍콩 해운항구국(Hong Kong Maritime and Port Board)에 따르면, 대부분의 컨테이너(약 81.6%)는 9개의 터미널로 구성된 콰이칭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처리되며 나머지 컨테이너는 미드 스트림 사이트와 툰문 리버 트레이드 터미널(약 18.4%)에서 처리된다. <작업 구역별 홍콩 컨테이너 처리량 비율> 2022년 Kwai Tsing Container Terminals Mid-Stream and Other Berths 총계 해운 (Seaborne) 강운 (River) 전체 해운 (Seaborne) 강운 (River) 전체 1월 77.9% 8.0% 85.9% 3.5% 10.5% 14.1% 100% 2월 78.1% 8.2% 86.3% 2.9% 10.8% 13.7% 100% 3월 66.4% 12.3% 78.7% 3.5% 17.9% 21.3% 100% 4월 61.1% 14.5% 75.5% 3.9% 20.6% 24.5% 100% [자료: 홍콩 해운항구국] 홍콩 항만 물류 동향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 2022년 1~4월 홍콩의 항만 화물 물동량 누계는 6,000만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 감소했다. <2022년 1~4월 홍콩 항만 화물 물동량> (단위 : 천 TEU, 전년 동기 대비 %) 2022년 항만 화물 물동량 1월 13,766(-25.3) 2월 11,804(+4.5) 3월 16,836(-13.4) 4월 17,886(-3.5) 누계 60,292(-11) [자료: 홍콩 해운항구국] 2022년 1월 항만 물동량이 감소한 만큼 홍콩의 컨테이너 처리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6% 급감한 122만 TEU를 기록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세가 점차 줄어들면서 4월 컨테이너 처리량은 전년 대비 6.5% 증가하며 다소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1~4월 홍콩 컨테이너 처리량> (단위: 천 TEU, 전년 동기 대비 %) 2022년 내항 컨테이너 처리량 외항 컨테이너 처리량 총 컨테이너 처리량 1월 634(-20.7) 587(-20.4) 1,221(-20.6) 2월 550(+6.1) 501(-0.05) 1,051(+3.1) 3월 778(-5.5) 656(-10.7) 1,434(-7.9) 4월 843(+5.3) 773(+8) 1,616(+6.5) [자료: 홍콩 해운항구국] 홍콩 공항 물류 동향 세계적으로 유명한 홍콩 국제공항은 2021년 기준 미국의 멤피스(Memphis) 공항을 앞지르고 세계 최대의 화물 물동량 처리로 1위를 차지했다. <화물처리 물동량 세계 10대 공항 순위> (단위: Metric Tonnes, 전년 동기 대비 %) 2021년 순위 (2020년 순위) 공항 물동량 1(2) 홍콩 5,025,495(+12.5) 2(1) 멤피스 4,480,465(-2.9) 3(3) 상하이 3,982,616(+8.0) 4(4) 앵커리지 3,555,160(+12.6) 5(6) 인천 3,329,292(+18.0) 6(5) 루이빌 3,052,269(+4.6) 7(7) 타이페이 2,812,065(+20.0) 8(8) 로스앤젤레스 2,691,830(+20.7) 9(11) 도쿄 2,644,074(+31.1) 10(9) 도하 2,620,095(+20.5) [자료: Airports Council International] 2021년 오미크론 변종이 나타나 비행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화물수요는 증가했다. 홍콩 국제공항에 따르면, 화물 처리량이 증가한 것은 환적량이 전년 대비 증가한 데 따른 것이며 북미, 유럽, 동남아시아를 오가는 전체 화물도 증가했다고 밝혔다. 2022년에는 홍콩 내 코로나19 제 5차 확산으로 인해 홍콩으로 오가는 항공운송이 지연되면서 1~6월 홍콩의 항공 화물 물동량 누계가 210만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8% 감소했다. 글로벌 물류기업 DHL에서 발표한 'DHL 홍콩 항공운송 물류 지수(DHL Hong Kong Air Trade Leading Index)'에 따르면, 2022년 3분기부터 홍콩의 항공운송 산업은 내수회복에 힘입어 호조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국제 연료가격 상승 지속에 따른 항공 화물 운임의 변동성이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년 3분기 DHL 홍콩 항공운송 물류 지수> [자료: DHL, 홍콩 생산력촉진국(Hong Kong Productivity Council)] 홍콩 수출입 실적 대비 운송수단별 대외상품 거래량 2022년 2월 이후 육로를 제외한 항공, 해운, 강운을 통한 수입 상품 거래량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다. 2월 당시 현지 물류회사에 따르면 선전과 홍콩 접경지대를 오가는 화물차 기사들의 확진 및 밀접 접촉자 격리로 전체 기사의 약 10%만 운행이 가능한 상태라고 하였다.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중국–홍콩 국경 간 운전자 인력 수급 차질과 트러킹 지연으로 육로를 통한 거래량이 지속 감소했으며 국경간 화물 운송을 해운 및 강운 운송으로 대체하였다. <2022년 홍콩 운송수단별 대외상품 거래량(수입)> (단위: 백만 홍콩달러, 전년 동기 대비 %) 2022년 항공 해운 육로 강운 기타* 전체 1월 209,027 (+6.9) 53,833 (-0.4) 182,724 (+16.8) 4,682 (-6.9) 2,636 (+21.6) 452,901 (+9.6) 2월 198,250 (+15.4) 43,598 (+15.3) 97,548 (-12.7) 4,504 (+68.3) 1,999 (+9.7) 345,898 (+6.2) 3월 252,287 (+16.0) 74,878 (+48.6) 67,284 (-58.2) 13,127 (+168.2) 2,453 (+4.4) 410,029 (-6.0) 4월 238,452 (+13.6) 79,282 (+61.0) 86,284 (-42.2) 18,870 (+230.8) 2,697 (+8.4) 425,585 (+2.1) 5월 237,959 (+15.4) 62,407 (+22.9) 104,988 (-32.1) 16,579 (+219.7) 2,881 (+17.5) 424,812 (+1.3) 6월 248,550 (+15.8) 58,058 (+30.1) 122,896 (-31.4) 16,608 (+190.6) 3,130 (+5.5) 449,241 (+0.5) *주: 기타는 직접 운반과 소포 우편을 포함 [자료: 홍콩통계청] 수출의 경우, 2022년 2~5월간 전체 수출 상품거래량은 전체 수입 상품 거래량보다 평균 9% 정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나며, 특히 6월에는 약 15% 하회한 것으로 보인다. <2022년 홍콩 운송수단별 대외상품 거래량(수출)> (단위: 백만 홍콩달러, 전년 동기 대비 %) 2022년 항공 해운 육로 강운 기타* 전체 1월 177,159 (+29.2) 59,929 (+14.1) 211,371 (+12.1) 10,688 (+13.2) 401 (+10.0) 459,549 (+18.4) 2월 127,291 (+12.0) 41,686 (-0.4) 135,587 (-9.2) 8,984 (+49.6) 243 (-18.6) 313,790 (+0.9) 3월 163,595 (+17.2) 68,069 (+47.3) 121,823 (-42.8) 18,953 (+88.6) 327 (-17.0) 372,767 (-8.9) 4월 167,999 (+25.4) 56,866 (+17.9) 146,667 (-23.5) 17,148 (+60.0) 323 (-5.0) 389,003 (+1.1) 5월 161,043 (+15.6) 50,992 (+9.4) 157,676 (-19.9) 18,072 (+69.2) 355 (+6.8) 388,137 (-1.4) 6월 150,477 (+5.3) 47,512 (+0.1) 168,255 (-18.1) 14,032 (+36.2) 432 (+10.6) 380,708 (-6.4) *주: 기타는 직접 운반과 소포 우편을 포함 [자료 : 홍콩통계청] 2022~23년도 홍콩 정부의 물류산업 육성 정책 홍콩 해운 항만국은 스마트 항만(Smart Port)*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전담팀을 구성했다. 스마트 항만 개발을 통해 항만 시스템이 디지털화되면 화물 처리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 항만의 자동화·지능화를 통하여 항만의 다양한 정보가 실시간 연계되고 물류 흐름이 최적화되는 항만 또한, 홍콩 해운 항만국은 더 많은 해양 운송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 해운업 관련 기업들에 세금 할인 혜택을 확대 제공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기존에 당국은 2020년부터 선박 임대업자와 선박 임대업 관리자의 적격 소득에 대한 비과세 및 50%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해상 보험 관련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홍콩의 항공 화물 운송 부문은 항공 노선 네트워크가 잘 구축되어 있고, 간단하고 빠른 통관 절차로 세계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향후 홍콩 정부는 대만구(Great Bay Area, GBA)와의 글로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각종 수송 기관을 통합할 계획이다. 홍콩 공항 당국(Airport Authority)은 중국 광둥성 중남부에 위치한 둥관에 홍콩 국제공항 상류 물류 단지(Upstream HKIA Logistics Park) 및 홍콩 국제공항에 해공 연계 통합 화물 터미널(Airside Intermodal Cargo Handling Facility)을 설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중국 본토에서 수출되는 상품이 사전 보안 검사를 마친 후 홍콩으로 원활하게 운송될 수 있으며 이후 추가 보안 심사를 거치지 않고 홍콩 국제항공망을 통해 모든 해외 행선지로 직송되어 양질의 편리한 운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홍콩 국제공항의 새로운 북활주로로 지정된 제3활주로(Three-Runway System)가 2022년 7월 8일에 공식 개장되어 운영되고 있다. 2011년부터 논의되어 2016년에 건설이 시작된 홍콩 국제공항의 제3활주로 프로젝트는 기존 공항 부지 북쪽에 제3활주로를 구축하고, 터미널2의 확장과 T2 탑승동 건설, 무빙워크 및 자동 수화물 처리 시스템 개발 등을 포함하고 있는 사업으로 전체 프로젝트는 2024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시사점 2022년 1분기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으로 홍콩-중국 간 육로 트러킹이 지연되고, 강화된 코로나19 검역 조치로 물류 대란의 우려가 있었다. 하반기에는 홍콩의 출입국 제한 완화 및 내수 시장 회복 전망 등에 따라 물류산업이 다시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국제 연료 가격 상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미∙중 갈등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우려됨에 따라 안정적인 산업 공급망 구축을 위한 기업과 정부의 협력이 중요한 시기이다. 무역 및 물류산업이 홍콩의 4대 중심 산업인 만큼 현지 정부는 해운업 관련 기업 대상 세금 감면, 항공 인프라 확충 등 다양한 물류산업 육성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중국 및 동남아 시장의 진출 거점으로 홍콩을 택하고 홍콩을 중계 무역항으로 활용하려는 한국 기업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 Airports Council International, DHL, 홍콩통계청, 홍콩 해운항구국(Hong Kong Maritime and Port Board), 홍콩 생산력 촉진국(Hong Kong Productivity Council), 홍콩 공항관리국(Airport Authority), KOTRA 홍콩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홍콩무역관 김경아 | 홍콩 | 2022.08.26
-

- 미국 물가 상승률에 대응하기 위한 판매세 면세 기간 연장 및 시사점
- 소비자 부담 해결을 위해 판매세 면제 프로그램 연장 지난 8월 16일 월스트리트저널은 2022년 인플레이션의 증가로 소비자들이 물가 상승에 따른 지출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주장 하면서, 미국 내 州 정부들이 소비 촉진을 위해서 ‘판매세 면세 기간’(Sale-Tax-Holiday)를 연장한다고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2022년 미국 내 소비자들이 ‘백투스쿨 세일’기간 동안 약 370억 달러의 소비를 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이는 유치원, 초, 중, 고등 취학 아동이 있는 가정의 평균 지출이 약 864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2022년 8월 기준 ‘백투스쿨 세일’기간 판매량 1 ~ 5위> 순위 사진 품목 할인율 1 도시락 및 식품 보관 12 ~ 30% 2 의류 20 ~ 50% 3 기술 제품 10 ~ 50% 4 기숙사 인테리어 20 ~ 40% 5 학용품 15 ~ 25% (자료: CNN Underscored) 작년 대비 지출 증가 예측에도 기사는 전미소매협회(National Retail Federation)의 7월 조사를 인용하면서, 7월 물가 상승률로 소비자들의 38%가 다가올 할인을 위해 지출을 줄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州 정부는 면세 기간을 연장하거나 일정 기간 판매세를 부과하지 않는 방식으로 소비자 부담 완화에 나섰다. 특히 50개 州 가운데 20개 州가 이번 면세 제도에 동참한 가운데, 플로리다와 코네티컷은 기간 연장을 결정했고, 일리노이와 뉴저지는 각각 판매세 감세와 완전 면세를 선언했다. <특정 6개 州 별 7 ~ 8월 판매세 면세 품목 및 기간> (단위: US 달러) 州 품목 면세액/비율 기간 메릴랜드 의류 및 신발 $100 8월 14일 ~ 20일 버지니아 의류, 학용품, 에너지 스타(Energy Star) 인증 제품, 허리케인 대비 제품, 발전기 의류 : $100 학용품 : $20 에너지 스타 인증 제품: $2,500 허리케인 대비 제품 : $60 발전기 : $1,000 8월 5일 ~ 7일 일리노이 전 품목, 의류 및 학용품 전 품목 판매세율 : 5%▼ 하향 의류 및 학용품 : $125 8월 5일 ~ 14일 뉴저지 학용품 및 컴퓨터 $3,000 8월 27일 ~ 9월 5일 코네티컷* 의류 및 신발 $100 4월 10일 ~ 16일 8월 21 ~ 27일 플로리다 학용품, 의류, 컴퓨터 학용품 : $50 의류 : $100 컴퓨터 : $1,500 7월 25일 ~ 8월 7일 * 코네티컷의 경우 4월 10일 ~ 16일 1차 시행 이후 8월 21 ~ 27일 까지 2차 시행 주: 플로리다의 경우 1 ~2년간 학용품, 의류, 컴퓨터를 제외한 다양한 제품에 대한 면세 혜택 제공 (자료 : Federation of Tax Administration) 작년에 이은 소비 지출 증가가 예상되지만 물가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의 부담도 증가 2021년 세일 동안 미국 내 유치원, 초,중,고 학생들이 있는 가구는 평균적으로 296달러를 지출했고, 대학생들은 가구당 360달러의 지출을 기록했다. 특히 학용품, 의류, 액세서리 등 학생들에게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물품들의 소비가 매우 높았고, 이 기간에 타겟(Target), 월마트(Walmart), 스테이플(Staples) 같은 소매 기업들은 각종 할인 혜택과 홍보로 고객 유치에 나섰다. 특히 전월 9.1%에 달했던 6월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Consumer Price Index)이 7월 보고에서 8.5%로 하향 발표되면서 일각에서는 미국 내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고 안정세를 유지 할 것이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내렸다. 하지만 2022년 7월 소비자 물가는 전년 대비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소비자들이 평균적으로 8.52%의 물가 상승률을 겪었다고 분석했다. <품목별 미국 내7월 소비자 전년 대비 체감 물가 상승률> 품목 상승률 식품 10.5% ▲ 에너지 32.93% ▲ 의류 5.13% ▲ 가구 14.8% ▲ 가전 5.29% ▲ 학비 및 보육 2.61% ▲ 전체 평균 8.52% ▲ 주: 전체적인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운송료, 컴퓨터 주변기기, 차량 대여 서비스 등은 하락세 기록 [자료 : 월스트리트저널] 현지 반응 및 시사점 일리노이 州 세입부(Department of Revenue)에 따르면 일리노이 州 내 소비자들은 ‘백투스쿨 세일’기간과 판매세 면세 기간 동안 약 5,000만 달러를 지출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품목에 따라 면세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연장한 플로리다의 경우 약 8억5,370만 달러의 소비 지출을 예상하며, 내수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관측했다. 또한, 인플레이션의 상승으로 높아진 물가에 따라 소비자 부담이 증가함으로써, 州 정부는 판매세 면세 기간 연장이라는 제도를 도입하며 소비자들의 지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나섰다. 하지만 대다수의 세금 전문가들은 판매세 면제 기간 연장은 장기적인 소비 촉진 관점에 봤을때 대부분의소비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루시 다다얀(Lucy Dadayan) 부르킹스 조세정책센터 연구원에 따르면, 저소득층 납세자들은 특정 기간을 골라서 물건을 구매할 여유가 없기 때문에, 단순한 기간 연장으로는 州 정부가 노리는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그는 기간 연장으로 감세 혜택을 주는 것 보다 직접적인 감세 혜택을 주는 것이 납세자들에게 더 이익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미 조세재단(Tax Foundation)의 연구에 따르면 판매세 감면은 구매력이 높은 소비자들만 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로써, 정작 재정 지원이 필요한 소비자들은 큰 도움을 받지 못한다고 비난했다. 자료: 월스트리트저널, CNN Underscore, Federation of Tax Administration 및 기타 언론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워싱톤무역관 이인덕 | 미국 | 2022.08.26
-

- 美 반도체 지원법 도입 본격화
- 현지시간 8월 9일,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반도체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에 최종 서명했다. 동 법안에 포함된 반도체 지원법은 반도체 제조 및 연구·개발 지원 뿐만 아니라 미국 내 반도체 공장 건설 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까지 포함하고 있어 향후 반도체 공급망 재편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반도체 지원법의 주요 내용과 업계에 미치는 영향 반도체 지원법은 미국 내 반도체 제조업과 공급망을 강화하고 관련 연구 및 개발 확대를 통해 향후 미국이 반도체 산업의 주권을 확보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 내 반도체 생산 시설 설립에 390 억 달러, 연구 및 인력 개발에 110억 달러, 국가 안보 분야 반도체 제조에 20억 달러 등 총 520억 달러(68조원) 규모의 보조금 지원을 골자로 한다. 여기에 반도체 관련 투자기업 대상 25%까지 세액 공제를 지원하면서 미래 반도체 생산 거점으로의 입지를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반도체 지원법을 통해 직접적으로 보조금 및 세액 공제를 받는 파운드리 기업, 종합 반도체 기업 뿐만 아니라 장비, 소재, 디자인 업체들까지 반도체 제조기업들의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과학법에 서명중인 바이든 대통령> [자료 : Senate Commerce Committee ] 동 법안이 제시하는 지원자금은 크게 미 상무부 주관 보조금(500억 달러)과 국방부 주관 보조금(20억 달러) 로 나뉜다. 먼저 상무부 보조금은 제조시설 직접 보조금(390억 달러)과 첨단 반도체 연구개발 자금(110억 달러)로 구성된다. 제조시설 직접 보조금에는 성숙 공정(Mature Nodes) 시설 보조금 20억 달러를 포함해 지난 2021~2022년 반도체 공급난으로 인해 자동차산업 등 수요산업이 입은 피해를 예방하고자 했다. 연구개발 자금은 국가반도체기술센터(NSTC) 창설, 국가기술표준원(NIST) R&D 지원, 연방 첨단 후공정 생산 프로그램 출범 지원 예정이다. 국방부 주관 보조금은 군, 정보기관 등 주요 인프라에 사용될 안전성 측정 가능한(Measurably Secure) 반도체 생산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반도체과학법의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들이 향후 10년간 중국을 포함한 비(非)우호국에 10년 간 신규 반도체 생산 시설을 설립 혹은 확장을 금지하고 있다. 미국은 이미 한국, 일본, 대만과의 반도체 협의체(CHIP 4)를 제안해왔다. 여기에 반도체 과학법을 통해 미국이 중국 배제를 위한 추가 조치를 본격화 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현재 미국기업들의 중국 의존도가 높은 상황임을 고려했을때 반도체과학법이 당장 중국에 극단적인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반도체과학법을 통한 미국 정부의 지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 현지 반도체 제조 시설(Fab) 투자 경쟁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미국의 높은 Fab 제조 원가와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 보조금과 세액공제 수혜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 한편 미국이 동 법안을 통해 중국 의존도 뿐만 아니라 견제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는 해외 반도체 기업 전반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것으로도 보인다. 백악관은 브리핑에서 “미국의 현재 반도체 생산량은 전세계 10% 수준에 불과하며, 첨단 반도체(advanced chip)를 생산하고 있지 않아 동아시아 지역이 전세계 생산량의 75%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반도체 주권 확보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고려했을때 동 법안이 제시하는 보조금이 자국 기업 위주로 편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있다. 보조금을 향한 피할 수 없는 경쟁 예상 백악관은 현재까지 동 법안 발효와 더불어 여러 기업들이 약 500억 달러 가까이 추가 반도체 제조 설비 투자를 발표하면서 바이든 정부가 들어선 이후 약 1,500억 달러의 산업 투자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자국 기업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메모리칩 제조에 4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퀄컴·글로벌 파운드리가 생산공장 확대에 따른 42억 달러 규모의 파트너십 계획을 발표했다. <투자 계획 발표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자료 : Bloomberg] 이러한 상황에서 보조금 경쟁이 예상된다. 최근 미국 내 반도체 공장 설립을 위해 약 2,000억 달러 규모의 중장기 투자 계획을 발표한 삼성전자를 비롯해 SK 하이닉스도 150억 달러 규모의 R&D 센터 및 첨단 패키징 제조시설 계획을 밝혔다. 여기에 대만의 TSMC도 애리조나에 12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한 상황임을 감안하면 보조금 확보를 위한 경쟁은 더욱 과열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가 현실화 되기까지 보조금 수혜 여부와 규모가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전망 및 시사점 바이든 대통령은 법안 서명식 연설에서 “미국의 경제와 일자리, 국가 안보를 위해 미국에서 다시 반도체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앞으로 반도체 산업의 미래는 미국에서 열릴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반도체 과학법에 대해 “미국 국민이 자랑스러워 할 만한 법으로 그간 시행한 산업 발전 프로그램 중 가장 큰 규모”임을 덧붙였다. 향후 미국이 반도체 산업의 중심국으로 거듭나겠다는 취지를 거듭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과학법 서명식에서 연설대로 향하는 바이든 대통령> [자료: ABC News] 또한 백악관은 브리핑에서 “반도체 과학법은 곧 모든것이 미국산인(Made in ALL of America) 미래를 가져올 것”이라며 조속히 법안을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반도체 지원법 도입에 의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내 지각 변동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 기업의 전략적인 대응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자료 : 백악관, ABC News, Bloomberg, CNN, Financial Times, Senate Commerce Committee 및 KOTRA 뉴욕 무역관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뉴욕무역관 심솔리나 | 미국 | 2022.08.26
-

- 프랑스 2022년 하반기 경제전망
- 2021년 코로나19 이동 제한 조치의 해제로 프랑스 경제는 급격한 정상화 흐름을 보이며 6.8%의 성장률을 기록했으나, 2022년 초반에 증폭된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공급망 문제, 우크라이나 사태 등이 경제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프랑스 통계청(INSEE)에 따르면, 2022년 1분기 프랑스 GDP 성장률은 - 0.2%를 기록했는데, 특히 가계 소비가 1.5% 감소했고, 수출 또한 저조한 흐름을 보였다. 2022년 2분기 프랑스 경제는 공급망 문제와 원료비 상승으로 인한 제조업 분야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관광산업이 활기를 띠면서, 기존의 흐름을 되찾은 서비스업의 효과로 전체적으로 비교적 안정된 흐름을 보였다. 2022년 하반기 프랑스 경제는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 상승과 우크라이나 사태로 비교적 저조한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전개 방향을 예측하기 어려워지면서 가계소비와 투자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프랑스 중앙은행은 지난 3월 2022년 GDP 성장률을 긍정, 부정적 방향으로 나누어 부정적인 상황이 전개될 경우 2.7%로 전망한 바 있으나, 6월 신규 분석 자료에서 이 수치를 2.3%로 하향 조정했다. 소비자 물가지수의 경우 지난 3월 부정적 상황의 경우 4.4%를 전망치로 발표했으나, 6월 자료에서는 5.6%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5월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식품과 공산품 가격은 각각 모두 3.8% 상승했다. <프랑스 경제동향 및 전망>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실질 GDP 성장률 1.9 -7.9 6.8 2.3 1.2 1.7 소비자 물가지수 1.3 0.5 2.1 5.6 3.4 1.9 소비자 물가지수 (에너지, 식품제외) 0.6 0.6 1.3 3.3 3.0 2.2 실업률 8.4 8.1 7.9 7.4 7.7 7.9 국가부채 (GDP 대비 %) 97 115 113 112 109 109 * 2022년부터는 전망치 [자료: 프랑스 중앙은행. 22.6.21. 발표자료기준] 프랑스 중앙은행은 2022년 4분기까지 경제성장이 지체될 것으로 분석했고, 현재의 위기가 지나간 후 2024년에 이르러 이전의 성장 흐름을 되찾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실업률의 경우 약간의 증가세는 있겠으나, 현재의 안정적인 흐름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인플레이션 압박과 정부의 ‘구매력 보호법’ 우크라이나 사태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하반기 프랑스 경제의 가장 큰 화두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될 전망이다. 프랑스 통계청은 소비자물가지수가 지속 상승해 하반기 끝에서는 7%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연평균 5.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198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프랑스 인플레이션 추이> (단위: %) [자료: 프랑스 통계청, Les echos] 이런 상황에서 프랑스 정부는 하반기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로 '구매력 보호법'을 서둘러 발표했고, 기나긴 국회 토론 끝에 지난 7월 22일 하원 통과 후 8월 4일 상원에서 확정됐다. 총 200억 유로 규모의 예산이며, 통과된 주요 법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프랑스 구매력 보호법 주요내용> 유가 보조금 지급으로 단가인하 1리터 당 0.18~0.3 유로(9월, 10월) 1리터 당 0.1 유로(11월, 12월) TV 수신료 폐지 1가구 당 약 138유로 절약 효과(2022년부터) 정부예산 35억 유로 규모로 부가가치세 수입에서 일부 조달계획 퇴직연금, 실업수당 등 인상 인플레이션을 감안하여 사회보장 수당 4% 인상 임대료 인상 상한적용 ’23.6.30.까지 프랑스 전역 상가 임대료인상률 3.5%로 제한(직원 250명 이하 기업) 기업 비과세 보너스 인상 및 소득세 공제 2022년 7월(소급적용)~2023년 12월까지 - 직원 당 3,000유로까지 보너스 비과세 적용 -최저임금의 3배 이하 급여소득자(약 4.000유로)에 한해 소득세 공제 저소득층 보너스 지급 총 800만 가정에 성인 1인당 100유로, 아동 1인당 50유로 지급(’22.8.16. 지급) [자료: 프랑스 경제부, 파리무역관 정리] 프랑스 통계청은 가계수입이 2022년 1분기에는 감소했으나, 정부의 구매력 보호법과 임금 인상 효과로, 하반기에 빠르게 상승해 2022년 평균 4.1%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프랑스 정부는 2021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최저임금을 약 6% 인상했고, 공무원 임금은 2022년 7월부터 3.5%가 인상된다. 최저임금은 일반적으로 매해 초 한 차례 인상하는 것이 관례인 만큼 매우 이례적인 조치이며, 공무원 임금의 경우 지난 37년만의 최고 인상률이다. 프랑스 기업들 또한 2022년 1분기부터 산업분야별로 임금 인상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프랑스 중앙은행에 따르면 평균 3%대의 인상률로 진행되고 있다. 참고로 자동차 제조 분야는 2022년 4월 협상 기준 4.5%가 인상됐다. 프랑스 기업들의 임금 인상은 일반적으로 연말에 결정되나, 올해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분기별 혹은 7월부터 긴급 인상을 결정하고 있다. 실업률 증가 프랑스 정부의 구매력 보호법이 단기적으로는 에너지값 폭등으로 인한 충격을 흡수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정부 지원이 단기에 머무는 만큼 장기적으로 효과가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프랑스 경제전망 연구소( l’OFCE)는 지난 7월 발표한 하반기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마크롱 대통령이 향후 5년의 재임 기간 목표로 설정한 ‘완전고용’은 이루기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소에 따르면, 제조업 분야의 침체로 내년 실업률은 8%(현재 7.3%)까지 증가할 수 있으며, 2027년에 이르러서야 7.5%까지 하락 가능할 전망이다. 시사점 한 치 앞을 알 수 없이 전개되는 국제정세와 이로 인한 경기 침체, 식량위기, 인플레이션 압박, 겨울철 에너지 대란 등의 불안요소로 프랑스의 하반기 경제전망에도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 프랑스는 여름휴가 기간이 긴 편이고 대부분의 기관과 학교가 9월부터 재개되는 만큼, 현재 새 학기를 준비하는 학생들의 학용품, 식품 등 소비재 물가인상 이슈가 중요하게 보도되고 있다. 2022년 하반기에는 프랑스 소비자들의 불안심리가 증가할 것이 전망되고, 소비시장의 양극화도 뚜렷해지고 있는 만큼, 프랑스에 진출하려는 기업들은 보다 세분화되고 유연한 방식으로 시장을 공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자료: 프랑스 통계청(INSEE), 프랑스 중앙은행, 프랑스 경제전망연구소(l’OFCE), 프랑스 경제부, 일간지 레제코(Les echos), 르몽드(Le Monde), 파리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파리무역관 곽미성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08.23
-
- 2022년 상반기 한-나이지리아 교역 동향
- 2022년 對나이지리아 수출 4억5400만 달러로 -0.3% 감소 對나이지리아 수출은 화학제품 수출 증가 및 점진적 경기 회복에 따라 2021년 9억6300만 달러(86.5%↑)를 기록하였으며, 2022년에는 6월 말 기준 4억54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현상 유지 중이다. 수입의 경우 2021년 9억7400만 달러(29.9%↑)를 기록하였으며, 2022년에는 원유 및 LPG 수입 대폭 증가 등의 영향으로 6월 말 기준 7억3400만 달러를 기록 전년 동기 대비 39.9%의 증가세를 보였다. 무역수지는 2021년 1200만 달러 적자를 보였고 2022년에는 6월 말 기준 2억8000만 달러 적자를 보이고 있는 등 당분간 적자 폭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합성수지(18.3%), 위생용품(503.1%), 의약품(15.8%), 철강관(1,683.0%) 등 수출 품목이 호조를 보이고 있으나 경유(-22.2%), 기타석유화학제품(-18.9%), 알루미늄조가공품(-31.3%), 축전지(-7.3%), 기타섬유제품(-18.1%) 등 지난해 호조를 보였던 품목들의 수출이 부진하고 있다. <양국 간 교역 추이> (단위: U$ 천,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1-6월) 금 액 증감률 교역 규모 1,965,412 1,485,649 1,266,510 1,937,453 1,188,455 對나 수출 917,850 759,612 516,307 962,966 454,393 -0.3 對나 수입 1,047,562 726,037 750,203 974,487 734,062 33.9 무역 수지 -129,712 33,575 -233,896 -11,522 -279,669 - [자료: KOTIS] 주요 품목별 수출입 동향 원유, 천연가스 및 LPG 등 석유 가스 자원 수입액은 2018년 9억4855만 4000달러, 2019년 4억9293만 8000달러, 2020년 6억5757만2000달러, 2021년 9억417만2000달러로 전체 수입에서 각각 90.5%, 67.9%, 87.7%, 92.8%의 비중을 보였다. 이는 연괴 및 스크랩은 자동차용 폐배터리 수입, 국내에서 재생하기 위한 것이다(무역상이 수입하고 국내 재생 기술 보유기업에서 재생함). 채유종실은 참깨 수입을 말하며, 2018년 3,948톤, 2019년 9,678톤을 수입하였으며 2020년은 6402톤, 2021년은 3047톤을 수입하였다(중량 기준 전년 대비 52.4% 감소). <對 나이지리아 주요 수출품목(MTI 4단위)> (단위: U$ 천, %) 순번 품목명 2021년 2022년 (6월) 수출액 증감률 수출액 증감률 총계 962,966 86.5 454,393 -0.3 1 합성수지 277,988 110.8 149,951 18.3 2 경유 253,440 1,246.9 81,171 -22.2 3 기타석유화학제품 83,413 22.7 42,400 -18.9 4 알루미늄조가공품 58,054 226.4 23,896 -31.3 5 축전지 38,691 13.4 17,535 -7.3 6 기타어류 7,850 56.9 12,802 272.1 7 기타섬유제품 28,932 -7.2 12,184 -18.1 8 위생용품 4,693 -57.3 9,033 503.1 9 의약품 24,089 122.5 7,812 15.8 10 철강관 2,318 21.5 7,552 1,683.0 11 연초류 17,532 109.3 6,192 -12.2 12 승용차 12,320 -37.1 5,821 -2.1 13 기타정밀화학원료 19,120 133.9 5,636 -46.0 14 열연강판 2,355 -81.6 4,815 105.2 15 주단강 245 -86.0 4,677 11,957.4 16 건설중장비 2,652 -9.7 3,757 231.0 17 화학기계 116 -90.7 3,211 27,959.5 18 공기조절기 4,837 -0.7 3,075 71.5 19 폴리에스터직물 6,699 29.1 2,970 -5.7 20 기타플라스틱제품 5,338 -15.6 2,879 -11.6 21 자수포 3,793 47.2 2,613 61.9 22 밸브 2,613 -14.9 2,187 25.7 23 소스류 3,632 -11.3 1,925 10.4 24 철구조물 407 -8.3 1,918 2,204.2 25 집적회로 반도체 2,561 384.5 1,590 96.4 26 기타종이제품 753 24.1 1,459 827.6 27 취미오락기구 13 0.0 1,307 10,492.3 28 기초유분 896 -83.9 1,177 107.7 29 X선 및 방사선기기 1,222 131.2 1,171 56.8 30 기타정밀화학제품 6,060 -2.7 1,164 -75.0 31 가열난방기 2,442 27.6 1,146 -8.8 32 칼라TV 945 1.1 1,100 121.7 33 폴리에스텔섬유 2,900 24.9 1,088 -29.3 34 제어용케이블 24 -87.1 1,075 7,458.6 35 안료 4,471 -1.7 1,048 -46.8 [자료: KOTIS] <對 나이지리아 주요 수입품목(MTI 4단위)> (단위: U$ 천, %) 순번 품목명 2021년 2022년 (6월) 수입액 증감률 수입액 증감률 총계 974,487 29.9 734,062 33.9 1 원유 517,835 1.8 378,749 39.6 2 천연가스 384,926 196.8 244,481 1.7 3 동괴 및 스크랩 40,158 -13.1 51,823 227.6 4 LPG 1,411 -92.6 39,484 2,699.0 5 연괴 및 스크랩 22,377 1.8 11,225 -17.7 6 기타목재류 498 -82.2 3,306 2,485.6 7 채유종실 4,509 -53.2 2,654 -37.0 8 알루미늄괴 및 스크랩 354 -85.0 1,745 1,603.1 9 자동제어기 5 0.0 107 0.0 10 그림 13 -77.7 87 2,240.0 [자료: KOTIS] 나이지리아는 우리나라의 51위 수출국, 50위 수입국 (’21) 2021년 최대 수출 교역국은, 중국이 1위(1629억 달러, 22.9%), 미국이 2위(959억 달러, 29.4%), 베트남 3위(567억 달러, 16.9%), 홍콩 4위(375억 달러, 22.2%), 일본 5위(301억 달러, 19.8%)를 차지했다.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모잠비크가 26억 달러로 1위, 라이베리아가 20억 달러로 2위, 남아공이 10억 달러로 3위, 나이지리아(9억6000만 달러)가 4위, 토고(4억7000만 달러) 5위의 순서를 보였다. 2021년 최대 수입 교역국은, 중국이 1위(1386억 달러, 27.3%), 미국이 2위(732억 달러, 27.3%), 일본이 3위(546억 달러, 18.7%)이며, 호주가 4위(329억 달러, 75.9%), 사우디아라비아가 5위(243억 달러, 51.9%)를 차지했다. ’22년(6월) 우리나라의 53위 수출국, 46위 수입국 위치를 유지하였으며 2022년 최대 수출 교역국은, 중국이 1위(814억 달러, 6.9%), 미국이 2위(550억 달러, 18.2%), 베트남 3위(319억 달러, 23.4%), 일본 4위(160억 달러, 11.9%), 홍콩 5위(155억 달러, -13.4%)를 차지했다.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라이베리아가 16억 달러로 1위, 토고가 12억 달러로 2위, 남아공이 5억8000만 달러로 3위, 나이지리아(4억5000만 달러)가 4위, 케냐(3억3000만 달러) 5위의 순서를 보였으며, '22년 최대 수입 교역국은, 중국이 1위(772억 달러, 19.7%), 미국이 2위(406억 달러, 11.7%), 일본이 3위(282억 달러, 7.0%)이며, 호주가 4위(221억 달러, 64.1%), 사우디 5위(198억 달러, 101.2%)를 차지하였다. 아프리카 주요국 교역동향 <對 아프리카 주요국 수출현황> (단위: U$ 백만, %) 순번 국가명 2021년 2022년 (6월) 수출액 증감률 수출액 증감률 30 라이베리아 1,992 -6.6 1,578 31.8 35 토고 474 -41.7 1,236 767.8 48 남아프리카 공화국 989 48.4 583 17.5 53 나이지리아 963 86.5 454 -0.3 61 케냐 258 17.3 329 178.6 83 카메룬 98 203.6 128 67.8 84 가나 298 32.6 127 -15.6 88 서사하라 0 -100.0 110 0.0 91 코트디부아르 183 61.1 94 12.6 93 탄자니아 200 32.3 89 -10.8 98 모잠비크 2,593 3,473.1 79 99.5 100 수단 153 7.6 75 -12.1 주: 對라이베리아 수출은 선박 수출이 2018년 13억8800만 달러, 2019년 17억400만 달러, 2020년 21억2000만 달러, 2021년 19억7800만 달러로 각각 99.2%, 99.4%, 99.3%, 99.3%를 차지하고 있음. [자료: KOTIS] <對아프리카 주요국 수입현황> (단위: U$ 백만, %) 순번 국가명 2021년 2022년(6월) 수입액 증감률 수입액 증감률 32 남아프리카 공화국 2,621 54.9 1,672 53.4 46 나이지리아 974 29.9 734 33.9 49 가봉 603 266.2 597 351.1 51 콩고 민주공화국 850 91.8 541 17.8 64 모잠비크 230 70.2 270 307.4 73 적도 기니 366 150.0 167 4.5 74 카메룬 75 33.4 165 361.1 87 마다가스카르 16 -70.9 70 1,045.6 99 잠비아 101 563.4 49 -8.5 [자료: KOTIS] 자료: KOTIS, 라고스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라고스무역관 IkennaGodwin Uyamasi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08.22
-

- 잘 알려지지 않은 국가, 네팔 국가정보
- 네팔 국가정보 한국에 알려진 네팔은 포카라 지역을 포함한 히말라야를 트래킹하기 좋은 지역, 셰르파, 저렴한 외국인 노동자 유입국, 그리고 세계 최빈국 중의 하나라는 이미지 정도일 것이다. 그러나, 네팔은 잠재적 수력 발전 가능성, 열악한 인프라만큼 개발 수요가 많은 국가이며, 1990년대 이후 민주화를 거쳐 시장경제를 적극 도입하며 투자 자유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이다. 잘 알려지지 않은 미지의 국가, 네팔에 대한 정보와 경제 전반에 대해 본 보고서를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네팔 국가정보 요약> 국가명 네팔(The Federal Democratic Republic of Nepal) 수도 카트만두(Kathmandu) 면적 147,181 ㎢ 인구 30,185,000 (’22, IMF) 민족 아리안족(80%), 티벳-몽골족(17%), 기타 소수민족(3%) 언어 네팔어 외 9개 종교 힌두교(81.3%), 불교(9%), 이슬람교(4.4%), 기독교(1.4%), 기타(3%) 기후 네팔은 인도 북동부 히말라야 산맥 및 산록에 위치하고 있어 고도에 따라 강수량에 큰 차이가 있으며, 기후 또한 빙설 기후에서 열대성 기후까지 다양하다. * 일반적으로 6~9월 우기, 10~5월 건기로 나뉨 국가 원수 ㅇ 국가 원수: 비디아 데비 반다리(Bidya Devi Bhandar) * 취임일: 2015.10.29 (7년 임기) ㅇ 총리: 셔 바하두르 데우바(Sher Bahadur Deuba) * 소속 정당: 네팔 의회당(Nepali Congress) [자료: 네팔 정부(mofa.gov.np), 주네팔 대한민국 대사관] 네팔은 히말라야 산맥, 인도와 중국 티베트의 국경과 맞닿아 있으며, 약 3,000만 명의 인구와 남한의 1.5배 크기의 면적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다. 여러 작은 부족민들로 나뉘어 인도, 중국 등 주변 변방 국가의 지배를 받다가 1768년 12월 21일, 프리트비 나라얀 주도 아래 통일되었다. 네팔은 세계 최빈국 중 하나로, 인구의 3분의 2가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 중심국이며, 담배 및 곡물 등의 농산물과 원단 및 카펫과 같은 경공업 제조가 산업의 주를 이루고 있다. 네팔 달력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그레고리력(태양력)과 다르게 비크람 삼밧(Bikram Sambat, 고대 네팔의 왕 이름)이라는 날짜를 따른다. 음력 354일과 양력 365일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4년에 한 달을 추가하는 등 태양력과 태음력을 조합하여 날짜를 계산하기 때문에, 매달의 일 수는 29~32일이다. 따라서 매년 회계연도의 기간이 다르며, 기본적으로 금년 7월 16일 ~ 다음 해 7월 15일까지로 생각해두면 계산에 용이하다. <네팔의 회계연도> 날짜 회계연도 기간 2018/19 회계연도 2018년 7월 17일 ~ 2019년 7월 16일 2019/20 회계연도 2019년 7월 17일 ~ 2020년 7월 15일 2020/21 회계연도 2020년 7월 16일 ~ 2021년 7월 15일 2021/22 회계연도 2021년 7월 16일 ~ 2022년 7월 15일 [자료: 뉴델리무역관] 현재 네팔의 최저 임금은 월 NPR(Nepalese Rupee, 네팔 현지화) 13,450(USD 105.75), 하루 NPR 192(USD 1.51), 시간당 NPR 26(USD 0.20)이며, 평균 급여는 NPR 24,000 ~ 109,000(USD 189.48 ~ 860.55) 수준이다. 네팔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정규 근무시간은 일일 8시간으로, 초과 근무의 경우 150%의 초과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하루에 4시간, 주간 20시간 이상 초과 근무는 불가능하다. 한국과 네팔의 외교관계는 1968년 영사관계를 시작으로 1971년 무역협정 체결, 1974년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 주한 네팔 대사관이 설립되며 대사관계로 격상되었다. 2001년 10월 이중과세방지 협정이 체결되어 2003년 5월 29일 발효되었고, 2005년에는 문화협정이 체결되었다. 참고로 네팔 정부는 2007년 3월 서울에 대사관을 설립하였다. 아울러, 네팔은 수력 발전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어, 관련 프로젝트에 다양한 기업들이 진출해 있다. 한국남동발전은 2012년 3월 23일, 국제금융공사(IFC)와 네팔 어퍼 트리슐리-1 수력발전(Upper Trishuli-1, 이하 “UT-1”) 개발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2015년 네팔 대지진, 인도의 국경 봉쇄 등 여러 난관 속에서도 2016년 네팔 정부와의 정부보증계약, 2018년 전력구매계약 체결 등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2019년 10월 국제금융공사(IFC), 아시아개발은행(ADB), 수출입은행(K-EXIM), 산업은행(KDB),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 등 9개 금융기관과 4억5,400만 달러 규모의 금융 약정을 체결했으며, 10년의 개발 끝에 2020년 10월 29일에는 두산중공업과 EPC 계약을 체결하며 본 공사 시작이 가시화되었다. 본 프로젝트는 2021년 3월 본 공사 착공, 2026년 상업운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완공 시 연간 15억3천만 유닛의 전력을 생산(216 MW 규모 프로젝트)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인프라 부문뿐만 아니라, 교육 및 문화, CSR 등을 통해 최근에도 한국과 네팔은 협력을 강화해왔다. 2020년 1월 14일 전남교육청은 네팔 성커라플 지역에 ‘네팔 전남휴먼스쿨 준공식’을 진행하면서, 교육·문화 등 교류 강화를 도모하였다. 아울러, 주네팔 대한민국 대사관은 2021년 6월 4일 KOICA(한국국제협력재단)를 통해 20만 달러 상당의 코로나19 PCR진단키트 17,760회 검사분을 네팔 보건부에 전달하였다. KOICA는 2020년 6월에도 32만 달러 상당의 코로나19 진단키트 2만회 분을 제공한 바 있으며, 박종석 주네팔 대사는 네팔 정부의 대규모 검사를 통한 코로나19 확산 대처 노력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표명한 바 있다. 한 눈에 보는 네팔 경제 <네팔 주요 경제지표> 경제지표 2017 2018 2019 2020 2021 경제성장률 9% 7.6% 6.7% -2.4% 4.2% 명목 GDP(억 달러) 289.7 331.1 341.9 334.3 362.9 1인당 명목 GDP(달러) 1048.5 1178.5 1195.0 1166.3 1163.0 정부부채(% of GDP) 25.0% 30.1% 33.1% 42.2% 47.3% 물가상승률 4.5% 4.2% 4.6% 6.2% 3.6% 실업률 3.3% 3.2% 3.1% 4.7% 5.1% 對한국 수입(백만 달러) 77.8 79.7 74.0 82.4 125.4 對한국 수출(백만 달러) 1.3 1.5 2.1 1.1 1.9 외한보유고(억 달러) 94.4 83.4 87.1 114.7 96.6 기준금리 7% 7% 6.5% 6% 5% [자료: 세계은행, IMF, Statista, 네팔 통계국, 네팔 산업통상자원부] 네팔의 경제 또한 코로나를 겪으며 많은 부분 타격을 받았다. 네팔은 크게 2020년 3월 코로나19 1차 확산, 2021년 4월 2차 확산, 2022년 1월 3차 확산이 있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였다. 동 3개 기간 모두 인접국인 인도의 확산 시기와 동일하다는 점을 통해 볼 때 두 국가는 인적교류가 많은 편으로 사료된다. 2020년 3월 코로나19 1차 확산 이후, 봉쇄령과 함께 숙박업 및 관광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으며 소비가 둔화되고, 공급망 불안정으로 제조업 생산 또한 둔화되면서 네팔의 2020-21 회계연도 경제성장률('20.7월~21.7월)은 기존 세계은행이 전망하였던 2.7% 대비 0.9%p 낮은 1.8%를 기록했다. 이후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며 2021-22 회계연도 상반기('21.7~12월) 서비스 부문을 주요 회복 동인으로 도소매 무역, 운송 및 금융 서비스 부문이 큰 회복세를 보였으며,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함께 농업생산, 관광업이 재개되었다. 참고로 2022년 3월 기준 인구의 60% 이상이 코로나19 백신 2차까지 접종을 완료하였다고 보고되었다. 그러나 네팔 하원 해산 등 정치적 불안 및 코로나19 재확산 위험요소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러-우 전쟁발 원자재 및 유가 상승으로 무역 적자폭이 상승하고 있다. 또한, 투자심리 감소 등 외환보유 또한 감소세가 이어지며 국가 경제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네팔 당국은 2022년 4월 28일 외한보유고 감소세 억제를 위해 2022년 7월 15일까지 수입 금지 품목으로 사치품 10개를 지정하였으며, 최근에는 이 규제를 8월 30일까지 연장하였다. 네팔 당국이 지정한 수입 금지 품목은 ▲주류, ▲담배, ▲다이아몬드, ▲32인치 이상 TV, ▲자동차(지프차, 밴 등), ▲장난감 및 완구류, ▲장난감 카드(playing cards), ▲수입 과자류, ▲600불 이상 휴대폰, ▲250cc 이상 오토바이이다. 네팔 정부는 2022-23 회계연도 GDP 성장률 전망치를 8%로 발표하였으나, 세계은행 및 IMF는 그 절반 수준인 4.1%를 전망하고 있다. 최근 네팔 정부가 외화 유출 억제를 위해 수입 금지 등 소비 억제 정책을 도입하고 있는 가운데 8%의 성장 목표는 과도하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2022년 6월 기준 소비자물가지수는 기존 최고치였던 3월 7.14%에 이어 70개월래 최고치인 8.56%를 기록하였으며, 네팔중앙은행(NRB)은 지난 7월, 28개 도시를 대상으로 조사한 소비자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3개월간 14%대, 연 13.5%일 것으로 물가 상승을 전망하였다. 이에 소득의 대부분을 식료품에 지출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타격이 클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네팔중앙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버터와 기름 22.60%, 과일 12.61%, 유제품 및 계란 11.22%, 두유 및 콩류 9.13%, 교통 부문 25.79%, 가정 용품 8.30% 등 주요 물가가 상승하였다. 특히, 휘발유 및 디젤 가격은 2022년 6월 기준 사상 최고치인 리터 당 각각 NPR 199(USD 1.56), NPR 192(USD 1.51) 수준으로 집계되고 있다. 네팔, 잘 알려지지 않은 투자국 네팔은 서남아시아 국가 중 외국인 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가 저조한 나라 중 하나이나, 1990년대와 현재를 비교했을 때 2010년을 기점으로 외국인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네팔 산업부에 따르면 국가가 1981년 외자기술이전법(FITTA, Foreign Investment and Technology Transfer Act)를 마련하여 외자 유치에 나선 이래로 2022년까지 3월까지 3,980억 NPR(31.29억 USD) 규모의 FDI를 유치했다. 투자유치 규모는 지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2020년과 2021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네팔 산업부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로 서비스, 관광, 정보기술, 농업, 임산물, 제조업 등 분야에 관심을 보인다고 밝혔다. <최근 30개년 對네팔 투자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자료: UNCTAD] UNCTAD의 “World Investment Report 2022’에 따르면 2021년 네팔에 투자된 FDI 유입액은 약 1억 9,600만 달러로 2020년 약 1억 2,600억 대비 55.5% 가량 증가했다. 2021년 7월(네팔 회계연도 시작)부터 2022년 3월 사이 정부가 330억 NPR(2.59억 USD) 이상의 외국인직접투자를 승인했음을 발표했다. 해당 기간 정부가 승인한 FDI 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72억 8천만 NPR(5,723만 USD) 가량 증가한 것이다. 이에 네팔 산업부 사무국장은 정부가 155개 외자 사업을 승인했으며 2만 1,623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최근 네팔 정부 자료에 따르면 2021-22 회계연도 네팔이 유치한 외국인직접투자 공약은 전년 대비 68% 증가한 541.5억 NPR(4.5억 USD)를 기록했다. 국가별로는 중국기업 투자가 전체의 79%, 인도 기업 투자는 4.6%를 차지했으며, 분야별로는 서비스 부문 투자가 43.8%, 관광 부문이 35.8%, 제조업 부문이 14.6%를 차지했다. 다만 통상 공약 된 투자 규모와 실제 유입되는 투자에는 큰 격차가 존재하며, 2021-22 회계연도 11개월간 네팔에 실제로 유입된 FDI는 173.5억 NPR(1.36억 USD)에 불과하다. <최근 5개년 對네팔 투자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2017 2018 2019 2020 2021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198 86.7 67 △66.2 185 176.1 126 △31.9 196 55.6 [자료: UNCTAD] 최근 네팔은 외국인 투자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산업 분야에서 법적, 구조적, 절차적 개혁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2019년 5월, 기존 500만 NPR(3만9천 USD)에서 5,000만 NPR (39만 USD)로 10배 가량 인상시킨 FDI 최소 투자금액을 2년 만인 2022년 5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장려하고자 2022-23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7월 중순부터 FDI 최소 투자금액을 다시 2,000만 NPR(15만 USD)로 완화하기로 결정하였다. 1994년부터 집계된 수출입은행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對네팔 투자는 2022년 3월까지 총 42개의 신규법인이 진출했으며 신고금액은 1억 7,155만 달러이나 도착 기준 총 투자금액은 1억 3,822만 달러로 집계되고 있다. <연도별 한국의 對네팔 투자 현황> (단위: 천 달러, 건, 개사)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3월) 누적 (’94년~) 투자금액 1068 19,323 9,161 15,295 24,992 26,919 436 138,332 신고금액 1,748 20,779 10,227 14,225 25,297 27,862 4,512 171,558 신고건수 9 20 12 13 7 6 6 153 신규법인수 4 4 1 8 1 1 0 42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의 對네팔 주요 투자 분야는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으로 전체 투자금액의 81%를 차지한다. 제조업이 약 17%를 차지하며 그 뒤를 잇고 있다. 하지만 진출기업의 경우 제조업의 신규법인수가 13개로 가장 활발히 진출하였다. 숙박 및 음식점업의 투자 신고금액은 167만 달러로 신고금액 기준 3번째로 높은 투자를 유치한 분야이나, 실질적인 투자금액은 38.6만 달러에 그쳤다. 한국의 對네팔 투자 현황에서의 주요 특징은 신고금액 대비 투자금액이 저조한 편으로, 많은 사업들이 실질적인 투자로 연결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업종별 한국의 對네팔 투자 현황> (단위 : 천 달러, 개사) 업 종 누적액(1994~2022.03) 투자금액 신고금액 신규법인수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112,036 120,710 3 제 조 업 23,323 41,753 13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638 3,231 3 도소매업 482 1,400 1 정보통신업 313 358 3 건설업 362 1,422 5 숙박 및 음식점업 386 1,670 3 기 타 794 1,008 11 총 계 138,332 171,559 42 주: 투자금 기준 順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한국기업의 주요 진출 현황으로는 2019년 롯데 GRS가 운영하는 롯데리아가 히말라야 엔케이 유한회사(N.K. Company)와 네팔 진출 계약을 체결하여 마스터 프랜차이즈 사업 확대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2025년까지 10여개의 롯데리아를 네팔에 개장할 계획이다. 2022년 5월 오리온은 네팔 유통업체 밀레니아 글로벌과 제휴하여 현지 시장 진출 확대를 준비하고 있으며, ㈜크루피 기업은 2018년 12월 네팔 현지법인 IMU와 협력해 사업허가를 취득하여 복권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네팔에 투자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을 위해 네팔에 위치한 산업단지(Insutrial Zone)와 특별경제구역(Special Economic Zone), 그리고 관련 자문을 받을 수 있는 현지 로펌들을 아래와 같이 소개하니 업무 상 참고하면 좋겠다. <네팔 주요 산업단지 및 SEZ> (단위: sqft, 달러) 연번 단지명 주소 규모 임차비용 연락처 1 Balaju Industrial District Balaju, Kathmandu, P.O.Box:138 3,669,058 125 Tel. +977-1-4350851/4350520 Email. balaju@idm.org.np 2 Dharan Dharan-8, Sunsari 1,105,988 141 Tel. +977-25-520331/523431 Email. dharan@idm.org.np 3 Butwal Ramnagar, Butwal 2,376,633 65 Tel. +977-71-540285/540585 Email. butwal@idm.org.np 4 Nepaljunj Industrial District Surkhet Road, Nepalgunj 1,275,872 127 Tel. +977-81-530156/520317 Email. nepalgunj@idm.org.np 5 Bhaktapur Byasi, Bhaktapur - 424 Tel. +977-1-6610099/6611299 Email. bhaktapur@idm.org.np 6 Pokhara Kundahar, Pokhara - 65 Tel. +977-61-570205/526033 Email. pokhara@idm.org.np 7 Bhairahawa SEZ Bagaha Rd 7, Sahalkot 32500 1,403,938 430 Homepage. https://www.seznepal.gov.np/content.php?id=22 8 Panchkal SEZ Kathmandu 44600 5,357,880 860 Homepage. https://www.seznepal.gov.np/content.php?id=24 주: 임차비용은 5,476 Sqft를 연간 임차했을 때의 비용 기준 [자료: FNCCI, IDM] <네팔 현지로펌 리스트> 연번 회사명 주소 연락처 홈페이지 이메일 1 Prime Law Associates (PLA) Prime Law AssociatesAdvocates & Legal Consultant Anamnagar, Kathmandu, Nepal Postal Code 44600 +977-9851059026/ +977-1- 4102849 http://www.primelawnepal.com/ pthapa@primelawnepal.com info@primelawnepal.com 2 Super lawyers Court Area, In Front of District Administration Office, Baskota Market Sadarline Road Near Court Area नेपालगञ्ज 21900 Nepal +977-984-1571996 http://superlawyer.business.site superlawyer7@gmail.com 4 narayani Law firm & Legal research Centre Chandragiri 11, Satungal Kathmandu, Nepal 44600 +977-9843786531 https://narayanilawfirm.org.np/ info@narayanilawfirm.org.np 5 Pioneer law Associates 246 Sahayog Marg, Anamnagar, Kathmandu +977-1- 5706295 / +977-1-5706000 / +977-1-5706392 https://pioneerlaw.com/ info@pioneerlaw.com 6 Imperial Law Associates 4th Floor, Gravity Center (Big Mart Complex), Anamnagar-29, Kathmandu 44600, Nepal +977 9808811027 / +977 9849093540 https://www.lawimperial.com/ info@lawimperial.com [자료: 각 사 홈페이지] 네팔의 주요 교역 파트너와 수출입 동향 네팔 산업부에 따르면, 2021년 네팔의 對세계 수입국 1위는 수입액 기준 89.5억 달러로 인도가 차지했으며, 그 다음으로는 중국이 22.2억 달러로 2위를 기록하고 있다. 두 국가가 차지하는 수입액 비율은 무려 75.5%인 반면 두 나라를 제외한 나머지 상위 8개국의 점유율은 각각 3%를 하회하고 있다. 한국은 2021년 1.25억 달러로 네팔의 10위 수입국을 기록했으며, 2020년 코로나19 영향에도 불구하고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2019-2021 네팔 주요 수입국>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국가명 2019 2020 2021 2021년 점유율 2021년 전년대비 성장률 1 인도 6,918 5,856 8,950 60.5% 52.9% 2 중국 1,726 1,254 2,226 15.0% 77.5% 3 아르헨티나 82 202 422 2.9% 108.5% 4 UAE 227 171 388 2.6% 127.5% 5 인도네시아 232 143 342 2.3% 139.9% 6 미국 140 161 278 1.9% 73.2% 7 호주 56 43 213 1.4% 389.8% 8 우크라이나 78 85 185 1.3% 117.6% 9 말레이시아 88 75 129 0.9% 72.5% 10 한국 74 82 125 0.9% 52.2% - 전체 10,964 9,120 14,784 - 62.1% [자료: 네팔 산업통상자원부 및 무역수출진흥센터] 네팔 주요 수출국의 경우 1위를 기록한 인도에 더욱 편향된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1년 대인도 수출 점유율은 무려 80%를 기록하였다. 미국, 독일, 영국이 그 뒤를 잇고 있으며 미국을 제외한 독일, 영국, 터키 등 이하 수출국 모두 2%대 이하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2019-2021 네팔 주요 수출국>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국가명 2019 2020 2021 2021년 점유율 2021년 전년대비 성장률 1 인도 586.7 583.9 1,245.6 80.0% 113.3% 2 미국 87.5 81.3 123.8 8.0% 52.4% 3 독일 25.2 22.1 27.9 1.8% 26.0% 4 영국 19.7 16.0 22.0 1.4% 37.0% 5 터키 21.5 11.5 20.2 1.3% 76..0% 6 프랑스 10.7 9.0 11.7 0.8% 29.4% 7 호주 5.6 5.8 8.8 0.6% 51.1% 8 중국 16.1 5.4 7.9 0.5% 46.0% 9 이탈리아 8.0 5.2 7.5 0.5% 43.0% 10 캐나다 6.7 6.0 7.5 0.5% 25.2% 21 한국 2.1 1.1 1.9 0.1% 68.8% - 전체 854 801 1,556 - 94.3% [자료: 네팔 산업통상자원부 및 무역수출진흥센터] 네팔 산업통상자원부 및 무역수출진흥센터에 따르면, 2021년 네팔-한국 교역은 작년 대비 52.4%증가하며, 교역액 최초 1억 달러를 달성하였다. 코로나19 팬데믹 전과 비교하여 네팔의 對한국 수출액은 크게 늘지 않았지만,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이 2019년 대비 무려 70% 가까이 증가하였다. <2019-2022 네팔 對한국 수출입액 추이(네팔 기준)> (단위: 달러,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1년 증감률 수입 79,700,913 74,023,281 82,362,566 125,366,358 52.2% 수출 1,531,332 2,147,378 1,114,360 1,880,541 68.8% 교역액 81,232,246 76,170,659 83,476,926 127,246,899 52.4% 무역수지 -78,169,581 -71,875,904 -81,248,207 -123,485,817 52.0% [자료: 네팔 산업통상자원부 및 무역수출진흥센터] 네팔은 세계 최빈국 중 하나로, 경제적으로 타국에 크게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중국, 미국 등 국제기관과 주로 인도의 원조를 받고 있으며, 특히 도시개발, 고속도로 건설 및 전력망 구축을 위한 건설 프로젝트를 발주하거나 원조 또는 국가 협력을 통해 인프라 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네팔의 對한국 주요 수입 품목별 수입액은 연도별로 편차가 큰 편이며, 상위 수입품목 순위의 등락 또한 빈번하다. 2021년 네팔-한국 수입품목은 MTI(3단위) 기준 금속공작기계가 2,294만 달러로 1위를 차지하였다. 이 외 계측제어분석기, 기계류, 산업용 전자기기, 공구 등 인프라 산업 관련 품목들이 상위 품목을 차지하였다. <네팔 對한국 2021년 상위 10개 수입품> (단위: 백만 달러) 순위 품목 MTI(3단위) 연도 2019 2020 2021 1 금속공작기계 723 0.19 0.004 22.94 2 무기류 970 - 32.32 15.18 3 계측제어분석기 815 0.25 0.23 6.16 4 자동차 741 15.85 4.24 5.50 5 기타기계류 790 0.42 0.03 4.83 6 농약 및 의약품 226 1.38 2.64 3.59 7 산업용 전자기기 842 0.67 0.03 2.86 8 전자응용기기 814 4.13 1.86 2.65 9 합성수지 214 2.52 2.21 2.61 10 공구 752 0.53 0.01 2.52 - 상위 품목 전체 - 25.94 43.58 68.84 [자료: KITA] 네팔은 인구의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는 만큼 사탕수수, 차(茶), 옥수수 등의 농작물과 의류, 완구를 포함하는 경공업, 악기, 캐시미어 등의 수공예품을 수출하고 있다. 2021년 네팔의 對한국 수출품은 의류, 섬유제품, 패션잡화 순으로 각각 1~3위를 차지하였으며, 식품류와 악기가 그 뒤를 이었다. <네팔 對한국 2021년 상위 10개 수출품> (단위: 백만 달러) 순위 품목 MTI(3단위) 구분 2019 2020 2021 1 의류 723 0.68 0.53 0.87 2 기타섬유제품 970 0.98 0.76 0.85 3 패션잡화 815 0.15 0.22 0.49 4 기호식품 741 0.45 0.34 0.47 5 악기 790 0.04 0.05 0.15 6 신변잡화 226 0.16 0.11 0.13 7 문구 및 완구 842 0.08 0.12 0.11 8 식물성 재료 814 0.01 0.02 0.10 9 서적 214 0.0008 0.002 0.09 10 식물성물질 752 0.15 0.02 0.08 - 상위 품목 전체 - 2.70 2.17 3.34 [자료: KITA] 네팔 정부는 수출 진흥을 위해 2016년, 9개 품목(직물&섬유, 카펫, 향두구, 차, 파시미나, 허브 등)에 초점을 둔 수출진흥정책인 ‘네팔 무역 통합전략(Nepal Trade Integration Strategy)’를 발표하였다. 이후 2년 만에 동 9대 품목의 수출량이 약 18%까지 증가하였으나, 2019-20 회계연도 이후 국내 소비가 증가하고 원자재, 가공시설, 제조공장 및 인프라 시설 부족 등의 이유로 수출량이 둔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네팔과 한국은 1971년 5월 6일 무역협정을 체결한 바 있으며, 이외에도 네팔은 인도, 파키스탄 등 남아시아 7개국이 합의한 ‘남아시아 자유무역협정(SAFTA)’ 등 14억 명을 거느린 세계 최대 자유무역권에 속해 있기도 하다. <네팔 무역협정 체결현황> 협정명 체결국가 체결일자 FTA(자유무역협정) 대한민국 1971-05-06 SAFTA(남아시아 자유무역협정) 인도, 파키스탄, 네팔, 부탄, 스리랑카, 몰디브, 방글라데시 2006-01-01 BIMSTEC(벵골만 다분야 기술경제협력 기구) 네팔, 방글라데시, 부탄, 인도, 미얀마, 스리랑카, 태국 2004-02-08 (참여시점) FTA(자유무역협정) 미국(1947), 영국(1965), 북한(1970), 이집트(1975), 방글라데시(1976), 스리랑카(1979), 불가리아(1980), 중국(1981), 파키스탄(1982), 인도(1991), 몽골(1992), 폴란드(1992) 등 - [자료: 네팔 산업통상자원부] 네팔 수출 및 통관 시 유의점 네팔은 해외 물품의 수입에 대해 개방적이고 투명한 체계를 갖추고 있다. 관련 규칙과 규정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외의 기관, 그리고 재무부 산하의 관세부(Department of Customs)가 관리한다. 육지로 둘러싸인 네팔의 특성상, 네팔 국제무역의 대부분은 인도의 콜카타 항에 의존하여 수입을 처리하고 있으며, 네팔 정부는 콜카타 건조 항구에 컨테이너 화물 정거장(CFS)를 소유하고 있다. 이외에도 네팔 화물은 인도 서벵골의 할디아을 통해 운송되고 있으며, 2016년 이후에는 안드라프라데시주의 비샤파트남 항구 또한 네팔행 화물에 활용되고 있다. 각 항구에서 수입된 화물은 철도나 도로를 통해 네팔의 국경 세관으로 운송된다. 네팔은 수출입을 촉진하고자 내륙통관창고(ICD)를 개발하고 있다. 현재 4개의 ICD가 운영되고 있으며, 해당 ICD들은 도로 또는 철도로 콜카타 항까지 연결이 되어 있다. 그러나, 연결성을 강화하고자 네팔과 인도정부는 협력을 통해 4개의 통합 체크포스트(ICPS)를 개발 및 운영할 예정이다. 수입업자들이 항공을 이용할 경우, 카트만두에 있는 네팔 유일의 국제공항인 트리부반 공항을 통해 네팔로 배송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 바이라하와(Bhariahawa), 가탐 부다(Gautam Buddha), 포카라 국제공항이 건설 중에 있다. 인도로부터의 수입은 일반적으로 대개 인도 루피로 지불되게 된다. 허나, 그 외의 제3국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해서 정부는 물품에 대한 선불이나, 운임에 대한 별도 지불을 허용하지 않는다. 금지된 품목 외 수입물품 대금에 대한 외화 방출에 제한은 없으나, 시중은행으로부터 외화를 수취하기 위해서는 수입업자가 은행의 요구조건(외환관리양식-BBN3, L/C 금액의 10~100%를 은행에 보증금 형태로 예치 등)을 충족시켜 신용장(L/C)를 발급받아야 한다. 네팔에 양모, 식품, 종자, 의약품, 식물 등을 수출할 경우에는 품목별 품질 인증이 무엇이 필요한 지 무슨 절차를 따라야 하는 지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일반적인 경우, 네팔 세관은 선적 전 검사를 요구하지 않으며, 일반화된 검사 시스템이 없다. 다만, 위의 제품군들에 대해서는 일부 선적 전 검사 또는 품질인증이 요구될 수 있다. (종자, Seed) 종자의 유전적 정체성과 순도를 유지하고, 다양한 품종과 종류를 유지하는 고품질 종자에 대해 인증을 줌으로써, 대중적 이용가능성을 높이고자 한다. 네팔 주요 종자 인증기관은 종자품질관리센터(SQCC), MoAD이며, 지역 종자 시험소 또한 관련 기관으로 볼 수 있다. 인증절차는 씨앗에 적절한 라벨을 부착하여 해당 기관에 등록해야 하는데, 등록할 때 종, 수집 날짜, 수집 장소 등의 정보가 기재되어야만 한다. 참고로 네팔은 ‘National Seed Vision 2013-2025’에 따라 네팔 종자 산업의 발전을 위한 비전을 선포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식품, Food & Food Processing) 네팔은 1999년에 설립된 남아시아 지역 표준 기구(SARSO)의 활발한 회원국 중 하나이며, 식품 및 식품 가공 방법의 지역 표준을 형성하는데 참여하고 있다. 이에 식품, 식품 가공, 식품의 운송 및 보관과 관련한 부문에서 100개 이상의 네팔 자체 표준을 구축하고 있다. 1966년 식품법에 따라, 식품표준화위원회(FSB)라는 별도의 정부기관이 존재하는데, 이 기관은 국제적인 관행과 원칙에 따라 정부의 식품 기준, 원칙,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있다. 이외에도 네팔 국가표준위원회(NCS)는 네팔의 국가표준을 승인할 책임이 있는 기관이며, 네팔 표준 계량국(NBSM)은 NCS의 사무국으로서 식품 및 가공법에 대한 네팔 국가 표준을 작성한다. (의약품, Pharmaceutical Product)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는 의약품 생산에 수반되는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제품이 품질 표준에 따라 일관되게 생산되고 관리되는지 확인하는 시스템이다. GMP는 원재료, 생산 부지 및 장비, 직원의 교육과 위생 등 생산 모든 측면을 관리한다. 많은 나라들이 세계보건기구(WHO)의 GMP를 기반으로 자체적인 시스템을 준수하고 있으며, 네팔 또한 제조 공정의 각 단계에서 올바른 절차를 준수했다는 문서화된 증거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써 GMP를 이용하고 있다. 수입 관세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 기준으로 평가되며, 관세율은 0~80%까지 다양하다. 살아있는 동물, 어류 등 대부분의 1차 제품은 인도에서 수입할 경우 수입관세가 면제되나, 그 외의 국가는 10%의 관세가 적용된다. 필수재 또는 기계류는 5%의 관세율이 일반적으로 책정된다. 관세는 일반적으로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가치에 따라 평가되며, 수입품도 CIF에 관세를 더한 금액에 13% 가량의 부가가치세(VAT)를 부과해야 한다. 수입 관세 및 세금과 관련한 변동사항은 매년 연간 예산안을 통해 발표되며, 시행되기 전에 의회에서 비준된다. 아직은 저조한 교역과 투자진출 네팔 산업부에 따르면, 2021년 한국과 네팔의 교역량은 1.2억 달러를 넘어서며 2011년 교역 수준인 4,400만 달러의 3배 수준으로, 한국-네팔의 교역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네팔의 국가별 수입 비중에서 한국은 1%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네팔의 한국 주 수입 품목은 공작기계, 계측 분석기, 기계류 등의 인프라 산업 중심이며 이에 따라 네팔 정부의 프로젝트와 한국 기업들의 건설 수주량에 따라 교역액 편차가 있는 편이다. 실제로 한국 對네팔 투자 부문에서 전기, 가스 및 공기 조절 공급업이 전체 투자금액의 80%를 상회하고 있으며, 이 또한 신고금액 대비 실제 투자금액이 저조한 편이다. 이를 볼 때 다양한 산업군의 진출 모색이 필요해 보인다. 네팔은 2010년 중반 이후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세계 트렌드에 더 쉽게 노출되었다. K-pop, K-드라마 등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 또한 증대되면서 과거에는 없었던 한류에 대한 인기가 증가하고 있다. 주네팔 대한민국 대사관은 2022년 4월 20일부터 6월 1일까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2022 케이팔월드페스티벌 네팔’을 개최한 바 있다. 총 38팀이 지원하여 지역 예선전을 통과한 10개 팀(댄스 7개 팀, 보컬 3개 팀)이 최종 경연을 펼쳤다. <2022 네팔 K-Pop 월드 페스티벌> [자료: 주네팔 대한민국 대사관] 한국 라면이 네팔에 소개되었던 초기, 주 고객층은 외국인 관광객 및 현지 한인 소비자들 위주의 판매상품 이었지만, 최근 한류 열풍으로 네팔 현지인들의 한국 라면에 대한 인지도 또한 상승하고 있다. 세계 인스턴트 라면 협회(World instant noodles association) 통계에 따르면 2021년 라면 소비량 순위에서 네팔이 13위를 차지(한국 8위), 1인당 소비량 4위(한국 2위)를 차지하였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대네팔 라면 수출액은 2010년대 초 3만 달러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20년 기준 무려 32배 증가한 약 99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한국 라면 특유의 매운 맛이 네팔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것이다. 그러나 최근 아세안 타이 푸드, 와이와이(Waiwai) 등 한국 라면 이미지를 노골적으로 모방한 라면들이 비교적 값싼 가격에 출시되고 있는 바 수출 시 지식재산권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네팔에서 판매되고 있는 라면 제품> [자료: 현지 언론, 각 사 홈페이지] 자료: 주네팔 대한민국 대사관, 대외정책연구원, 현지 및 국내 언론보도 종합, 네팔정부(산업부, 무역수출진흥센터, 통계국 등), KITA, 한국수출입은행, UNCTAD, 세계은행, Statista, IMF 등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뉴델리무역관 류찬영 | 인도 | 2022.08.19
-

- 7월 실적으로 보는 중국 수출입 동향
- 중국 수출이 석달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해관총서에 따르면 2022년 7월 중국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18% 증가한 3330억 달러로 집계됐다. 견조한 해외 수요를 바탕으로 중국 내 물류난이 크게 해소되면서 코로나 봉쇄가 완화된 5월부터 증가폭이 확대되고 있다. 수입액은 전년 동월 대비 2.3% 증가한 2317억 달러로, 4개월째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 7월 중국 교역총액 전년 동월 대비 11% 증가한 5647억 달러 ** 7월 누계 기준 중국 수출입 금액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4.6%, 5.3% 증가한 2조627억 달러, 1조5804억 달러, 교역총액은 3조6431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0.4% 증가 <중국 수출입 증감률(당월, %)> [자료: 해관총서] 수출 미국 등 주요국의 경기 후퇴 우려 속에서 시장은 7월 중국 수출의 상승세가 꺾일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로 중국의 미국향 수출 증가율은 6월의 19.3%에서 7월 11%로 신장세가 크게 둔화했다. 대홍콩 수출은 6월 △6.2%에서 7월 △18.1%로 감소폭이 확대했다. 대한국 수출 증가율도 6월 대비 10%p 줄었다. * 7월 중국 수출 증가율 전망치: 블룸버그 14%대, 현지 증권가 16%대 <수출대상국/지역별 증감률(당월, %)> [자료: CEIC, SWS RESEARCH] 그러나 아세안, 브라질, 러시아, 남아공 등 신흥국에 대한 수출 증가폭이 확대되면서 기대 이상의 ‘깜짝 실적’을 냈다. 7월 중국의 아세안, 남아공향 수출은 30% 이상 늘어났다. 브라질에 대한 수출 증가율은 50%를 상회했고 대러시아 수출은 플러스로 돌아섰을 뿐만 아니라 전년 동월 대비 20% 이상 증가했다. 7월 인도향 수출 증가폭은 6월보다 11.2%p 하락했지만 수출 증가율은 52.6%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EU, 일본 등 선진국에 대해서도 20% 안팎의 견조한 수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일본향 수출 증가폭은 6월 대비 10.8%p 확대했다. <2022년 6월·7월 수출대상국/지역별 증감률(당월)> 선진국 신흥국 미국 EU 일본 캐나다 한국 아세안 인도 브라질 러시아 남아공 7월(%) 11.0 20.4 19.0 12.0 15.3 33.5 52.6 51.1 22.2 30.7 6월(%) 19.3 14.6 8.2 20.0 25.3 29.0 63.8 41.2 △17.0 10.9 증가폭(%p) △8.3 5.8 10.8 △8.0 △10.0 4.4 △11.2 9.9 39.2 19.7 [자료: wind] 품목별로는 중국의 주력 수출 품목 중 노동집약형 제품 수출이 견조한 데 반해 전자제품 수출 신장세가 약화하고 있다. 액정패널 수출 감소폭은 6월 △17%에서 7월 △100%까지 확대됐다. 휴대폰 수출도 두자릿수 감소세를 보였으며 집적회로 수출은 7월 역성장했다. 한편, 중국 자동차 수출은 강세를 보이고 있다. 7월 중국의 자동차 수출 증가율은 6월 대비 42.8%p 대폭 확대되며 64%의 신장세를 기록했다. 자동차 부품 수출 증가율도 6월 13.8%에서 7월 27.3%로 늘어났다. <2022년 6월·7월 품목별 수출 증감률(당월)> 유형 품목 7월(%) 6월(%) 증가폭(%p) 농산품 29.0 24.0 5.0 노동집약형 플라스틱 제품 20.5 18.7 1.8 가방 41.3 47.1 △5.9 방직품 16.1 7.9 8.2 의류 18.5 19.1 △0.6 신발 37.5 45.7 △8.2 완구 27.9 35.3 △7.4 기계설비류 선박 △30.5 16.3 △46.9 일반 기계설비 21.3 8.9 12.4 자동차 자동차 64.0 21.2 42.8 부품 27.3 13.8 13.5 전자제품 휴대폰 △10.3 2.8 △13.1 음향설비 및 부품 8.2 10.9 △2.7 집적회로 △5.3 16.5 △21.8 자동데이터처리기계 및 부품 2.8 9.2 △6.4 액정패널 △100.0 △17.0 △83.0 의료기기 1.6 △1.3 2.8 부동산 관련 세라믹 11.5 18.5 △6.9 가전 △7.7 △13.1 5.4 조명기기 △0.9 5.9 △6.8 가구 및 부품 △2.1 △0.3 △1.8 금속제품 철강 △100.0 52.8 △152.8 알루미늄 58.9 62.7 △3.8 기계전자제품 13.0 12.5 0.5 하이테크 제품 2.4 7.4 △5.0 [자료: wind] 수입 예상 외의 선방을 보여준 수출과 달리 중국의 수입은 계속하여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7월 원유를 제외한 중국 수입금액은 전년 동월 대비 1.6% 감소했다. 3월부터 5개월째 마이너스 구간에 머물러 있다. 중국의 내수 회복세 미진으로 위축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중국 수입 증감률 추이> [자료: 해관총서] 중국의 에너지, 농산품 수입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7월 원유, 석탄, 정제유, 대두 등 품목의 수입금액은 급증했지만 이는 수입단가 폭등에 의한 것이다. 이들 품목의 수입 물량은 지난 2개월간 두자릿수의 감소세를 보였다. <중국 벌크상품 수입 증감률(당월, %)> 수입금액 수입물량 수입단가 7월 6월 7월 6월 7월 6월 농산품 곡물 6.8 △7.1 △17.0 △25.0 28.7 23.9 대두 15.7 △4.8 △9.1 △23.0 27.3 23.8 벌크상품 철광석 △35.8 △28.4 3.1 △0.5 △37.6 △28.1 원유 38.9 43.8 △9.5 △10.7 53.4 61.2 정제유 △9.1 8.5 △35.5 △23.0 41.0 41.0 구리(동) △0.4 22.0 9.3 25.5 △8.9 △2.8 석탄 28.9 16.5 △22.1 △33.1 65.4 74.2 [자료: wind] 현지 업계는 코로나 봉쇄가 완화된 이후에도 중국 중간재 수입, 특히 전자산업 관련 수입 개선세가 미진한 점을 우려하고 있다. 품목별 수입 증감률을 비교해 보면 기계전자류, 전기전자류 제품 중 6월 대비 수입 개선세가 뚜렷한 품목은 공작기계, 자동차, 항공기뿐이며 이중에서도 자동차와 항공기 수입은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감소했다. 중국의 집적회로 수입 감소폭은 6월 대비 2.6%p 개선됐지만 아직 역성장 중이다. 6월 32.5% 줄어든 액정패널 수입은 7월 감소폭이 100%로 확대했으며 자동 데이터 처리기계 및 부품 수입은 7월에도 두자릿수 감소세를 이어갔다. <2022년 6월·7월 품목별 수입 증감률(당월)> 유형 품목 7월(%) 6월(%) 증가폭(%p) 농산품 곡물 6.8 △7.1 13.9 육류 3.4 3.7 △0.3 (신선, 말린)과일 4.2 34.7 △30.4 대두 15.7 △4.8 20.5 식물성 유지 △3.2 △59.7 56.6 벌크상품 철광석 △35.6 △28.4 △7.2 구리(동) △7.2 26.2 △33.4 석탄 28.9 16.5 12.4 원유 38.9 43.8 △5.0 정제유 △9.1 8.5 △17.6 플라스틱 △4.3 △0.2 △4.1 철강 △4.3 △14.9 10.6 기계전자류 자동차 부품 △17.2 △16.9 △0.4 공작기계 5.8 △16.5 22.3 자동차 △7.6 △37.8 30.2 항공기 △45.6 △86.3 40.7 의료기기 △5.1 △3.7 △1.5 전기전자류 집적회로 △2.7 △5.3 2.6 자동데이터처리기계 및 부품 △13.6 △13.2 △0.4 반도체 디바이스 △7.9 △0.4 △7.6 액정패널 △100.0 △32.5 △67.5 기타 고무 10.9 17.8 △6.9 목재류 △24.1 △9.1 △15.0 펄프 △1.4 △2.8 1.4 방직품 △34.2 △15.2 △19.0 의약품/약재 3.9 16.3 △12.4 [자료: wind] 7월 미국을 제외한 주요 수입대상국/지역으로부터의 수입 모두 개선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년 동월 대비 감소세는 면치 못했다. 이중에서 최소 감소폭을 보인 수입대상국/지역은 한국, 대한 수입금액은 작년 7월 대비 0.9% 감소했는데 6월 대비 감소폭이 6.3%p 줄었다. <2022년 6월·7월 수입대상국/지역별 증감률(당월)> 한국 일본 대만 미국 영국 독일 호주 7월 (%) △0.9 △9.2 △5.7 △4.5 △20.1 △6.7 △8.0 6월 (%) △7.2 △14.2 △6.0 1.7 △24.2 △11.9 △15.0 증가폭(%p) 6.3 5.0 0.3 △6.2 4.1 5.2 7.0 [자료: wind] 전망 중국 경기하방 압력 가중, 기저효과 약화, 코로나19 대규모 재확산 및 제로코로나 정책 등으로 중국 수출입이 지속 둔화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경기상황을 가늠하는 신규 수출 수주 PMI(구매관리자지수), 수입PMI는 작년 6월부터 기준선인 50선을 하회하고 있다. 봉쇄 완화와 더불어 6월 49까지 회복됐다가 7월 다시 47선으로 주저앉았다. 현지 수출입 기업들의 체감경기가 악화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 구매관리자지수(PMI)가 기준선을 상회하면 경기 확장, 50선을 밑돌면 경기 위축을 의미함 <중국 신규 수출 수주·수입 PMI] [자료: 국가통계국] 그러나 일각에서는 국제에너지값 급등, 글로벌 공급망 혼란의 ‘반사이익’으로 중국의 수출 수주량이 급격하게 감소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국제에너지값 폭등으로 생산원가 부담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타 지역에 비해 중국은 정부의 강력한 가격 안정화 조치로 에너지값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중국산의 가격경쟁력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SWS RESEARCH(申萬宏源硏究) 등 현지 증권연구소들은 중국은 완비된 제조업 체계를 보유하고 있어 글로벌 공급망 혼란으로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는 타 지역의 신규 수출 수주를 흡수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사회과학원 글로벌거시경제연구실의 추이샤오민(崔曉敏) 부주임은 ‘러-우사태에 에너지 소비구조 개선 등 영향으로 유럽의 에너지 공급부족이 심화되면서 중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 수요가 한동안 견조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추이 부주임은 금속제품, 자동차 및 부품, 전기차 등을 중국의 유럽향 수출유망 상품으로 꼽았다. 시사점 우리 기업들은 중국의 내수 회복세, 특히 전기전자 등 한중 주요 교역 품목 및 관련 산업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사전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중국 내 코로나 대규모 재확산 및 봉쇄조치로 소비심리가 급위축하면서 올 상반기 중국 스마트폰 출하량(1억4000만 대)은 전년 동기 대비 14.4% 감소했다. 이는 우리나라의 주력 대중 수출 품목인 집적회로, 자동 데이터 처리기계 및 부품의 대중 수출 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흐름이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봉쇄 완화에 따라 중국 내 생산 정상화는 빠르게 이뤄지고 있지만 스마트폰 등 전자제품 소비 수요가 위축되고 있는데다가 최근 양안(중국-대만지역)관계가 급격하게 악화하고 있어 중국 전자산업 관련 품목 수입 급회복은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과도하게 반도체와 중간재에 편중한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구조를 개선하고 소비재 비중을 확대하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중국의 코로나 확산세 및 봉쇄조치 등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현지 업계는 7월 중국 전자제품 수출기지인 광둥성의 코로나 재확산 및 방역통제 조치가 관련 제품 수출 둔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7월 광둥성의 본토 코로나19 감염자(무증상 포함) 수는 1000명에 육박했다. 중국의 강도 높은 ‘제로코로나’ 정책은 해당 지역의 생산, 수출, 물류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우리 기업들은 물류 적체 등 요인이 공급망에 미칠 연쇄 효과에 대해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7월 광둥성 본토 코로나19 확진자 수 681명, 무증상 261명, 총 942명 자료: 해관총서, SWS RESEARCH(申萬宏源硏究), 화촹증권(華創證券) 등 KOTRA 베이징 무역관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베이징무역관 김성애 | 중국 | 2022.08.19
-

- 우크라이나 중앙은행, 고정환율 29.25흐리브냐에서 36.57흐리브냐로 조정
- 러-우 사태 직후 우크라이나 흐리브냐가 초 약세를 보이자 우크라이나 중앙은행은 환율 통제에 나섰다. 우크라이나 중앙은행은 2월 24일, 1달러에 29.25흐리브냐로 환율을 고정 했다. 그 뿐 아니라, 고객의 외화 판매를 제외한 외환 시장 운영을 중단하였으며 계좌에서 외화로 현금을 인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국가 간 통화 지불에 대한 모라토리엄을 시행했다. 해외 투자도 금지했고, 또한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은 동결되었다. 중앙은행의 이러한 조치는 흐리브냐의 평가 절하를 크게 억제하고 외환 보유고를 유지도록 하였으며 자금 유출을 제한했다. 이를 통해 흐리브냐의 추가적인 평가 절하와 해외 자본의 상당한 유출을 피할 수 있었다. 중앙은행은 이후 점진적인 통화정책을 완화하기 시작했다. 특히, 4월 14일부터 은행이 국민에게 현금 외화를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2,3월 환전 시장 환율은 중앙은행 고정환율 29.25 흐리브냐와 큰 차이 없이 유지되었으나, 4월 중순으로 접어들면서 격차가 나기 시작했다. 고정환율과 비교해 약 2흐리브냐의 격차가 나기 시작하다가 5월 하순에는 중앙은행 환율 대비 약 6흐리브나 이상 격차가 나게 되었다. 우크라이나 중앙은행장 Kyrylo Shevchenko는 고정환율 시스템은 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높은 현재 상황에서 경제의 안정 장치임에 틀림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5개월 넘게 전쟁이 지속되고 있으며 그 동안 우크라이나와 세계 경제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고 이러한 상황에서 29.25 흐리브냐 공식 환율을 유지하는 것은 더 이상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따라, 7월 21일, 중앙은행은 미국 달러 대비 가치를 25% 절하하기로 결정하고 달러당 환율을29.25흐리브냐에서 36.57흐리브냐로 조정했다. 달러화 강세와 함께 전쟁에 따른 우크라이나 경제의 구조적 특징의 변화가 통화 가치 변화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우크라이나의 채무상환 연기 요청이 미국 등 주요 채권단의 동의를 얻은 지 하루 만에 단행됐다. <전쟁 이후 환율 변동 현황> (단위: UAH) 날짜 환전 시장 평균 환율 중앙은행 고정환율 2월 24일 29.20 29.25 3월 1일 29.25 29.25 3월 15일 29.25 29.25 4월 1일 29.25 29.25 4월 15일 29.26 29.25 5월 1일 31.85 29.25 5월 15일 32.00 29.25 6월 1일 35.00 29.25 6월 15일 35.10 29.25 7월 1일 35.17 29.25 7월 15일 37.00 29.25 7월 21일 36.55 36.57 [자료: Minfin] 이는 우크라이나 제조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비즈니스의 경제 회복력을 높이고 전시 상황에서 경제의 안정성을 지원할 수 있다고 중앙은행은 보았다. 이러한 조치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분분하다. 몇몇 전문가들은 전쟁이 끝나기 전이나 후에 변동 환율로 복귀하게 되면 흐리브냐 가치 하락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크라이나가 전쟁 전에 가지고 있던 부채를 상환해야할 뿐 아니라 전쟁 중에 빌린 부채 또한 상환해야 하기 때문이다. 경제 학자 Khmelevsky는 고정환율을 유지한다고 해도 흐리브냐의 평가 절하는 계속될 것으로 예측했다. 전쟁 중에 기업들과 국민들 모두 외화로 자금을 저축하려고 할 것이며, 국가 예산의 적자는 채권 발행으로 자금 조달하는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전쟁 전후 흐리브냐의 완전한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고정환율을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경제학자 Oleksiy Gerashchenko는 환율 조정이 향후 수입업자에게는 큰 손해를 입히게 될 것이며, 수입품 가격이 25% 인상될 수 있다고 했다. 우크라이나 정치 연구소 소장 Ruslan Bortnik은 환율 조정이 흐리브냐의 평가 절하를 확실히 가속화하며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게 할 수 있다고 했다. 현재 시장 환율은 8월 2일기준, 달러 당 40.58흐리브냐이다. 환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중앙은행은 7월 29일부터 환전소 환율 현황판에 환율 정보 표시를 금지하였다. 중앙은행은 사설 환전소의 부풀린 환율이 소비자의 불안 심리를 가중시키고 이로 인해 통화 구매와 시장 환율의 큰 변동으로 이어졌다고 한다. 금지 조치 이후에 소비자들의 심리적 불안이 감소하면서 시장 상황이 안정되어 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중앙은행은 이를 시작으로 환전소의 새로운 운영 규칙을 시행하고자 준비하고 있다. 첫번째로, 정해진 요율에 대해 제한 조치를 시행 예정이다. 현재 환전소가 현재 수요와 시장 상황을 기반으로 매수/매도 비율을 설정했다면, 장차 더욱 엄격한 제한을 설정할 예정이다. 두번째로, 디지털 스코어보드를 통한 환율 정보 금지 뿐 아니라 플랫폼을 통한 정보 제공 금지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셋째로, 환전소에 부과하는 세금 인상 방안이다. 넷째로, 환전소의 활동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처음은 서면 경고 하고 두번째 위반시에는 환전 면허가 취소된다. 중앙은행은 금융시장의 상황을 계속 살피고 투명한 시장을 위해서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전쟁이 6개월 이상 지속되면서 어려운 경제 상황속에서도 경제활동을 재개하려는 우크라이나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시장은 환율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다. 제품을 수입하는 바이어들은 특히 더하다. 바이어들에게 있어 흐리브나-달러 환율이 높은 것도 문제이지만 환율이 어떻게 변동이 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수입을 주저하게 만드는 원인 중의 하나이다. 지금으로선, 우리나라 기업들이 환율의 변동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 unian, gk-press, glavcom, ukrinform, epravda, bank.gov,minfin, KOTRA 키이우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우크라이나 | 키이우무역관 최한나 | 2022.08.18
-

- 재선에 비상걸린 브라질 정부, 물가 억제에 올인
- 브라질은 역사적으로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경제가 불안했던 경험이 있는 국가다. 인플레이션이 가장 극심했던 때는 월 물가상승률이 무려 80%에 달했던 1980년대와 1990년대를 꼽을 수 있다. 1980년대 연평균 인플레이션은 233.5%였으며 1990년대에는 499.2%를 기록했다. 당시 브라질 정부는 물가를 잡기 위해 여러가지 경제 정책을 펼친 끝에 까르도주 대통령 정부가 발표한 플라누 헤알(Plano Real) 정책으로 천정부지로 치솟았던 물가가 겨우 잡혔다. 이후 브라질 물가는 등락을 반복하며 하향 안정세를 보여왔으나 코로나19에 따른 경제활동 위축, 글로벌 공급망 대란, 환율 상승 등으로 인해 2021년 연간 물가상승률은 10.06%를 기록했다. <브라질 물가 상승률 변화> (단위: %) [자료: IBGE]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물가상승 문제는 브라질뿐 아니라 전 세계를 강타했다. 코로나로 경직된 글로벌 금융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경제 성장 둔화를 가져왔고 경제, 정치, 사회적 불평등은 더욱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다. 응용경제연구원(IPEA)은 "2022년 브라질 경제는 성장하겠지만 시장 개방, 백신 접종자 증가, 감염자 수 및 사망률 감소에도 불구하고 느리고 점진적인 속도로 성장할 것이다”고 예측을 하였다. 브라질 글로벌 기후변화 연구 네트워크(Rede CLIMA)의 전문가 그룹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 여파가 2045년까지 지속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연료비 하락으로 물가상승률 진정세 브라질 통계원(IBGE)에 따르면 2022년 7월 기준 브라질의 물가상승률(IPCA)은 -0.68%를 기록했다. 지난 12개월 동안 누적치는 10.07%였다. 7월 물가상승률은 IBGE가 조사를 시작한 198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이다. <월별 물가상승률 변화(22.1~7.)> image2.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38pixel, 세로 279pixel" src="https://dream.kotra.or.kr/attach/namo/images/000235/20220813035721505_ZJPX8HKV.png" style="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sans-serif !important; font-size: 18px !important; width: 437px;"> [자료: IBGE] <최근 12개월 누적 물가상승률 변화(22.1~7.)> image3.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96pixel, 세로 250pixel" src="https://dream.kotra.or.kr/attach/namo/images/000235/20220813035721606_7ICYIYDG.png" style="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sans-serif !important; font-size: 18px !important; width: 496px;"> [자료: IBGE] 7월 물가 진정은 브라질 정부의 가솔린 등 연료 가격 인하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보우소나루 정부는 서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연료비에 부과되는 유통세(ICMS)에 상한선을 정했다. 유통세(ICMS)는 주 정부의 주요 세수원이다. 유통세가 줄면서 7월 한달 동안 가솔린 가격은 전월 대비 약 20% 하락했다. 6월 말 1리터 당 7.39헤알이던 가솔린 가격은 7월 말 5.89헤알로 낮아졌다. 전문가들은 12개월 누적 물가상승률이 7월 10.07%에서 9월에는 8%대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Rio bravo Investimento의 전문가 Luca Mercadante는 “최근 물가가 다소 하락했으나 여전히 소비자들에게는 높은 수준이다"라고 말했다. 브라질 중앙은행이 발표한 최근 경제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말 물가상승률은 7% 안팎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전년보다 3%P 정도 낮은 수치지만 중앙은행의 목표치인 3.5%(최소 2%, 최대5%)를 크게 벗어나는 것이다. 물가상승으로 정부에 대한 불만 커져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정부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 보우소나루 정부는 구매력이 현저하게 떨어진 소비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10월 재선에 성공하려는 목표 아래 각종 세금 감면과 Auxilio Brasil과 같은 저소득층 지원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이 같은 취지에서 ‘에너지 가격 인하’ 정책을 발표하였고 물가상승률을 끌어내리는 데 어느 정도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저소득층에게는 연료 가격보다 식료품 가격 상승이 더 민감한 부분이다. 2022년 7월 식료품 가격은 전월 대비 1.3% 올랐다. 같은 달 가솔린 가격은 15.48% 하락했으나 우유 가격은 25.46% 상승했다. Investimentos BRA의 전문가는 “7월 연료 가격이 하락한 것은 조세 감면 덕분이다. 그러나 머지않은 시기에 줄어든 세수를 보상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가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전문가들은 연료 가격 하락이 8월에도 영향을 미쳐 인플레이션 진정세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9월부터는 물가가 다시 상승세로 전환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을 공통적으로 나타냈다. <7월 카테고리별 물가상승률> (단위: %) image4.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51pixel, 세로 253pixel" src="https://dream.kotra.or.kr/attach/namo/images/000235/20220813035721705_2X4JFYC7.png" style="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sans-serif !important; font-size: 18px !important; width: 350px;"> *주: Alimentaçaõ e bebidas: 식품 및 음료수 가격, Despesas pessoais: 개인 지출, Vestuário: 의류비, Saúde e cuidados pessoais: 보건 및 개인위생, Artigos de residência: 주거용 아이템, Comunicação: 통신비, Educação: 교육비, Habitação: 주거비, Transportes: 교통비 [자료: IBGE] <최근 12개월 카테고리별 물가상승률> (단위: %) image5.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53pixel, 세로 289pixel" src="https://dream.kotra.or.kr/attach/namo/images/000235/20220813035721802_OP6713TD.png" style="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sans-serif !important; font-size: 18px !important; width: 452px;"> *주: Vestuário: 의류비, Alimentaçaõ e bebidas: 식품 및 음료수 가격, Artigos de residência: 주거용 아이템, Transportes: 교통비, Despesas pessoais: 개인 지출, Saúde e cuidados pessoais: 보건 및 개인위생, Educação: 교육비, Habitação: 주거비, Comunicação: 통신비 [자료: IBGE] 물가상승으로 더 어려워진 저소득층 브라질에서 인플레이션의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저소득층이다. 저소득층은 최저임금인 1,212헤알에서 그의 5배인 6,060헤알까지의 소득을 가진 가구를 의미한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2021년 10월까지 식품 가격은 21.39%, 주거비는 15.39% 상승했다. 저소득층의 경우 월 소득의 대부분이 식비와 주거비에 사용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 브라질 국민의 연평균 소득은 전년대비 10.2% 감소했다. 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한 식품은 쌀, 설탕, 육류 등이었으며 가스와 에너지도 많이 올랐다. 브라질, G20 국가 중 네 번째로 물가상승률 높아 브라질은 G20 국가 중 네 번째로 물가상승률이 높은 국가이다. 최근 12개월 누적 물가상승률을 살펴보면 1위 터키 79.6%, 2위 아르헨티나는 64%, 3위 러시아 15.9%, 4위 브라질 10.1%로 조사됐다. 브라질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미국은 8.5%로 7위에 이름을 올렸다. 브라질 제품 가격의 약 30% 이상은 미국 달러 환율 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G20 국가의 물가상승률> (단위: %) [자료: Quantzed] 전문가 인터뷰 Bradesco 은행의 Paulo 애널리스트는 “대통령 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현 정부는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상황 개선 및 백신 접종자 증가로 기업들이 대부분 정상 업무로 복귀하고 있어 경제 회복세가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선거를 앞두고 정치 불안이 더욱 커지면서 환율이 크게 변동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새로운 변종 확산, 팬데믹 이후 부정적인 경제 전망, 공급망 대란에 따른 원자재 가격 변동 등 2022년은 여러 측면에서 불확실성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의견을 나타냈다. 시사점 팬데믹 기간에 브라질 정부 투자는 질병 확산과 그 영향을 통제하기 위한 건강, 재정 및 금융 정책에 집중되었다. 이러한 공공정책을 집행하기 위해 브라질 정부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지출했으나 비효율적인 정책 때문에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다. 올해 대선에서 재선을 노리는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국영에너지회사 Petrobras를 압박해 물가상승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연료비 상승세에 제동을 걸었다. 그 결과 7월에 이어 8월까지는 물가가 진정세를 보일 것으로 관측되지만 이후에는 물가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대선을 전후해 물가상승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자료: Folha de Sao Paulo, Valor Economico, KOTRA 상파울루 무역관 보유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상파울루무역관 최선욱 | 브라질 | 2022.08.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