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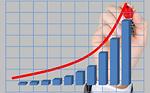
- 인플레이션 40년 만에 최고치, 2022년 하반기 캐나다 경제 상황은?
- 2022년 7월 캐나다의 인플레이션은 8.1%를 기록하면서 40여 년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 같은 이례적 경제 상황에 기여한 가장 큰 요인은 유가 상승으로 분석되며, 현재 캐나다 휘발유 가격은 전년대비 54.6% 증가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캐나다 내 물가 부담은 점점 심화되고 있으며 예상 밖의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식료품 가격이 크게 인상되면서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적잖은 피해가 예상된다. 이러한 가운데 2022년 캐나다 하반기 경제 상황과 전망에 대해 파악해 보고자 한다. 인플레이션 압박에 캐나다 중앙은행 기준금리 2.5%까지 인상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심화됨에 따라 캐나다 중앙은행(Bank of Canada)은 7월 13일 기준금리를 2.5%까지 인상했다. 기준금리가 한 번에 1%p(100bp) 인상된 것은 24년 만에 처음으로, 업계와 국민들은 적잖은 충격을 받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G7국가 중 물가 안정을 위해 기준금리를 1%p 올린 경우는 캐나다가 처음이다. 중앙은행은 캐나다의 인플레이션은 예상보다 더 심각하며 따라서 이번 인상은 이례적인 경제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캐나다 인플레이션 및 기준 금리 현황> [자료: 캐나다 중앙은행, 캐나다 통계청] 캐나다의 인플레이션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식료품 및 휘발유 가격, 무역 거래 영향, 공급망 붕괴로 인한 물류 비용 등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내 수요 변화도 원인이 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팬데믹 이후 소비재와 비접촉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고 주택, 렌트 등의 비용도 크게 증가하면서 영향을 미쳤다. 더불어 중앙은행은 캐나다 소비자 물가 지수를 구성하는 항목의 절반 이상이 5% 이상 상승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캐나다 CPI 인플레이션 기여 요인> (단위: %p) [자료: 캐나다 중앙은행, 캐나다 통계청]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을 2~3%까지 낮추기 위해 올해 이미 세 차례 금리를 인상했다. 이번 기준금리 인상 발표 시 중앙은행은 높은 인플레이션이 고착될 경우 국가 경제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물가 안정을 회복하려면 더 높은 금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금리 인상으로 인해 국민들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경제 지출이 감소해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시점이다. 인플레이션 고조, 식품업계 경고등 캐나다 경제 상황이 고조됨에 따라 식품 공급업체들은 식료품점 소매상들에 올가을 가격 인상이 또 한 번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캐나다 낙농 위원회(Canadian Dairy Commission)가 오는 9월 올해로 두 번째 인상을 시행할 예정임에 따라 식품 물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우유, 치즈, 요거트 등의 유제품 가격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퀘백주에 위치한 낙농 회사 Saputo Dairy Products Canada는 생산 비용, 사료 및 비료 등이 모두 증가함에 따라 농장 생산 우유의 가격 조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캐나다 통계청의 최신 소비자 물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월 식품 가격은 전년도에 비해 9.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CBC News는 캐나다 통계청의 자료를 기반으로 물가가 상승한 대표 품목 16개를 지정했는데 이는 닭가슴살 및 다진 소고기 등의 육류부터 오렌지, 사과 등의 과일, 양파, 고추, 밀가루 및 관련 식품, 식물성 오일, 커피, 참치캔 등이 포함된다. 특히 신선 과일과 신선 야채는 각각 전년도에 비해 10%, 8.2% 증가했다. 가장 큰 인상이 있는 제품은 쿠킹 오일로 전년도와 비교해서 약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 식품 품목별 전년대비 가격 인상 현황> [자료: CBC News] 한편 캐나다 푸드 뱅크(Food Banks Canada)는 캐나다인 4명 중 1명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먹어야 되는 양보다 적게 먹고 있다”는 데이터를 발표했다. 더불어 최근 푸드 뱅크를 통해 식품을 공급받는 인구가 급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특히 푸드 뱅크 측은 올해 푸드 뱅크를 처음으로 방문하는 캐나다인들이 급속도로 유입되고 있어 올여름은 기관의 41년 역사상 가장 힘든 시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캐나다인들은 주택, 기름, 식품 비용 상승으로 인해 식량을 구입할 돈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2022년 하반기 캐나다 경제 전망 중앙은행의 7월 통화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3분기 캐나다 GDP는 2분기 4%에서 2%로 하락하며 성장이 느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면 서비스에 대한 억눌린 수요가 완화되면서 소비 성장은 완만해질 것으로 기대되나 높은 인플레이션에 따라 가계 예산은 줄어들고 저축률이 증가할 것으로 분석된다. 주택시장 활동 또한 하반기 들어 급격히 낮아지고 있으며 대출금리가 높아지면서 주택 가격도 낮아지는 추세다. 다만 수출 및 비지니스 투자 부문은 성장세에 있으며 3분기에 팬데믹 이전 수준을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미국의 산업 성장과 여행 규제 완화에 따라 향후 캐나다 수출 시장은 단기적으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에너지 부문 관련 수출과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2022년 3분기 캐나다 경제 전망> (단위: %p) [자료: 캐나다 중앙은행, 캐나다 통계청] 캐나다 경제는 현재 모든 지표상 생산 능력 이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분석된다. 수많은 기업들이 노동력 부족 현상을 겪고 있으며 물류 대란도 지속되어 생산 및 판매에 악영향을 받고 있다. 특히 자동차 부문에서는 여전히 반도체 소싱과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적잖은 피해를 보고 있다. 일례로 중앙은행이 기업 1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22년 2분기 기준 인력난과 공급망 문제를 겪는 기업 수는 각각 60개, 40개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물가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 속에서도 캐나다 중앙은행은 올해 3.5%, 2023년에 1.75%, 2024년에는 2.5% 경제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인플레이션은 올해 후반에 다시 하락하기 시작해 내년 말까지 약 3%로 완화되고 2024년 말까지 2% 목표치로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앙은행은 향후 3년간 유가 및 공급망 문제 등이 완화되면서 인플레이션은 하락할 것이고 캐나다 경제는 경기 연착륙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캐나다 CPI 인플레이션 전망> [자료: 캐나다 중앙은행, 캐나다 통계청] 시사점 현재의 캐나다 경제 상황은 글로벌 요소들이 큰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예측이 어렵고 불확실성이 크다.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이 차츰 완화돼 내년도에는 경제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예상하지만 캐나다가 곧 경기 침체를 겪을 것이라고 전망하는 의견도 적지 않다. 캐나다 정책 대안 연구소(CCPA)는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오히려 경기 불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캐나다 왕립은행(RBC)는 노동력 부족, 식품 및 유가 상승, 금리 인상 등이 맞물리면서 불경기가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일부 경제학자들은 캐나다의 인플레이션은 현재 수치보다 더 높은 8.4%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물가 부담으로 소비 위축이 우려되는 현 시점, 우리 기업들은 적절한 전략을 통해 불경기를 극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자료: 캐나다 통계청, 캐나다 중앙은행(Bank of Canada), 캐나다 푸드 뱅크(Food Banks Canada), 캐나다 정책 대안 연구소(CCPA), 캐나다 왕립은행(RBC) 보고서, CBC News 등 미디어, KOTRA 밴쿠버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밴쿠버무역관 김진영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08.09
-

- 브라질 탄소배출권 시장 어디까지 왔나?
- 브라질 탄소배출 감축시장 동향 세계 탄소배출 거래시장은 1997년 '교토의정서 - 탄소배출 절감 협약'에 180개국이 서명하면서 시작되었다. 주요 국가들은 2012년까지 가스배출량의 5.2%를 감축하기로 합의하였다. 2015년 파리협정 이후 각국이 감축해야 하는 탄소량은 증가하였고 기업들이 자율거래시장에서 배출권을 판매하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졌다. 파리협정에서는 195개국이 '탄소배출 절감·기후정책'에 서명했으며 NDC(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도 확정되었다. 브라질도 2015년 탄소배출절감 협정에 서명하여 2005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5년까지 37%, 2030년까지 43% 감축 해야한다. 2021년 개최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는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50% 상향 조정되었다. 세계 탄소배출권 시장은 유럽연합(EU)이 주도하고 있는데 'Refinitiv Financial Solutions'에 따르면 2020년 세계적으로 2,290억 유로의 탄소배출권이 거래되었다. 현재 유럽은 세계 탄소배출권 거래량의 90%를 차지한다. 이는 2017년 보다 5배 많은 수치다. 탄소배출권 가격은 1~137달러로 편차가 컸는데 평균 10달러에 거래되었다. WayCarbon과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2021년에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브라질은 2030년까지 농업, 수목, 친환경 에너지 산업에서만 1,000억 달러의 탄소배출권(약 10억 톤)을 생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브라질은 14,500개의 탄소배출 절감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이고 세계 탄소배출권 자유거래시장에서 거래되는 탄소배출권의 5~37.5%, 규제거래시장에서 거래되는 탄소배출권의 2~22%를 공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규제거래시장에서 거래되는 탄소배출권은 REDD(산림전용 및 산림 황페화 방지), CDM(청정개발체제) 인증을 받아야 거래할 수 있다. 탄소배출권은 유엔이나 독립된 전문기관이 인증해줄 수 있다. 브라질에서는 '골드 스탠더드(Gold Standard)', '자발적 탄소표준(VCS : Verified/Voluntary Carbon Standard)' 인증도 통용된다. 탄소배출권 시장은 규제거래시장과 자유거래시장으로 구분되는데 브라질에서 아직 규제거래시장은 부재하고 자유거래시장이 주도하고 있다. 주요국 탄소배출권 자유거래시장 규모는 2021년 탄소배출권 거래량 기준 인도(2,310만톤), 미국(1,440만톤), 중국(1,020만톤), 브라질(460만톤)이었다. 브라질은 자유거래시장 거래량 순위 7위에 올랐다. 브라질 언론사 'Casa JOTA'에 따르면 2021년 세계 탄소배출권 규제거래시장 규모는 8,000억 달러였고 자유거래시장 규모는 10억 달러였다. 아직 자유거래시장은 규모가 작지만 규제거래시장이 없는 국가 위주로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자유거래시장은 2030년까지 300~5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이다. 브라질 기업들은 산림복구나 '풍력·태양광, 폐기물,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설'을 통해 탄소배출권을 확보하고 자율거래시장에 판매하고 있다. 많은 기업들은 아직 자국에 탄소배출권 거래 제도가 없어도 회사 이미지를 개선하거나 ESG 연계 투자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자율거래시장에 참여한다. 신재생에너지 회사, 수풀림을 조성하는 회사들은 기타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 탄소배출권을 인증받기도 한다. 많은 브라질 회사들은 '과학 기반 감축목표 이니셔티브(SBTi)' 등 전문기관에서 탄소배출 절감량을 인증받고 거래소에 판매하는 방법을 자문받는다. 브라질 정부는 탄소배출권 규제거래시장 도입을 위해 법적·경제적 측면을 검토하고 있는데 여러 산업계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신중한 입장이다. 참고로 브라질 정부는 자동차 연료산업에 한정된 탄소배출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2017년 법률(Lei 13.576) 제정을 통해 RenovaBio 프로그램을 출범시켰고 바이오연료 생산회사와 연료 유통회사는 'CBio'를 브라질 증권거래서(B3)에서 거래한다. 연방정부는 바이오연료 사용 증진을 위해 RenovaBio 프로그램을 구상했다. 바이오연료 생산회사는 전문기관으로 부터 인증을 받아 Cbio 크레딧을 생성하고 금융기관을 통해 유통할 수 있다. 연료 유통회사들은 매년 연방정부로 부터 부여받는 목표를 채우기 위해 CBio를 구매해야 한다. 2021년 2,980만개의 CBIO가 거래되었고 거래액은 11억7,000만 헤알이었다. 정부는 2022년 CBIO 목표를 3,600만개로 설정했다. 2022년 중순까지 CBIO 평균가격은 90.45헤알에 형성되었으며 이 추세를 이어간다면 연말까지 30억 헤알의 CBIO가 거래될 것이다. <브라질 탄소배출권 규제거래시장 vs 자유거래시장 비교> [자료 : UNFCCC :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 협약] 탄소배출권 거래 법률 제정 움직임 (임시법률)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이후 브라질 국회는 탄소배출권 규제거래시장 도입 준비를 위한 임시법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브라질 국회는 2009년 교토 의정서 서명 이후 탄소거래권 제도 도입을 위한 환경조성을 위해 법률(Lei 12.187)을 제정하였다. 2022년 국회는 임시법안(PL 528/2021)을 상정하였고 하원 투표를 기다리고 있다. 'PL 528/2021 임시법안'은 탄소배출권 규제거래시장의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고 탄소배출 감축 목표를 부여받을 산업군 선정을 목표로 한다. 임시법안은 탄소배출권 등록, 인증, 거래방식, 감독 등 제도시행을 위한 세부사항도 다룬다. 규제거래시장은 경제부(Ministério da Economia) 산하 '국가 기후정보 등록기관(INRDC)'이 관리할 예정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자유거래시장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는 방안도 논의되었다. 임시법안에는 탄소배출권이 자유거래시장에서 거래될 때 사회기여세(PIS/Cofins), 연간이윤세(CSLL)를 감면·면제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탄소배출권 규제거래시장에 포함될 유력한 산업군은 전력 생산·배전, 교통(운송, 승객), 제조업(소비재 포함), 화학, 종이·셀룰로오즈, 광물, 건설·엔지니어링, 보건, 농업이다. (대통령령) 연방정부는 2022년 5월20일 대통령령(Decreto Federal nº 11.075)을 발표하였는데 브라질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시행을 위한 액션플랜을 담고있다. 브라질 정부는 2009년 '국가 기후변화 정책(Política Nacional sobre Mudanças de Políticas Climáticas)'을 수립하였는데 이번에 발표된 대통령령 (nº 11.075)은 기후변화 정책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액션플랜들을 제시한다. 대통령령 제정에는 경제부(Ministério da Economia), 환경부(Ministério do Meio Ambiente)가 참여하였다. 각 산업군들이 달성해야 하는 탄소배출 절감분을 확정하지 않지만 대통령령은 브라질 주요 9개 산업군이 대통령령 발표 후 180일 이내에(180일 연장 가능) '산업별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제출할 것을 권고한다. 계획을 제출해야 하는 산업군은 전력, 교통, 제지·셀룰로이즈, 광산업 등이다. '배출권 등록', 인증방법, '탄소 배출권 인증기관', '감축목표 미달성 시 패널티'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기재되지 않았다. 연방정부는 탄소배출권 규제거래시장 도입을 위해 '국가 가스배출 절감 시스템(SINARE)'을 구축하기로 했는데 탄소배출권 관련 모든 정부는 이 시스템에 기록될 예정이다. ※ '국가 가스배출 절감 시스템(SINARE)'에 등록되는 정보 ① 탄소발자국 (개인 또는 단체가 직접·간접적으로 발생시키는 온실 기체의 총량), 기업 프로세스·활동 ② 산림탄소 흡수량 ③ 토양의 탄소 저감 ④ 블루카본 측정 ⑤ 탄소저장소 정보 대통령령은 기업들이 메탄 배출 감축분도 별도 시스템에 등록하고 거래할 수 있다고 기재하나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나오지 않았다. 유럽 등 주요국은 탄소배출 절감 프로그램 운영 시 메탄도 다른 온실가스와 합쳐서 관리한다. 기업들은 브라질 정부가 메탄을 분리하여 배출권 거래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하는 이유를 궁금해하고 있다. 아직 대통령령(Decreto Federal nº 11.075)은 탄소배출권 규제거래시장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뿐이며 구체적인 방안은 연방정부가 차츰 발전시킬 예정이다. 경제부와 환경부가 탄소배출권 제도 관련 발전시킬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경제부·환경부가 탄소배출권 규제거래시장 관련 발전시킬 내용 ① 탄소배출권 등록 ② '국가 가스배출 절감 시스템(SINARE)'에 등록되는 인증 기준 ③ 탄소배출권 인증자 정보 검증 ④ SINARE 시스템 운영방식 ⑤ 탄소배출권을 공공정보로 등록, 디지털 환경을 통해 접속가능성 ⑥ 타 탄소배출권 거래 시스템과 호환가능성 등 대통령령은 뒷받침하는 법률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령 (nº 11.075)이 제정되었다고 해서 탄소 규제거래시장이 바로 개시되는 것은 아니다. 여러 산업계가 동의하고 임시법안 등을 거쳐 구체적인 법률이 만들어져야 브라질에서 정식 탄소거래시장이 개시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령이나 임시법률은 명확한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방식을 언급하지 않았으나 '캡앤트레이드(Cap and Trade)' 방식이 유력하다. 유럽에서 사용하는 제도로 연방정부는 '각 산업계와 기업이 배출할 수 있는 탄소배출 한도'를 만들고 기준 배출량 이하로 탄소를 배출한 기업은 거래소에 배출권을 매각할 수 있다. 생활이나 여행 중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돈으로 환산해서 지불하고 모인 돈으로 이산화배출 저감사업에 투자하는 '오프셋(Offset)' 제도도 제시되었다. 기업 동향 브라질 탄소배출권 측정·거래지원 회사인 Carbonext는 자유거래시장에서 2022년 중순까지 245만개의 탄소배출권을 거래했다. 금액으로는 3,000만 달러에 달한다. Carbonext는 경제사회개발은행(BNDES), TIM, 우버(Uber), 하이젠(Raízen) 등을 고객으로 두고 있다. 경제사회개발은행(BNDES)은 2022년 창립 후 처음으로 탄소배출권을 구매했다. BNDES는 2022년 3월 1,000만 헤알 규모의 탄소배출권을 구매하고 수년 내 구매액을 1억~3억 헤알로 확장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리우데자네이루 시는 '브라질 탄소 마켓플레이스' 설립에 관심이 있어 'AirCarbon Exchange(ACX)'라는 탄소배출권 거래회사와 탄소 자유거래시장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리우데자네이루 주는 '나스닥 마켓 테크놀로지(Nasdaq Market Technology)' 및 '글로벌 환경자산 플랫폼(Global Environment Asset Platform)'과 탄소배출권 플랫폼 구축 등을 논의하고 있다. 기업들도 탄소배출권을 자유거래시장에 판매하기 위해 여러 친환경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브라질 알루미늄 제조회사 CBA는 '대서양 수풀림(Mata Atlântica)', 세하두(Cerrado) 보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브라질에서 탄소배출권 규제거래시장이 개시되면 획득한 탄소배출권을 거래할 계획이다. 오메가 에네르지아(Omega Energia)는 유엔에서 CDM(청정개발체제) 허가권을 받았으며 2021년 353만개의 탄소배출권을 판매했다. 탄소배출권 매출은 2,200만 헤알이었다. 오메가 에네르지아는 브라질 8개 주에 신재생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발전용량은 1.869GW다. 2022년에는 이미 획득한 100만개의 탄소배출권을 판매하고 세계 자유거래시장에도 진출하고자 한다. 오리존 VR(Orizon VR)은 2021년 기준 브라질에 고형폐기물 발전소 및 5개의 쓰레기 매립지를 운영하고 있다. 이 회사는 2022년 7개 신재생 발전소를 추가로 매입하여 탄소배출권 410만개를 확보할 계획이다. 우르카(Urca Comercializadora de Energia)는 네오에네르지아가 운영하던 '텔레스 피레스 수력발전소(Hidrelétrica Teles)' 인수를 통해 230만개의 탄소배출권을 확보했고 협력사가 운영하는 가스화력발전소(UTE Prosperidade III)가 배출하는 탄소와 상쇄했다. 'EDF신재생에너지(EDF Renewables)'는 파라이바주에 2023년까지 '세하지세리두(Serra de Seridó)' 풍력발전소를 건설할 예정이다. 이 발전소 건설을 통해 20만8000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이 억제될 것이다. 페트로브라스(Petrobras) 대관 담당 임원 하파엘 샤베스(Rafael Chaves)는 페트로브라스도 수년 내 탄소배출권 매입, 판매 사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페트로브라스는 1억2,000만 헤알을 수풀림 조성에 투자해서 온실가스를 흡수하고 탄소배출권을 획득할 계획이다. 아직 브라질 내 탄소배출권 규제거래시장이 형성되지 않았기에 자유거래시장에서라도 참여하겠다는 입장이다. 수풀림 조성에 필요한 투자금 50%는 경제사회개발은행(BNDES) 대출을 통해 충당할 예정이다. 프랑스 전력회사 엔지(ENGIE)는 브라질 내 CDM(청정개발체제)에 인증을 받은 13개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 회사는 신재생 발전소 운영을 통해 확보된 탄소배출권을 브라질 및 글로벌 회사에 판매한다. 수력, 풍력, 태양광, 바이오매스 등 발전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지라우 수력발전소(Hidrelétrica de Jirau)만 연간 600만개의 탄소배출권을 생성한다. 펄프·제지회사 수자누(Suzano)는 750만개의 탄소배출권을 인증받고 있으며 자유거래시장에 유통할 계획이다. 왈터 솰카(Walter Schalka) 대표는 "펄프·제지 산업은 연방정부가 탄소배출절감 계획안을 요청한 9개 산업에 포함되므로 회사 자체적으로 적극적으로 탄소배출 절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브라질에서도 규제거래시장이 확립되어야 수자누 등 대기업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적극적으로 탄소배출권 생성 사업을 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농업, 수풀림 조성, 신재생 에너지가 향후 브라질에서 탄소배출권을 생성하는데 가장 유망한 분야라고 언급한다. 예를 들어 농기업은 수풀림을 조성하고 에탄올·설탕회사는 사탕수수를 가공하는데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면서 탄소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축산기업은 가축이 배출하는 메탄가스를 절감하면서 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다. 브라질이 배출하는 탄소 중 절반 정도가 아마존 등 수풀 파괴에서 발생한다. 이 점을 고려할 때 기업들은 수풀림 조성 프로젝트에도 많은 금액을 투자할 것으로 보인다. <브라질 탄소배출권 자유거래시장 연간 거래규모> [자료 : FGV] 시사점 브라질은 탄소배출권 제도는 아직 태동단계로 강제력이 생기고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참가하기 위해서는 '탄소배출권 규제계약시장'이 정립되야 한다. 정부는 임시법안(PL 528/2021), 대통령령(Decreto Federal nº 11.075)을 통해 탄소배출권 시장 도입을 공론화시켰지만 제도가 자리잡히고 국회에서 정식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수년이 소요될 것이다. 화학, 철강, 조선, 자동차 등 브라질 주요 산업계에 속한 많은 회사들은 아직 탄소배출권을 거래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 브라질 중소·중견 기업들도 영세한 곳이 많아 탄소배출권 제도를 준비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탄소배출 절감량을 측정하고 거래하는 기술·플랫폼 도입에도 시간이 걸릴 것이다. 하지만 브라질 내 '탄소배출권 자유거래시장'이 탄생한지 오래되었고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 '수풀림 조성', '에탄올 공정기술 개선' 등 많은 친환경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장기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 시장이 급속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탄소배출을 억제하는 기술이나 솔루션 수요도 증가할 것이다. 수년 안에 브라질 내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우리기업도 탄소배출 감축 압박을 받을 수 있다. 우리기업은 브라질 탄소배출권 제도·법률을 모니터링하고 스타트업 협력, 친환경 발전소 기자재 공급 등 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아직 우리기업의 경험이 부족한 '수풀림 조성', '신재생 발전소 건설' 등 분야도 급격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현지기업과 파트너링 등을 통해 관련시장에 진출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자료 : Alem da Energia, O Globo, Brazil Journal, CNN Brasil, TradeMap, G1, Capital Reset 등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상파울루무역관 신재훈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08.08
-

- 이집트 신용장 의무화 조치 이후 6개월, 공급부족 우려 현실로
- 이집트 중앙은행이 지난 2월 말 5000달러 이상의 수입 거래를 신용장으로만 제한한 지 6개월에 접어들었다. 아직까지 은행에서는 신용장 의무화 조치 완화에 대한 별다른 신호는 없는 가운데 이집트와의 무역 관계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둘러보고 현 상황을 점검해 보고자 한다. 한국의 대이집트 수출 급감, 대표 수출품목 수출감소 두드러져 <이집트 신용장 조치 후 한국-이집트 간 수출입 변화> (단위: 억 달러, %) 구분 수출입 4월 증감률 5월 증감률 6월 증감률 당월 수출 1.2 △16.9 1.3 △7.3 1.4 △14.1 수입 1.7 649.3 1.2 133.4 0.4 △13.2 교역 2.9 73.9 2.5 31 1.8 △13. 누계 수출 5.7 14.4 7 9.7 8.4 5.1 수입 5.3 259.5 6.5 227.2 6.9 182.2 교역 11 70.3 13.5 61.2 15.3 46.7 [자료: KITA] <이집트 신용장 조치 후 한국의 이집트 수출현황> (단위: 백만 달러, %) 순번 품목명 2021 2022.1~6. 수출액 증감률 수출액 증감률 총계 1,682 38.4 844 5.1 1 합성수지 245 61.6 161 36.6 2 승용차 274 58.5 103 -18.7 3 자동차부품 71 14.2 41 7.1 4 철도차량부품 31 1,550.0 34 233.1 5 아연도강판 55 31.9 33 40.9 6 건설중장비 66 95.5 32 24.5 7 철도차량 180 292.1 27 -72.5 8 집적회로 반도체 23 17.8 25 154.4 9 석유화학 합성원료 41 -2.6 25 40.4 10 기타 석유화학제품 35 3.1 20 4.7 [자료: KITA] 이집트 중앙은행의 신용장 의무화 조치 이후 2022년 2분기 우리나라의 대이집트 수출은 약 3억9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2.8% 감소했다. 3월 한 달 간의 조정기간 이전 거래 건을 기존 추심 방식 등으로 처리한 이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신용장 의무화 조치에 따른 영향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대이집트 대표 수출품 중 하나인 자동차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8.7% 감소하며 신용장 제한 조치에 많은 영향을 받은 모습이다. 자동차의 경우 수입자가 신용장 개설 전 이집트 중앙은행의 사전승인도 필요해 향후 수출 감소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이집트 산업생산도 물음표, 공급 애로에 따른 산업활동 제약 가능 이집트의 4월 산업생산지수도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이집트 통계청은 4월 기준 광공업 및 제조업 생산지수가 8.7% 감소했다고 밝혔다. 그중 식음료 산업생산이 25% 감소했고 자동차 및 트레일러 분야 산업생산은 36% 급감했다. 이집트 내부거래위원회 수입분야(Internal Trade Committee of the Importers Division) 위원장은 3월부터 이집트 수입이 거의 중단됐으며, 특히 위생용품, 전기제품, 가전제품, 사무용품, 목재, 가구, 장난감 및 자동차 부품과 같은 최종 제품의 경우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신용장뿐만 아니라 대금 송금 자체에 문제 이집트 은행에서 신용장이 개설된다 하더라도 90일, 120일 조건 등 기한부 신용장 개설에 그쳐 우리 수출업체의 대금 수취에도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의 이집트 거래에는 일람불 신용장(At-sight)을 개설해 통관을 용이하게 하는 실무적 방안이 가능했다. 그런데 신용장 의무화 조치 이후 은행에서 신용장 개설 승인을 안 해주는 것은 물론 90일, 120일 기한부 신용장을 개설해주면서 수출기업 입장에서 대금수취 리스크가 높아진 상황이다. 더불어 현지 법인의 본사 송금에도 애로사항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의 달러가 부족 문제로 거래대금뿐만 아니라 현지 매출을 송금의 경우에도 지연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현지에 진출한 기업은 신용장 거래에 따라 기존에는 바이어를 통해 부품 등을 수입했으나 현재는 현지 법인이 직접 수입을 진행하는 등 행정적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관련해 현지에 진출한 기업의 관계자는 현지 법인이 제품이나 부품을 직접 수입하면서 법인의 매출 실적이 왜곡되는 등의 문제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무역보험 등 안전장치 마련할 필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수출기업은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무역보험 등 손실을 보전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무역보험공사에 문의한 결과 수입자 앞 수출 건에 대한 수출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보험 부보율은 90% 이내로만 설정이 가능하고 무신용장 거래의 경우 이집트 중앙은행이 허용한 품목에 한 해서만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무역보험공사 고객센터(1588-3884)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수출기업 인터뷰 - A사(주방기기) 6월에 이미 이집트에 도착한 선적 2건에 대한 신용장이 개설이 안 되고 있다. 창고료는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피해가 크다. 올해에만 이집트 수출실적에서 200만 달러 손해를 예상하고 있다. - B사(자동차 부품) 이미 도착한 선적 건에 대한 신용장이 열리지 않는 문제도 있고 이미 생산이 완료됐는데 신용장 개설이 지연돼 한국 창고보관료도 추가로 발생하고 있다. 운임료도 많이 오른 상황인데 창고보관료까지 발생하니 비용부담이 크다. - C사(타이어) 매출이 50% 이상 감소했고 선적 대기 중인 수십 대의 컨테이너 취소 손실과 항구 대기 컨테이너 지체 수수료가 막심하다. 이집트에 타이어 재고도 점차 떨어지고 있어서 소비자들에게까지 피해가 가고 있는 상황이다. 타이어 교체 시기를 놓친 차량으로 인해 안전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다. 자료: 이집트 재무부, 이집트 통계청, KITA, 현지 언론 및 KOTRA 카이로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 경제자료 ] [ 금융 ] 카이로무역관 신준열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08.05
-

- 2022년 상반기 對알제리 교역 동향
- 2022년 상반기 양국 교역 현황 2022년 6월까지의 우리나라와 알제리의 교역량은 16.3억 달러로 전년 9.65억 달러 대비 68.6% 증가하였으며 무역수지는 -14.3억 달러 수준이다. 해당 기간 알제리는 한국의 46위 교역 상대국이었다. 예년 수입보다 수출이 많았던 알제리 시장은 한국의 주력수출품목인 자동차 및 전제제품 등이 현지 제조업 육성을 위한 산업보호 정책으로 각종 수입규제에 막혀 수출이 대폭 줄어든 반면, 알제리산 원유 및 나프타 등 에너지 자원의 도입이 크게 늘어 2018년 이래 무역역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었다. <우리나라 對 알제리 교역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6월)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전체 교역량 2,915 49.4 2,447 -16 1,158 -53 2,100 81.3 1,629 68.6 수출 950 -23.3 701 -26.2 254 -63.7 197 -22.5 99 4.2 수입 1,965 175.7 1,746 -11.1 904 -48.2 1,903 110.5 1,530 75.9 무역수지 -1,015 -1,045 -650 -1,706 -1,431 * 전년 동기 대비 증감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K-stat)] 수출 현황 2022년 상반기 對알제리 수출은 약 9,990만 달러로 전년 동기 수출액인 9,500만 달러 대비 4.2% 증가하였다. 한국의 對알제리 수출은 2017년 이래로 감소세를 보이며 2021년 최저점을 찍었으나 2022년 상반기 역시 작년과 유사한 수치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동 기간 중 알제리는 한국의 90위의 수출 상대국 순위를 기록하였다. 최근 코로나 이후 세계경제 정상화 및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유가 상승으로 산유국인 알제리는 재정균형 수준인 배럴 당 100달러 이상의 원유수출 수혜를 받고 있다. 하지만 2015년 이후 지속되었던 저유가 상황을 경험한 알제리 정부는 산유국 경제를 탈피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제조업 육성 및 자국 산업 보호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다만 자유로운 시장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아닌 수입 억제를 통해 대체 산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다양한 수입억제 및 규제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수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對 알제리 주요 20대 수출품목> (단위: 천 달러, %) 순번 품목명 2021년 2022년 (~6월)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총계 197,258 -22.5 99,767 4.2 1 자동차부품 45,266 -4.8 19,970 -7.3 2 합성수지 27,551 23.5 16,292 10.2 3 공기조절기 10,837 -46.1 8,027 -1.7 4 의약품 9,322 4.3 7,363 56.7 5 기타산업기계 4,083 2.6 3,330 363.5 6 다이캐스팅금형 0 -100 2,843 0 7 의료용전자기기 4,974 -8.2 2,703 -14.2 8 분석시험기 1,623 73.7 2,660 356.9 9 제어용케이블 1,902 -14 2,337 83.1 10 펌프 2,185 31.6 2,329 43 11 가열난방기 143 -97.3 2,317 12,523.60 12 건설중장비 9,246 -72.8 1,817 -70.6 13 기타기계류 5,374 438.7 1,718 -34.4 14 식품포장기계 155 -35.9 1,584 2,717.00 15 기타의료위생용품 5,352 1.2 1,567 -43.7 16 기타석유화학제품 1,133 -42.3 1,526 99.2 17 기타플라스틱제품 2,029 19.6 1,293 11.8 18 기타정밀화학원료 5,101 185.1 1,263 -37.3 19 기타기계류부품 528 -60.9 1,256 258.5 20 X선및방사선기기 2,145 51 1,179 2.8 [주 : MTI 4단위 분류 기준,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K-stat)] 수출호조품목 2022년 상반기 對알제리 주요 수출 품목(상위 20위) 중 13개 품목이 증가세를 보인 가운데, 제조 산업 소/부/장 제품군 및 의료품목의 증가세가 뚜렷히 나타나고 있다. 소/부/장 제품 군에서는 합성수지(10.2%), 기타산업기계(363.5%), 분석시험기(356.9%) 등의 증가세가 컸고, 의료품의 경우 의약품(56.7%) 등이 높았다. 더군다나, 작년에 수출이 없었던 다이캐스트 금형이 280만 달러로 6위를 기록하였다. 그 외, 작년 14만 달러에 불과했던 가열난방기 수출은 올해 상반기에만 230만 달러를 기록해 수출 증가율이 12,523%에 달했다. 對알제리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 부품의 경우 전년대비 -7.3% 감소하며 1,990만 달러를 기록했으나, 2위 품목은 합성수지 수출액(1,630만) 보다 약 20% 높았다. 수출부진품목 반면, 2017년까지 對알제리 주력수출품목 이었던 승용차(2.6억 달러/2017), 선박(2억 달러), 화물자동차(6,500만 달러) 등은 100위권 밖이거나 수출액이 전무하였다. 그 이후 제1의 수출품목인 자동차 부품은 -7.3%를 기록하였다. 현지 자동차 부품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수입 및 금융 규제로 인해 실질적인 수출은 대폭 감소하였다. 그 외, 건설 경기 침체로 건설 중장비(-70.6%), 기타기계류(-34.4%), 기타의료위생용품(-43.7%)등의 수출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입 현황 2022년 상반기 對알제리 수입액은 약 15억 달러를 기록, 전년 동기대비 75.9% 증가하였다. 전체 수입액의 99% 이상을 차지하는 나프타 및 원유는 금액기준 전년대비 각각 80.0%, 61.9% 의 증가세를 시현했다. 나프타 및 원유는 글로벌 경제 회복세 및 국내 제조업 성장세에 따른 수요 증가,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기인한 것으로 실제 도입량은 각각 14.6%, 0.8%로 금액 보다는 낮은 증가세를 보였다. 작년도 수입이 없었던 LPG도 올해 6월까지 1,000만 달러 수준 수입이 되었다. <對 알제리 주요 수입품목> (단위: 천 달러, %) 순번 품목명 2021년 2022년 (~6월)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총계 1,902,857 110.5 1,530,066 75.9 1 나프타 1,273,321 167.3 1,100,601 80 2 원유 611,656 44.5 418,010 61.9 3 LPG 0 0 10,582 0 4 어육 978 -72.8 538 121.6 5 참치 150 -38.3 115 320.2 [주 : MTI 4단위 분류 기준,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K-stat)] 시사점 알제리와 한국의 교역량은 유가 상승으로 큰 폭 증가하였으나, 한국의 수출의 비중은 6%로 최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비록 최근 유가상승으로 재정 수입이 증가되긴 했으나 일시적인 고유가로 판단하는 알제리 정부는 산유국 경제를 탈피하고 자국 제조산업을 육성하고 보호하고자 대대적인 수입규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일부 정책은 너무 성급히 추진하다가 자체 시스템 미구축으로 시행을 연기하는 해프닝까지 연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완제품 수입은 지속적으로 제한할 것이 자명하다. 반면 현지 제조설비 운영을 위한 기계 및 부품 등 소부장 제품의 수요는 날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현지 비즈니스 맨들 사이에서 제조업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막연한 사업 구상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설비 및 부품 공급 뿐 아니라 제조사업 컨설팅 및 인력 교육 등의 부가 서비스가 제공된다면 보다 현실적인 사업으로 개발될 가능성이 높다. 알제 무역관에서는 현지 소부장 수요를 발굴하여 국내 기업들과 연결해 주는 '알제리 제조업 지원 사업'을 연중 추진하고 있다. 소/부/장 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들은 알제 무역관에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란다.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알제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알제무역관 한석우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08.05
-

- 2022년 바이에른주 경제 동향 및 시사점
- 바이에른주의 GDP는 27개 EU 국가 중 22개 국가보다도 높으며, 1인당 GDP 또한 50,289 유로로 독일 전체 42,953 유로와 유럽 32,270 유로 보다 높다. 글로벌 자동차 OEM인 BMW, Audi와 인더스트리 4.0의 대표 기업인 Siemens 등 독일 전통 기업이면서 미래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이 소재한 바이에른주의 2022년 경제 동향과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진출전략을 조망한다. * 27개 유럽국가(GDP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폴란드, 스웨덴, 벨기에,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덴마크, 핀란드, 루마니아, 체코, 포르투갈, 그리스, 헝가리, 슬로바키아, 룩셈부르크,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리투아니아, 슬로베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사이프러스, 몰타 바이에른주 주요 기본 정보 바이에른주는 독일 동남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쪽으로는 체코, 남쪽으로는 오스트리아, 스위스와 국경을 맞닿고 있다. 바이에른주의 총 면적(2020년 기준)은 70,541.57 km2로 16개 독일 내 연방 주 가운데 가장 넓다. 면적과 더불어 총 인구 수도 2021년 기준 13,176,989 명으로 독일 내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ordrhein-Westfalen) 17,924,591명에 이어 두 번째로 가장 많다. 바이에른주의 주도는 뮌헨이며, 2018년 3월 취임한 기사당(CSU) 소속 마르쿠스 죄더(Markus Söder)가 주 총리 직을 수행하고 있다. 바이에른주 주요 경제 지표 바이에른주에는 아디다스, 알리안츠, 아우디, BMW, MTU Aero Eingines, MAN, Siemens 등 글로벌 기업뿐만 아니라 제조업, 서비스업 분야에 두루 걸쳐 뛰어난 중소중견기업들이 위치해있다. 바이에른주의 2021년 GDP는 코로나 위기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약 3% 성장한 약 6,615억 유로다. 이 수치는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웃국가인 오스트리아(약 4,027억 유로)와 체코(약 2,382억 유로)의 경제규모 보다 크다. 바이에른주는 스위스(약 6,871억 유로)와 비슷한 경제 규모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바이에른주의 1인당 GDP는 50,289 유로로 독일 내에서 도시 자체가 주(州)로 편성된 함부르크를 제외하고 가장 부유하다. <바이에른주와 독일 및 유럽 전체 GDP 비교> 구분 GDP(백만 유로) 1인당 GDP(유로) 바이에른주 661,541 50,289 독일 전체 3,570,620 42,549 유럽(27개국) 14,477,941 32,370 [자료 : Bayerisches Landesamt für Statistik, 2022] 또한 아래 그래프와 같이 바이에른주의 실업률은 독일 내 최저를 자랑한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작년 독일 전체 실업률이 5.7%, 수도 베를린의 실업률이 9.8%에 육박했으나, 바이에른주의 실업률은 3.5%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고용상황을 나타내었다. <2019~2021 독일 연방주별 실업률> (단위: %) [자료 : 독일연방 고용통계청(Statistik der Bundesagentur für Arbeit, Sonderauswertung, Jahresdurchschnittswerte)] 바이에른주 2021년 수출입 동향 2020년 전세계를 강타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이 2021년에도 계속되면서, 유럽의 강도 높은 락다운 정책은 경제활동을 위축시켰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독일과 바이에른주의 2021년 교역량은 오히려 증가하였으며, 바이에른주의 교역량 증가율은 독일 전체 교역량 증가율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2021년 독일과 바이에른주의 수출입 현황> 구분 바이에른주 독일 금액(십억 유로) 전년대비변화율 금액(십억 유로) 전년대비변화율 수출 189.9 12.9% 1,460.1 9.9% 수입 221.8 17.2% 1,266.1 9.3% [자료 : 바이에른 경제부, Statista] 바이에른주는 제조기업이 많아 해외로부터 기계, 전기발전 및 송전기계 수입이 많으며, 주요 수입 품목인 기계는 2021년에 전년대비 9.3% 증가하였고, 전기 발전 및 송전기계 수입은 17.9% 증가하였다. 의약품 수입만 -10.3% 감소하였고, 이외 주요 품목의 수출입은 대부분 증가하였다. <우리나라와 바이에른주의 2021년 교역 동향> (단위 : 백만 유로) 구분 2021년 2020 수출(한국→바이에른주) 1,980 1,714 수입(바이에른주→한국) 3,314 3,453 교역량 5,294 5,167 [자료 : 바이에른주 통계청] 2021년 우리나라의 대 바이에른 수입액은 약 33억 1천 4백만 유로로 전년 대비 약 4% 감소했으며, 수출액은 약 19억 8천만 유로로 전년 대비 약 19% 증가하였다. 코로나 위기에도 불구하고 2021년 전세계 교역량은 22,283.91달러로 ‘20년 대비 26% 증가하였고, 우리나라와 바이에른주 간의 교역량은 작년 대비 약 2% 증가한 52억 9천 4백만 유로를 기록하였다. 바이에른주의 주요 수입품목인 기계, 전자부품은 우리나라의 대독 주요 수출 품목과 유사하며, 특히 독일 자동차 산업이 기존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우리나라와 협력이 증가하여 교역량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바이에른주의 주요 수입국인 중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대비 우리나라 제품의 수입점유율은 아직 1%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한 점유율 확대가 필요하다. 바이에른주에 소재하고 있는 독일 대표기업 스포츠브랜드의 대표적인 기업 Adidas, 프리미엄 완성차를 제조하는 BMW, 인더스트리 4.0으로 대변되는 Siemens 등 독일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바이에른주에 본사를 두고 있다 . <바이에른주 소재 주요 독일 기업> 순위 (매출액) 기업명 품목 소재지 매출(십억 €) 2021년 기준 1 알리안츠 (Allianz SE) 보험 뮌헨 148.5 2 BMW AG 자동차 뮌헨 111.2 3 지멘스 (Siemens AG) 엔지니어링 뮌헨 62.3 4 Munich RE 재보험 뮌헨 59.6 5 아우디 (Audi AG) 자동차 잉골슈타트 53.1 6 아디다스 (Adidas AG) 스포츠용품 헤르초게나우라흐 21.2 7 베이바 (Baywa AG) 농업 및 건설자재 무역 뮌헨 19.8 8 셰플러 (Schaeffler AG) 자동차 부품 헤르초게나우라흐 13.85 9 인피니온 (Infineon AG) 반도체 뮌헨 근교 11.1 10 MAN 상용차 및 엔진 제조 뮌헨 10.9 [자료 : KOTRA 뮌헨무역관 정리] 특히 바이에른주에는 미래자동차, 산업 자동화, 반도체 등 하이테크(High Tech) 산업이 집중되어 있다. 삼성SDI의 전기차 배터리 판매 주요 고객인 BMW는 유럽 국가들의 주요 프로젝트인 IPCEI(Important Project of Common European Interest) 배터리 분야에 선정되어 차세대 리튬 이온 셀, 배터리 모듈 및 시스템 컨셉 뿐 아니라 프로토타입의 생산시설을 개발을 진행 중이다. BMW는 2023년에는 전체 차종 중 90%는 최소 한 가지의 순수 전기차 모델 출시, 2030년까지는 전체 판매 차량의 50%는 전기차 판매를 목표로 활발한 미래 차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이를 위해 BMW는 새로운 동력 장치와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다. 관련하여 BMW는 2022년 올해 가을 뮌헨 근교의 파스도르프(Parsdorf)에 ‘배터리 셀 제조센터(Cell Manufacturing Competence Center)’를 오픈하고, 새로운 제품군에 탑재될 배터리 셀의 시제품 생산 등을 예정하고 있다. 트럭 등 대형차를 제조하는 MAN도 수소 트럭을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Audi도 순수 전기차 라인업을 강화하는 등 독일 자동차 산업이 급격하게 전기차 플랫폼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 같은 전통 바이에른주 자동차 제조사들의 수소, 전기차 등 미래차로의 전환은 2035년부터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모든 차량의 판매가 금지되는 등 유럽연합에서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바이에른주에 진출해 있는 우리기업 정보 BMW사의 주요고객인 삼성SDI, 남양넥스모, 삼성전자 반도체 유럽법인 등 총 22개사가 바이에른주에 진출해 있다. 특히 2021년 뮌헨 무역관에서 신규 개소한 KOTRA GP센터를 통해 5개사가 추가 진출하였다. <바이에른주 소재 우리기업 리스트> 연번 기업명 (가나다 순) 소재지 분야 1 남양넥스모 뮌헨 자동차 조향장치 2 네오팩트 뮌헨 재활 의료기기 3 두산전자 뮌헨 자동차 전장부품(FPCB) 4 디엠티 에르딩 플라스틱 부품 5 뷰런테크놀로지* 뮌헨 라이다 소프트웨어 6 삼성전자 반도체 유럽법인 뮌헨 반도체 7 삼성SDI 유럽법인 이즈마닝 전기차 배터리 8 서울로보틱스 뮌헨 라이다 센서 연계 SW 9 서울반도체 뮌헨 LED 10 성우하이텍(WMU Bavaria) 니더라이히바흐 자동차 프레스 금형 11 센서뷰 뮌헨 케이블, 광통신 안테나 12 소울에너지* 뮌헨 배터리관리 시스템 13 아우토크립트* 뮌헨 자율주행 보안시스템 14 알피니언메디칼시스템 할베르그무스 의료 초음파기기 15 에이디테크놀로지 뮌헨 반도체 소자 설계 및 제조 16 에스엘 뮌헨 자동차 LED 헤드램프 17 인지컨트롤스* 뮌헨 자동차부품 18 일진베어링 슈바인푸르트 자동차 베어링 19 LG전자 뮌헨 전장부품 20 펨트론 펠트키르헨 반도체검사장비 21 텔레칩스* 운터푀링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22 현대로보틱스 뮌헨 산업용 로봇 * 5개 GP 센터 입주기업 [자료 : KOTRA뮌헨무역관 정리] 바이에른주는 미래자동차의 핵심산업인 전장, 반도체, 완성차기업들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과의 협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자르강변의 실리콘밸리, 이자르 밸리(Isar Valley) 2021년 애플은 뮌헨에 칩 설계를 위한 유럽 센터 설립과 2024년까지 1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애플은 뮌헨에서 5G 등 모바일 관련 신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다. 40년 전에 이미 뮌헨에 사무소를 오픈한 애플은 현재 뮌헨에 7개의 지사에서 1,500여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 2015년에 설립된 바바리안 디자인 센터에서는 350여명의 엔지니어가 근무중이며, 팀 쿡 애플 CEO는 뮌헨의 엔지니어들이 어떤 것을 개발할지가 최대의 관심사이며, 다른 곳에서 찾기 어려운 인재들을 뮌헨에서 찾을 수 있었다고 프랑크푸르트일간지(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뮌헨에는 애플뿐만 아니라 구글, 마이크로 소프트, IBM, 아마존 등 세계 최대의 하이테크 기업들이 진출해 있다. 2006년에 진출한 구글은 뮌헨에서 1,200명 이상 고용하고 있으며, 규모를 2배 이상 확장하기위해 증축 공사를 진행중이다. 또한 2016년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독일 법인을 뮌헨 슈바빙(Schwabing) 지역에 설립했고, IBM 또한 2017년에 연구소를 설립했다. 아마존 또한 뮌헨 전역에 고용 중인 2,500여명의 직원을 슈바빙 지역으로 수용하려고 하고 있다. 기술 기반 기업들은 이처럼 한 지역에 가까이 모여 하나의 혁신 클러스터를 형성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엔지니어들이 서로 경험과, 창의력, 뛰어난 아이디어를 주고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며 글로벌 하이테크 기업의 뮌헨 진출은 더 많은 기술 중심 기업의 뮌헨 진출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에른주와 뮌헨이 이처럼 기술기업들의 중심지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뮌헨과 바이에른주 내에 우수한 대학과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프라운호퍼(Fraunhofer), 포티스(fortiss)와 같은 우수한 연구소가 있기 때문이다. 애플은 또한 칩제조사 인피니온(Infineon), 배터리제조사 바르타(Varta), 산업용 특수 접착제 제조사인 델로(Delo) 등 뮌헨 인근에 위치한 기업들과도 협업을 계획하고 있다. 뮌헨은 애플과 같은 글로벌 테크기업 유치를 통해 제 2의 실리콘밸리인 '이자르밸리‘를 꿈꾸고 있다. 뮌헨은 독일, 나아가 유럽 하이테크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국내 기업들에게도 좋은 기회의 도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1 독일 Top 50 스타트업 중 바이에른주 기반 스타트 업 8개사> 순위 기업명 설립연도 품목 1 mentalis 2018 건강, 생활과학 2 Nanostruct 2021 나노기술 3 Plan4Better 2021 스마트시티 4 Retury 2021 이커머스 5 Summetix 2021 AI/KI, IoT 6 inContAlert 2021 의료기술 7 Invitris 2021 바이오기술 8 DeepScenario 2021 모빌리티 [자료 : top50startups] Top50startup은 2015년부터 독일 스타트업 중 우수한 50개사의 랭킹을 발표하고 있다. 2021년에도 총 170개의 스타트업 대회에 참여한 다양한 스타트업 중 우수한 스타트업 50개를 발표하였는데, 그 중 8개 스타트업이 바이에른주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처럼 바이에른주는 스타트업을 창업하고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산업과 인프라가 갖춰져 있다. 한국 스타트업과의 협업 및 비즈니스에도 적극적인 현지 주요 기업 KOTRA는 BMW Garage, 에어버스 등과 협업하여 우수한 기술을 가진 국내 스타트업의 독일 진출 지원을 위한 ‘오픈이노베이션 IR로드쇼’ 사업을 추진하였다. 2022년 6월 29일 BMW 연구혁신센터인 FIZ에 국내 스타트업 6개사가 자사의 기술을 소개하고 BMW와 협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초대받았다. 해당 스타트업 6개사는 각각 △AI 가상 인간 D사 △인공신경망처리장치(NPU) 기반 AI 반도체 D사 △친환경 가죽 시트 및 가죽실 제조사 A사 △클라우드 기반 VR 및 메타버스 솔루션 I사 △개발자용 AI 비서 L사 △디지털 ID 인증 및 보안솔루션 S사이다. BMW FIZ에서 열린 해당 피칭 행사에는 BMW 임직원이 온오프라인으로 150여명 참석하였고, 기술 소개 부스에는 350여명이 방문하는 등 BMW 그룹 임직원들은 한국의 혁신 기술 스타트업과의 협업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BMW Technology Office 아시아태평양본부 드라가나 코스틱(Dragana Kostic) 총괄은 “코로나 이후 외국의 스타트업이 본사를 직접 방문해 기술을 소개하는 것은 이번 행사가 처음”이라며 “참가한 스타트업들이 모두 우수해 앞으로 많은 협업 프로젝트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해당 기업들은 6월 30일에는 세계 2위 항공기업인 에어버스 연구센터를 방문하여 연구센터의 핵심 인력을 대상으로 피칭을 진행하고, 에어버스에서는 국내 스타트업 기술에 높은 관심을 갖고 기술 검증을 위한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2020년 코로나로 인해 현지 방문이 어려워지며 온라인으로 추진하였던 1회 BMW IR 로드쇼 이후 최초로 진행된 국내 스타트업의 BMW 본사 방문 피칭 행사였으며, 해당 기업들은 독일 기업들의 높은 관심으로 BMW 뿐만 아니라 이번 뮌헨 방문을 통해 에어버서, 베바스토, 아큐론 등에게 기술을 소개하고 협업을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며 해당 행사 또한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다. 시사점 2020년 3월부터 전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위기와 이에 따른 물류대란에도 불구하고 2021년 세계 교역은 상품교역을 중심으로 양호한 회복세를 보였다. 바이에른주 교역량 또한 전년대비 수입 17.2%, 수출 12.9%가 증가하였다. 또한 바이에른주는 코로나 전후 모두 독일 내에서 가장 낮은 실업률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경제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금년 들어 우크라이나 사태, 중국의 봉쇄조치 장기화 등으로 인한 국제원자재가격 상승, 중국의 교역 액 감소 등이 세계 경제 하방리스크로 작용하여, 독일과 바이에른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에른주와 국내 교역액이 2년 연속 증가하였고, 미래차 전환 과정에서 국내기업과 바이에른주의 완성차 OEM, Tier-1,2 등과의 협업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올해 KOTRA 뮌헨 무역관에서 주최한 ‘2022 한-유럽 배터리데이’, ‘오픈이노베이션 IR 로드쇼’ 등의 사업을 통해, 독일 전통 자동차 시장의 우리나라 기업에 많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미래 하이테크 산업 중심으로 급격하게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이에른주 경제구조 특성 상, 향후 전기차 배터리, 전장 제품, 반도체, IoT 등 우리나라가 강점을 보이고 있는 분야의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응하여 KOTRA 뮌헨무역관은 2년 연속으로 성공적으로 개최한 ‘한-유럽 배터리데이’를 내년에는 더욱 확대하여 국내 기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국내 기업들에게는 코로나19 종식과 함께 다양한 전시회, 오프라인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 : statista, 바이에른 경제부, 바이에른주 통계청, 독일연방 고용통계청, 독일 고용노동부, top50startups, insideev, KOTRA 뮌헨 무역관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뮌헨무역관 황새별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08.04
-
- 필리핀 의료용 대마 합법화 법안 발의
- 최근 태국의 대마 합법화에 이어 필리핀도 대마의 의학적 사용을 합법화하는 상원 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대마를 사용하여 통풍, 류머티즘 관절염 및 말라리아를 포함한 특정 질환을 치료하는 의학적 연구를 확대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필리핀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대마 사용을 허용하고 이를 통한 경제적 이익을 취하거나 치료 외 목적의 사용 및 남용을 강력히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필리핀의 대마 규제 필리핀은 마약에 대한 엄격한 처벌 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두테르테 전임 대통령이 선포한 마약과의 전쟁을 마르코스 신임 대통령도 계승해가고 있다. 필리핀에서 대마의 재배 및 사용은 공화국법(9165) 또는 2002년 종합 위험 약물 관리법에 따라 불법으로 간주된다. 필리핀은 1961년 유엔 마약단일협약에 서명하였으며, 대마는 의료 및 과학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마 관련 제품의 수입, 판매, 밀수, 재배, 사용 시 무기징역 및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 대마초 합법화에 반대하는 포스터 자료: 필리핀 식약청(FDA) 필리핀 상원, 의료용 대마 합법화 법안 발의 필리핀 의료용 대마 합법화 법안(SBN-230) 자료: 필리핀 상원 (https://legacy.senate.gov.ph/lis/bill_res.aspx?congress=17&q=SBN-230) 이번에 발의된 법안에 따르면 암이나 녹내장, 다발성 경화증, 신경계 손상, 간질, 면역 결핍 바이러스, 후천성 면역 결핍증, 류머티즘 관절염, 만성적인 자가 면역 결핍증이나 호스피스 치료가 필요한 질병 치료를 위해 의료용 대마 사용이 허용된다. 치료 목적 외 대마 사용은 금하며 사용 허용 기준에 해당되는 환자들에게 대마 성분이 포함된 캡슐이나 오일 형태로 제공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필리핀 보건부(DOH)는 공공목적 및 지정 병원에 한하여 의료용 대마 지원 센터를 설립하며 처방전 감시 체계와 등록된 의료용 대마 사용 환자관리 및 대마 처방이 등록된 의사들의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규제 관리를 할 예정이다. 또한, 필리핀 식약청(FDA)은 의료용 대마 제품 테스트를 진행하며 위험물 위원회(DDB)와 필리핀 마약 단속국(PDEA)이 의료용 대마를 감시하고 규제 및 관리하게 된다. 처벌 규제로는 목적 외 사용 또는 경제적인 이익을 위한 남용 방지 보호 규제가 포함되어 있다. 의료 목적 외에 대마 취급 및 사용 시 법률 위반 행위에 따라 12년에서 20년의 징역과 최대 1천만 페소의 벌금을 부과하며 조항을 위반한 의사는 의사 자격이 정지되거나 취소된다. 의료용 대마 합법화 법안 발의 반대 의견 필리핀 위험 약물 관리법안 RA 9615 자료: 필리핀 마약단속국(PDEA) (https://pdea.gov.ph/images/Laws/RA9165.pdf) 한편, 현재 발의된 법안 외에도 의료 목적의 대마 사용을 허용하는 법안이 있음을 근거로 추가적인 합법화 법안에 반대입장을 고수하는 의원들이 있다. 필리핀은 1972년 공화국법(RA) 6425와 2002년 종합 위험 약물 관리법을 통해 허용되지 않은 의약품 사용을 규제하고 있었으나, 공화국법 RA 9165를 통해 중증 환자 및 호스피스 환자들을 위해 부분 허용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해당 법안을 통해 약물 남용 방지 정책, 의료 프로그램 계획 및 시행의 통합 시스템을 통해 위험한 약물, 기타 유사 물질의 밀매 및 사용에 대해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해당 법의 특별 지침인 Dangerous Drugs Act라고 불리는 동정 사용 조항은 의료용 대마와 더불어 필리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이 허가되지 않은 의약품에 대한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식약청은 전문의 또는 전문기관에게 특별권한을 부여하여 말기 또는 중증 환자 진료 목적에 한해 일반적으로 허가되지 않은 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별 허가는 후천성 면역 결핍증을 비롯한 암 또는 생명이 위독한 환자에게 허용되며 특별 허가를 요청하는 의사는 환자에게 필요한 미등록 의약품의 추정량, 미등록 의약품 조달을 위한 허가 의약품 및 기기 시설, 자격을 갖춘 전문의의 이름 및 주소를 포함한 서류들을 제출해야 한다. 2017년 10월 CNN의 필리핀 보도에 따르면 필리핀 식약청은 의료 목적의 특별 사용 허가를 한 달 평균 50여 건 접수하고 있다. 시사점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강력한 마약 단속을 진행 중인 필리핀에서 의료용 대마 사용 합법화 추진 소식에 필리핀 상원에서는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있으나, 중증 환자 및 호스티스 병동 환자들을 위해 치료용 대마 사용 합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마약 문제가 늘 도사리고 있는 필리핀에서 치료목적의 대마 사용에 대한 반대 의견이 많아 해당 법안의 시행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 필리핀 상원, 필리핀 하원, 필리핀 식약청(FDA), 필리핀 마약 단속국(PDEA), Philstar 및 KOTRA 마닐라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마닐라무역관 김진형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08.04
-

- RCEP의 향후 중국 대외무역 관련 영향 전망
- RCEP 개요 및 전망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은 2013년부터 협상이 개시되어 약 7년여의 협상 끝에 2019년 11월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3차 정상회의에서 협정문이 타결되었다. RCEP의 참여국가는 한국, 중국, 일본, ASEAN 10개국, 호주, 뉴질랜드로 총 15개국이며 참여국가수, 교역규모, 인구수 등에서 현재 규모가 가장 큰 메가FTA로 평가받는다.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에서 발표한 RCEP이 향후 중국 경제에 미칠 영향 시뮬레이션을 살펴보면 2035년까지 중국의 실질GDP, 수출량, 수입량은 각각 0.35%, 7.59%, 10.55% 증가할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은 이를 통해 중국의 수출액, 수입액, 경제후생의 누적 증가규모가 각각 3,154억 달러, 3,068억 달러, 996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 부부장(副部长) 류샹둥(刘向东)은 “올해 중국의 무역액은 RCEP으로 인해 2,000억 달러가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RCEP은 중국이 주도한 메가FTA로서 중국은 이를 통해 글로벌 경제∙무역에서 자국의 위상을 높이고자 한다. 중국이 한국, 일본과 같은 제조 강국을 포함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한 것은 점점 고도화되어 가는 자국 제조 기술에 대한 자신감을 반영했다고 볼 수 있다. RCEP 체결국은 현재 중국의 수출입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21년 기준 중국과 기타 RCEP 체결국간의 교역액은 중국 전체 교역액의 30%를 차지한다.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은 RCEP 발효를 기점으로 이 비중이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20년 중국-RCEP 체결국간 무역규모> (단위: US$ 억) [자료: 첸잔산업연구원(前瞻产业研究院)] 상하이 리신(立信)회계금융학원 자유무역구 연구원 부원장 샤오본화(肖本华)는 RCEP 발효로 인해 올해 중국 수출입 규모가 약 2% 성장할 것이며 특히 기계, 전력 설비, 자동차 및 그 부품, 방직, 식품, 광물에너지, 석유화학 제품이 우선적으로 수혜를 볼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RCEP 체결국 간의 무역품목은 대부분의 중간재와 소비재를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기계∙전력 설비는 중국의 주요 수출 품목 중 하나이다. 중국의 ASEAN향 수출 품목은 주로 중간재에 집중되어 있는데 기계∙전력 설비 및 그 부속품, 화학제품 등이 그것이다. 한편 중국의 한국, 일본, 호주와 같은 선진국향 주요 수출 품목은 의류, 가구, 장난감 등으로 소비재이다. RCEP 발효 이후 중국-ASEAN, 중국-호주, 중국-뉴질랜드 간의 전체 교역 품목 중 즉시 ‘0관세’에 도달하는 품목의 비중은 모두 약 65%에 달한다. RCEP은 한국, 중국 양국이 일본과 처음으로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이다. 중국과 일본은 이번 RCEP을 통해 ‘0관세’로 수입할 수 있는 상대국 품목 비중이 각각 25%, 57%에 이른다. RCEP 발효 10년 후 ‘0관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수입품목은 약 90%에 이르러 장기적으로는 역내 수출입 활성화에 대한 공헌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국은 상호간 중간재 수출입이 활발한 한-중-일 삼국간의 교역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국 대(對) 주요 체결국 수입 관세양허 수준> (단위: %) 양허유형 한국 일본 ASEAN 호주 뉴질랜드 (발효 후) 즉시 철폐 비중 38.6 25.0 67.9 65.8 66.1 점진적 철폐 비중 10년 41.0 46.5 12.7 14.2 13.9 15년 3.1 11.5 3.0 0 0 20년 3.2 3.0 6.9 10.0 10.0 최종 철폐 비중 86.0 86.0 90.5 90.0 90.0 제한적 양허(PR-X) 비중 1.0 0.4 5.4 5.5 5.6 양허 예외 비중 13.0 13.6 4.1 4.5 4.4 [자료: 중국해관] <주요 체결국 대(對) 중국 수입 관세양허 수준> (단위: %) 양허유형 한국 일본 ASEAN 호주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태국, 인니, 필리핀, 브루나이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즉시 철폐 50.4 57.0 74.9 29.9 75.3 65.4 최종 철폐 86.0 88.0 90.5 86.3 98.2 91.8 제한적 양허 1.1 0 5.5 0 1.1 8.2 양허 예외 12.9 12.0 4.0 13.7 0.7 0 [자료: 중국해관]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 아주소(亚洲所) 위안보(袁波) 부소장은 RCEP의 발효로 역내에 거대한 시장 형성이 될 것이며 이는 중국 우위제품 수출 뿐 아니라 한국, 일본의 고부가 제품의 원활한 수입을 통한 중국 내 산업 업그레이드와 경쟁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외에도 위안보 부소장은 RCEP이 포함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조항, 원산지 규정 내 최소 정보 요건, 서비스 무역 조항 등으로 인해 역내 무역의 질적 성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RCEP은 역내 원산지 누적 기준을 적용하는 바 소비재와 같은 완성품 보다 중간재간의 교역이 더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한국과 중국 모두 기존에 호주와 양자 FTA를 체결했음에도 한국이 호주로부터 중간재를 수입하여 이를 가공 후 중국에 수출할 경우 호주산 중간재는 역내 생산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RCEP 발효 이후 호주로부터 수입한 중간재도 역내 생산으로 인정받아 관세 혜택을 보다 쉽게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역내에서 생산된 원재료나 중간재가 복수의 체결국간에 왔다 갔다 하더라도 이를 역내 생산으로 인정해주는 것이 원산지 누적 기준에 핵심이다. 누적 원산지 기준은 위탁가공무역과 같은 다른 무역 방식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이 한국으로부터 중간재를 수입하여 중국 공장에서 완성품을 제조한 뒤 한국으로 재수출하였을 때에도 누적 원산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외자기업을 포함한 중국내 생산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제조기업의 수출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누적 원산지 기준 적용 예시> [자료: KOTRA 다롄무역관 정리] 중국 해관이 발표한 1월 1일 RCEP 발효 후 지난 5개월 간의 무역통계치를 살펴보면 중국의 수출입 규모는 16조 400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8.3% 증가했다. 특히 RCEP 발효 후 한달 동안 중국내 기업들의 RCEP원산지증명서 신청수는 24,695건 이었으며 이를 가치로 환산하면 92.5억 위안에 달한다. 이중 RCEP을 활용해 통관을 완료한 경우는 267건으로 4.6억 위안 상당이다. 주요 품목으로는 윤활유와 같은 석유∙화학제품 및 주류, 제화 등이 있었다. 특히 상하이 해관에서는 RCEP 발효 후 한달이 안되어 20억 위안에 상응하는 RCEP을 통한 수출입이 발생하여 가장 높은 활용도를 보였다. 시사점 및 향후 전망 중국 사회과학원 아태및글로벌전략연구원의 선밍후이(沈铭辉) 부원장은 “RCEP 발효 후 원산지규정, 통관절차, 검역검사, 기술 표준 등 무역∙투자 편리화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역내 비즈니스 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중국과 기타 체결국간의 경제∙무역 협력이 강화될 것이다. 또한 역내 가치사슬 내 분업과 협력이 심화되어 최종적으로 중국이 역내 및 글로벌 산업사슬, 가치사슬, 공급망 네트워크에 깊이 융합되고 경제의 질적 성장을 이룰 것” 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중국의 긍정적인 전망에도 메가FTA로서 RCEP의 향후 전망은 다소 미지수이다. 우선, 현재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촉발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진행형에 있고, 또한 역내 경제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도 확대 추세에 있는 등 권역별 블록화도 진행중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RCEP의 향후 영향력 확대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우리 기업은 현재 교역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인 중국과 교역 시 한-중 FTA와 RCEP의 관세혜택을 적절히 비교 활용하는 동시에, RCEP 체결국과의 교역 시 원산지누적기준, 통일 원산지규정 등 RCEP 특유의 혜택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자료: 중국상무부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 중국 해관, 경제일보, 광명일보(光明日报), 인민일보(人民日报), 중국개혁발전연구원, 중국수석경제학자세미나, 중국발전관찰잡지사 및 KOTRA 다롄무역관 정리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다롄무역관 한상은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08.04
-

- 중국의 물류중심 후베이성에 아시아 최초 화물 전용 공항, 어저우 화후공항(EHU) 정식 오픈
- 2022년 7월 17일, 아시아 최초 화물수송 전용 공항 ‘어저우 화후공항, EZhou Huahu Airport(鄂州花湖机场, 약칭 EHU)’가 후베이성 어저우(鄂州)에 정식 오픈하였다. 어저우 화후공항 정식 개항으로 후베이성은 중국 내륙 지역에서 전 세계로 연결되는 정식 물류노선을 구축하였으며, 임공경제구역(临空经济区, 공항 중심으로 발전하는 지역경제)으로 첨단산업 진출을 가속화해 우한은 물론 중국의 새로운 글로벌 경쟁력을 구축하게 할 것이다. 아시아 최초 화물수송 전용 공항 첫 취항 2013년 중국 상품 교역량이 전 세계 1위를 차지하면서 증가하는 물동량을 처리하기 위한 화물수송 전용 허브 공항 건설이 추진되었다. 그로부터 8년 후 2022년 7월 17일, SF Express의 화물 전용기가 어저우 화후공항에서 선전으로 이륙하면서 전 세계 4위 규모의 화물수송 전용 허브 공항이 정식 개항되었음을 전 세계에 알렸다. (세계 3대 화물 전용 공항 : 미국 멤피스 공항(FEDEX), 미국 루이빌 공항(UPS), 독일 라이프치히 공항(DHL)) <7월 17일 어저우 화후공항(EHU) 정식 개항> [자료: 창지앙르빠오] 어저우 화후공항은 중국 내륙 중심도시인 우한 도시권(90분 내외)에 위치하고 있으며,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청두, 시안 등 중국 주요 도시와 모두 1,000km 내외로 떨어져 있어 각 지역에 신속하게 운송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을 갖고 있다. 일반 항공 운송 반경 1,200km(비행 시간 1.5시간)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어저우 화후공항은 장강 삼각주, 주강 삼각주, 진징지(京津冀, 베이징-톈진-허베이) 등 중국 전체 경제의 90%, 인구 80% 이상의 주요 경제 클러스터를 커버하고 있다. <어저우 화후공항(EHU) 지리적 요건 및 교통상황> image2.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50pixel, 세로 561pixel" src="https://dream.kotra.or.kr/attach/namo/images/000221/20220803203012237_26DV76UF.png" class="" style="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sans-serif !important; font-size: 18px !important; width: 542px;"> [자료: 중국 도시 물류 경쟁지수 보고서] 어저우 화후공항의 총 면적은 11.8km²이며, 프로젝트 1단계 투자액은 320억 6천만 위안이다. 공항의 본격적인 건설은 2019년 10월에 시작되었으며, 2025년 여객수 100만 명, 화물 물동량 245만 톤을 목표로 설계됐다. 현재 700,000㎡ 규모의 분류 및 수송 센터가 건설 중이며, 수송 센터 내부에 전체 길이 210km의 7개의 선별 라인이 설치되면 최대 50만 개의 상품 분류가 가능하다. <어저우 화후공항 1단계 프로젝트 조감도> [자료: 중국민영항공홈페이지] 어저우 화후공항은 중국에서 최초로 민간자본이 투입된 프로젝트로 중국 최대 민간 물류기업인 SF Express가 4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SF Express는 중국 최대 화물 항공사인 SF항공(SF Airlines)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체 보유중인 화물기 70대와 임대 화물기 13대 등 총 83대의 화물기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SF Express는 아시아 뿐만 아니라 유럽, 미국 등 전 세계 80개 이상의 도시에 도달할 수 있는 화물운송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2025년까지 물동량 245만 톤, 장기적으로는 908만 톤 처리 계획 수립 어저우 화후공항이 개항되기 전에는 중국의 모든 국내 항공화물 수송은 일반 공항에서 이뤄졌으며, 항공화물은 주로 여객기의 일부 공간을 활용하였다. 예를 들어, 상하이 푸동공항은 여객수송이 주요 기능이지만, 항공 화물량도 상당하여 현재 기준 중국 1위 규모로 물동량 기준 중국 화물수송의 허브 공항이라고 불리지만 화물 전용 공항이라고 하지 않는다. 일반 공항과 비교할 때 화물 전용 공항의 장점은 주로 하드웨어 인프라 및 프로세스 처리 과정에서 들어난다. 예를 들어, 상품이 최대한 빨리 도착하여 하역할 수 있도록 공항 활주로 옆에 전문 화물 스테이션 보유, 창고 운영 기술이 기준 이상의 자동화에 도달했는지 여부, 창고에 냉장 창고 보유 여부 등이다. 물류 회사의 경우 화물수송 전용 공항 활용 시 적재 능력을 높이고 운송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어저우 화후공항 운영 계획에 따르면, 1단계는 중국 국내 여객노선 7개, 국내 화물노선 2개, 국제 화물노선 2개(오사카, 프랑크푸르트)를 개통하여 2022년 11월 말까지 화물수송 기능을 전면 가동할 예정이다. 2025년까지는 한국과 일본, 아시아 태평양, 유럽 및 북미를 연결하는 약 10개의 국제 화물 노선과 50개의 중국 국내 노선을 개항하여 화물 및 우편물 처리량 245만 톤, 여객 수 100만 명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화물 및 우편물 처리량 330만 톤, 여객 수 150만 명 달성으로 국제 항공화물 허브로 발돋움하려 하고 있다. 2045년까지 제 3활주로를 건설하여 연간 화물 및 우편물 처리량 908만 톤, 여객 수 2,000만 명, 항공기 이착륙 횟수 270,000회 달성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어저우 화후공항 중장기 계획> 구분 2025년 2030년 2045년 물동량(만 톤) 245 330 908 여객 수(만 명) 100 150 2,000 [자료: 롄민왕] 어저우 화후공항은 통합 교통 시스템 구축을 통해 기존 화물 운송 시스템보다 뛰어난 수송 역량을 보유하게 되었다. 해당 공항은 장강 인근 7개의 항구와 인접해 있으며, 4개의 시내 고속도로, 2개의 시외 고속도로 및 6개의 고속철도와 연결되어 있다. 또한 강해(江海) 항로 및 중국-유럽 화물열차 정거장과도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다. 어저우 화후공항은 SF Express의 운송 시간을 업계 평균보다 3시간 이상 단축하였으며, 운송 효율화를 통해 1일 이내 중국 국내 배송 및 2일 이내 해외 배송지 도착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한, 중국 유일의 여객 및 화물 ‘듀얼 허브 도시’로 등극 우한 톈허(天河)공항은 1995년 4월에 개항하였으며, 중부 지역 최초의 4F급 민간 국제 공항이다. 공항에는 현재 3개의 터미널과 2개의 활주로가 있으며 승객 운송 능력은 연간 3,500만 명, 화물 및 우편물 처리 능력은 44만 톤이다. 2019년 톈허공항의 여객 수는 2,715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중국 21개 대형 공항 중 1위를 차지했다. 7월 17일 어저우 화후공항 정식 개항으로 우한 톈허공항은 여객 수송에, 우한 도시권에 위치한 어저우 화후공항은 물류 운송에 집중하면, 우한은 중국에 하나 밖에 없는 여객 및 화물 '듀얼 허브 도시’가 될 것이다. 두 공항의 시너지 효과는 후베이성 대외 개방을 한층 더 심화시켜 중국 경제 대순환의 중요한 분기점이자, 국내외 쌍순환의 중요한 거점으로 발돋움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한, 여객과 화물의 듀얼 허브 도시로 등극> [자료: 중국민항신원왕] 7월 19일, 우한시 정부는 <우한시 강국건설시범실시방안(武汉市通强国试点实施方案)> 발표를 통해 중국 내륙 개방형 종합 운송 플랫폼, 특히 글로벌 항공 운송 플랫폼 건설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2년 내에 우한 톈허공항과 어저우 화후공항의 운영 협력 및 연계를 강화하여 2025년까지 국제 여객 및 화물 노선 각각 65개, 80개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우한 글로벌 항공노선도> [자료: <우한시 강국건설시범실시방안(武汉市通强国试点实施方案)>] 중국 내륙 지역과 바다를 잇는 하늘 노선, 지역 산업 발전의 새로운 엔진 글로벌 물류 기업인 FEDEX, UPS, DHL은 화물 운송능력 및 화물기 활용도 향상을 위해 멤피스, 루이빌, 라이프치히와 같은 물류 중심지역에 글로벌 화물 허브를 보유하고 있다. 물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물류 산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자체 항공운송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느냐가 관건이다. 이번 아시아 최초의 화물전용 공항인 어저우 화후공항의 정식 개항을 계기로 우한은 내륙 지역에서 전 세계로 이어지는 물류 노선을 구축한 한편, 글로벌 물류시장에서 새로운 경쟁력을 갖게 되었다. 각 산업의 분업화 및 물류 산업 발전에 힘입어 글로벌 기업은 더 이상 지리적 거리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 않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운송 시간이 보장된 시스템을 구축한 지역에만 해당된다. 특히 첨단기술로 생산되는 고부가가치 제품의 경우, 운송 시간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임공경제구역(临空经济区, 공항 중심으로 발전하는 지역경제)을 주목하고 있다. 공항은 더 이상 전통적인 의미의 승객과 상품을 운송하는 환승 장소가 아니라 항구처럼 지역 산업 발전을 위한 새로운 엔진이 되어가고 있다. 어저우 화후공항의 개항은 신흥산업 분야 기업을 우한 도시권에 유치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갖도록 하였다. 또한, 기존의 우한 도시권 내 광전자, 바이오의약품 등 첨단산업 기업들도 글로벌 산업사슬에 보다 손쉽게 연결될 것이다. 향후 우한 도시권은 중국 중부의 물류기지 및 전자상거래(크로스보더) 기지가 될 것이며, 공항 주변에 많은 전자상거래 창고와 전자상거래 라이브커머스 기지가 구축될 것이다. 그리고 공항 정비업, 항공기 정비업, 항공기 관련 산업, 고속철도 물류업 등 물류 관련 산업의 발전이 가속화될 것이다. 화물 전용 공항으로서 어저우 화후공항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은 물류 환적이다. 출발 또는 복귀 화물 적재량이 부족한 항공편은 어저우 화후공항에서 타 항공편 화물과 취합하여 화물기 만선 후 목적지로 출발할 수 있다. 향후 어저우 화후공항 국제노선 증편되면, 한국-유럽, 한국-서아시아, 한국-중국 서부 지역의 물류가 이 곳에서 환적될 것으로 예상되며 동시에 금년에 개항한 우한-부산 강해(江海) 항로와 중국-유럽 화물열차(中欧班列)와 연계하면 복합 운송이 가능하다. 자료: 롄민왕, 창지앙르빠오, 중국 도시 물류 경쟁지수 보고서, <우한시 강대국 시범실시방안(武汉市通强国试点实施方案)>, 중국민간항공왕, 중국민항뉴스, KOTRA 우한무역관 자체 정리 등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우한무역관 김종원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08.0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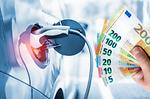
- 독일 연방정부 전기차 보조금 삭감안 발표, 무엇이 달라지나?
- 2021년 새롭게 출범한 이른바 신호등 연립 정부는 전기차 보조금을 삭감한 후 완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7월 26일 연방정부는 2023년부터 현재의 전기차 보조금을 축소하는 삭감안을 발표했다. 이번 뉴스에서는 이 보조금 삭감안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정책 부분을 분석하기 전에 우선 현재 독일의 전기차 보급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자. 독일 전기차 보급 현황 독일 연방 자동차청에 따르면 최근 독일의 전기차 보급 대수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2022년 4월 기준 신규 등록된 전기 승용차 수는 배터리 전기차(BEV) 68만7241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는 62만2971대로 약 130만 대에 이른다. 이는 2021년 4월에 비해 59만6014대, 약 83%가 증가한 것이다. <독일 전기차 등록대수(2020.4.~2022.4.)> (단위: 대) 배터리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수소 전기차 총계 2020년 4월 158,880 124,624 549 284,053 2021년 4월 365,262 349,341 910 715,513 2022년 4월 687,241 622,971 1,315 1,311,527 주: 독일 연방자동차청은 외부 충전이 가능한 경우만 전기차로 분류함. [자료: 독일 연방자동차청] 2022년 1월 기준 독일의 사용 연료별 승용차 비중을 살펴보면 가솔린과 디젤 자동차가 여전히 93%가 넘는 압도적인 비중을 보였다. 전기차의 경우 배터리 전기차 1.3%,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1.3%로 전체 승용차 중 2.6%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22년 1월 기준 사용 연료별 승용차 비중> (단위: %) 가솔린 63.9% 디젤 30.5% 하이브리드(HEV) 2.1% 배터리 전기차 1.3%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1.3% LPG+CNG 0.9% [자료: 독일 연방 자동차청] 독일 연방 자동차청의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전체 등록 승용차 중 전기차의 비중은 2017년 이후 급 증가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이러한 증가세는 전기차 보조금 정책과 무관하지 않다. 왜냐하면 독일은 2016년에 처음으로 보조금 정책을 도입했기 때문이다. 또한 눈에 띄는 점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여러 요인이 있지만, 주목할 만한 요인 중 하나는 독일의 공공 충전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현재 독일은 전기차 대수에 비해 공공 충전시설이 부족하고 지역별 편차도 큰 편이다.* 따라서 부족한 공공 충전 인프라로 인해 배터리 전기차의 경우 장거리 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반면 장거리 운행 시 내연기관을 이용해 주행할 수 있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이러한 문제의 대안이 될 수 있어 그 수요가 늘었다고 분석할 수 있다. 또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 시 현행 최대 4500유로의 국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것도 판매량 증가의 주요 원인 중 하나다. 주: 독일 전기차 공공 충전소 인프라 현황과 관련해서는 KOTRA 해외시장뉴스 「독일 전기차 충전기 시장동향」 참고 <독일 전체 승용차 중 배터리 전기차, 플러그 하이브리드 전기차 비율(2012~2022)> [자료: 독일 연방 자동차청] 한편, 브랜드별 배터리 전기차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독일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인 브랜드는 점유율 20.7%를 기록한 폴크스바겐이다. 폴크스바겐 전기차는 2022년 5월까지 집계 기준 12만 6228대로 전년 동월 대비 두 배가량 증가했다. 현대와 기아의 전기차는 각각 4만4873대와 1만3979대로 5위와 14위를 기록했다. 현대의 경우 2020년 BMW, Nissan의 전기차보다 등록대수가 적었으나 이후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며 2022년에 해당 제조사들을 제치고 점유율 7.37%로 5위에 올랐다. <브랜드별 배터리 전기차 등록 현황(2020~2022)> (단위: 대, %) 순위 브랜드 2020 2021 2022 점유율 1 VW 19,378 62,225 126,228 20.74 2 Renault 27,750 57,036 87,748 14.42 3 Tesla 34,389 66,422 10.92 4 Smart 21,923 36,109 57,028 9.37 5 Hyundai 6,911 21,418 44,873 7.37 6 BMW 16,756 23,268 36,578 6.01 7 Opel 671 7,379 24,517 4.03 8 Audi 2,948 8,810 19,872 3.27 9 Skoda 9 4,768 19,572 3.22 10 Peugeot 1,488 5,382 17,321 2.85 11 Mercedes 1,722 5,530 15,854 2.61 12 Nissan 7,900 11,048 14,926 2.45 13 Mini 198 4,372 14,061 2.31 14 Kia 2,072 6,232 13,979 2.30 15 Fiat 208 1,050 12,937 2.13 16 Mazda 1 3,780 6,544 1.08 17 Seat 2 2,106 6,536 1.07 18 Porsche 818 2,877 6,403 1.05 19 Dacia 1 4,046 0.66 20 Citroen 1,499 1,587 3,434 0.56 21 Ford 108 312 2,681 0.44 22 Honda 26 1,143 2,181 0.36 23 Jaguar 806 1,800 1,916 0.31 24 Volvo 11 117 1,182 0.19 25 Mitsubishi 1,046 996 963 0.16 26 DS 58 227 348 0.06 27 Lexus 20 118 0.02 28 Toyota 2 3 110 0.02 29 Suzuki 71 65 56 0.01 30 Sachsenring 37 36 36 0.01 31 Subaru 14 16 11 0.00 32 Chevrolet 4 4 6 0.00 33 Land Rover 1 3 4 0.00 34 Lada 4 0.00 35 MG Rover 3 4 4 0.00 36 Saab 2 2 3 0.00 37 Daihatsu 2 2 2 0.00 38 Jeep 2 1 1 0.00 39 Alfa Romeo 1 0.00 주: 2022년은 5월까지 집계 기준 [자료: 독일 연방 자동차청] 2023 독일 전기차 보조금 정책 독일은 앙겔라 메르켈 총리 재임 시절인 2016년 처음으로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도입했다. 살펴본 바와 같이 보조금 정책 이후인 2017년부터 독일의 전기차 수는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 하지만 독일의 전기차 보급에 일조한 보조금 정책은 지난해 말 새롭게 출범한 이른바 신호등 연립 정부에 의해 변화가 예고됐다. 왜냐하면 연정 구성 당시 사민당, 녹색당, 자민당은 2023년부터 기후 보호에 효과가 있는 자동차 즉 배터리 전기차에만 지원을 집중하는 데 합의했기 때문이다. 관련해 지난 7월 26일 로버트 하벡 연방 경제기후보호부 장관은 2023년부터 보조금 지원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구체적인 보조금 삭감안을 발표했다. 하벡 장관은 연정 구성 시 합의한 바대로 가능한 예산 범위 내에서 기후 친화적인 배터리 전기차에 보조금이 집중될 것을 예고했다. 또한 그는 향후 2년간 배정할 34억 유로(2023년 21억, 2024년 13억 유로)의 전기차 보조금 예산이 소진되면 보조금 지급을 중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독일 연방정부가 추진 중인 전기차 보조금 삭감안의 내용은 하기와 같다. <독일 전기차 보조금 삭감안> ㅇ 배터리 전기차 보조금: 배터리 전기차 보조금은 2023년부터 차량 가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삭감된다. 연도 보조금 정책 2022 - 40,000유로 미만: 최대 6000유로 - 40,000~65,000유로: 최대 5000유로 2023 - 40,000유로 미만: 최대 4500유로 - 40,000~65,000유로: 최대 3000유로 2024 - 45,000유로 미만: 최대 3000유로 ㅇ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현행 최대 4500유로의 보조금이 2023년부터 전액 삭감된다. ㅇ 2023년 9월 1일부터 보조금 지급 대상은 개인으로 제한된다. [자료: 연방경제기후보호부] 연방정부는 보조금이 삭감되고 향후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전기차로의 전환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벡 경제기후보호부 장관은 “2021년에 전기차 100만 대 목표를 달성했고, 올해 그 수가 200만 대에 가까워질 것“이라며, “따라서 전기차는 점점 더 대중화되고 있으며 가까운 장래에 더 이상 정부 보조금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며 보조금 삭감이 전기차 보급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진단했다. 이러한 연방정부의 판단과 달리 보조금 삭감이 전기차 보급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경고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독일 뒤스부르크대학 자동차연구센터(Center for Automotive Research)의 두덴회퍼(Ferdinand Dudenhöffer) 교수는 “현재 물가 상승률과 배터리 셀 병목현상 등을 고려할 때 향후 3~5년간 전기차의 가격이 상승할 소지가 있고, 이는 내연기관 자동차와 비교 시 심각한 가격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보조금을 삭감할 경우 전기차 보급 속도가 확연히 느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시사점 연방정부가 추진 중인 보조금 정책이 시행되면, 2023년부터 2년간 배터리 전기차 중 4만 유로 이하 경차의 수요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4만 유로 이상의 전기차의 판매량은 감소할 수 있고, 특히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보조금 지급 중단으로 판매량이 많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연방정부가 추진하는 보조금 삭감안은 4만 유로 이상의 배터리 전기차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주력으로 판매하는 완성차 업체에는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썸네일 출처: Store + Charge 자료: 독일 연방자동차청, 연방경제기후보호부, Statista, Süddeutsche Zeitung, Tagesschau, KOTRA 함부르크 무역관 보유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함부르크무역관 문기철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08.04
-

- 2022년 하반기 영국 경제 전망
- 더 타임스의 6월 기사에 따르면 영국 국민들은 최악의 인플레이션에 긴장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높은 인플레이션이 명목급여 가치를 잠식함에 따라 실질급여 가치가 최근 10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떨어지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따라서 영국의 소비자들은 이미 지출을 억제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영국의 연간 인플레이션 동향> (단위: %) 주: CPI(Consumer Prices Index: 소비자물가지수), CPIH(Consumer Prices Index including owner occupiers’ housing costs: 자가 거주인의 주거비 포함 CPI), OOH(Owner occupiers’ housing costs: 자가 거주인의 주거비) [자료: 인플레이션, 영국 통계청: 2022년 5월] 소비자물가지수인 CPI는 4월 9%에서 5월 9.1%로 소폭 상승했는데, 이는 생활비 압박이 계속될 것이라는 신호를 나타낸다. 에너지 가격은 계속해서 높은 인플레이션을 야기하는 주요 동인이며 코로나19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사태, 중국 봉쇄 등과 관련된 공급망 이슈도 이에 포함된다. 또한 영국 통계청(ONS)에 따르면 실질 가처분 소득은 1.5% 인상된 임금이 1.7%의 인플레이션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1월과 3월 사이에 0.2% 감소했다. 치솟는 인플레이션으로 가계 소득이 사상 최대로 4분기 연속 하락한 것이다. <영국 GDP 추이> (단위: Index 2019=100) 주: 영국, 2020년 2월~2022년 3월, 2019년 월별 GDP 지수 및 분기별 평균 GDP 지수 [자료: 영국 통계청 ONS – GDP quarterly national accounts: 2022년 6월] ONS는 영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기록적인 517억 파운드(GDP의 8.3%)라고 전했다. 치솟는 인플레이션으로 가계와 기업이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생활비 위기가 영국을 침체(2분기 연속 생산량 감소)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인플레이션은 이미 2022년 6월 기준, 9.1%에 도달했으며 가을에는 11%를 넘을 예정이다. EY Item Club의 Martin Beck은 "2분기에 에너지 가격 상한선이 50% 이상 증가하고 개인 세금이 인상되면서 가계 지출에 대한 압박이 더 커질 것이다. 10월에는 에너지 가격 상한선이 더 크게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10명 중 8명은 생활비 부담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 영국 일간지 메트로(Metro)는 7월 가계가 생활비 위기의 압박을 느끼면서 영국 경제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팬데믹 시작 이후 최저점을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8%만이 향후 12개월 동안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반면에 78%는 상황이 더 나빠질 것이라고 믿고 있다. 가계 재정에 대한 낙관론도 6월에 -40으로 떨어졌는데, 이는 2020년 3월 코로나 팬데믹 기간의 최저점과 일치하고 5월의 -28에서 추가 하락했다. 가계의 재정적 어려움은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소비자의 58%는 생필품을 줄이거나 저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지난 달에 약 210만 가구가 모기지, 임대료, 대출, 신용 카드 또는 청구서를 미납했거나 연체했으며, 올해 6개월 동안 200만 가구 이상이 지불을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Which? 매거진 Rocio Concha 정책 이사는 이는 재정적으로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서 특히 두드러지며 소득이 GBP 21,000 이하인 사람들의 약 2/3가 필수품을 충당하기 위해 최소한 한 번 재정적 조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년도 하반기 영국 경제 예측 영국상공회의소(British Chambers of Commerce)는 악화되는 경제전망에 대해 2022년 영국 GDP 성장률에 대한 기대치를 3.75% 이하로 하향 조정했다. 이제 영국의 인플레이션율이 2022년 4분기에 10~11%에 도달하여 평균 소득 증가율을 능가할 것으로 예상하고있다. 경제 불확실성과 비용 상승도 기업 투자를 크게 약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 경제지표 현황 및 전망*> (단위: 퍼센트(%)) 구분 평균 예측 2010-2019 2021 2022 2023 2024 연평균 GDP 2 7.5 3.75 -0.25 0.25 가계소비 2 6.25 4.75 1 1 사업투자 3.75 -1 11 0.5 -5.25 주택투자 3.75 14 7.25 -1.75 -1.5 수출 3.5 -1.25 4.25 3 2.5 수입 3.75 3.75 5.5 7.75 2.25 시간당 노동 생산성 1.5 1 -0.25 0.25 1 실업률 5.25 4 3.5 4.25 5 CPI 인플레이션 0.5 5 10.25 3.5 1.5 *주: 수치는 연간 평균 성장률을 나타냄. [자료: 영란은행, Bank of England Monetary Policy Report May 2022] GDP 2022년 성장에 대한 기대치는 3.75%로 작년에 기록된 7.5% 성장의 절반에 겨우 도달하는 수치이다. 분기별 GDP는 4분기에 0.2% 감소하기 전에 2분기와 3분기에 성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평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정적인 전망은 치솟는 인플레이션, 약한 기업 투자, 세금 인상 및 글로벌 경제 충격의 조합을 반영한다. 영국의 연간 경제성장률은 2023년 급격히 둔화된 후 2024년 약간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소비자 지출은 2022년에 4.75%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는 1분기의 예측에서 다소 하락한 것이다. 이는 현재 인플레이션이 올해 평균 소득 증가율 5%를 훨씬 능가하기 때문에 실질 가계 소득에 대한 압박이 높았음을 반영한다. 투자 기업 투자는 2022년에 11%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는 이전 예측된 수치에서 하향 조정됐다. 등급 하향은 정치적, 경제적 불확실성의 증가와 소규모 기업의 투자능력을 제한하는 비용 압박 증가를 반영한다. BCC의 기업투자 조사데이터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인플레이션 기업과 소비자는 원자재 가격 상승, 에너지 가격 상한 인상,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 상승 압력으로 인해 전례 없는 인플레이션 압력에 직면해 있다. 소비자물가지수(CPI)인 인플레이션은 2022년 4분기에 11%까지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CPI 기록이 1989년에 현재 형태로 시작된 이래 가장 높은 수치가 될 것이다. 영국 상공회의소 정책 이사인 Alex Veitch 는 예측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의 최신 예측에 따르면 영국 경제가 직면한 역풍은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압력과 부진한 성장으로 줄어들 기미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영국이 코로나19 회복을 시작할 때 시작됐다. 영국 기업들의 사업 수익성에 추가 압박을 가하고 있다." 그는 "인플레이션이 임금보다 앞서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는 기업에 추가로 영향을 미치고 성장을 저해할 소비자 지출 감소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만일 추세가 계속된다면 인플레이션이 2024년 말이나 되어야 영란 은행의 목표 금리인 2%대로 돌아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금리 한편, 영국 통화정책위원회(MPC, Monetary Policy Committee)는 2022년 6월 15일 회의에서 9명 중 6:3의 다수의 의견으로 기준금리를 1.25%로 0.25% 포인트 인상했다. 다음 발표는 8월 중순이다. <영국 기준금리 변동 현황> (단위: %) 변경시기 2020. 3. 19. 2021. 12. 16 2022. 2. 3 2022. 3. 17 2022. 5. 5 2022. 6. 16 기준금리 0.10 0.25 0.50 0.75 1.00 1.25 [자료: 영국중앙은행(Bank of England)] 전망 및 시사점 영국의 무역적자는 3월 116억 파운드에서 4월 85억 파운드로 예상보다 많이 줄었다. 로이터에 따르면 경제학자들은 하반기에 108억 파운드로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적자는 1973년 석유 금수 조치로 물가가 인상됐던 1970년대 중반 이후 GDP 대비 최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Pantheon Macroeconomics 컨설팅사의 수석 영국경제학자 Gabriella Dickens는 영국 기업들이 유럽에서 시장 점유율을 계속 잃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앞으로 우리는 최근 유가가 추가로 상승하고 여행 서비스 수입이 반등함에 따라 수입 가치가 계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 한편 영국의 수출은 브렉시트가 수요를 둔화시키면서 상대적으로 부진한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영국 국민들의 지갑사정이 얇아지고 소비자들이 상품 가격에 더더욱 민감해지는 만큼 영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은 현재의 급변하는 영국 경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주요 저가 소매업체를 공략해 시장 진입을 노려봐야 할 것이다. 자료: 가디언, 메트로, 영국상공회의소, 영국중앙은행, 영국통계청, 파이낸셜타임즈, OECE, IMF 및 KOTRA 런던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런던무역관 유안나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08.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