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 2021년 통계로 보는 한국의 북마케도니아 수출 특징
- 최근 한국의 북마케도니아 수출은 주요 수출품인 승용차의 수출 감소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화장품, 가전/생활용품, 의약품, 기계류 등의 수출 증가로 품목의 다변화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기업을 필두로 현지 수출 기업의 숫자 또한 지속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북마케도니아는 인구 200만 명의 비EU국가로, 시장 진입 장벽 및 경쟁 강도가 낮은 특성을 가지는 만큼 유럽 초기 진출 시장으로서의 북마케도니아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2021년 한국의 북마케도니아 수출 실적 2021년 한국의 북마케도니아 수출은 761만 달러로 전년대비 4.8% 감소했으며, 2017~2021년 연평균 20%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수출 비중이 높은 승용차 수출이 감소했기 때문인데 2017년 1374만 달러를 기록한 한국 승용차 수출은 2021년 125만 달러로 급감했다. 2021년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은 승용차가 125만 달러로 1위를 기록했으며, 뒤를 이어 의약품(101만 달러), 공기조절기(100만 달러), 자동차부품(63만 달러), 기타정밀화학제품(61만 달러)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한국의 북마케도니아 수출은 그간 승용차에 편중돼 있었는데 2020년을 기점으로 의약품, 공기조절기, 화장품 등 증가하고 있다. <2017~2021년 한국의 북마케도니아 수출 및 10대 수출 품목 현황(MTI 4단위 기준)> (단위: 천 달러, %) MTI 품목명 2017 2018 2019 2020 2021 CAGR 총 수출 18,568 12,790 9,033 7,944 7,607 -20 7411 승용차 13,741 8,761 4,317 919 1,251 -45 2262 의약품 41 63 120 259 1,008 123 7131 공기조절기 0 10 10 292 1,002 N/A 7420 자동차부품 1,127 586 780 408 630 -14 2290 기타정밀화학제품 90 98 83 644 611 61 2273 화장품 14 10 29 193 434 136 6212 알루미늄조가공품 340 251 151 149 346 0 3109 기타플라스틱제품 147 289 228 282 339 23 8147 의료용전자기기 104 178 257 2,462 247 24 3203 타이어 1,634 1,023 25 434 242 -38 [자료: 무역협회 수출입통계] 2021년 한국의 북마케도니아 수출 제품 분석 2021년 한국의 북마케도니아 수출을 제품 성질별로 분석해보면, 한국은 자본재의 수출 비중이 37.1%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한국은 불가리아에 자본재를 282만 달러로 가장 많이 수출했으며, 뒤를 이어 원자재(248만 달러), 소비재(231만 달러)의 순이었다. 특히, 2017~2021년 소비재 수출이 연평균 38%씩 급감한 반면에 원자재와 자본재의 경우 같은 기간 각각 연평균 22%, 10%의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7~2021년 한국의 제품 성질별 북마케도니아 수출 현황> (단위: 천 달러,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CAGR 소비재 15,530 9,957 5,311 1,718 2,310 -38 원자재 1,109 1,198 960 1,558 2,477 22 자본재 1,928 1,635 2,762 4,669 2,821 10 합계 18,567 12,790 9,033 7,945 7,608 -20 [자료: 관세청 ‘신성질별 국가별 수출입실적’ 통계(무역관 재가공)] (소비재) 2021년 내구소비재의 수출이 152만 달러로 가장 많았으며 동 기간 한국이 북마케도니아에 수출한 주요 내구소비재 제품으로는 승용차(125만 달러), 생활용품(15만 달러), 가전제품(12만 달러) 등이 있다. 특히, 2017~2021년 사이 내구소비재의 수출이 연평균 42% 감소했는데, 이는 승용차의 수출이 동 기간 크게 줄었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비내구소비재의 경우 한국은 770만 달러를 수출하며 2017~2021년 기간 연평균 18%의 감소세를 보였는데, 동 기간 한국의 주요 비내구소비재 수출 제품인 타이어의 수출이 연평균 38% 감소한 반면, 화장품의 수출은 134%씩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마지막으로 2021년 한국은 북마케도니아에 2만 달러의 직접소비재를 수출했는데, 세부 제품으로는 담배와 조제식료품 등이 있었다. <2017~2021년 한국의 대 북마케도니아 소비재 성격·제품별 수출 현황> (단위: 천 달러,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CAGR 직접소비재 0 6 4 7 23 N/A 담배 - - - - 14 N/A 조제식료품 - 6 4 7 9 N/A 내구소비재 13,817 8,862 5,228 1,035 1,522 -42 자동차(승용) 13,704 8,753 5,121 919 1,251 -45 생활용품 38 62 47 75 151 41 가전제품 75 47 60 40 120 12 기타 - - 1 - - N/A 비내구소비재 1,713 1,089 79 676 765 -18 화장품 14 9 25 187 422 134 타이어 1,634 1,023 25 434 242 -38 인쇄물 32 21 - 33 58 16 기타 3 35 29 22 43 7 총계 15,530 9,957 5,311 1,718 2,310 -38 [자료: 관세청 ‘신성질별 국가별 수출입실적’ 통계(무역관 재가공)] (원자재) 2021년 한국은 북마케도니아에 원자재 중 화학공업제품을 205만 달러로 가장 많이 수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약품 등을 포함한 정밀화학제품을 164만 달러로 가장 많이 수출했으며, 뒤를 이어 플라스틱제품(40만 달러) 등이 있었다. 철강·금속제품의 경우, 2021년 한국은 35만 달러의 알루미늄을 수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알루미늄 제품은 현지 자동차 부품공장에서 조립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서유럽 완성차 밸류 체인에 납품되고 있다. 덧붙여, 같은 해 한국은 농산물(종자) 등을 포함한 동식물성 연·원료 7만 달러를 수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7~2021년 한국의 대 북마케도니아 원자재 성격/제품별 수출 현황> (단위: 천 달러,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CAGR 화학공업제품 422 542 518 1,247 2,046 48 정밀화학제품 135 177 209 912 1,641 87 플라스틱제품 282 357 302 333 403 9 기타 6 7 7 2 2 -24 철강/금속제품 340 251 151 149 346 0 알루미늄 340 251 151 149 346 0 동식물성 연/원료 143 252 138 104 76 -15 농산물(종자) 127 136 125 96 71 -14 제지원료 15 12 10 5 5 -24 기타 2 104 3 2 - N/A 기타 204 153 152 58 8 -55 총계 1,109 1,198 960 1,558 2,477 22 [자료: 관세청 ‘신성질별 국가별 수출입실적’ 통계(무역관 재가공)] (자본재) 2021년 한국은 기계류 제품을 206만 달러로 불가리아에 가장 많이 수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제품을 보면 일반기계가 143만 달러로 가장 많았다. 참고로, 2020년의 정밀기계 수출이 318만 달러로 일시적으로 늘었는데, 이는 코로나 확산 등으로 북마케도니아 내 의료기기(영상진단기기)에 대한 수요가 발생했기 때문으로 확인됐다. 나아가 자본재 중 두 번째로 수출이 많은 수송장비의 경우 자동차부품 수출이 대부분으로, 한국의 승용차 수출 감소, 글로벌 물류비 상승 등의 영향으로 한국 자동차부품 수출은 2017~2021년 기간 연평균 14%씩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덧붙여, 2021년 한국은 IT제품과 IT부품을 각각 6만 달러, 5만 달러를 북마케도니아에 수출했는데 IT제품의 경우 무선통신기기 및 정보기기를, IT부품의 경우 기타IT부품을 수출했다. <2017~2021년 한국의 대 북마케도니아 자본재 성격/제품별 수출 현황> (단위: 천 달러,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CAGR 기계류 685 750 1,701 4,163 2,058 32 일반기계 440 184 1,038 895 1,429 34 정밀기계 164 513 559 3,180 582 37 전기기계 5 14 38 40 31 58 기계요소/공구 75 39 66 13 17 -31 기타 - - - 35 - N/A 수송장비 1,186 780 863 426 655 -14 자동차부품 1,126 586 775 408 630 -14 자동차(상용) 22 147 48 2 - N/A 기타 38 46 40 16 25 -10 IT제품 41 95 76 23 56 8 무선통신기기 - - - 1 35 N/A 정보기기 40 95 67 18 21 -15 방송기기 - - 7 5 - N/A 유선통신기기 1 - 1 - - N/A IT부품 16 10 122 56 52 34 반도체 - - - 1 1 N/A 펑판디스플레이 7 3 64 - - N/A 기타 9 7 58 55 51 54 총계 1,928 1,635 2,762 4,669 2,821 10 [자료: 관세청 ‘신성질별 국가별 수출입실적’ 통계(무역관 재가공)] 2021년 한국의 북마케도니아 수출 기업 분석 2021년 북마케도니아에 수출한 한국 기업은 127개사로 2020년 119개사 대비 8개사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127개사 중 중소기업이 81.9%(104개사)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뒤를 이어 대기업 10개사(7.9%), 중견기업 8개사(6.3%) 등의 순이었다. 특히, 2021년 북마케도니아에 수출하는 중소기업 수는 전년대비 늘었으나 총 수출액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결과 2021년 중소기업 1개사당 평균 수출액은 35,474달러로 전년(51,647달러) 대비 16,173달러 감소했다. 반면, 대기업의 경우 북마케도니아 수출 기업 수와 수출액이 각각 10개사, 336만 달러로 전년대비 모두 늘었으며, 이에 따라 2021년 대기업 1개사당 평균 수출액은 336,291달러로 전년대비 전년대비 121,340달러 증가했다. <2017~2021년 한국의 대 북마케도니아 수출기업 규모별 수출 현황> (단위: 개사, 천 달러) 연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기타/미분류 합계 기업 수출 기업 수출 기업 수출 기업 수출 기업 수출 2017 9 14,110 5 1,662 75 2,763 1 32 90 18,568 2018 10 9,673 7 1,328 91 1,768 1 21 109 12,790 2019 11 5,990 9 217 96 2,826 0 0 116 9,033 2020 9 1,935 8 760 101 5,216 1 33 119 7,944 2021 10 3,363 8 490 104 3,689 5 65 127 7,607 [자료: KOTRA 자체 자료 (무역관 재가공)] 2021년 북마케도니아 수출기업의 산업 및 지역 분포 2021년 북마케도니아 수출 기업 127개사의 산업 분포를 분석한 결과 ‘도매/상품중개업’이 전체 기업의 16.5%인 21개사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의료·정밀기기 제조기업(20개사), 기타 기계·장비 제조기업(15개사), 전자·컴퓨터·통신장비 제조기업(11개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인구 200만 명 규모의 작은 시장 특성상 소량 주문 대응이 가능한 수출 대행사를 통한 대리 수출이 활발하여 ‘도매·상품 중개업’의 비중이 높았으며,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북마케도니아로 수출하는 ‘의료·정밀기기 제조’, ‘의약품 제조’기업의 숫자가 많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는 경기 소재 기업이 48개사로 전체 기업의 37.8%를 차지했으며 뒤를 이어 서울(43개사), 강원(6개사), 경남(6개사), 대전(4개사), 부산(4개사)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수출기업의 71.7%가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 북마케도니아 수출기업 산업/지역 분포 현황> 지역 산업 경기 서울 강원 경남 대전 부산 기타 지역 합계 도매/상품 중개업 8 11 - - - 1 1 21 의료/정밀기기 제조 9 3 4 - 1 - 3 20 기타 기계/장비 제조 4 6 - 1 - 1 3 15 전자/컴퓨터/통신장비 제조 6 4 - - - - 1 11 의약품 제조 4 2 2 - 1 - - 9 화학제품 제조(의약품제외) 2 4 - - - - 2 8 고무/플라스틱제품 제조 3 1 - 1 - 1 1 7 소매업(자동차제외) 3 4 - - - - - 7 자동차/트레일러 제조 2 1 - 2 - - 1 6 출판업 - 3 - - - - - 3 식료품 제조 1 - - - - - 1 2 영상/오디오 제작/배급 - 2 - - - - - 2 섬유제품 제조(의복 제외) - 1 - - - - 1 2 전기장비 제조 2 - - - - - - 2 기타제품 제조 - - - 1 - 1 - 2 기타 4 1 - 1 2 - 2 10 합계 48 43 6 6 4 4 16 127 주: 1) 기타지역은 북마케도니아 수출기업이 4개사 미만 지역으로 ‘광주’, ‘경북’, ‘대구’, ‘세종’, ‘울산’ ‘인천’, ‘충남’, ‘충북’, ‘미분류’를 포함 2) 산업은 대한민국 10차 표준산업분류 기준을 적용 [자료: KOTRA 자체 자료(무역관 재가공)] 시사점 2021년 한국의 북마케도니아 수출은 761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수출총액이 높진 않지만, 그동안 승용차 등 특정 품목에 집중됐던 한국의 수출 품목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어 향후 우리 기업의 시장 진출 기회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수출 제품의 성질별로는 2021년 자본재의 수출 비중이 37.1%로 가장 높았으며, 그중에서도 기계류 제품은 두 자릿수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었다. 소비재의 경우 2017~2021년 연평균 42%의 높은 수출 감소세를 보였으나 화장품, 생활용품, 가전제품 등 일부 제품의 경우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7~2021년 북마케도니아 수출 기업의 수가 꾸준히 증가했는데 특히, 중소기업의 시장 진출이 가장 활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북마케도니아가 비EU로서 인증 등의 진입장벽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고 시장 규모가 작아 경쟁 강도가 낮은 사실 등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자료: 무역협회 수출통계, 관세청 수출통계, KOTRA 자체 통계, 통계청(한국표준산업분류), KOTRA 소피아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소피아무역관 정지운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06.1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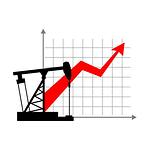
- 루블화 강세, 기회인가 위기인가
- 네덜란드병이란 석유, 가스 등 자원이 개발된 후 단기적으로는 경기 호황을 누리다가 자원 수출에 따른 부작용으로 장기적으로는 경제가 침체되는 현상을 일컫는 용어로, 1959년 네덜란드의 사례에서 유래했다. 1959년 흐로닝언주 앞 북해에서 천연가스가 발견되면서 네덜란드는 가스 수출로 큰 돈을 벌었다. 그러나 수출대금이 자국으로 대거 유입되자 달러 대비 굴덴화(네덜란드 화폐 단위)의 가치가 크게 상승해 네덜란드 내에서 수출업을 영위하던 기업에는 오히려 악재로 작용했다. 또한 달러의 유입으로 시중에 풀린 돈이 많아지자 인플레이션이 발생해 임금 상승을 주장하는 노조와 기업 간 대립이 심화됐다. 이후 네덜란드는 극심한 사회 불안과 기업들의 투자위축을 경험했고 이는 결국 경기 불황으로 이어졌다. 러시아는 1999년 이후 계속된 고유가의 영향으로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였으나 루블화 가치 상승으로 인한 수출경쟁력 약화, 인플레이션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바 있다. 최근 러-우 사태 이후 석유 등 자원 가격 상승으로 루블화 강세가 지속되자 러시아 경제는 “네덜란드병”에 직면할 상황이라고 전문가인 D.Domashenko 박사는 전망했다. 그는 루블화 강세는 결국 에너지 자원을 제외한 시장에서의 러시아 제품 가격 경쟁력 하락을 야기할 것이라고 RBK Group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이와 같은 전개를 피하기 위해 몇몇 전문가는 고정환율제도 도입해 네덜란드병을 피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루블화 추이 2월 말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서방 국가들이 제재에 동참하며 루블화가치는 급격히 하락했다. 그 후 러시아 정부는 중앙은행을 통해 환율 안정화 정책을 펼쳤다. 국가화폐의 가치가 올라가면 수입 물품 가격이 비교적 저렴해지고 단기적으로는 급격한 인플레이션을 막는 효과가 있지만 결국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고 국고도 줄어드는 단점이 있다. <러-우 사태 이후의 루블화 추이> [자료: investment.ru] 2022년 5월 1달러당 환율은 58루블, 1유로당 환율은 60루블까지 떨어졌다. 3월 말부터 루블화 강세가 시작되며 계속해서 신기록을 세우고 있다. 루블화 강세에는 아래와 같은 이유가 있다. 외화 관련 제재 전문가들에 의하면 몇년 만에 달러가 60루블 이하로 떨어지게 된 것은 전형적인 기술적인 사유들 때문이라고 한다. 2월 말 러-우 사태가 시작되며 루블화가 평가절하되고 러시아 은행들에 대한 제재가 시작되며 거주자의 루블 현금화 및 달러화 시도들이 늘어났다. 자국 외화 이탈을 막고자 중앙은행에서는 외화 관련 제재를 만들었다. 그 효과는 성공적이었고 3월 중순 이후로 루블화 가치는 급격하게 상승해 러-우 사태 이전으로 돌아왔다. 현재 루블화 강세는 일반적인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해 만들어졌다기보다 러시아의 금융 조치로 이루어졌다. 중앙은행은 외화 이탈을 막기 위해 러시아 거주자들에 대해 러시아 외의 금융기관에서 개설된 본인 계좌로의 외화 송금을 금지했다. 또한 기준금리를 20%까지 높이고 만 달러 이상의 현금이나 외화 화폐 상품은 해외 반출을 금지시켰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43개 비우호국 국민에 대해서는 해외 송금을 월 5,000달러로 제한시키고 달러 및 주요 외화로의 현금 인출은 처음에는 월 만 달러로, 이후에는 아예 금지시켰다. 이후 환율이 완화되자 러시아 중앙은행은 지난 6월 8일부터 러시아 거주자 및 우호국 비거주자의 해외 송금을 월 15만 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비우호국에 속한 비거주자 단체에 대해서는 종전과 동일하게 러시아 내로부터의 해외송금은 금지된 상태이다. 수출 대금, 세금 및 가스 판매 지난 3월 루블화 하락세가 지속되자 러시아 중앙은행은 수출업체에 매출 80%에 해당하는 외화를 의무적으로 매각해야 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이로 인해 루블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 5월 25~27일경 수출업체 세금 납부 기한이 되며 수출 업체들은 세금 납부 목적으로 추가로 루블화 매입을 해야 했다. 이로 인해 유입되는 달러에 비해 수요는 상대적으로 적어져 현재 상황과 모순되는 루블화 강세로 이어졌다고 연구센터 TeleTrade 소속 경제학자 마크 고이흐만은 밝혔다. 또 다른 루블 강세 원인으로 작용한 제도는 가스 대금 지불을 루블화로 의무화한 것이다. 러시아 최대 에너지 국영기업 Gazprom의 해외 파트너 54개 사는 대금 루블화 지급을 위해 Gazpombank 계좌를 개설했다. 또한 러시아 주 수입원 중 하나인 석유 가격이 상승하며 루블화 강세를 불러왔다. 몇주 간 루블화 강세가 지속되자 정부는 규제를 완화했다. 5월 매도 필수 금액을 80%에서 50%까지 낮추고 매도 기한을 3일에서 120일로 늘렸다. 전망 일부 전문가들에 의하면 여름에는 루블화 상승세의 2차 바람이 불어 1달러 당 50루블까지 내려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중앙은행이 루블화의 지나친 상승을 지켜보지 않을 것이다. 루블화 강세로 인해 지나친 인플레이션과 수입제품 가격 상승은 막았지만 루블화 강세는 수출 경쟁력을 떨어트려 네덜란드병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경제학 교수 B.Heifez는 네덜란드병 외에 러시아 경제에 다른 평가를 내렸다. 러시아 경제가 세계로부터 고립되며 수입, 투자, 상거래 등이 줄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러시아 경제개발부에 의하면 2022년 러시아 내 수입은 작년 대비 17%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로 금융 제재 및 물류 제재의 결과이다. 루블화 강세는 수입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루블화 강세가 지속되는 동안 자국 산업이 무너지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수입업체 지원을 지속해야할 것이라고 그는 RBC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자료: 네이버 지식백과, Ria, RBC, KOTRA 상트페테르부르크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상트페테르부르크무역관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06.13
-

- 10년의 러시아 경제실적, 그리고 2022년 하반기 전망
- 지난 10년간의 러시아 경제 실적 2021년 러시아 명목 GDP는 1조7759억 달러로 전년대비 4.7% 상승한 것으로 파악된다. 경제성장률은 지난 10년 동안 최고점을 기록했으나, 명목GDP 규모로는 2012년에 최고점(2조2067억 달러)을 기록했다. 러시아는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로 2015년부터 역성장(-2.8%)이 시작됐고, 2017년부터 소폭 회복되기 시작했다. 2020년 코로나19가 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2021년 동안 코로나19 발발 이전 수준 이상으로 경제 회복세를 보였다. 러시아의 2021년 1인당 명목 GDP는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 발발 이후인 지난 7년 중 최고 수준(1만2205달러)을 기록했다. 한편, 2012년 1인당 GDP는 1만4068달러로 지난 10년 기준 최고 수준이었고,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발했던 2014년은 그보다 소폭 낮은 1만2972달러를 기록했다. 물가상승률은 2016년이 최고점을 기록하면서 연간 인플레이션이 12.9%였다. 실업률은 코로나19가 발발한 2020년에 최고치를 기록(5.9%) 했다. 러시아의 총수출 규모도 2012년에 최대 규모(5280억 달러)를 기록했고 총수입도 같은 해 최고 규모(3357억 달러)를 기록했다. 대한 수출은 2019년에 176억 달러로 지난 10년동안 최대 규모였고, 수입(한국의 대러 수출)은 2012년에 110억9000만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러시아 전체 무역수지 규모로 보면, 2012년 1923억 달러로 최고점을 기록했고 경상수지로는 2021년 1203억 달러를 기록하여 최고점을 찍었다. <지난 10년간의 러시아 주요 경제제표> 주요 지표 단위 2012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인구 백만 명 143.2 146.3 146.5 146.8 147.0 147.2 146.9 146.2 145.5 명목 GDP 십억 달러 2,206.7 2,059.0 1,363.4 1,280.1 1,563.2 1,564.0 1,686.7 1,474.1 1,775.9 1인당명목GDP 달러 14,068 12,972 9,099 10,986 10,654 10,655 11,482 10,082.7 12,205.5 실질성장률 % 3.7 0.8 -2.8 -0.2 1.6 2.3 1.3 -3.0 4.7 실업률 % 5.7 5.2 5.6 5.8 5.4 5.4 4.7 5.9 4.8 소비자물가상승률 % 6.6 11.9 12.9 6.5 4.1 4.0 4.3 4.9 8.4 재정수지 (GDP대비) % -0.1 -0.4 -2.4 -3.4 -2.2 2.6 1.7 -3.8 0.4 총수출 US$ 억 5,280 4,936 3,519 2,885 3,343 3,364 4,380 3,317 4,933 - 대한 수출 〃 113.5 156.6 113.0 100.0 120.0 175.0 176.0 124.4 173.0 총수입 〃 3,357 3,080 1,963 1,798 2,107 2,221 2,580 2,397 2,961 - 대한 수입 〃 110.9 101.2 46.8 51.0 69.0 73.0 72.0 71.6 99.8 무역수지 US$ 억 1,923 1,856 1,556 1,087 1,236 1,143 1,800 920 1,972 경상수지 〃 713 584 658 353 533 1,130 830 325 1,203 환율(연평균) 루블/US$ 31.09 55.43 61.34 67.06 58.53 62.43 65.1 72.32 73.65 해외직접투자 억 달러 488.2 570.8 220.9 223.1 367.6 313.8 219.2 53.0 384 외국인직접투자 억 달러 505.9 220.3 68.5 325.4 285.6 87.9 319.8 86.6 292 [자료: 러시아 통계청(Rosstat), 러시아 중앙은행, 경제개발부, EIU, WTA, KITA, 세계은행] *주: 2014년 이전 2012년만 반영 2021년 러시아 경제 회복 배경 2014년 우크라이나 관련 대러 서방 제재가 시작되면서 러시아는 2016년까지 경기침체를 경험했다. 그리고 2017년부터 회복세에 진입했다가 2020년 세계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다시 마이너스 성장을 피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2021년 ‘봉쇄(록다운) 없는 방역규제’와 백신 개발, 디지털 경제 등의 고부가가치 창출 산업 발전 등으로 2014년 이전의 경제 성장 모멘텀을 회복했다. 2021년 동안 유럽 가스 거래가격은 한때 전년대비 250%까지 상승세를 보였는데, 이는 팬데믹으로부터 글로벌 경제회복에 따른 각 국가들의 수요 증가, 재고량 확보 난관(글로벌 공급망 악화), 세계 탄소저감 기조 등 복합적 요인들이 작용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세계 1위 천연가스 매장량과 세계 2위 생산량을 보유하는 러시아는 급격한 경상수지 호조세로 진입하게 됐다. 한편, 2020년 러시아의 세계 가스 수출규모는 전년대비 36% 감소했는데, 이는 우크라이나 관련 대러 서방제재 일환으로 러시아의 노드스트림2(러 야말-유럽 가스파이프라인)의 글로벌 기업 참여 중단이 주 요인이었다. 러시아 가즈프롬(Gazprom)은 2020년 2월부터 단독으로 ‘노드스트림2’ 프로젝트를 추진했고 2021년 9월에 완공했다. 다만, 독일을 포함한 EU 가스거래 신규 규정(자원개발사의 가스유통 규제)으로 노드스트림2를 전적으로 개발한 가즈프롬의 대 유럽 가스 공급은 완공에도 불구하고 지연되고 있었다. <2021년 말 기준 러시아 가스의 국제적인 포지셔닝 현황> ▷ 국제 가스가격 상승세 및 러시아의 세계비중: (매장량) 세계1위, (생산량) 세계2위, (공급) 유럽 수요 의 40% 이상 ` ▷ 매장량 기준 · 세계1위: 러시아(47조8200억㎥, 26.6%) · 세계2위: 이란(26조7400억, 14.9%) · 세계3위: 카타르(25조7800억, 14.3%) ▷ 생산량 기준(‘18년 기준) · 세계1위: 미국(864bcm) · 세계2위: 러시아(741bcm) · 세계3위: 이란(232bcm) [자료: 러시아 에너지자원부, 세계은행, IEA 등] 2022년 하반기 러시아 경제지표 전망 2021년 동안 러시아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부터 경제 회복을 구가했는데, 2022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발하면서 급격한 경제 역성장이 전망되고 있다. 2022년 1월 기준 러시아는 2021년 연간 경제 회복 모멘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2021년의 뚜렷한 팬데믹 이전 상태의 경제 회복 기대와 함께 2022년 1월까지 월 20%대의 러시아 구매력이 증가하고 있었다. 그리고 2021년 하반기 국제 원부자재 가격 상승으로 수개월 동안 월 50~60%씩의 수입 상승세를 보인 결과였다. 올해 2월 우크라이나 사태 발발 이후 대러 국제 제재가 대폭 강화되기 시작했고, 4월8일 러시아 중앙은행은 연초 8%대였던 기준금리를 20%까지 대폭 인상했다. 당시 러시아 중앙은행은 2월 동안 1조2000억 루블(약 185억 달러) 정도의 예금 뱅크런 현상을 보였다가 3월 동안 다소 안정세로 돌아섰으나 여전히 자금유동성 불안정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내린 결정이라고 발표했다. 4월 11일 러시아 중앙은행은 20%의 기준금리에서 17%까지 인하조치했는데, 여건 불확실성이 지속되더라도 3월보다 금융시장 고위험성은 다소 안정세로 돌아섰기 때문이라고 사유를 밝혔다. 그리고 4월 29일에 추가로 14%까지 기준금리가 인하됐고, 6월 10일 현재의 기준금리는 9.5%이다. 우크라이나 사태 및 국제 제재 강화에 의해 변동이 큰 거시경제 지표는 인플레이션이다. 2021년 8%대의 인플레이션을 겪었던 러시아는 2022년 초부터 소비자물가 조정을 위한 경기 진작 계획을 세웠으나 2월 24일 우크라이나 사태 발발 이후 결국 그 계획들이 무산되는 결과를 안게 됐다. 사태 직후 환율 불안(3월 10일 한때 모스크바 거래소에서 달러당 126루블 기록)과 패닉 바잉 현상이 보이면서 지난 4월 러시아 중앙은행은 올해 내 러시아 인플레이션 상승률을 최대 23%까지 전망했다. 러시아 경제개발부는 올해 인플레이션을 18~20% 사이로 전망했고, 금융감사청은 17~20% 사이로 전망치를 내놓았다. 한편, S&P의 2023년 러시아 인플레이션은 10%대로 하락하고 2024년은 7.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관별 예측 러시아 경제성장률 및 인플레이션> 기관(발표일) 경제성장률 인플레이션 ’22년 2023 2024 2022 2023 2024 러 중앙은행 -8~-10% *경제부 –11.9% 전망 -5% - 18~23% - - 러 금융감사청(4.12.) -10% 이상 - - 17∼20% - - IMF(4.21.) -8.5% -2.3% - 21.3% - - S&P(4.26.) -11.1% -1.9% 1.6% 17.8% 10% 7.5% 골드만삭스(3.21.) -10% - - - - - 평균치 -9.76% - - 17~20% - - [자료: 기관별 웹사이트, RBC(언론) 등] 러시아 스베르방크 산하 경제분석기관인 프라임은 현 경제 상황을 감안하면 달러당 74루블 환율이 가장 적절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적정 환율 분석 배경은 최근 루블화 강세로 공급이 수요를 넘어섰는데, 이는 러시아 정부 신규 외환거래법 일환인 러시아 수출자들의 외환 수익의 80%를 거래계좌에서 루블로 자동 환전되면서 루블 강세가 지속됐기 때문이다. 한편, 러시아 정부는 루블화 강세 지속의 이유로 5월 말경에 수출 수익 80%의 자동 환전 기준을 50%로 낮추었다가 6월 7일 이 자동 환전제도를 폐지했다. Univer Capital, BCS World 등의 컨설팅 및 경제분석기관들은 러시아의 루블 의무 매수로 급격한 루블 가치 상승을 겪고 있다고 재차 밝혔다. 5월 4일부터 루블 환율은 달러당 70루블 이하로 하락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2021년 10월 이래 처음으로 70루블 이내를 기록한 최고 가치 상승 수준이다. 5월 말부터 6월 8일 현재까지 61루블 선을 유지 중이나 5월 23일 한때 MOEX(모스크바 거래소) 거래 환율이 달러당 57.7루블까지 하락하면서 2018년 4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한 바 있다. 5월부터 시작되는 루블 가치 상승의 또다른 배경은 국제 에너지 연료(석유, 가스) 가격이 확대되면서 러시아 경상수지가 2021년보다 클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2021년~2022년 6월 1일 러시아 주요 금융지표> 2021 2022.1. 2022.2.10. 2022.3.1. 2022.4.1. 2022.5.2. 2022.6.1. 환율 - 루블 74.79 77.34 75.06 96.80 83.42 70.96 61.32 주가 - 러(MOEX) 3,787.26 3,530.38 3,655.76 2,470.50 2,757.38 2,445.17 2,384.48 - 러(RTSI) - - - - 1,041.53 1,081.52 1,222.70 [자료: MOEX, RTSI 등 웹사이트] <2021년~2022년 6월 1일 주요 원자재 가격(러시아 국내외 가격)> 2021 2022.1. 2022.2.22. 2022.3.3. 2022.4.1. 2022.5.3. 2022.6.1. 원유(브렌트) 77.78 91.21 97.34 118.28 103.82 107.19 116.72 천연가스(mmbtu) 3.73 4.87 4.73 4.93 5.64 7.64 8.27 알루미늄(톤) 2,818.45 3,028.65 3,280.60 3,530.07 3,490.85 3,048.9 2,787.0 밀(톤)* 278.50 266.00 293.98 376.64 368.47 382.88 293.42 옥수수(부셸) 5.93 6.26 6.65 7.60 7.46 8.14 7.53 석탄(톤)*수출가 - - 186.0 435.00 273.00 326.30 339.00 나프타(톤)*수출가 - - 850.80 1,041 996.03 903.91 888.39 [자료: MOEX, IEA 등 웹사이트, RBC 등 언론] <2022년 1월 말~4월 19일 달러당 루블 환율/브렌트 유가/MOEX주가지수 변동> [자료: Tradingview.com] 2022년 5월 12일 러시아 중앙은행은 2024년까지 중기 경제 전망을 내놓았다. 요약하면 2023년 중반까지를 러시아 국제 제재 적응기로 두고, 현지화 및 수입 대체화 정책 확대를 통해 경제 불확실성을 감소하겠다는 계획이다. 러시아 수출은 유럽의 대러시아 제재 강화(현재까지 6차 제재 선언)로 에너지 연료를 유럽이 아닌 아시아 지역으로 방향전환(Reorient) 하면서 할인 가격(우랄유 배럴당 55달러)을 반영한 전망치가 발표됐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2022년 수출 성장률이 90년대 이후로 최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2021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 동안 국제 에너지 연료 가격 급등으로, 올해 경상수지는 1450억 달러 흑자로 전망되고 있다. 2022년 2분기 러시아의 에너지 연료 수출 수익은 전분기 대비 다소 감소 예정이라고 한다. 1분기 러시아의 원유 수출 수익은 전년동기대비 29%, 가스 수출 수익은 88%까지 상승했다. SberCIB(연구소)에 따르면, 1분기 수익의 대부분은 가즈프롬사 수익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외 타트네프트, 로즈네프트, 루코일 등을 포함하면 약 430억 달러 수익을 기록했다고 한다. 러시아는 올해 2월부터 경제 지표, 산업, 교역 등의 공식 통계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러시아의 상반기 교역 실적 예상과 하반기 전망치를 추정하기는 다소 힘든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 통계 상(한국 무역협회)으로 보면, 올해 상반기 한-러 교역은 전년동기대비 2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하반기는 약 30%일 것으로 전망된다. 대 러시아 한국 수출은 상반기 기준 약 40%까지 하락, 하반기는 70%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품목군으로는 합성수지, 특수차량 및 중장비, 철구조물 등이 상반기 동안 수출증가세를 보일 예정이나 하반기는 러시아 경제 불확실성으로 전망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최근 대러시아 수출 상위 10대 품목> (단위: US$ 백만, %) 2021년 2022년 1분기 품목명 금액 증감률 품목명 금액 증감률 승용차 2,549 71.7 승용차 365 -36.3 자동차부품 1,509 37.5 철구조물 286 2,550 철구조물 487 2,188.3 자동차부품 282 -18.4 합성수지 476 88.6 합성수지 104 13.1 건설중장비 425 99.9 건설중장비 102 9.3 화장품 290 19.2 선박 72 131.303 아연도강판 211 40.2 화장품 65 -11.6 기타 플라스틱 제품 175 20.9 아연도강판 40 -22.2 선박 139 18.7 기타 플라스틱제품 36 -14.2 의자 119 25.1 운반하역기계 33 93.3 총수출 9,983 44.7 2,107 -0.8 [자료: KITA(MTI 4자리)] <최근 대러시아 수입 상위 10대 품목> (단위: US$ 백만, %) 2021년 2022년 1분기 품목명 금액 증감률 품목명 금액 증감률 나프타 4,383 72.8 나프타 1,295 53.3 원유 4,270 79.1 원유 1,241 65.5 유연탄 2,202 30.9 유연탄 921 166.8 천연가스 1,715 120.8 천연가스 676 211.0 백금 593 80.7 알루미늄괴 및 스크랩 135 107.0 게 453 14.2 게 128 18.5 무연탄 363 26.9 무연탄 111 110.7 알루미늄괴 및 스크랩 299 54.1 명태 84 105.6 고철 267 57.1 고철 63 55.1 우라늄 252 12.2 기타 정밀화학원료 59 409.8 총수입 17,352 63.2 5,323 77.0 [자료: KITA(MTI 4자리 기준)] 2022년 5월 한 달 기준 러시아의 PMI(구매관리지수)는 올해 처음으로 50% 이상(지수 50 이상이면 상승세이고 이하이면 하락세)을 기록했다고 S&P Global이 발표했다. S&P Global은 5월 기준 러시아의 산업 생산, 신규 주문, 고용지수, 구매력 등은 여전히 하락세이나 하계 휴가철로 인한 계절적 요인으로 일시적으로 상승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5월 30일 러시아 재무부는 러시아 경기부양책으로 8조 루블(약 1230억 달러)의 예산 투입을 준비 중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경기 부양 예산은 에너지 연료 수출 수익으로 인한 세수로 최대 1조 루블을 확보 가능하다는 것이 러시아 재무부의 의견이다. 이 세수는 사회복지로 지출 예정이기 때문에 하반기의 러시아 경기 후퇴가 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하반기부터 에너지 연료를 유럽에서 아시아로 수출 전환되면서 가격 할인이 대폭 이루어지는 데다 일일 원유 생산량을 소폭으로 감축할 예정이기 때문에 러시아 정부의 세수 확보가 예정대로 이루어질지는 예측이 힘든 상황이다. 참고로, 유럽의 6차 대러시아 제재 일환인 러시아 원유 금수조치(독일과 폴란드는 단계적으로 수행, 올해 내 92% 금수 계획)로 러시아의 연간 에너지 연료 수출액의 1/3(천억 달러 이상)이 감소할 것이라고 유럽은 전망했다. 자료원: 현지언론(www.kommersant.ru, www.vedomosti.ru, https://reader.rbc.ru, lenta.ru 등), 러시아 관세 통계자료(www.globusfea.com , www.trade.gov), 러시아 연방 천연자원부( www.mnr.gov.ru), IHS Markit(https://connect.ihsmarkit.com/),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무역관 자료 수집 및 편집 등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모스크바무역관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06.13
-

- 터키에만 있는 생소한 자원활용지원기금(KKDF)
- KKDF 정의와 시행 배경 자원활용지원기금(Kaynak Kullanımı Destekleme Fonu, 이하 KKDF)은 1984년에 수출과 투자 진흥을 위해 처음으로 설립되었으며, 법인과 개인 관계없이 대출 상품을 이용하거나 상품 수입 시 대금을 분납할 때 상품 가격의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부과하도록 했다(1988.5.12. Decree No.88/12944호). 영문명으로는 RUSF(Resource Utilization Support Fund)라고 알려진 KKDF는 수입대금의 일시 지불을 장려하기 위해 생겨났다. 터키는 환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이 있어, 분할 납부 시 일시 지불을 할 때보다 외화 구매에 드는 현지화 비용 총액이 커지게 되기 때문이다. 해당 기금은 터키 수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터키 세관에서 수입자에게 징수한다. KKDF 과세 고지를 받으면 고지를 받은 그 다음 달의 15일 저녁까지 납부해야 한다. *법령에는 저녁이라고 되어있을 뿐, 특정 시간은 명시하지 않음 KKDF 징수 조건 상품 수입 시 KKDF가 발생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수입 대금 결제일과 방법이다. 현지 관세법인 Unsped에 따르면, KKDF는 수입 신고일 기준으로 그 이후에 결제 조건이 인수신용장(acceptance credit), 연지급신용장(deferred payment of letter of credit), 상품인도결제방식(Cash against delivery)으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발생한다. 반면, 상품 수입 시 수입 신고일 이전에 수입 대금을 선지급하면 KKDF가 발생하지 않는다. 불가피하게 수입 신고일 이전에 선지급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현금이나 LC 거래를 통해 일시 지불을 해야 한다. 한편, 터키 관세청 시행령 제2011/16호에 따르면 free zone에서 터키 역내로 수입되는 상품 역시 KKDF과세 대상이다. 이러한 경우, KKDF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출국의 판매자와 터키 보세구역에 물건을 보관하고 있던 소유자에게 대금을 수입 신고일 이전에 지불하여 수입 시 잔금이 없도록 해야 한다. KKDF의 수출자와 수입자에 대한 영향 KKDF는 당초 외화자금을 활용하는 터키 거주자에 부담시키는 세금이었으나, 실제적으로 해외 수출업체에 동일한 수준의 원가가 전가되는 효과가 있다. 수입가격(통상적으로 FOB 또는 CIF)을 기준으로 6%가 계산되어 세금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터키 수입업체들은 KKDF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현금거래를 이용했고, 현금 유동성이 좋지 않은 경우 대출을 통해 현금을 확보했다. 그러나 이자 부담이 커서 대출을 통한 현금 확보에도 한계가 있어 터키 업체들 사이에는 6%의 KKDF를 수출자에게 전가하는 것이 관행으로 자리잡았다. 한편, 수입거래세에 대한 부담으로 터키 바이어들이 구매단가 협상 시 과도하게 낮은 가격을 요구해 계약 자체가 성사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KKDF 예외 적용 이러한 KKDF가 일부 상황에서는 면제가 되기도 하는데 대표적으로 세 가지 경우가 있다. 첫째로 투자 인센티브 증명서에 따른 투자 관련 기계, 제품 수입 시 면제가 가능하다. 투자 인센티브 증명서를 얻기 위해서는 터키 진출 전에 터키 투자청에 문의하여 투자 프로젝트 계획서를 제출하고 생산하려는 제품이 투자 인센티브 지원 대상인지 확인해야 한다. 투자청 및 터키 산업부의 검토 후, 투자 인센티브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터키 무역부 인가 하에 투자 지원 품목 생산을 위해 수입하는 것을 인정 받아 KKDF를 면제받을 수 있다. 둘째, 가공무역 허가를 받은 제품 수입 시에도 KKDF 면제가 가능하다. 이 또한, 사전에 터키 무역부에서 가공무역 허가를 받아 가공무역 증명서(Dahilde İşleme Belgesi)를 발급받아야 한다. 셋째, 터키 정부에서 ’14년에 관보를 통해 발표한 KKDF 0% 적용 품목 리스트에 포함될 경우 면제된다. 해당 제품들은 중간재가 주를 이룬다(관보 제29322호 각료회의 결정 제2015/7511호 첨부 목록, 2015.4.10.). <수입 시 KKDF 0% 적용 품목> HS Code 품목명 12 채유(採油)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각종 종자와 과실, 공업용∙의약용 식물, 짚과 사료용 식물(1202.41.00.00.00, 1202.42.00.00.00, 1206.00.91.00.11, 1206.00.99.00.11, 1213.00.00.00, 12.14 제외) 13 락(lac), 검·수지·그 밖의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15 동물성·식물성·미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한 식용 지방과 동물성·식물성 왁스 18 코코아와 그 조제품 1901.90 기타(1901.90.91.00.00, 1901.90.00 제외) 21.02 효모(활성이거나 불활성인 것), 그 밖의 단세포 미생물(죽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3002호의 백신은 제외한다)과 조제한 베이킹 파우더 23 식품 공업에서 생기는 잔재물과 웨이스트(waste), 조제 사료(23.09 제외) 24.01 잎담배와 담배 부산물 26 광(鑛)∙슬래그(slag) ∙회(灰) 27 광물성 연료∙광물유(鑛物油)와 이들의 증류물, 역청(瀝靑)물질, 광물성 왁스 28 무기화학품, 귀금속∙희토류(稀土類)금속∙방사성원소∙동위원소의 유기화합물이나 무기화합물 29 유기화학품 30.01 장기(臟器) 요법용 선(線)과 그 밖의 기관(건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가루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선(線)과 그 밖의 기관이나 이들의 분비물의 추출물로서 장기(臟器) 요법용의 것, 헤파린과 그 염, 치료용∙예방용으로 조제한 그 밖의 인체물질이나 동물의 물질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 30.02 사람의 피, 치료용·예방용·진단용으로 조제한 동물의 피, 면역혈청·그 밖의 혈액 분획물과 면역물품(생물공학적 방법에 따라 변성되거나 얻어진 것인지에 상관없다), 백신·독소·미생물 배양체(효모는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 세포 배양체(변성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31 비료 32 유연용·염색용 추출물(extract), 탄닌과 이들의 유도체, 염료·안료와 그 밖의 착색제, 페인트·바니시, 퍼티와 그 밖의 매스틱(mastic), 잉크(3210.00.10, 3212.90.00, 3213.10.00, 3213.90.00 제외) 33.01 정유[콘크리트와 앱설루트를 포함하며, 테르펜을 제거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레지노이드, 추출한 올레오레진, 정유의 농축물[냉침법이나 온침법에 따라 얻은 것으로서 유지·불휘발성유·왁스나 이와 유사한 물질을 매질로 한 것으로 한정한다], 정유에서 테르펜을 제거할 때 생기는 테르펜계 부산물, 정유의 애큐어스 디스틸레이트와 애큐어스 솔루션 33.02 방향성물질의 혼합물과 방향성(芳香性) 물질의 하나 이상을 기본 재료로 한 혼합물(알코올의 용액을 포함하며, 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방향성(芳香性) 물질을 기본 재료로 한 그 밖의 조제품(음료제조용으로 한정한다) 34.03 조제 윤활유[윤활제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 절삭제·볼트나 너트 방출제·방청제·부식방지제·이형(mould release) 조제품을 포함한다], 방직용 재료·가죽·모피나 그 밖의 재료의 오일링처리나 가지처리에 사용하는 조제품[석유나 역청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은 제외한다] 35 단백질계 물질, 변성전분, 글루(glue), 효소(3506.10.00 제외) 3701.10.00 엑스선용 필름 3702.10.00 엑스선용 필름(롤 형태) 3707.90.90 기타 38 각종 화학공업 생산품(38.08, 38.20, 3824.90.58 제외) 39 플라스틱과 그 제품(39.18, 39.22, 3923.10, 3923.21, 3923.29, 3923.30, 3923.50, 3923.90, 39.24, 3925.30.00, 3926.10.00, 3926.20.00, 3926.40.00, 3926.90.50, 3926.90.92, 3926.90.97 제외) 40 고무와 그 제품(4011.10, 4011.40, 4011.50, 4012.11, 4012.20, 4012.90, 4013, 4014, 4015, 4016.10, 4016.91, 4016.92, 4016.95 제외) 41 원피(모피는 제외한다)와 가죽 43 모피ㆍ인조모피와 이들의 제품(43.03, 43.04 제외) 44 목재와 그 제품, 목탄(44.02, 4414.00, 44.15, 4417.00.00.00.00, 4418.90.80.90.11, 4418.90.80.90.12, 4419.00, 44.20, 44.21 제외) 47 목재나 그 밖의 섬유질 셀룰로오스재료의 펄프, 회수한 종이·판지[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48 종이와 판지, 제지용 펄프·종이·판지의 제품(4814, 4817, 4818.10, 4818.20, 4818.30, 4818.50, 4818.90.90, 4819.30, 4819.40, 4819.50, 4819.60, 4820, 4821, 4823.61, 4823.69, 4823.70.90, 4823.90.85 제외) 49 인쇄서적·신문·회화·그 밖의 인쇄물, 수제(手製)문서·타자문서·도면 50 견 51 양모ㆍ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나 거친 털·말의 털로 만든 실과 직물(51.09 제외) 52 면(5204.20.00, 52.07 제외) 53 그 밖의 식물성 방직용 섬유, 종이실(paper yarn)과 종이실로 만든 직물 54 인조필라멘트, 인조방직용 섬유재료의 스트립(strip)과 이와 유사한 것(54.06 제외) 55 인조스테이플섬유(55.11 제외) 56 워딩(wadding)·펠트(felt)·부직포, 특수사, 끈·배의 밧줄(cordage)·로프·케이블과 이들의 제품 58 특수직물, 터프트(tuft)한 직물, 레이스, 태피스트리(tapestry), 트리밍(trimming), 자수천(58.05 제외) 59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 공업용인 방직용 섬유제품(59.04 제외) 60 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 64.06 신발류 부분품[갑피(甲皮)(바깥 바닥을 제외한 바닥에 부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포함한다], 갈아 끼울 수 있는 안창과 힐쿠션(heel cushion)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 각반ㆍ레깅스나 이와 유사한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6406.90.50 제외) 68.13 마찰 재료와 그 제품[예: 시트(sheet)ㆍ롤ㆍ스트립(strip)ㆍ세그먼트ㆍ디스크(disc)ㆍ와셔(washer)ㆍ패드](장착되지 않은 것으로서 브레이크용ㆍ클러치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의 석면ㆍ그 밖의 광물성 재료ㆍ셀룰로오스를 기본 재료로 한 것으로 한정하며, 직물이나 그 밖의 재료와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69.02 내화벽돌·내화블록·내화타일과 이와 유사한 건설용 내화 도자제품(규조토나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으로 만든 제품은 제외한다) 70 유리와 유리제품(70.13, 70.16, 70.18 제외) 72 철강 73 철강의 제품(73.15, 73.19, 73.21, 73.23, 73.24, 73.26 제외) 74 구리와 그 제품(74.18, 74.19 제외) 75 니켈과 그 제품 76 알루미늄과 그 제품 78 납과 그 제품 79 아연과 그 제품 80 주석과 그 제품 81 그 밖의 비금속(卑金屬), 서멧(cermet), 이들의 제품 84 원자로·보일러·기계류와 이들의 부분품(84.15, 8418.10, 8418.21, 8418.29, 8418.30, 8418.40, 8418.50, 8418.91, 8418.99, 8419.11, 8419.19, 8421.11, 8421.12, 8422.11, 8423.10, 8433.11, 8433.19, 8450.11, 8450.12, 8450.19, 8450.20, 8451.21, 8452.10, 84.70, 84.71, 84.72, 84.73, 84.76 제외) 85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음성 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과 음성의 기록기·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부속품(85.04, 8506.10, 8506.30, 8506.40, 8506.50, 8506.60, 8506.80, 8507.10, 8507.20, 8508.11, 8508.19, 8508.60, 8509.40, 8509.80, 8510.10, 8510.20, 8510.30, 8513.10, 8515.31, 8515.39, 8516.10, 8516.21, 8516.29, 8516.31, 8516.32, 8516.33, 8516.40, 8516.50, 8516.60, 8516.71, 8516.72, 8516.79, 8516.80, 85.17, 85.18, 85.19, 85.21, 85.22, 85.23, 85.27, 85.28, 85.31, 8539.10, 8539.21, 8539.22, 8539.29, 8539.31, 8539.32, 8539.39, 8539.41, 8539.49, 8543.10, 8543.20, 8543.30, 8543.70, 85.44, 85.46, 85.47, 85.48 제외) 86 철도용이나 궤도용 기관차ㆍ차량과 이들의 부분품, 철도용이나 궤도용 장비품과 그 부분품, 기계식(전기기계식을 포함한다) 각종 교통신호용 기기(86.09 제외) 8704.10 덤프차(비고속도로용으로 설계된 것으로 한정한다) 87.05 특수용도차량(주로 사람이나 화물 수송용으로 설계된 것은 제외한다)[예: 구난차(breakdown lorry)·기중기차(crane lorry)·소방차·콘크리트믹서 운반차·도로청소차·살포차·이동공작차·이동방사선차](8705.40, 8705.90.30 제외) 87.06 엔진을 갖춘 섀시(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 87.08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8708.30, 8708.70, 8708.80, 8708.91, 8708.92, 8708.93, 8708.99 제외) 87.09 공장·창고·부두·공항에서 화물의 단거리 운반에 사용하는 형으로 권양(捲揚)용이나 취급용 장비가 결합되지 않은 자주식(自走式) 작업차, 철도역의 플랫폼에서 사용하는 형의 트랙터, 이들의 부분품 87.14 부분품과 부속품(제8711호부터 제8713호까지의 차량의 것으로 한정한다) 88 항공기와 우주선, 이들의 부분품 89 선박과 수상 구조물(89/03, 8907.10 제외) 90 광학기기·사진용 기기·영화용 기기·측정기기·검사기기·정밀기기·의료용 기기,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93.05 부분품과 부속품(제9301호부터 제9304호까지의 것으로 한정한다) [자료: 터키 관보] 시사점 KKDF는 전 세계에서 터키만 적용 중이기 때문에 터키와 처음 거래하는 기업의 경우 수입업체가 일반적이지 않은 명칭의 세금을 언급하며 구매 비용의 6%를 지원해줄 것을 요구하면 당황하기 마련이다. 앞서 언급한 대로 KKDF는 수입업체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미 오랜 시간 동안 현지 업체들 사이에서 KKDF를 수출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관행처럼 자리 잡았고, 영업 규모가 영세한 기업의 경우 수입액의 6%를 추가로 지불할 경우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KKDF 발생을 막기 위해 바이어에게 수입대금을 수출 신고 전에 선지급하거나, 수출 신고 이후 현금 결제를 요청하면 되겠지만 이 또한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첫 거래로 아직 양사 간에 신뢰 관계가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터키 바이어들이 대금 전체를 선납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두 번째 방법으로 현금 1회 완납을 요청할 수 있다고 우리 기업들은 생각할 수 있지만, 대량의 외화를 즉시 마련해 완납하는 것 역시 수입 업체에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 KKDF는 추후 환급도 되지 않기 때문에 터키 기업에 부담스러운 비용이고, 수출하는 한국 기업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우리 기업이 직접적으로 KKDF 발생을 막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다만, 현실적인 방법으로는 터키 수입자가 KKDF 부담을 요청 시 조율을 통해 KKDF를 양사가 분배해 함께 부담하는 것을 제시하거나 구매 단가를 조금 낮추어 수입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현재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자료: 터키 관보, 제4458호 관세법, 터키 세관법 시행령 제2011/16호, 제88/12944호 장관령, 제2015/7511호 장관령, 터키 국세청, Unsped, GumrukTV, aslangumruk, altunbasak, KOTRA 이스탄불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이스탄불무역관 김우현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06.13
-

- 이스라엘의 2022년 상반기 경제 동향 분석 및 하반기 경제 전망
- 글로벌 경기 불안에도 불구하고 2022년 이스라엘 경제는 5%대 경제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비스업 수출은 2021년만큼 성장하진 않겠지만 2022년에도 여전히 이스라엘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스라엘의 2022년 상반기 경제 동향 2022년 1분기 이스라엘 경제는 전분기 대비 1.6% 하락, 전년 동기 대비 9% 성장했다. 전분기 기저효과 탓에 전기대비 성장률은 하락을 기록했지만, 전반적 성장 추세는 지속됐다. 1분기 개인소비는 전기대비 0.7% 소폭 하락했는데, 내구재 소비는 감소한 반면 여행·외식·스포츠레저 등의 서비스 지출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생산도 1.6% 소폭 감소했지만 기업경기가 위축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이스라엘 통계청이 2022년 4월 실시한 사업동향 설문에 따르면, 대부분 업종은 경기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건설업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재점화한 글로벌 공급 불안으로 건설자재와 설비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중국의 봉쇄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대외교역은 양호한 실적을 기록했다. 전분기 이스라엘의 성장을 견인했던 서비스 수출이 6.1% 하락했지만 수입은 16.2% 성장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스라엘 수출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스라엘 중앙은행은 우크라이나, 러시아와의 교역량 합계가 이스라엘 전체 대외교역의 1%로 규모가 매우 작고, 국제정세 불안이 오히려 이스라엘의 국방물자 수출을 성장시킬 것으로 분석했다. <최근 4분기 이스라엘의 주요 경제 지표> (단위: %) 구분 2021년 2022년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경제성장률 16.6 6.5 15.6 -1.6 산업생산 19.0 6.5 15.6 -1.6 개인소비 34.3 4.5 18.2 -0.7 개인소비(내구재 제외) 22.4 9.6 19.5 4.4 공공지출(국방수입 제외) 4.5 3.6 10.9 -7.5 고정자산형성(항공선박 제외) 12.1 9.9 15.4 2.5 수출(다이아몬드 및 스타트업 수출 제외) 14.9 8.0 25.3 -6.1 민간수입(다이아몬드 및 항공선박 수입 제외) 18.4 7.2 27.8 16.2 [출처: 이스라엘 중앙은행, 2022년 6월 9일 검색] 고용 시장은 코로나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2022년 4월 기준 만 15세 이상 인구의 고용률은 60.6%를 기록했는데, 이는 2019년 연평균 고용률 61.1%와 근접한 수준이다. 여행업과 스포츠레저업 등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았던 산업들도 채용을 재개하기 시작해 전체 취업자 대비 빈일자리 수 비율이 5%까지 상승했다. 소비자 물가는 2022년 4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4% 상승하며 이스라엘 중앙은행의 목표범위(1~3%)를 상회했다. 우크라이나 사태, 중국의 봉쇄 등이 불러온 글로벌 공급망 불안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과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 탓이다. 이스라엘 중앙은행은 물가 상승 추세를 진정시키기 위해 2022년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금리를 인상해 0.1%에서 0.75%로 인상했다. 이스라엘의 물가 상승률이 목표 범위를 벗어나긴 했지만 OECD 평균 물가 상승률(5.5%)보다는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 중앙은행 총재는 이스라엘이 적정 수준의 통화량을 유지했고, 이미 물가 수준이 높아 생산자와 유통업자가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스라엘의 에너지 자급률(40%, OECD)이 높아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 충격을 비교적 적게 받은 영향도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2022년 4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OECD 국가들의 평균 에너지 가격 상승률은 33.7%인데 비해 이스라엘은 12.7%에서 진정됐다. 이스라엘의 2022년 경제 전망 이스라엘 중앙은행은 2022년 이스라엘 경제성장률을 5.5%, 2023년 성장률을 4.0%로 예측했다. IMF와 OECD는 2022년 이스라엘 경제성장률을 각각 5%, 4.8%로 중앙은행보다 조금 더 낮게 예측했다. 이스라엘 중앙은행은 글로벌 경기 불안으로 국내 산업투자 심리는 위축될 수 있으나 첨단기술산업 부문의 투자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전쟁, 코로나 재유행과 같이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들이 언제 해소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주요 수출 대상국인 북미와 유럽 국가들도 긴축 정책을 펼치고 있어, 천연가스를 제외한 상품 수출 수요는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소프트웨어와 전문과학기술 서비스 수출은 수요가 지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관광 서비스 수출도 상당 수준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스라엘 중앙은행은 글로벌 물가상승 압력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통화량 증가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물가 안정화를 비교적 빠르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통화량이 지난 2년 사이(2020~2022년) 63% 증가한데 반해 OECD 국가들은 평균 241% 증가했고, 같은 기간 이스라엘의 물가상승률은 4%, OECD 국가 평균 물가상승률은 7.5%로 나타났다. 이스라엘 중앙은행은 기준금리 1.5%를 목표로 2022년 4월부터 1년 동안 점진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계획이며, 2023년 상반기 중으로 물가 상승률 3% 이하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스라엘 중앙은행의 2022년 4월 발표 경제 전망> (단위: %)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경제성장률 8.2 5.5 4.0 개인소비 11.7 8.0 5.0 고정자본형성(선박항공 제외) 11.4 5.0 4.0 공공지출(국방수입 제외) 3.3 4.0 3.0 수출(다이아몬드 및 스타트업 수출 제외) 10.8 3.0 3.0 민간 수입(다이아몬드 및 선박항공 제외) 18.4 7.0 4.5 고용률 57 60.7 61 실업률 4.6 3.5 3.4 물가상승률 2.5 3.6 2.0 [자료: 이스라엘 중앙은행, 2022년 6월 9일 검색] 위험요소 분석 및 우리 기업의 기회 요인 불안정한 내·외부적 환경 탓에 경제적 위험 요인도 상존한다. 이스라엘 정부는 정치적 문제로 아직 2022~2023년 예산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이다. 이스라엘의 정부 재정 불확실성은 매해 거듭된 문제이며, 이는 외국 투자 유치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는 사태도 잠재적 위험 요인이다. 직접적으로는 이스라엘로 유입되는 이민자 규모가 커질 것이고, 글로벌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투자 심리도 위축될 수 있다. 이미 삐걱거리고 있는 건설업 생산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이스라엘은 국토개발계획을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지정할 만큼 주택과 인프라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 만약 글로벌 공급 불안이 지속돼 건설업 생산이 감소할 경우 주택 가격 인상 등의 사회 문제로 이어져 이스라엘 정부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다만, 러시아를 제외한 에너지 안보 네트워크 구축에 이스라엘이 더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이는 우리 기업의 수출 성장 기회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스라엘과 유럽을 연결하는 가스관 건설, 지중해 연안 플랜트 건설 등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 수주가 늘어나고 관련 건설자재와 중장비 수출 확대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출처: 이스라엘 중앙은행, 이스라엘 통계청, IMF, OECD, EIU, KOTRA 텔아비브 무역관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텔아비브무역관 황현규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06.13
-
- 인도네시아 경제를 관통하는 새로운 키워드, 할랄
- ‘할랄’은 ‘허용된 것’이라는 뜻의 아랍어로 이슬람 율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제조·가공·유통 등이 이루어졌는지를 의미하며, 식품·화장품 등 재화뿐만 아니라 금융·서비스 등에도 적용이 될 수 있다. 경제성장률이 높은 국가가 다수 포함돼 소비 잠재력이 크고, 이슬람 국가들의 높은 출산율을 바탕으로 잠재 소비층이 빠르게 확대되는 할랄 시장에서 인도네시아가 가지는 중요성을 알아보고, 인도네시아에서 주목해야 되는 할랄 산업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보면서 인도네시아 시장진출을 위한 새로운 키워드로 할랄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전 세계 할랄시장에서 점차 커지는 인도네시아의 중요성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할랄시장 규모를 가진 나라로 2021년 기준 2억2960만 명의 무슬림 인구를 기반으로 연간 1840억 달러 규모의 할랄 상품과 서비스를 소비한다. 특히 세계 57개국 이슬람국가들이 결성한 국제기구인 이슬람협력기구(OIC)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내수 할랄시장 규모가 2025년까지 연평균 14.96%씩 성장할 것이라 전망되기에 할랄 제품에 대한 수요가 점차 늘어날 것이다. 나아가 인도네시아의 경우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 소비재 전반뿐만 아니라 제조공장, 설비, 금융 등에도 할랄 인증을 하며 경제활동 전반에 대해 할랄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할랄 제품에 대한 세계 무역에서도 인도네시아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2022년 발표된 Global Islamic Economy Report 2022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2020년 연간 211억 달러의 할랄제품을 수입했고, 연간 85억 달러 규모의 할랄제품을 수입하며 세계 5대 할랄상품 교역국에 등극했다. 특히, 인도네시아 최고 이슬람위원회(MUI)에서 자국 이슬람 상품수출을 증대하기 위해 할랄 수출상품 제조설비 등에 향후 3년간 51억을 투자할 것이라 발표하며 앞으로 세계 할랄 교역시장에서 인도네시아의 비중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 세계 할랄에 대한 투자부문에서도 인도네시아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이슬람협력기구에서 규모 및 중요성을 가지고 선정한 2020~2021년 주요 글로벌 할랄 관련 M&A, VC, PE 71건 중에서 20건이 인도네시아에서 이뤄지며 전 세계 2위를 기록했다. <이슬람협력기구 선정 할랄분야 주요 글로벌 투자(M&A, VC, PE) 유치 건수> (단위: 건) [자료: 이슬람협력기구] 나아가 인도네시아는 2021년 발표된 글로벌 이슬람 경제지표(GEI)에서 식음료, 패션부문에서 놀라운 성장세를 보이며 터키를 제치고 종합순위 4위에 등극했다. 또한, 이슬람 국가들 뿐만 아니라 미국, 독일, 영국 등 전 세계 45개 국제 할랄 인증기관들과 협력해 일부 품목에 대한 할랄 교차인증제를 시행하며 세계 할랄시장에서 영향력을 키워 나가고 있다. 인도네시아 주요 할랄 산업분야 2020년 인도네시아 최고 권위 이슬람단체 MUI(Indonesia Ulama Concuil)에서는 인도네시아 할랄경제에 대해 7대 중점 육성산업을 선정하고, 정부에서 해당 분야에 대한 집중육성 및 적극적인 투자를 건의했고 정부에서 이를 수용했다. 정부에서는 이를 위해 2024년 10월부터 식품분야를 시작으로 인도네시아에서 판매되는 모든 재화에 대해 할랄 인증여부를 의무화, 할랄 산업단지 조성 및 보조금 지급 등 여러 금전 및 비금전적 지원을 통해 국가 할랄경제 육성에 앞장서고 있다. <인도네시아 7대 할랄 산업분야 > 연번 산업 시장규모(10억 달러) ‘20~’25년 평균성장률(%) 1 식품 135 14.64 2 패션 15.6 3.34 3 의약 5.13 5.83 4 화장품 4.19 12.62 5 미디어 20.73 8.95 6 관광 3.37 18.96 7 금융 119.5 8.3 [자료: Indoneisa Halal Market Report 2021/2022] 7대 할랄 산업분야에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것은 식품분야이다. 식품의 경우 직접 섭취해 몸에 흡수된다는 점에서 가장 엄격한 할랄 기준 부합을 적용받는 산업분야로 할랄 여부가 무슬림들에게 식재료를 구매하거나 먹을 식당을 선정하는데 핵심적인 고려사항으로 작용한다.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분야 중 하나로 할랄 화장품이 떠오르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1인당 소득수준이 2021년 기준 4349달러로 높아짐에 따라 개인 소비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금전적인 여유가 많아지고 SNS를 중심으로 젊은 세대 사이 뷰티, 자기관리, 화장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급속도로 커져가는 화장품 산업에 대한 할랄 경제규모도 커져가고 있기 때문이다. 할랄경제 육성을 위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노력 인도네시아 7대 중점 할랄산업 육성 이외에도, 인도네시아 정부에서는 다양한 노력을 통해 자국 할랄 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2019년 인도네시아 부통령에 Ma’aruf Amin 이슬람 최고기구 MUI의 회장이 임명되며 할랄이 인도네시아 경제에 가지는 중요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다. Amin 부통령을 필두로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9년 ‘인도네시아 샤리아 경제 마스터플랜 2019-2024’를 발표하며, 정부 차원에서의 할랄경제 육성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정책 지원을 공고화했다. 해당 로드맵에는 첫째, 인도네시아 내 할랄 밸류체인 강화, 둘째, 인도네시아 내 샤리아 율법에 따른 금융활동 확대, 셋째, 할랄 제품 생산 및 서비스 제공에 종사하는 중소기업 육성, 넷째, 디지털 경제와 핀테크를 활용한 할랄경제의 대중화 등의 정책목표가 반영돼 있다. 이듬해 2020년에는 정부 주도의 할랄 산업단지 8곳의 건립을 발표하며, 이곳에 입주해 할랄 경제에 기여하는 업체들에는 세제 혜택, 인프라 지원, 법인설립 행정절차 간소화 등의 혜택 제공을 공표했다. 이 중에서 Safe n Lock 할랄 산업단지(동부자바), Mordern Cikande 할랄 산업단지(자카르타), Bintan Inti Hala 허브(빈탄) 등이 부분 완공돼 가동 중에 있다. 주요 산업분야별로 정부의 지원정책을 자세히 살펴보면, 식품산업의 경우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2024년부터 모든 식음료 상품에 대해 할랄 인증 여부를 의무적으로 표기하게 만들어 소비자들의 할랄상품 구매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할랄 인증비용 면제, 제조설비 할랄 전환에 대한 비용 지원 등을 통해 더 많은 인도네시아 기업들이 할랄산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나아가 국제 할랄 식품시장에서의 인도네시아 제품의 경쟁력 강화를 Born to Be 수출특화 할랄 식음료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R&D 예산을 증액하고, 수출 할랄식품 제조공장들이 높은 국제 위생기준에 부합될 수 있도록 GHP, GMP, HACCP 등 국제인증 획득을 위한 비용지원 및 전문가 코칭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인도네시아 할랄산업 중에서 두번째로 규모가 큰 금융분야의 경우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에서 발표한 필두로 ‘이슬람 경제 및 금융 발전계획’을 토대로 인도네시아 할랄 벨류체인(HVC) 육성을 위한 공적자금 투입, 샤리아 율법에 따른 금융활동을 위한 법과 제도 정비, 할랄산업 투자 확산을 위한 규제 해소 및 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하며 이슬람 금융시장의 선두주자로 도약하기 위한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2021년 인도네시아 정부에서는 국가에서 제일 큰 규모의 샤리아 국영은행 3곳(BNI, Mandiri, BRI)을 병합해 자산규모 152억 달러 규모의 PT. Bank Syriah Indonesia Tbk를 설립했고, 이는 전 세계 샤리아 은행 중에서 10위 안에 드는 큰 규모로, 할랄경제 성장을 위한 정책자금 및 금융정책의 구심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처럼 할랄은 인도네시아 시장진출에 있어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다. 우리 기업들이 더 이상 할랄을 수출길 앞에 놓인 허들이 아니라 1840억 달러 인도네시아 할랄시장으로 통하는 새로운 창으로 바라보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해 나가길 기대한다. 자료: Global Islamic Economy Report, 인도네시아 MUI, Bank of Indonesia, Indoneisa Halal Market Report, 이슬람협력기구 OIC, KOTRA 수라바야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수라바야무역관 고창현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06.09
-
- 2022년 미국 알래스카주 경제 및 무역 동향
- 알래스카주는 아시아와 북미 사이의 중간 기착 지점으로 많은 화물기들이 경유하는 곳으로 알려져있으며 금, 철광석, 석탄, 석유 등의 천연 자원이 풍부하고 군사기지가 위치해 미국의 전략적∙지정학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곳이다. 알래스카 주는 미국 본토 48개 주와 지리적으로는 떨어져있지만 하와이 주와 함께 정치적으로는 미국 본토에 속한다. 이하에서 알래스카 주의 비즈니스 환경, 경제 동향, 무역 현황 및 산업 여건에 대해 상세히 알아본다. 알래스카 주정부 개황 및 비즈니스 환경 <알래스카 주정부 개황> 주명 알래스카주(State of Alaska) 위치 미주대륙 서북부 (위도 51°20′~71°50′/경도 130°~172°) 면적 1,717,856㎢ (미국에서 가장 큰 주) 기후 남부 및 남동부: 중위도 해양성 기후 북부: 아북극 해양성 기후 주도 (State Capital) 주노(Juneau) 가장 큰 도시 앵커리지(Anchorage) 인구 732,673명 주요 인사 주지사: Mike Dunleavy 부지사: Kevin Meyer 연방 상원의원: Lisa Murkowski(공화당), Dan Sullivan(공화당) 연방 하원의원: Don Young (2022.3.18. 별세) 인종구성 백인(65.3%), 아메리칸 인디언 및 알래스카 원주민(15.6%), 히스패닉 또는 라틴계(7.3%), 아시아인(6.5%), 흑인 또는 아프리카계 미국인(3.7%), 하와이 원주민 및 기타 태평양 섬 주민 단독(1.4%) [자료: U.S. Census Bureau, KOTRA 실리콘밸리 무역관] 미국 인구조사국(US Census Bureau)에 의하면 알래스카주의 총 기업 수는 68,032개, 총 고용수는 266,063명으로 이 지역 비즈니스는 주로 석유생산, 어업, 연방 및 주정부(민간 및 군사) 지출, 연구 및 개발, 관광업을 기반으로 한다. 이 중에서도 알래스카주의 어업은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 중 하나로 다양한 종류의 연어를 포함해 알래스카 수산물의 대부분은 해외로 수출되고 있다. 알래스카주 경제 현황 및 ‘22년 전망 미국 경제분석국에 의하면 알래스카주의 2021년 GDP는 549억7,010만 달러로 미국 전체 GDP의 0.23%를 차지하고 세계 은행 및 미국 인구조사국의 데이터에 의하면 미국의 1인당 GDP는 63,206.5 달러이지만, 알래스카 주의 1인당 GDP는 75,026.7달러에 이른다. 한편 알래스카주의 실업률은 팬데믹 이후 미국 전체 실업률이 감소하는 추세에 맞춰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미국 전체 실업률에 비해 높은 편이다. <알래스카주 실업률 동향(계절 조정 값)> [자료: 알래스카주 노동 및 고용개발부] 알래스카주에서 채광·채석·석유 및 가스추출산업은 알래스카주 전체 경제 규모의 11.86%의 비중을 차지하는 주요 산업이다. 이어서 정부·정부사업(9.72%), 금융·보험·부동산·임대 및 리스 산업(5.46%), 운송·창고 산업(5.19%), 교육서비스·의료·사회지원 산업(3.93%), 전문서비스 산업(2.81%), 소매업(2.23%), 건설업(1.84%), 제조업(1.44%), 정보업(1.28%), 도매·무역업(1.22%), 문화서비스 산업(0.97%), 전력 등 공익사업(0.78%), 농업·임업·어업 및 수렵업(0.37%) 등이 알래스카 주의 경제 규모를 구성하고 있다. <알래스카주 경제 현황> 미국 알래스카주 GDP 22조 9,961억 달러 549억 7,010만 달러 1인당 GDP 63,206.5달러 75,026.7달러 실업률 3.6% 4.9% 산업구조 금융·부동산(21.2%), 전문서비스(12.9%), 정부·정부사업(12.1%), 제조업(11.1%), 교육/의료(8.4%), 도매업(6.0%), 소매업(6.0%), 정보업(5.7%), 건설업(4.2%), 문화서비스(3.7%), 교통·운송·창고 서비스(2.8%), 전력 등 공익사업(1.7%), 광업(1.2%), 농업(1.1%), 기타(1.9%) 채광·채석·석유 및 가스추출(11.86%), 정부·정부사업(9.72%), 금융·보험·부동산·임대 및 리스(5.46%), 운송·창고(5.19%), 교육서비스·의료·사회지원(3.93%), 전문서비스(2.81%), 소매업(2.23%), 건설업(1.84%), 제조업(1.44%), 정보업(1.28%), 도매·무역업(1.22%), 문화서비스(0.97%), 전력 등 공익사업(0.78%), 농업·임업·어업 및 수렵(0.37%) 물가상승률 소비자물가 상승률: 8.3%(식품 및 에너지 포함) (전년 동기 대비 2022년 4월 기준) 생산자물가 상승률: 11.0%(식품 및 에너지 포함) (전년 동기 대비 2022년 4월 기준) 부채 28조4,290억 달러 외환보유고 2,401억 달러 [자료: U.S. Bureau of Economic Analysis, World Bank,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2022년 6월 기준 최신자료] 알래스카주 고용노동개발부가 2022년 1월에 발간한 ‘Alaska Economic Trends’에 의하면 알래스카주의 2022년 경제는 고용률의 뚜렷한 회복세, 관광 산업 반등, 건설업 지속 발전, 유가 상승 등의 요인으로 코로나19 위기에서 벗어나 새로운 가능성과 변화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지만 한편으로는 공급망 문제 악화로 인한 인플레이션 및 자발적 실업, 알래스카주 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시장 축소 등의 여파로 경제 성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도 함께 전했다. 동 자료를 중심으로 한 알래스카 주 2022년 경제 전망을 아래 표와 같이 정리했다. <알래스카주 ‘22년 경제 전망> 개요 구체적 내용 긍정적 측면 ▲연방 자금 유입, 크루즈 사업 재개 및 인적·물적 항공 운송 증가에 힘입은 관광 산업 반등, ▲연방 인프라 법안 영향으로 건설업 지속 발전, ▲의료 부문 고용 증가, ▲유가 상승으로 인한 정부수입 증가 (연방 자금 지원 확대) 코로나19로 인한 CARES Act 등 연방 자금 지원 확대로 알래스카 주민과 기업에 폭넓은 경제지원 이뤄짐. 다수 자료는 알래스카 주가 총 1조2000억 달러 규모 연방 인프라 법안의 최대 수혜자가 될 것으로 예상(1인당 수혜 기준). 알래스카 주는 연방 인프라 자금으로 향후 5년간 고속도로에 35억 달러, 페리 시스템에 10억 달러, 신규 페리 증설에 7,300만 달러 등 투입 예정으로 건설, 서비스 산업의 진작이 예상 (항공 운송 부문은 경기 회복 견인) 알래스카 주의 항공 운송 부문은 팬데믹 기간 중에도 크게 위축되지 않았으며, ‘22년 억눌린 여행 수요 회복으로 항공 여행객이 증가할 경우 알래스카 주 경기회복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 특히 크루즈 운항이 본격 재개되면 레저, 접객, 관광, 운송, 요식, 호텔 등 연관 산업에 긍정적 영향 예상 (건설 및 관련 서비스 산업 성장) 팬데믹 기간 중 높은 목재 가격과 공급망 문제로 일부 건설 프로젝트에 제동이 걸리기도 했지만 추가 가계 수입 및 주택프로젝트의 보편화로 성장세를 견지. 연방 인프라 법안 효과로 2022년에는 해당 부문의 일자리가 완전히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며, 건설 부문의 성장은 엔지니어링, 회계, 보안과 같은 전문·비즈니스 서비스(PBS) 산업의 성장 견인할 전망 (의료서비스 산업 완전 회복 예상) ‘22년 병원 고용 회복 및 외래 진료 성장을 바탕으로 약 500개의 새로운 일자리 확충이 예상 부정적 측면 ▲주정부의 미해결 장기 예산 문제, ▲공급망 문제 악화로 인한 인플레이션과 자발적 실업 증가, ▲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시장 축소로 임금 상승 촉발, 경제 성장 위축 (주정부 미해결 장기 예산) 세입, 세출, 영구 기금 배당금 등 산적한 예산 문제의 해결 시급. 팬데믹 기간에 단기적 경기 부양을 위해 비축 자금을 사용했으나 장기적으로 경제 건전성 제고를 위해 예산 안정성 견지가 필요. 특히 알래스카 주는 다른 주보다 더 열악한 경제상황 하에서 팬데믹을 맞이해 경기 회복에 오랜 시간 소요될 것으로 전망 (공급망 문제) ‘22년 역시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적 생산, 제조 및 배송 중단이 야기한 공급망 문제와 더불어 항구 병목 현상, 트럭기사 부족 등의 문제가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중요 요인될 것으로 예상 (석유 및 가스 산업 느린 회복) 고유가 호재 및 North Slope 사업 재개, 전 세계적인 석유 수요 전망에도 불구, 석유 및 가스 산업은 ‘22년 가장 느린 일자리 회복세를 보일 전망 (수산물 가공업 제조업 부문 노동시장 축소) 알래스카 주 제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산물 가공업 고용은 팬데믹 이전 수준을 거의 회복하겠지만, 해당 부문 노동 인력의 3/4가 외부 인력 유입으로 이뤄짐에 따라 지역 내 고용 성장 회복에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 정부 기관 고용 전망 ‘22년 전망 ▲주정부 고용: 감소 ▲지방정부 고용: 다소 회복 ▲연방정부 고용: 이전 수준 유지 (주정부) 주정부는 ‘15년 이후 지속적으로 ’작은 정부(Smaller Government)’ 압박과 코로나19로 신설된 일시적 고용이 대거 소멸될 예정으로, 400여개의 일자리 감소가 예상 (지방정부) 지방정부는 팬데믹 초기 관광 위축 및 판매세 수입 감소로 예산 손실이 예상되었으나 연방 지원을 통해 이를 상쇄, 수입 회복이 이뤄짐. 대부분 학교의 비대면 교육으로 인해 발생한 고용 손실이 대면 교육 시행으로 전환되면서 2022년 총 1,100여개의 일자리를 회복할 예정 [자료: 알래스카주 노동 및 고용개발부 2022년 1월 발간 ‘Alaska Economic Trends’, 주앵커리지 대한민국 출장소] 알래스카주 무역 현황 및 산업 여건 (무역 현황) 알래스카주의 2021년 총 수출액은 60억 달러로 2020년의 총 수출액 46억 달러 대비 약 30% 가량 상승했고 2021년 총 수입액은 38억1200만 달러로 2020년 총 수입액 23억7100만 달러 대비 약 60% 가량 상승했으며 무역수지는 21억 8,8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알래스카주의 주요 수출품은 아연 광석, 납 광석, 금 등의 광물·광석, 어육, 알래스카 명태, 어란 등의 수산물 및 기타 해양제품, 석유 및 오일 등 석유 제품 등이고 2021년 주요 10개 수출대상국은 중국, 일본, 한국(3위), 캐나다, 오스트리아, 독일, 네덜란드, 스위스, 대만, 벨기에 순이다. 한편 알래스카주의 주요 수입품은 전자기기부품, 반도체, 전자집적회로 등의 컴퓨터 및 전자제품, 석유 및 석탄 제품, 항공기 등 수송 장치 등으로 2021년 주요 10개 수입대상국은 한국(1위), 캐나다, 베트남, 말레이시아, 러시아, 태국, 중국, 프랑스, 일본, 대만 순이다. <알래스카주 ‘21년 무역 현황> (단위: US$ 백만) 수출 수입 규모 6,000 3,812 주요 품목 광물·광석, 수산물 및 기타 해양제품, 석유 및 가스, 일차 금속 제조품, 수송 장치, 석유 및 석탄 제품(플라스틱류), 임산물 등 컴퓨터 및 전자제품, 석유 및 석탄 제품(플라스틱류), 수송 장치, 기계(전자제품 제외), 광물·광석, 석유 및 가스, 일차 금속 제조품 등 대상국 중국, 일본, 한국(3위), 캐나다, 오스트리아, 독일, 네덜란드, 스위스, 대만, 벨기에 순 한국(1위), 캐나다, 베트남, 말레이시아, 러시아, 태국, 중국, 프랑스, 일본, 대만 순 [자료: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2021년 기준 통계, 2022년 5월 기준 최신자료 통계분류 코드 NAICS(3자리) 사용] (산업 여건) 알래스카주의 주요 산업은 수산업, 임업, 산림 및 목재 제품업, 광물 및 광업, 석유 및 가스, 관광 산업 등으로 알래스카 주정부 상무부 산하 경제개발부에서는 ▲마케팅 및 수출 지원 프로그램, ▲우대 프로그램 및 조달, ▲중소기업 자금 조달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알래스카 제품 특혜 프로그램(Alaska Product Preference: APP)등과 같이 알래스카 주 현지에서 생산 및/또는 제조된 제품에 대해서 주정부 거래 입찰우선권을 확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지정학적 한계로 인해 알래스카주에 진출한 글로벌 기업은 찾기 힘들지만 알래스카에서 가장 큰 규모의 상위 5개 기업은 Bristol Bay Native, Chungach Alaska, Chenega, Afognak Native, Yukon Kuskokwim Health이다. <알래스카주 대기업 Top5> 기업명 직원 수 1 Bristol Bay Native 4,869 2 Chungach Alaska 4,822 3 Chenega 4,500 4 Afognak Native 4,450 5 Yukon Kuskokwim Health 3,365 [자료: Zippia] 한편 미국 내 활동 및 투자 장려를 위해 특별 세관 절차가 사용될 수 있는 대외 무역 구역(자유무역지대)은 총 298곳으로, 이 중 알래스카주에 위치한 곳은 아래의 4곳이다. <알래스카주 대외 무역 구역> zone 명칭 위치 no.18 City of Vadez AK, Valdez no.160 Port of Anchorage AK, Anchorage no.195 Fairbanks Economic Development Corp. AK, Fairbanks no.232 Kodiak Island Borough AK, Kodiak [자료: Internal Trade Administration] 알래스카주와 한국 간 무역 동향 (對한국 수입 동향 및 주요 수입 품목) 2021년 기준 알래스카주 수입시장에서 한국은 제1위의 교역국으로 수입시장 점유율은 40%에 이르고 2021년 대한국 수입액은 15억2,8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대비 82.7% 증가했다.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주요 품목은 석유 및 석탄 제품, 컴퓨터 및 전자제품, 가공 식품 등이다. <對한국 수입 동향> (단위: US$ 백만, %) 2019년 2020년 2021년 한국 수입 순위 수입시장 점유율 (‘21) 수입증가율 (‘20~’21) 미국 77,479 76,057 94,955 7 3.3 24.8 알래스카 682 836 1,528 1 40.0 82.7 [자료: U.S. Census Bureau] <’21년 對한국 주요 수입 품목> (단위: US$ 백만) 순번 품목 금액 1 Petroleum & Coal Products 921 2 Computer & Electronic Products 587 3 Processed Foods 4 4 Paper 4 5 Nonmetallic Mineral Products 4 6 Goods Returned(Exports and Imports) 2 7 Chemicals 2 8 Plastics & Rubber Products 1 9 Textile Mill Products 1 10 Wood Products 1 [자료: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통계분류 코드 NAICS(3자리) 사용] (對한국 수출 동향 및 주요 수출 품목) 2021년 기준 알래스카주 수출시장에서 한국은 제3위의 교역국으로 수출시장 점유율은 13.1%에 이르고 2021년 대한국 수출액은 7억8,6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대비 1.6% 감소했다. 한국으로 수출하는 주요 품목은 광물 및 광석, 수산물 및 기타해양제품, 수송기, 컴퓨터 및 전자제품 등이다. <對한국 수출 동향> (단위: US$ 백만, %) 2019년 2020년 2021년 한국수출 순위 수출시장 점유율 (‘21) 수출증가율 (‘20~’21) 미국 56,504 50,965 65,772 5 3.7 29.0 알래스카 1,082 799 786 3 13.1 -1.6 [자료: U.S. Census Bureau] <’21년 對한국 주요 수출 품목> (단위: US$ 백만) 순번 품목 금액 1 Minerals & Ores 394 2 Fish & Other Marine Products 362 3 Transportation Equipment 25 4 Computer & Electronic Products 2 5 Processed Foods 1 6 Chemicals - 7 Electrical Equipment, Appliances & Components - 8 Forestry Products - 9 Beverages & Tobacco Products - 10 Other Special Classification Provisions - [자료: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통계분류 코드 NAICS(3자리) 사용] 시사점 2022년 알래스카주는 고용률의 뚜렷한 회복세, 관광 산업 반등, 건설업 지속 발전, 유가 상승 등의 요인으로 코로나19 위기에서 벗어나 전반적인 회복세를 보이며 한국 기업의 수출 증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알래스카주는 한국과의 교역이 매우 활발하다는 점에서 유리하다. 다만 알래스카주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우리 기업이라면 높은 물가, 부족한 노동력 등의 리스크 요인을 고려해야 하는 등 진출에 앞서 신중한 사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알래스카 주정부 상무부 산하 경제개발부에서는 알래스카에서 비즈니스를 계획하고 있는 이들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 해당 웹페이지(https://www.commerce.alaska.gov/web/DoingBusinessinAlaska.aspx)에서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취득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자료: U.S. Census Bureau, 미국 경제분석국, 알래스카주 노동 및 고용개발부, World Bank,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주앵커리지 대한민국 출장소,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Zippia, 알래스카 주정부 상무부 산하 경제개발부, KOTRA 실리콘밸리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실리콘밸리무역관 이지현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06.09
-

- 대만, 코로나19 확산 이후 ’22년 경제전망
- 2022년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 물가+코로나19 기인 소비심리 위축 영향 대만 행정원 주계총처(통계청 격)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대만 내 코로나19 확산 이후 수정된 경제전망을 5월 27일 발표했다. 수정된 2022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3.91%로 2월 24일 발표한 4.42%보다 0.51%p 낮아졌다.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은 민간소비 부문의 여건이 당초 전망보다 악화된 데 기인한다고 대만 정부는 설명했다. 2022년 대만의 민간소비는 전년대비 3.10%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당초 전망치보다 2%포인트 내려간 수치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물가 상승압력이 커진데다 4월 말 들어서는 대만에서도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져 민간소비 부문에 영향이 불가피해진 것으로 평가된다. <주요 경제전망 수치 수정 전후 비교> 2월 24일 발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19 확산 요인 미반영) 5월 27일 발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19 확산 요인 반영) 조정폭 경제성장률 4.42% 3.91% 0.51%p ⇩ 민간소비 성장률 5.10% 3.10% 2.00%p ⇩ 민간투자 성장률 5.65% 4.61% 1.04%p ⇩ 상품 수출 증가율 9.69% 14.62% 4.93%p ⇧ 상품 수입 증가율 9.57% 15.61% 6.04%p ⇧ 소비자물가 상승률 1.93% 2.67% 0.74%p ⇧ [자료: 대만 행정원 주계총처] 대만인들의 소비심리 변화 흐름은 소비자신뢰지수 조사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2022년 5월 대만의 소비자신뢰지수는 67.81로 2020년 5월(64.87) 이후 2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조사 항목별로도 향후 6개월간 △ 가계 형편 △ 국내 경기 △ 고용상황이 악화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전월(2022년 4월) 조사 대비 증가한 반면, 개선되거나 유지될 것이라고 내다본 비율은 감소했다. 물가수준에 대해서는 96% 이상이 상승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코로나19 시작 이후 대만의 소비자신뢰지수(CCI) 변화 추이> 주: 대만 소비자신뢰지수는 2020년 1월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 이후 급락했다가 코로나19 확산세가 잡히면서 상승세로 전환됨. 2021년에는 코로나19 재확산(5~6월) 이후 소비자신뢰지수가 반짝 반등했으나 민생 물가 상승에 따라 하락세를 보임. [자료: 대만 중앙대학 대만경제발전연구센터] <소비자신뢰지수 중 항목별 향후 6개월 전망(2022년 5월 조사 기준)> 항목 응답 비율(전월 대비 증감폭) 가계 형편 개선 2.1%(1.0%p ⇩) 유지 54.2%(3.1%p ⇩) 악화 43.8(4.1%p ⇧) 국내 경기 개선 8.2%(1.2%p ⇩) 유지 59.6%(3.6%p ⇩) 악화 32.0%(4.8%p ⇧) 고용 상황 개선 2.0%(0.7%p ⇩) 유지 39.9%(1.9%p ⇩) 악화 58.1%(2.7%p ⇧) 물가 수준 하락 0.1%(증감 없음) 안정 0.9%(증감 없음) 상승 96.3%(1.2%p ⇩*) 주: ‘물가수준’ 전망 중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2.7%로 1.2%포인트 상승 [자료: 대만 중앙대학 대만경제발전연구센터] 경기 판단의 척도 중 하나인 구매관리자지수에서도 민간소비 관련 소매업과 숙박·외식업의 ‘향후 6개월 전망’ 지수(12개 하위 지수 중 하나)가 2022년 5월 기준 각각 31.6, 20.0*으로 떨어진 상태다. 주*: 50 이상이면 확장, 50 미만이면 위축 국면을 의미 한편, 코로나19 요인이 민간소비의 주된 불안요인 중 하나이기는 하나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오래가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대만의 일일 확진자 수(국내 발생+해외 유입)는 5월 중순 9만 명 돌파 이후 안정기에 접어든 상태다. 6월에는 감소세에 접어들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위드코로나 기조에 따라 방역 정책을 점차 완화해 나가는 상황이기도 하다. 3차 백신 접종률이 60%를 넘어섰고 위중증·사망 비율도 낮은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어 코로나19에 대한 공포감도 어느 정도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 <대만의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 동향(2022.1.1.~6.6. 기준)> (단위: 명) [자료: Covid-19 Dashboard]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되더라도 글로벌 공급망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은 소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된다. 당초 대만 정부는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 목표인 2%를 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으나 5월에 수정 발표한 전망치는 2.67%로 높아졌다. 분기별로 볼 때 2분기에는 물가상승률이 3%를 넘고 4분기에야 2%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월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1년 8월부터 2%선을 웃도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으며, 2022년 3월에는 3%대에 진입했다. 17개 주요 민생물자*의 경우 평균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2022년 5월에는 17개 주요 민생물자의 물가 상승률이 5%대로 올랐다. 주*: 쌀·달걀·우유·식용유 등 식품류 12개, 세탁세제·화장지·치약 등 생활용품류 5개 <대만의 물가 상승 동향(전년동월대비 상승률)> (단위: %) [자료: 대만 행정원 주계총처] 물가 상승은 임금 증가폭을 상쇄해 임금 소득의 구매력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021년 대만의 명목통상임금(월급과 매달 지급하는 식대, 교통비 등 수당 포함)은 전년대비 1.92% 늘었지만 실질통상임금은 0.04% 줄었다. 감소폭이 크진 않았지만 2016년 이후 첫 감소여서 관심을 모았다. 통상임금에 상여금·성과급·초과근무수당 등을 포함한 임금총액의 경우 명목임금으로 3.01% 증가한 반면, 실질임금은 1.03% 늘어나는데 그치기도 했다. 2022년 1분기에도 상황은 나아지진 않았다. 명목통상임금은 전년 동기 대비 2.71% 증가한 반면, 실질임금은 0.10% 감소했다. 명목통상임금총액은 3.04% 늘어난 반면 실질임금은 0.22%가 증가한 데 그쳤다. 대만의 가계부채 상승 추세도 소비를 위축시키는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0년* 대만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0%를 넘었다. 100%를 넘지는 않았으나 2016년 84.4%에서(2017년) 86.1%→ (2018년) 88.0%→ (2019년) 89.6%→ (2020년) 91.9%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주*: 2022년 6월 기준 최신 통계 민간투자는 역기저효과 확대로 성장률 소폭 하향조정 민간투자 성장률 전망치는 당초 5.65%에서 4.61%로 낮아졌다. 민간투자가 위축됐다기보다는 2021년 실적이 상향 수정*된 데 기인했다는 것이 대만 정부의 설명이다. 주*: 2021년 대만의 민간투자 성장률은 19.05%에서 19.91%로 수정됐다. 대만 정부는 반도체 업계의 생산능력 확대 움직임을 주된 성장요인으로 꼽고 있다.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SEMI)에 따르면, 2022년 대만 기업의 팹 장비 투자액은 전년대비 56% 급증한 350억 달러로 세계 1위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1070억 달러에 달하는 세계 팹 장비 투자액에서 대만이 1/3을 차지한다는 얘기다. 파운드리뿐만 아니라 메모리 업체도 대규모 투자에 나선 상황이다. 난야(Nanya)의 경우 2022년 6월부터 3000억 대만 달러 규모의 D램 공장 신설사업에 착수한다. 2025년부터 월 4만 5000개 규모로 양산을 시작할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 분야도 대만이 민간투자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받쳐주고 있다. ‘2050 탄소중립’ 정책 추진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투자활동이 더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무역 성장세는 오히려 확대 전망 교역 부문은 2021년 30%를 넘어선 증가세에도 2022년 15%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9.63% 성장을 전망했던 당초 예측치보다 5%p 가량 상향 조정된 수치다. 금액 기준으로는 수출과 수입이 각각 5000억 달러, 4000억 달러를 돌파하며 무역 규모 1조 달러 시대를 앞두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2022년 세계 교역량 증가율이 5.0%에 그칠 것이라는 IMF 전망에도 불구하고 대만은 견고한 무역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하게 된 데는 세계 시장의 신기술·디지털 전환 수요가 많을 뿐만 아니라 반도체(대만의 1위 수출품)를 사용하는 제품이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대만 정부는 설명하고 있다. 기술 우위를 차지한 대만 기업들이 첨단공정 생산능력을 확대하고 있어 수출 경쟁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만의 교역 동향과 전망> (단위: 억 달러, %) 2020년 2021년 2022년 교역 금액 6,313 8,279 9,527 증감률 2.68 31.14 15.08 수출 금액 3,451 4,464 5,116 증감률 4.85 29.34 14.62 수입 금액 2,861 3,815 4,410 증감률 0.17 33.32 15.61 [자료: 대만 행정원 주계총처] 시사점 대만 정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에도 4% 성장에 자신감을 보인 바 있다. 그러나 물가상승 압력 확대와 코로나19 유행으로 4% 성장이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 시작했고 결과적으로 대만 정부의 공식적인 전망치도 3%대로 낮아졌다. 한편에서는 정부의 경제전망은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IT 산업의 잠재리스크, 환율 변동성이 전통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등과 같은 불확실성을 고려하지 않아 낙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례로 중소형 디스플레이 업체인 한스타(HannStar)의 경우 170억 대만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통과(2021년 7월)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잠정 보류한다고 발표하며 투자자세를 보수적으로 전환했다. 업황 둔화를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소비자신뢰지수나 구매관리자지수 뿐만 아니라 경기선행지수도 낮아지는 추세를 보여 하반기 경제전망을 낙관하기 어렵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경기선행지수는 향후 3~6개월 정도의 경기변동 예측에 이용하는데, 대만의 경기선행지수는 2021년 11월부터 6개월째 하락세를 그렸다. <대만의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 [자료: 대만 행정원 국가발전위원회 ‘Business Indicators Database’] 성장률 전망치가 오히려 큰 폭으로 상향 조정된 수출 부문에 대해서도 낙관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다. 미국·유럽 등 주요 국가들의 경제 전망이 하향 조정된 상황이므로 수출주도형 경제인 대만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논리에서다. 민간소비가 예상보다 더 부진할 경우 3% 성장도 도전적일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어 코로나19 유행 이후 하반기 대만 경제동향에 귀추가 주목된다. 자료: 대만 행정원 주계총처, 대만 행정원 국가발전위원회, 대만 중앙대학 대만경제발전연구센터, Covid-19 Dashboard, 현지 언론보도(중국시보, 경제일보, 공상시보, 비즈니스투데이) 등 KOTRA 타이베이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타이베이무역관 유기자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06.08
-

- 중국 스마트 농업 발전으로 보는 서부 내륙 진출 기회
- ‘스마트 농업(스마트팜)’은 전통적인 경작 방식의 농, 축, 수산업에 IT기술이 접목된 형태를 통칭하는 단어로 중국 정부 또한 경지 면적의 감소, 농약 과다 사용으로 인한 토양의 악화, 전통 농업의 효율성 저하, 고령화로 인한 농촌 노동력 감소 등의 문제 해결방안으로서 적극적인 스마트 농업(智慧农业) 육성 정책을 내놓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중국이 전 세계 농산품 생산량 1위(63%)를 차지하고 그 뒤를 이어 미국, 터키, 인도, 브라질, 칠레, 러시아, 이란이 약 10% 를 차지하고 있어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농업의 현대화가 농촌 경제 활성화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고 이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2015년 ‘인터넷 플러스’정책과 2016년 ‘2016-2020년 전국농업현대화계획(全国农业现代化规划)’을 발표하여 농업 현대화의 일환으로서 ‘스마트 농업’을 강조하였으며 리커창 총리 역시 2018년 3월 업무보고 중 ‘농업 분야에서 공급측 개혁을 위한 인터넷 농업을 적극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이에 중국 스마트 농업의 전반적인 현황을 살펴보고 현대 농업을 향후 10년 가장 중요한 혁신으로 강조하고 있는 중국 서부 내륙 쓰촨성과 윈난성을 중심으로 한 스마트 농업 발전 정책과 방향을 전망해보고자 한다. 중국 스마트 농업 현황 스마트 농업은 농업에서의 스마트 경제와 그 전반적인 형태를 나타낸 것으로 농업 및 농촌 경제와 효율적인 현대 농업 시스템을 이끄는 주요한 혁신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스마트 농업의 전반적인 산업 사슬 측면에서 보면 상위에는 사료, 비료, 드론, 환경 모니터링, 자동화 등의 ‘분야’으로 분류되며 중위에는 스마트 종묘, 스마트 농장, 스마트 축산, 스마트 어업 등의 ‘적용 대상’로 나뉘어 지고, 하위에는 농산물 가공, 농촌 전자상거래, 냉동 물류, 신선 전자상거래, 농업 금융 등의 ‘관련 서비스’로 이루어 지고 있다. 중국의 스마트 농업은 여전히 초보적인 단계로 현장에서의 적용율은 1%도 안되고 있지만 사회 환경이 뒷받침되고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관련 시장규모가 2016년부터 해를 거듭하면서 성장해오고 있어 2020년 622억 위안에서 2022년에는 743억 위안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16-2022 중국 스마트 농업 시장 규모 및 추세 (단위 : 억 위안) 자료원 : 중상산업연구원(中商产业研究院) 스마트 농업의 현장 적용 분야에 있어서도 각 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전반적인 빅데이터를 수집하여 활용하는 데이터 플랫폼 서비스와 현장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실용화가 가능한 무인기 활용, 정밀 양식, 농기계 자동화 등에 지방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중국 스마트 농업의 주 활용 분야 자료원 : 중상산업연구원(中商产业研究院) 농업은 국민 경제의 발전을 지탱하는 기간 산업으로서 이와 관련한 스마트 농업의 산업화는 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의 신기술에 의해 재구성되고 중앙 정부의 향촌 진흥 전략, 국가 디지털 농업 전략의 다양한 기회 요인으로 농업 분야에 새로운 블루오션이 생겨나 알리바바(阿里巴巴), 징둥(京东), 바이두(百度), 텐센트(腾讯) 등 거대 플랫폼 기업들도 스마트 농업 플랫폼 서비스에 뛰어들고 있으며 기존 농업 비즈니스에서 선두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대표 기업들도 지속적으로 신사업 모델 개발에 앞장서고 있다. 중국 스마트 농업 대표 기업 상장 현황 자료원 : 중상산업연구원(中商产业研究院) 스마트 농업 발전으로 인해 관련 서비스 업계도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 특히 중산층 위주의 소비자 식품 안전 의식도 끊임없이 까다로와 지고 있어 ‘온라인 농산물 직거래 서비스’와 신선 식품 구매와 연관된 ‘냉동 물류’ 시장도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다. 2016-2021(Q3) 중국 농촌 인터넷 소매액 규모 (조 위안) 자료원 : 중국 농업농촌부(农业农村部) 2016-2022 중국 냉동 물류 시장 규모 및 추세 (억 위안) 자료원 : 중국물류냉동물류위(中物冷链委) 쓰촨성(청두시)의 스마트 농업 발전 정책 중국 서부 내륙에 위치한 쓰촨성은 중국 내에서도 대표적인 농업 지역(农业大省)으로 그간 꾸준히농업 과학 기술의 혁신을 중시해 오며 2012년에 '현대 농업의 발전 가속화에 대한 의견(四川省人民政府关于加快发展现代农业的意见)'을 쓰촨성 정부가 발표하면서 현대 농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정책 방향을 내놓았다. 이어서 2015년 '쓰촨성 2015년 '인터넷+중점사업 방안(四川省 2015年 “互联网+重点工作方案)'에서 쓰촨성 농촌농업청이 주도하여 매년 정기적인 관계자 회의 및 학술 회의 개최를 통해 '인터넷+농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으며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싱크탱크, 인터넷, 전자상거래, 물류망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쓰촨성 내 농업 기업, 생산 기지, 협동 조합, 생태 농장 등을 스마트하게 업그레이드하여 쓰촨성은 물론 중국 서남 권역의 스마트 농업을 획기적으로 바꾸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2021년 쓰촨성 스마트 농업 향촌 진흥 보고회 전경 자료 : 쓰촨성 농촌농업청 이에 2019년부터 쓰촨성 정부는 국가급 현대농업 시범기지 13개소, 현대 농업 융합 시범원 230개소를 지정하여 공공정보 플랫폼, 기업의 디지털화, 스마트 농업단지 등의 시범 사업을 잇따라 시행하며 四川华朴(HUAPU AGRICULTURE), 久鑫电子(Jiuxin Electronics), 曙光集团(Sichuan Shuguang Group), 久远银海(Jiuyuan Yinhai), 五丰科技(Sichuan Wufeng Technology) 등의 대표 기업들이 쓰촨성 농업과학원(四川省农业科学院)과 쓰촨농업대학(四川农业大学) 등의 연구 기관들과 함께 한약재 정보플랫폼, 스마트농업 관리시스템 등 현대 농업 혁신의 기반이 되는 각종 시스템 개발에 나서고 있다. 2021년 2월에는 ‘쓰촨성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14차 5개년 규획 및 2035년 장기발전 요강(四川省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四个五年规划和二0三五远景目标纲要)을 발표하며 쓰촨성 농업 산업 발전에 있어 국가급 규모의 농업과학기술센터 설치 및 관련 플랫폼을 정비하고 현대 농업 시스템과 과 농업 조직을 전문화하여 가장 대표적인 농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세부 요강에는 채소(서남부), 차(雅安,乐山,宜宾,广元,巴中), 레몬 허브(安岳), 키위(绵竹,蒲江), 특수 약재(서북부 고원) 등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한 중점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현대 농업과 스마트 농업을 동시에 접목해 나갈 계획을 명시하였다. 쓰촨성 5대 경제권별 특색 농업 분포 자료 : 바이두(百度) 또한 2021년 11월에 ‘쓰촨성 향촌진흥촉진조례(四川省乡村振兴促进条例)를 발표하며 청두시를 시범개혁 모델로 지정하며 농기계 산업의 데이터화, 각종 센서 및 조기 경보, 빅데이터 관리, 농산품 공공서비스 개선, 농촌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을 체계화하였다. 특히 청두시 교외에 소재한 푸장시(蒲江), 충조우시(崇州), 총라이시(邛崃), 다이현(大邑), 원장구(温江) 등 현급 행정구역은 현대 농업 혁신의 오피니언 리더로써의 책임을 맡고 농촌 마을 환경 개선, 향촌 관광과 연계한 농민 서비스 증대, 농업 현대화, 농업 사물인터넷 시범기업(金堂正鑫, 邛崃微牧, 温江惠美 등 70개사) 지정 등에 가장 많은 정책적인 힘을 쏟고 있다. 윈난성(쿤밍시)의 스마트 농업 발전 정책 윈난성은 중국 서부 내륙에서도 천애의 생태 환경을 활용한 차, 약재, 담배, 화훼 등의 고원 농업이 주력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지역으로 일찍이 2016년에 ‘쿤밍시 인터넷+농업 행동방안(昆明市互联网+农业行动方案)을 내놓고, 쿤밍시 전체의 "디지털 농업" 발전을 위해 정책 방향과 실천 방안을 제정하였다. 또한 윈난성 정부가 주도하여 쿤밍시 농업농촌국, 윈난농업대학(빅데이터), 쿤밍농업발전투자유한공사 3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정부+대학+국유플랫폼’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쿤밍시의 디지털 농업 발전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3개 기관은 이미 윈난 농업 빅데이터 쿤밍 분센터(云南农业大数据昆明分中心)를 설립하여 농업 자원, 기후 토양, 시장 정보 등 3개 분야의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관리하며 쿤밍시의 중장기 발전 정책 수립과 의사 결정에 관련 근거를 제공하고 있으며 스마트농업 IoT 활용 클라우드 플랫폼인 ‘농업시장 빅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도 개발하여 시장에서 운용되고 있다. 또한 윈난성 정부가 주도하여 쿤밍시 농업농촌국, 윈난농업대학(빅데이터), 쿤밍농업발전투자유한공사 3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정부+대학+국유플랫폼’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쿤밍시의 디지털 농업 발전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3개 기관은 이미 윈난 농업 빅데이터 쿤밍 분센터(云南农业大数据昆明分中心)를 설립하여 농업 자원, 기후 토양, 시장 정보 등 3개 분야의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관리하며 쿤밍시의 중장기 발전 정책 수립과 의사 결정에 관련 근거를 제공하고 있으며 스마트농업 IoT 활용 클라우드 플랫폼인 ‘농업시장 빅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도 개발하여 시장에서 운용되고 있다. 현재 쿤밍시는 관련 산업 현장에 '디지털 클라우드 플라워', ‘농산물 품질 수급 시스템’ 등 6대 응용 체계를 구축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74만 8,592개 농가, 255만 3092명의 농촌 인구에 대한 기초정보, 1,249개 행정촌 9대 특화산업의 재배 면적 및 생산량에 대한 기초자료, 1,249개 촌락의 기본실태, 협동조합, 선도기업, 농촌환경 정비실태 등의 기초 수치를 데이터화하여 시 전체 시설 농업, 스마트 농업, 디지털 농업 발전을 위한 탄탄한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 윈난성의 농업 발전 정책 변화 자료원 : 윈난성 농촌농업청, 청두무역관 정리 결론적으로 정리해 보면 윈난성은 스마트 농업 발전에 있어 현장의 기업들이 차, 화훼, 채소, 과일, 한약재 등의 각 분야에서 농업 사물인터넷의 핵심 기술, 스마트 장비와 해결 방안을 시험하고 육성하도록 장려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디지털 농업 응용 모델을 널리 보급하여 농업 생산율, 노동 생산율, 자원 이용률을 높이고자 하고 있다. 시설 농업에는 물+비료 일체형 스마트 관개 시스템의 보급 및 활용을 가속화하고 현장 기업에는 사물인터넷(IoT) 제어, 원격 모니터링, 지능화 정밀 작업 등의 기술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축산업에는 양식 환경 감시, 정밀 사육, 폐기물 자동 처리, 인터넷 연동 장비를 중점적으로 응용하여 ‘디지털 양돈장’, ‘스마트 양계장’ 등을 확대하고 있다. 어업에는 수질환경 모니터링, 정밀 감시, 조기 경보, 원격 진단, 순환수 장비제어, 양식장비 시설 자동제어 등 기술과 장비 활용을 중점 도입하고 있다. 시사점 스마트 농업은 친환경적인 정밀 농업 방식을 도입하는 전반 기술,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는 현대 사회의 농촌 노동력 문제,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신개념 유통이라는 트렌드를 가지고 왔으며 단순히 재배기법의 개선, 생산성 개선, 유통비 절감 등의 생산 현장의 문제 해결만이 아닌 지역적 기후 환경 변화와 소득 수준에 따른 농작물 소비 패턴, 지속 발전 가능한 농업 정책의 개발 등의 중장기적인 과제로서 정부와 학교, 현장(기업)이 협력하고 있는 미래 먹거리 비즈니스 인프라라고 볼 수 있다. 이에 중국 서부 내륙에 소재한 농업 강성(强省)인 쓰촨성과 윈난성도 이러한 시대적 변화의 요구에 따라 현재 ‘향촌(농촌) 진흥’이라는 큰 정책 과제를 ‘현대 농업 혁신’, ‘관련 인프라 재정비’, ‘향촌 관광’, ‘ 농촌 소득 증대’ 등의 세분화된 액션 플랜을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다. 특히 수요자(농촌)를 대상으로 한 공공서비스 인프라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데이터 정밀 관리 및수집’, ‘빅데이터 대외 개방 및 활용’에 집중하고 있으며, 현장의 효율적인 혁신 측면에서는 ‘정밀 모니터링 기술’, ‘비용 절감과 노동 효율성을 고려한 시스템’, ‘판매와 직결된 온라인 마케팅’을 우선적으로 도입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 스마트 농업 시장 진출을 검토하고 있는 우리 기업의 입장에서는 유기농 비료, 스마트하고차별화된 응용 농기계도 현지 시장에서 많은 호응을 얻을 수 있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IOT와 연동한 스마트 온실, 정밀 모니터링 및 조기 경보, 지역적 환경 특색을 고려한 종합적인 스마트 재배(관리) 솔루션 등의 기술집약적 신비즈니스 모델도 적극 검토할 만 하다.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의 현지 진출에 있어서 기업이 개발한 모델의 원천 기술과 응용 기술에 대한 보안적인 부분도 우려가 될 수 있으나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등 국내 관련 기관의 해외 현지 실용화 사업참여를 통해 시장개척 가능성을 검토하여 현지 대기업(중견기업) 또는 학계와의 공동 기술개발을 통한 적극적인 현지 마케팅 방식은 신시장 개척을 통한 회사 수익모델 발굴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선택이라 할 수 있다. 자료원 : 쓰촨성 농업농촌청, 청두시 농업농촌국, 윈난성 농업농촌청, 쿤밍시 농업농촌국, 중상산업연구원(中商产业研究院), 중국물류냉동물류위(中物冷链委), 신경보(新京报), 바이두(百度), KOTRA 청두무역관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청두무역관 Mao Yu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06.08
-

- 필수생산재와 원자재 이집트 신용장 의무화 조치에서 제외, 세부 품목 리스트 공개
- 이집트 중앙은행이 지난 2월 발표한 신용장 의무화 조치에서 필수생산재와 원자재를 제외했다. 이전 발표문에서 명시한 신용장 의무조치 제외 품목인 의약품과 식료품 등에 산업필수재와 원자재가 추가되었으며 이에 해당하는 품목 리스트를 발표했다. 발표된 문서는 HS코드 6자리가 명시된 약 2,000개 품목에 달하는 리스트이며, 거래 바이어와 HS 코드를 사전 확인 후 대금결제 조건을 기존 추심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해당 리스트는 첨부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아랍어로 작성되었다. 이집트 업체들 '신용장 의무화 조치 부당, 통관도 지연되는 등 애로 가중' 신용장 의무화 조치 이후 이집트 내부에서도 여러 반발의 목소리가 많이 있다. 이집트 비즈니스연합회(EBA)와 이집트상공회의소(FEDCOC), 그리고 이집트 산업연합(FEI) 에서는 해당 조치 직후 곧바로 항의 서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외에도 여러 단체에서 반발이 많은데, 이번 조치가 이집트 여러 산업 비용을 증가시키고 국가 경제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더불어 이집트 은행 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급격하게 신용장 의무화 조치로 제한하게 되어 외국 거래선과의 관계 악화도 걱정된다는 목소리가 많다. 또한 신용장 방식으로 거래대금 결제조건을 제한할 경우 대금결제 외에도 실제 통관이 지연되는 상황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기존의 추심방식의 경우 수입업자의 지불능력을 보증하는 서류(Form4)만으로 수입물품 통관을 쉽게 진행할 수 있었는데, 신용장 조건으로 제한된 이후 통관을 위한 은행 서류 발급이 늦어져 현재 이집트항에 많은 수입물품이 쌓이고 있다고 현지 업체들은 전했다. 업체 인터뷰 결과 신용장 발급까지 최소 60일이 걸리는 것으로 확인되어 통관에까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용장 발급에도 순서가 있어, 불투명한 행정절차에 어려움 호소 조치 시행 외에도 실제 실무에서도 여러 애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지 수입업체 A사는 ‘실제 지급능력이 있고 계약 대금의 120%에 달하는 달러화를 가지고 가도 신용장 발급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은행에서 특정 품목에 대해서만 신용장을 우선 발급해주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에 실제 은행에 문의 결과 2022년 4월 경 현지 시중은행인 Bank Audi 특정 지점에서는 중장비에 대해서 2백만 달러를 할당해 그 이상의 신용장 발급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각 은행 지점에서는 실제 조치내용 외에도 각 은행 우수 고객, 거래 제품 등을 따져서 신용장 발급을 결정하게 되는 실정이다. 이러한 처사를 두고 ‘전국적인 조치를 취해놓고 정작 실무판단은 은행에 전임해버리면 지불능력이나 필수산업재 여부 등이 아니라 은행 우수 고객 등 비공식적인 사항으로 신용장 발급여부가 결정되기도 한다’ 면서 점차 어려워지는 상황을 전달했다. 또한, 신용장 발급 시 달러가 아닌 현지화로 은행에 예치할 경우 향후 환율 상승을 대비해 예치 시점의 달러대비 현지화 금액보다 120% 더 많이 예치를 해야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또, 사전에 발표한 신용장 발급을 위해 중앙은행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12개 품목 관련해서는 중앙은행에 문의를 수차례 했지만 답변이 오지 않아 거래일이 점차 뒤로 밀리고 있는 상황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신용장 발급 수수료 경감 등 기업활동 위한 조치도 병행 한편, 현지 은행도 이번 조치와 관련해 무조건 신용장 발급을 해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현지 시중은행 중 하나인 HSBC 관계자는 인터뷰에서 ‘이번 조치는 이집트 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경제 침체에 따른 달러 부족 현상을 감안한 것이다. 이집트 중앙은행은 제품 수입에 따른 달러 유출을 제한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고 답하여 이번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시중 은행들은 이번 조치에 따라 고객들의 불만 등을 확인해 신용장 발급 수수료를 낮추고 기존 고객의 신용 한도를 높이는 등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은행 지점 별로 보유 달러 규모가 달라 은행 지점별로, 신용장 개설 요청 품목별로 개설 여부가 상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은행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지 기업들의 신용장 개설 애로가 당분간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시사점 신용장 의무화 조치 이후 아직 시장에 혼란이 있는 모습이다. 한편, 이번 조치가 이후 사우디아라비아 긴급자금 지원 등 이집트 외환보유액 유지를 위한 국제사회 지원도 계속되고 있고 이집트 은행들의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수수료 경감등의 노력도 있는 바, 향후 신용장 의무화 조치가 단계적으로 완화되길 기대할 수 있다. 다만, 당분간 신용장 발급 지연과 이에 따른 통관지연 사태는 계속 될 것으로 보이기에 거래 은행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업무 진행이 필수인 상황이다. 은행에서도 각 지점별로, 고객별로, 제품별로 일종의 쿼터제를 운행하느 것으로 보이는 바 이에 따른 발빠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자료: 이집트 중앙은행, Back Audi 등 시중은행 인터뷰 및 무역관 자체수집 자료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카이로무역관 신준열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06.08











